목차
1. 머 리 말
2. 朝鮮初期 개성상인의 성장
3. 개성상인의 자본축적 活性化
4. 朝鮮後期 개성상인의 쇠퇴요인
5. 식민지시대와 그 이후의 개성상인
6. 맺 음 말
2. 朝鮮初期 개성상인의 성장
3. 개성상인의 자본축적 活性化
4. 朝鮮後期 개성상인의 쇠퇴요인
5. 식민지시대와 그 이후의 개성상인
6. 맺 음 말
본문내용
여 다시금 변화하게 되었다. 공황으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여 미곡증산중심의 식민지 지배정책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1931년 오타와회담의 결과 세계경제의 블럭화는 일선만(日鮮滿) 경제블럭의 위상을 재조정해야만 하게 되었다. 일본제국주의가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7년의 중일전쟁을 도발하여 준전시체제에 돌입한 결과, 조선은 정치·경제적으로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兵站基地\'로 그 위상이 설정되었다. 이제 조선은 대일본제국 내에서 단순 농업국으로부터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서의 공업국으로 그 위치가 변화되고 있었으며, 조선의 위상 변화로 인하여 1930년대 들어 한국의 공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인들을 용이하게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황국신민화정책이 실시되었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일본 패망이후에도 개성상인의 정신과 활동은 그 명맥을 지켜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성상인 출신 기업인으로는 삼정펄프 전재준 회장, 한국제지를 설립한 고(故) 단사천 회장, 오뚜기 식품 함태호 회장, 개성상회 한창수 회장, 한국화장품 임광정 명예회장 등이 있고, 2세 기업인들로서 한일시멘트 허정섭 명예회장, 태평양화학 서성배 사장, 신도리코 우석형 회장, 동양화학 이수영 사장, 한국 후지쯔 윤재철 사장, 한국야쿠르트 이은선 사장, 세방여행사 오창희 대표 등이 있다.
6. 맺 음 말
개성에는 高麗時代때부터 市廛이 開設되어 있었고, 그것은 조선시대에도 계속 존속하였다. 개성시전에 관한 자료가 적어서 그 진상을 구명하기는 어렵지만, 개성시전도 서울시전과 같이 琴亂廛特權이 인정되었고, 또 서울의 육의전에 비할 만한 사대전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四大典會儀라는 관부에서 인정하는 회의기구가 있어서 시전상인 상호간의 蕪爭認定과 大官府問題에 있어서의 權益保護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나아가서 행상하는 개성상인에 관해서도 그 기능이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개성상인의 商業活動의 본진을 市廛상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역시 국내名地方을 연결하는 사행활동과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외국무역활동에 있었으며 그들의 자본축적도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한편 조선 건국 이후 漢陽天道가 실시됨에 따라 도성중심의 상권개편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유교적 이념에 따라 강력한 상업통제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개성상업은 일시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곧 전과 다름없이 回復되었다. 그러나 이로써 개성상업이 몰락한 것은 아니었다. 고려 이래의 商業傳統은 그처럼 단기간에 단절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고, 조선 정부 역시 개성상업이 국내외 교역에서 담당하고 있던 비중과 역할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필요로 하였다. 그것은 財政運營이나 使臣優待등과 관련된 국가수요의 조달 문제였다. 조선 정부는 상업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국가 需要를 國初이래 시역의 형태로 도성의 시전에게서 우선 공급받고 있었다. 그런데 재정운영이나 사신지대, 경제정책의 一環으로 제기되던 국가수요 물품의 調達과 剩餘勿 처분역할은, 개성의 시전과 상인들 역시 그 한 몫을 떠맡고 있었다. 도성에 시전행랑이 조성되고 市廛體系가 형성된 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즉 이는 국가가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도성과 함께 개성상업을 이용하는 형태였고, 이는 곧바로 개성이 상업도시로서의 성격을 維持保全하는 기반이 되고 있었다.
개성상인의 資本蓄積活動은 송방을 통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국내무역과 인삼을 주요 수출품으로 한 대외무역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특히 19세기 삼업을 통한 부의 축적은 삼포경영과 홍삼무역을 통해서 가능했다. 三包經營은 거의 대부분 개성상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삼포수익이 언제나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고가의 商業作物로서 인삼재배의 수익은 대단히 컸기 때문에 19세기 내내 삼포경영은 꾸준히 유지 될 수 있었다.
개성상인은 외국무역을 주도하고 전국에 商業組織망을 형성하면서 상업자본을 축적하였다. 이를 기초로 인삼재배와 가공업에 進出하기도 했다. 개항 후 경강상인 등 포구 주인층은 外來資本에 점차 굴복된 반면 개성상인은 외래자본이 침투하기 어려운 내지유통망을 근거로 자본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외래자본과 끝까지 투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양적증대에 불과했을 뿐 근본적으로 개성상인을 비롯한 조선의 상업자본이 조세의 金納化, 개항, 새로운 외국무역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극복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개성상인의 경우 상단중심에서 초기의 부보상 중심의 형태로 회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미약했던 자본력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았고 결국 韓日合邦을 통해서 조선의 주권을 거머쥔 일본에 의한 商業資本, 그중에서도 개성상인에 대한 수탈정책을 통해 커다란 타격을 받았음이 사실이다. 회사령의 제정 人蔘販賣權의 강탈 등을 거치며 활동영역과 자본내지는 활동규모가 극도로 쇠약해졌음은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일본이 식민지시대 초기부터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개성상인의 정신은 아직까지도 실제하고 있음은 개성상인 자손들의 기업들이 현재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외형적인 모습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을 뿐 오늘날까지도 실제하고 있는 개성상인의 상업에 대한 정신, 신뢰와 節約위주의 경영철학은 “경제대란”이라 불리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선시대 이후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현재까지도 정신적, 형태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개성상인이라는 商業資本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현재적 의의를 고찰해볼 때 그 시사하는 바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데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朴平植 <朝鮮前期 開城商業과 開城商人> <<韓國使硏究>> 1998.
開城商人의 商業基盤 및 器質에 관한 硏究 한국 傳統商學연구.
한우근 韓國 開港期의 商業硏究.
姜萬吉 <開城商人硏究> <<韓國使硏究>> 1972.
김성수 開城商人發達使연구 -開城商人情神연구 2002.
양정필 19세기 開城商人의 資本전환과 蔘業자본의 성장 2002.
박경식, 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 (上), 靑木書店, 1973, pp. 108-109.
두산브리테니커 백과사전
6. 맺 음 말
개성에는 高麗時代때부터 市廛이 開設되어 있었고, 그것은 조선시대에도 계속 존속하였다. 개성시전에 관한 자료가 적어서 그 진상을 구명하기는 어렵지만, 개성시전도 서울시전과 같이 琴亂廛特權이 인정되었고, 또 서울의 육의전에 비할 만한 사대전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四大典會儀라는 관부에서 인정하는 회의기구가 있어서 시전상인 상호간의 蕪爭認定과 大官府問題에 있어서의 權益保護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나아가서 행상하는 개성상인에 관해서도 그 기능이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개성상인의 商業活動의 본진을 市廛상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역시 국내名地方을 연결하는 사행활동과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외국무역활동에 있었으며 그들의 자본축적도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한편 조선 건국 이후 漢陽天道가 실시됨에 따라 도성중심의 상권개편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유교적 이념에 따라 강력한 상업통제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개성상업은 일시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곧 전과 다름없이 回復되었다. 그러나 이로써 개성상업이 몰락한 것은 아니었다. 고려 이래의 商業傳統은 그처럼 단기간에 단절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고, 조선 정부 역시 개성상업이 국내외 교역에서 담당하고 있던 비중과 역할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필요로 하였다. 그것은 財政運營이나 使臣優待등과 관련된 국가수요의 조달 문제였다. 조선 정부는 상업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국가 需要를 國初이래 시역의 형태로 도성의 시전에게서 우선 공급받고 있었다. 그런데 재정운영이나 사신지대, 경제정책의 一環으로 제기되던 국가수요 물품의 調達과 剩餘勿 처분역할은, 개성의 시전과 상인들 역시 그 한 몫을 떠맡고 있었다. 도성에 시전행랑이 조성되고 市廛體系가 형성된 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즉 이는 국가가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도성과 함께 개성상업을 이용하는 형태였고, 이는 곧바로 개성이 상업도시로서의 성격을 維持保全하는 기반이 되고 있었다.
개성상인의 資本蓄積活動은 송방을 통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국내무역과 인삼을 주요 수출품으로 한 대외무역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특히 19세기 삼업을 통한 부의 축적은 삼포경영과 홍삼무역을 통해서 가능했다. 三包經營은 거의 대부분 개성상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삼포수익이 언제나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고가의 商業作物로서 인삼재배의 수익은 대단히 컸기 때문에 19세기 내내 삼포경영은 꾸준히 유지 될 수 있었다.
개성상인은 외국무역을 주도하고 전국에 商業組織망을 형성하면서 상업자본을 축적하였다. 이를 기초로 인삼재배와 가공업에 進出하기도 했다. 개항 후 경강상인 등 포구 주인층은 外來資本에 점차 굴복된 반면 개성상인은 외래자본이 침투하기 어려운 내지유통망을 근거로 자본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외래자본과 끝까지 투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양적증대에 불과했을 뿐 근본적으로 개성상인을 비롯한 조선의 상업자본이 조세의 金納化, 개항, 새로운 외국무역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극복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개성상인의 경우 상단중심에서 초기의 부보상 중심의 형태로 회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미약했던 자본력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았고 결국 韓日合邦을 통해서 조선의 주권을 거머쥔 일본에 의한 商業資本, 그중에서도 개성상인에 대한 수탈정책을 통해 커다란 타격을 받았음이 사실이다. 회사령의 제정 人蔘販賣權의 강탈 등을 거치며 활동영역과 자본내지는 활동규모가 극도로 쇠약해졌음은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일본이 식민지시대 초기부터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개성상인의 정신은 아직까지도 실제하고 있음은 개성상인 자손들의 기업들이 현재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외형적인 모습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을 뿐 오늘날까지도 실제하고 있는 개성상인의 상업에 대한 정신, 신뢰와 節約위주의 경영철학은 “경제대란”이라 불리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선시대 이후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현재까지도 정신적, 형태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개성상인이라는 商業資本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현재적 의의를 고찰해볼 때 그 시사하는 바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데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朴平植 <朝鮮前期 開城商業과 開城商人> <<韓國使硏究>> 1998.
開城商人의 商業基盤 및 器質에 관한 硏究 한국 傳統商學연구.
한우근 韓國 開港期의 商業硏究.
姜萬吉 <開城商人硏究> <<韓國使硏究>> 1972.
김성수 開城商人發達使연구 -開城商人情神연구 2002.
양정필 19세기 開城商人의 資本전환과 蔘業자본의 성장 2002.
박경식, 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 (上), 靑木書店, 1973, pp. 108-109.
두산브리테니커 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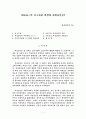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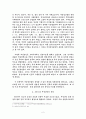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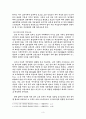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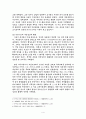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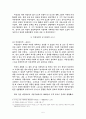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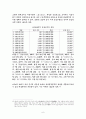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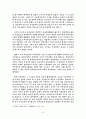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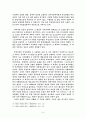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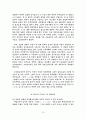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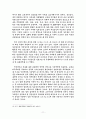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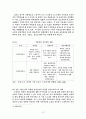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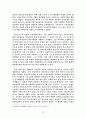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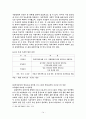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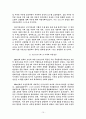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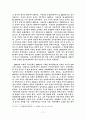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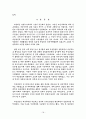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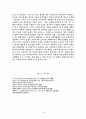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