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민주화 투쟁 당시 노동자 계급의 항쟁을 감동적으로 그려내었다고 평가받는 작품이다. 종전의 작품들이 핵심의 주변에서 맴돈 반면에 이 작품은 사건이나 항쟁의 내부에까지 접근하고 있다. 물론, 노동자 계급의 우월성과 관념적인 문제만을 다루었다는 평도 없지 않으나, 역사적인 사실에 노동자 계급의 의미와 신념을 표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종단부에서는 노동자의 신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자 계급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으며, 나아가 강대국인 미국의 허위를 고발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인 태도를 보는 비판이 아니라, 문학이 지녀야 하는 보편적 설득력의 강압에서 찾을 수 있는 비판의 태도이다. 문학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독자에게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형식이다. 만약 문학이 독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허구와 과장된 세계를 구축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계통의 작품에서, 사실적인 방법으로만 진실을 이끌어내려 하다 보면, 작품의 미학적인 범주에 속하는 감동이나 문체의 기사화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이런 목적 의식을 지닌 작품이 건너야 하는 가장 큰 난점인 문학으로서의 예술성이 하나의 문제로 등장하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이 작품만의 문제가 아니다. 목적 의식을 지닌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예술성을 지닌 작품으로서의 미학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 목적 의식의 작품들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가장 큰 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을 통해서 문제를 표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인 태도를 보는 비판이 아니라, 문학이 지녀야 하는 보편적 설득력의 강압에서 찾을 수 있는 비판의 태도이다. 문학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독자에게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형식이다. 만약 문학이 독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허구와 과장된 세계를 구축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계통의 작품에서, 사실적인 방법으로만 진실을 이끌어내려 하다 보면, 작품의 미학적인 범주에 속하는 감동이나 문체의 기사화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이런 목적 의식을 지닌 작품이 건너야 하는 가장 큰 난점인 문학으로서의 예술성이 하나의 문제로 등장하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이 작품만의 문제가 아니다. 목적 의식을 지닌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예술성을 지닌 작품으로서의 미학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 목적 의식의 작품들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가장 큰 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을 통해서 문제를 표출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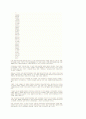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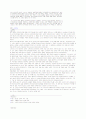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