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게르만법상의 共同所有
1. 總 有
(1) 合手的共同體的 總有
(2) 社團的 總有
2. 合 有
(1) 合手的 團體
(2) 持分 參加
(3) 합유의 변형
3. 共 有
(1) 공유의 개념
(2) 게르만법상의 공유
4. 로마법의 영향
Ⅲ. 우리 民法上의 共同所有
1. 구민법
2. 현행 민법
(1) 公 有
1)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 - 持分
2) 공유물의 分割
(2) 總 有
(3) 合 有
Ⅳ. 끝맺으며
Ⅱ. 게르만법상의 共同所有
1. 總 有
(1) 合手的共同體的 總有
(2) 社團的 總有
2. 合 有
(1) 合手的 團體
(2) 持分 參加
(3) 합유의 변형
3. 共 有
(1) 공유의 개념
(2) 게르만법상의 공유
4. 로마법의 영향
Ⅲ. 우리 民法上의 共同所有
1. 구민법
2. 현행 민법
(1) 公 有
1)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 - 持分
2) 공유물의 分割
(2) 總 有
(3) 合 有
Ⅳ. 끝맺으며
본문내용
합재산은 실질적으로는 조합이라는 단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조합원 각자의 개인적인 재산과는 구별되는 조합의 『特別財産』이다. 이러한 조합의 재산의 특수한 귀속관계를 『合有關係』라 한다.
조합에 있어서, 단체의 구성원인 개인은 여전히 독립한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團體性이 약하고, 개개의 구성원의 개성이 무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합원은 각각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유와 달리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해 구속되어 있고,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한다. (제 273조 Ⅰ) 그리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273조 Ⅱ) 합유물의 분할이 이루어 진다면, 그 합유물은 조합재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이며, 특약으로 분할 할 수도 있다.
합유는 공유에 비해서는 단체성이 강하지만, 총유에 있어서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뚜렷하다. 그리고 합유는 단체주의적인 게르만 법에서 생긴 공동소유형태이다.
합유관계의 종료원인은, 합유물의 양도로 조합재산이 없게 되는 때와, 조합체의 해산이 있게 되는 때이다. (제 274조 Ⅰ) 조합체의 해산으로 합유관계가 종료하게 되면, 합유재산은 분할되게 되는데, 그 분할에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 274조 Ⅱ)
(3) 總 有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서 결합하고 있고, 목적물의 관리, 처분은 단체 자체의 권한으로 하지만,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자 사용, 수익하는 권능이 인정되는 공동소유의 모습이다. 그런데 총유는 단체의 소유형태지만, 그 단체의 성질이 법인과는 다르다. 즉,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의 모습이 총유이다.
총유에는 지분이라는 것이 없고, 공유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단체주의적 공동소유의 모습이다. 그리고 합유와 마찬가지로 게르만 법에서 생긴 공동소유형태이다. 총유관계는 社團의 정관 기타의 규약에 의해 규율되나, 정관이나 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는 때에는 제 276조와 제 277조의 규정에 의한다. 즉, 제 276조 Ⅰ 에 의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하고, 각 사원은 제 276조 Ⅱ 에 의거해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使用, 受益 할 수 있다. 그러나 물건 자체에 대한 지분권은 없다. 또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당연히 취득, 상실된다. (제 277조) 즉, 사단을 탈퇴하게 되면,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 의무도 당연히 상실된다.
Ⅳ. 끝맺으며
위와 같이 고대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알아보았으며, 또한 이 상이한 두 법문화의 공동소유에 대한 관념이 반영되어 체계화된 오늘날 우리민법의 공동소유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인 법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근대법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개인소유권으로 分化될 수 있는 共有가 가장 원칙적인 공동소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동목적을 위하여 다수인이 결합하고 있는 경우에 공동소유자 사이의 연대를 강화시키고, 공동목적에 기한 구속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소유관계를 공유관계로서 규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合有의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總有에 대해서는 독자적 의의에 있어서 오늘날 의견이 대립된다. 게르만의 촌락공동체에서와 같은 토지의 총유적 이용관계는 현대의 소유권 개념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이질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유물이며, 따라서 장차 소멸할 운명이라는 견해와 다수인이 모여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으며 단체를 결성하는 추세는 늘어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체의 소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총유의 개념이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조합에 있어서, 단체의 구성원인 개인은 여전히 독립한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團體性이 약하고, 개개의 구성원의 개성이 무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합원은 각각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유와 달리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해 구속되어 있고,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한다. (제 273조 Ⅰ) 그리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273조 Ⅱ) 합유물의 분할이 이루어 진다면, 그 합유물은 조합재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이며, 특약으로 분할 할 수도 있다.
합유는 공유에 비해서는 단체성이 강하지만, 총유에 있어서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뚜렷하다. 그리고 합유는 단체주의적인 게르만 법에서 생긴 공동소유형태이다.
합유관계의 종료원인은, 합유물의 양도로 조합재산이 없게 되는 때와, 조합체의 해산이 있게 되는 때이다. (제 274조 Ⅰ) 조합체의 해산으로 합유관계가 종료하게 되면, 합유재산은 분할되게 되는데, 그 분할에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 274조 Ⅱ)
(3) 總 有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서 결합하고 있고, 목적물의 관리, 처분은 단체 자체의 권한으로 하지만,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자 사용, 수익하는 권능이 인정되는 공동소유의 모습이다. 그런데 총유는 단체의 소유형태지만, 그 단체의 성질이 법인과는 다르다. 즉,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의 모습이 총유이다.
총유에는 지분이라는 것이 없고, 공유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단체주의적 공동소유의 모습이다. 그리고 합유와 마찬가지로 게르만 법에서 생긴 공동소유형태이다. 총유관계는 社團의 정관 기타의 규약에 의해 규율되나, 정관이나 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는 때에는 제 276조와 제 277조의 규정에 의한다. 즉, 제 276조 Ⅰ 에 의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하고, 각 사원은 제 276조 Ⅱ 에 의거해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使用, 受益 할 수 있다. 그러나 물건 자체에 대한 지분권은 없다. 또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당연히 취득, 상실된다. (제 277조) 즉, 사단을 탈퇴하게 되면,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 의무도 당연히 상실된다.
Ⅳ. 끝맺으며
위와 같이 고대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알아보았으며, 또한 이 상이한 두 법문화의 공동소유에 대한 관념이 반영되어 체계화된 오늘날 우리민법의 공동소유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인 법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근대법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개인소유권으로 分化될 수 있는 共有가 가장 원칙적인 공동소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동목적을 위하여 다수인이 결합하고 있는 경우에 공동소유자 사이의 연대를 강화시키고, 공동목적에 기한 구속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소유관계를 공유관계로서 규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合有의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總有에 대해서는 독자적 의의에 있어서 오늘날 의견이 대립된다. 게르만의 촌락공동체에서와 같은 토지의 총유적 이용관계는 현대의 소유권 개념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이질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유물이며, 따라서 장차 소멸할 운명이라는 견해와 다수인이 모여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으며 단체를 결성하는 추세는 늘어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체의 소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총유의 개념이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추천자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지역사회의 복지기능과 활동
지역사회의 복지기능과 활동 [자본주의]자본주의 분석 고찰(자본주의 사회의 정의, 자본주의의 근원, 자본주의 사회의 성...
[자본주의]자본주의 분석 고찰(자본주의 사회의 정의, 자본주의의 근원, 자본주의 사회의 성... 21세기와 목재
21세기와 목재 Mintzberg의 정부역할의 5가지 모형과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 조직의 무형적 자원 계발 전략
Mintzberg의 정부역할의 5가지 모형과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 조직의 무형적 자원 계발 전략 지역사회복지 구조 기능의 특성과 문제점
지역사회복지 구조 기능의 특성과 문제점  일제강점기 이전의 지역사회복지
일제강점기 이전의 지역사회복지 양돈학 양돈경영, 판매 및 생산물
양돈학 양돈경영, 판매 및 생산물 지역 사회 복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지역 사회 복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 전략수립 및 지리적, 기능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 전략수립 및 지리적, 기능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조직) 요약정리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조직) 요약정리 북한 연구 [사회주의 공산주의 기본 원리 마르크스 레닌주의 주체사상 소련 공산주의 역사 사...
북한 연구 [사회주의 공산주의 기본 원리 마르크스 레닌주의 주체사상 소련 공산주의 역사 사...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가족 관계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가족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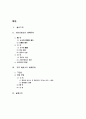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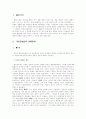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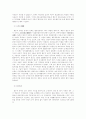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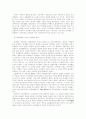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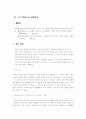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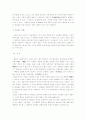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