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1
Ⅱ. 로마법상의 法人 2
1. 法人의 性質 2
2. 法人의 種類 2
(1) 公法人 2
(2) 社團 3
(3) 財團 3
1) 宗敎團體 3
2) 皇帝의 金庫 4
Ⅲ. 게르만법상의 法人 5
1. 總說 5
2. 團體의 種類 5
⑴ 協同共同體 5
1) 平等的 秩序의 團體 6
2) 支配的 秩序의 團體 6
⑵ 社團 6
1) 都市 7
2) 國家 7
3) 職業團體 및 營利團體 7
4) 文化團體 7
⑶ 合手的 團體 8
⑷ 中間團體 8
Ⅳ. 中世 이후의 法人理論 9
1.中世에서의 法人理論 9
2. 近代 이후의 法人理論 9
Ⅴ. 우리 民法의 法人 10
1. 獨逸民法 및 舊民法과의 比較 10
2. 우리나라에서의 法人論 10
3. 法人格없는 社團 12
Ⅵ. 結語 13
Ⅱ. 로마법상의 法人 2
1. 法人의 性質 2
2. 法人의 種類 2
(1) 公法人 2
(2) 社團 3
(3) 財團 3
1) 宗敎團體 3
2) 皇帝의 金庫 4
Ⅲ. 게르만법상의 法人 5
1. 總說 5
2. 團體의 種類 5
⑴ 協同共同體 5
1) 平等的 秩序의 團體 6
2) 支配的 秩序의 團體 6
⑵ 社團 6
1) 都市 7
2) 國家 7
3) 職業團體 및 營利團體 7
4) 文化團體 7
⑶ 合手的 團體 8
⑷ 中間團體 8
Ⅳ. 中世 이후의 法人理論 9
1.中世에서의 法人理論 9
2. 近代 이후의 法人理論 9
Ⅴ. 우리 民法의 法人 10
1. 獨逸民法 및 舊民法과의 比較 10
2. 우리나라에서의 法人論 10
3. 法人格없는 社團 12
Ⅵ. 結語 13
본문내용
법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즉, 오늘날 법인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인의 사회적 기능과 법인에게 법인격이 부여되는 이론적 근거와는 별개의 문제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특히 권리능력없는 사단이 오늘날 법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격면에 있어서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서 남을 수밖에 없다는 데로부터 명백하며, 법인이 법인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연인인 기관에 의하여 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인의 실재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법인은 권리주체임에 적합한 조직체에 대하여 법이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게 하기위한 법기술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단체는 법인격을 부여하는데 적합한 조직체를 갖기 때문에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는 조직체설적 입장에서는 성립의 계기로 볼 때 법인은 실체적 계기가치적 계기기술적 계기 등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제도인데, 의제설은 기술적 계기만 고려하고, 법인도 역시 사회적 실체라는 점은 무시한 점에서 타당치 못하고, 유기체설은 기술적 계기 또는 가치적 계기를 도외시함으로써 유기체이므로 곧 법인격이 부여된다는 논리의 비약을 범하고 있으며, 사회적 작용설은 법인의 사회적 실체보다 실체로부터 파생하는 현상인 작용에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실재설로서는 모순을 내포하는바, 이에반해 조직체설은 실체면과 가치면의 양계기를 동시에 고려하고, 법인의 사회적 실재에 대한 법인격 부여라는 법정책적 계기를 함께 인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어 법인성립의 기준이 명확하며, 또한 이 설은 법인설립의 준칙주의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민법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준칙주의를 채용하는데 비추어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인의 본질은 독자의 사회적 작용을 하고 권리능력을 가지는데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는 사회적 가치설적 입장에 의하면 우선 의제설은 자연인돈 법률을 떠나서 당연히 권리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역시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 것이므로 오늘날 승인될 수 없는 견해이고, 조직체설이 법인을 사회적 유기체로서 존재한다고 보지 않고, 법에 의하여 조직된 법적 실재라고 함으로써 결국 법 이전에는 자연인의 실재만을 인정하는 의제설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 이전의 단체적 존재를 인정하는 사회적 가치설이 보다 나은 견해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이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법인의 행위능력과 불법행위 능력, 법인의 이사의 지위,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에 과한 설명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법인의제설과 실재설은 각각 다른 시대적 배경하에서 탄생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념적 성질이 강한 것으로 어느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법인에 관한 구체적 해석론에 반드시 차이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법인에는 실체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 양쪽이 함께 병존하여 있다 볼 수 있다.
3. 法人格없는 社團
독일민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불충분하게나마 규율하고 있다. 즉 獨民 §54 Ⅰ은 법인격없는 사단이 조합의 구조가 아니고 사단적으로 조직되어 있음에도 조합(獨民 §§705 내지 740)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54 Ⅱ은 법인격없는 사단을 위하여 법률행위적으로 행동한 자의 개인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법인격 없는 사단은 조합보다도 권리능력 있는 사단의 유형에 보다 더 상응하는데 이러한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조합에 관한 獨民 §705 이하의 적용은 법인격없는 사단을 적합하지 않은 법률하에 두는 것이라는 이유로 법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높다.
우리 민법은 앞에서 서술한 독일민법과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 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그 소유관계를 “총유”라고 규정함으로써 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민법상 조합도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조합은 두 사람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사단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또 단기간만 성립하는 인적 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 성립될 수 있으나 사단은 어느정도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통설도 대체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체에 있어서 법인격 있는 사단과 같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의 선임방법총회의 운영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 중요한점은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판례 역시 비법인사단은 계속적 성질과 공동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사단으로서 규약에 의하여 대표자 자격이 인정되는 대표자있는 사단에 한한다고 하였다.(大判 57. 12. 5, 4290民上244)
Ⅵ. 結語
이상으로 주로 로마법과 게르만법 상의 단체법 일반이 논의되었던 전반적 과정과 맥락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우리의 민법과 비교해 보았다. 단체현상은 인간사회의 본원적 所與이다. 법은 이 所與를 전면적으로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분명히 규제할 수는 있다. 역사는 이러한 법적 규제의 주요한 수단이 법인격의 인정 여부와 단체의 목적규정 및 실제활동에 대한 공사법적 규제였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복합적인 현상의 많은 경우에 그렇듯이 단체법의 경우에도 어느 일방적 측면의 강조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에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현대의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의 범위내에서 단체의 자유로운 삶이 창달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단체모델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된 정책적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게르만법』. 서울 : 박영사, 2001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로마법』. 서울 : 법문사, 1996
최병조. 『로마법강의』. 서울 : 박영사, 1999
곽윤직 외. 『민법주해(Ⅰ) - 총칙⑴』. 서울 : 박영사, 1992
곽윤직. 『민법총칙』. 서울 : 박영사, 1999
이영준. 『민법총칙』. 서울 : 박영사, 1997
최병조. 『私法上團體에 관한 一般論 - 團體法論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XIX], 523-548면). 1997
이에 대하여 단체는 법인격을 부여하는데 적합한 조직체를 갖기 때문에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는 조직체설적 입장에서는 성립의 계기로 볼 때 법인은 실체적 계기가치적 계기기술적 계기 등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제도인데, 의제설은 기술적 계기만 고려하고, 법인도 역시 사회적 실체라는 점은 무시한 점에서 타당치 못하고, 유기체설은 기술적 계기 또는 가치적 계기를 도외시함으로써 유기체이므로 곧 법인격이 부여된다는 논리의 비약을 범하고 있으며, 사회적 작용설은 법인의 사회적 실체보다 실체로부터 파생하는 현상인 작용에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실재설로서는 모순을 내포하는바, 이에반해 조직체설은 실체면과 가치면의 양계기를 동시에 고려하고, 법인의 사회적 실재에 대한 법인격 부여라는 법정책적 계기를 함께 인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어 법인성립의 기준이 명확하며, 또한 이 설은 법인설립의 준칙주의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민법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준칙주의를 채용하는데 비추어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인의 본질은 독자의 사회적 작용을 하고 권리능력을 가지는데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는 사회적 가치설적 입장에 의하면 우선 의제설은 자연인돈 법률을 떠나서 당연히 권리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역시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 것이므로 오늘날 승인될 수 없는 견해이고, 조직체설이 법인을 사회적 유기체로서 존재한다고 보지 않고, 법에 의하여 조직된 법적 실재라고 함으로써 결국 법 이전에는 자연인의 실재만을 인정하는 의제설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 이전의 단체적 존재를 인정하는 사회적 가치설이 보다 나은 견해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이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법인의 행위능력과 불법행위 능력, 법인의 이사의 지위,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에 과한 설명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법인의제설과 실재설은 각각 다른 시대적 배경하에서 탄생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념적 성질이 강한 것으로 어느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법인에 관한 구체적 해석론에 반드시 차이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법인에는 실체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 양쪽이 함께 병존하여 있다 볼 수 있다.
3. 法人格없는 社團
독일민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불충분하게나마 규율하고 있다. 즉 獨民 §54 Ⅰ은 법인격없는 사단이 조합의 구조가 아니고 사단적으로 조직되어 있음에도 조합(獨民 §§705 내지 740)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54 Ⅱ은 법인격없는 사단을 위하여 법률행위적으로 행동한 자의 개인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법인격 없는 사단은 조합보다도 권리능력 있는 사단의 유형에 보다 더 상응하는데 이러한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조합에 관한 獨民 §705 이하의 적용은 법인격없는 사단을 적합하지 않은 법률하에 두는 것이라는 이유로 법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높다.
우리 민법은 앞에서 서술한 독일민법과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 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그 소유관계를 “총유”라고 규정함으로써 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민법상 조합도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조합은 두 사람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사단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또 단기간만 성립하는 인적 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 성립될 수 있으나 사단은 어느정도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통설도 대체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체에 있어서 법인격 있는 사단과 같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의 선임방법총회의 운영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 중요한점은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판례 역시 비법인사단은 계속적 성질과 공동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사단으로서 규약에 의하여 대표자 자격이 인정되는 대표자있는 사단에 한한다고 하였다.(大判 57. 12. 5, 4290民上244)
Ⅵ. 結語
이상으로 주로 로마법과 게르만법 상의 단체법 일반이 논의되었던 전반적 과정과 맥락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우리의 민법과 비교해 보았다. 단체현상은 인간사회의 본원적 所與이다. 법은 이 所與를 전면적으로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분명히 규제할 수는 있다. 역사는 이러한 법적 규제의 주요한 수단이 법인격의 인정 여부와 단체의 목적규정 및 실제활동에 대한 공사법적 규제였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복합적인 현상의 많은 경우에 그렇듯이 단체법의 경우에도 어느 일방적 측면의 강조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에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현대의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의 범위내에서 단체의 자유로운 삶이 창달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단체모델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된 정책적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게르만법』. 서울 : 박영사, 2001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로마법』. 서울 : 법문사, 1996
최병조. 『로마법강의』. 서울 : 박영사, 1999
곽윤직 외. 『민법주해(Ⅰ) - 총칙⑴』. 서울 : 박영사, 1992
곽윤직. 『민법총칙』. 서울 : 박영사, 1999
이영준. 『민법총칙』. 서울 : 박영사, 1997
최병조. 『私法上團體에 관한 一般論 - 團體法論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XIX], 523-548면).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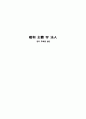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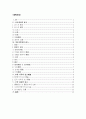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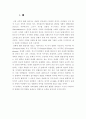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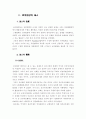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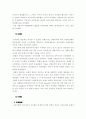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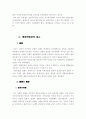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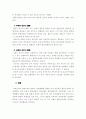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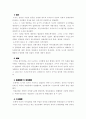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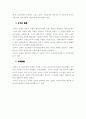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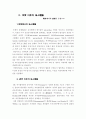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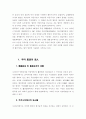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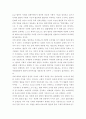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