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전짓불의 의미
정신병
박준의 3가지 소설의 의미
‘왜 글을 쓰지 못하는가’
보이지 않는 독자-소문의 벽
전짓불의 의미
정신병
박준의 3가지 소설의 의미
‘왜 글을 쓰지 못하는가’
보이지 않는 독자-소문의 벽
본문내용
이러한 리얼리티에는 작가 자신의 체험과 박준이 다른게 아니라 소설가라는 점이 한 몫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작품으로부터 얻고 싶은 것은, 작품의 완전한 해석을 통한 작가의 글쓰기에 대한 이해이다. <소문의 벽>에서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청준 선생은 문화마당의 <작가와의 대화> 강연에서 우리 삶에 있어 소설이라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옛날 우리 고향에선 무서운 밤길을 가다가 도중에 마주 오는 사람을 만나면 길이 더 적게 남은 사람이 더 많이 남은 사람에게 “좀 전에 당신 앞서 길을 가는 사람을 보았다”고 일러주는 관습이 있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건 없었건 그런 말로 상대방의 밤길에 위안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관습은 소설과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행자의 존재를 의지 삼아 밤 산길의 발길을 재촉하여 훨씬 편한 마음으로 종착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허구처럼 소설에서의 거짓과 허구는 자신의 삶에 대입하여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허구를 곧이들은 사람은 위로와 보탬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렵고 외로운 밤의 산길에서 지향점 마저 놓칠지 모른다.
밤의 산길처럼 목적지조차 믿을 수 없는 그 암담한 노정,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길인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 불확실한 삶의 노정을 위한 허구의 선행자 이야기가 더욱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후행자를 위한 자신의 작은 발자국 흔적이라도 남겨야 하는 것인지 모른다.
한 주변 사람에게서 인문학은 주변의 사실을 재정립하는 것이지만, 이학은 어쨌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이런 것으로 인해 이학에서는 남보다 특출나지 않으면, 낙오되기 쉬울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바로 전짓불의 역할을 한다. 즉, 나를 잘 알고, 나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모자란 만큼의 전짓불을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소문의 벽>을 통해 내가 본 글쓰기는 나에 대한 고찰 뿐만 아니라, 주변의 것, 즉, 정치적 억압이나 독자 등에 대한 전짓불을 안고 이루어진다. 이는 내가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이학을 전공하는 나에게 있어서 이 소설은 첫째로는 인간 근원의 두려움에 대한 고찰을 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지 않은 새로운 세계로의 깊이있는 해석을 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옛날 우리 고향에선 무서운 밤길을 가다가 도중에 마주 오는 사람을 만나면 길이 더 적게 남은 사람이 더 많이 남은 사람에게 “좀 전에 당신 앞서 길을 가는 사람을 보았다”고 일러주는 관습이 있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건 없었건 그런 말로 상대방의 밤길에 위안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관습은 소설과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행자의 존재를 의지 삼아 밤 산길의 발길을 재촉하여 훨씬 편한 마음으로 종착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허구처럼 소설에서의 거짓과 허구는 자신의 삶에 대입하여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허구를 곧이들은 사람은 위로와 보탬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렵고 외로운 밤의 산길에서 지향점 마저 놓칠지 모른다.
밤의 산길처럼 목적지조차 믿을 수 없는 그 암담한 노정,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길인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 불확실한 삶의 노정을 위한 허구의 선행자 이야기가 더욱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후행자를 위한 자신의 작은 발자국 흔적이라도 남겨야 하는 것인지 모른다.
한 주변 사람에게서 인문학은 주변의 사실을 재정립하는 것이지만, 이학은 어쨌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이런 것으로 인해 이학에서는 남보다 특출나지 않으면, 낙오되기 쉬울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바로 전짓불의 역할을 한다. 즉, 나를 잘 알고, 나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모자란 만큼의 전짓불을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소문의 벽>을 통해 내가 본 글쓰기는 나에 대한 고찰 뿐만 아니라, 주변의 것, 즉, 정치적 억압이나 독자 등에 대한 전짓불을 안고 이루어진다. 이는 내가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이학을 전공하는 나에게 있어서 이 소설은 첫째로는 인간 근원의 두려움에 대한 고찰을 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지 않은 새로운 세계로의 깊이있는 해석을 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추천자료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문학과 바다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문학과 바다 [고전문학의이해A+]만전춘별사(滿殿春別詞) 작품분석 및 작품해석
[고전문학의이해A+]만전춘별사(滿殿春別詞) 작품분석 및 작품해석 구비문학의_이해
구비문학의_이해 연세대 원주 고훈교수님 대중문학이해 음란서생
연세대 원주 고훈교수님 대중문학이해 음란서생 [서양문화의 이해-독후감] 보바리 부인(Madame Bovary), 엠마 _ 귀스타브 플로베르(Gustave F...
[서양문화의 이해-독후감] 보바리 부인(Madame Bovary), 엠마 _ 귀스타브 플로베르(Gustave F... 북한문학 이해의 필요성과 북한 문학의 특징 (북한문학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수령형상문...
북한문학 이해의 필요성과 북한 문학의 특징 (북한문학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수령형상문... 구약 지혜문학의 이해 - 요약 및 서평 (제임스 L. 크렌쇼 저, 강성열 역)
구약 지혜문학의 이해 - 요약 및 서평 (제임스 L. 크렌쇼 저, 강성열 역)  [서사문학의이해와창작 공통] 내 인생 5명의 인물 중에서 한편의 소설을 구상했을 때 어울릴 ...
[서사문학의이해와창작 공통] 내 인생 5명의 인물 중에서 한편의 소설을 구상했을 때 어울릴 ... [문학의이해 공통] ‘프로이트의 심리주의 비평’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신이 애독, 애청한 ...
[문학의이해 공통] ‘프로이트의 심리주의 비평’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신이 애독, 애청한 ... (문학의이해 공통) 다음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장 감동적이거나 인상 깊은 부분을 세 ...
(문학의이해 공통) 다음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장 감동적이거나 인상 깊은 부분을 세 ... (서사문학의이해와창작 공통) 1.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서사문학의이해와창작 공통) 1.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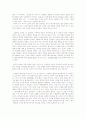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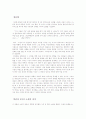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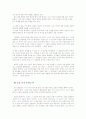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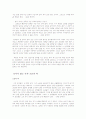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