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ꊱ 귀족제 이해의 시각
ꊲ 귀족의 존재형태
1. 사회적 우월성
2. 정치적 특권층
ꊳ 황제 ․ 귀족 ․ 한인
1. 관료로서의 귀족
2. 한문 ․ 한인의 등장과 귀족
ꊴ 향촌의 귀족
1. 귀족의 호족
2. 향론과 귀족
ꊵ 맺음말
ꊲ 귀족의 존재형태
1. 사회적 우월성
2. 정치적 특권층
ꊳ 황제 ․ 귀족 ․ 한인
1. 관료로서의 귀족
2. 한문 ․ 한인의 등장과 귀족
ꊴ 향촌의 귀족
1. 귀족의 호족
2. 향론과 귀족
ꊵ 맺음말
본문내용
을 바탕으로 현자, 혹은 유덕자로서 향론의 지지를 얻게 된다. 이 향론은 환절적 중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즉 현향 규모의 제 1차 향론그룹이 형성되고, 여기서 지지를 받은 인사들이 모여 군 규모의 제 2차 향론 그룹을 형성하며, 여기서 지지된 명사들이 중앙의 태학을 중심으로 제 3차 향론을 형성한다. 이 구조를 기초로 해서 전국적인 향론의 연결망을 갖게 된다.
후한정부에 실망했던 이들 청류세력들은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각기 자기가 기호하는 군벌에 참여하였다. 군벌간의 전투 속에 삼국으로 정립이 되었는데, 영천 및 북해그룹은 조위의 산하에 들어갔지만 오, 촉에도 일부가 들어갔다. 이들 각국에 분속되었던 청류파 사대부 사이에는 여전히 공통의 연대감정을 잃지 않고 상호연락을 취하면서 3국의 기초질서를 초월한 독자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조위에서는 영천그룹의 영수 순욱을 중심으로 영천북해그룹이 결속되고 그 외곽에 많은 명사와 민중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이 곧 삼국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 대표적 사대부가로부터 위진귀족이 형성된 것은 자연스런 결과이다. 위와 같이 위진귀족을 생성시킨 모태는 후한말 청류세력이고 이후 귀족의 존재양태는 청류세력의 구조 [향론의지지] 에 깊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향론구조를 제도화한 것은 구품관인법이지만 서진시대의 주대중정제가 설치됨으로써, 구품관인법은 본연의 구조원칙을 잃고 경직화해 버림으로써 귀족의 세습화 현상을 조장했고, 결과적으로 제도적인 귀족제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귀족의 세습화 현상은 이 향론 구조가 충분히 가능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다. 오랜 전란으로 향론그룹은 단절되고 제 3차 향론그룹이 자기 보전과 확대재생산을 위해 구품관인법을 자기 위주로 이용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귀족과 향당사회의 직접적 연결이 끊어진 후에도 향당사회가 일종의 관념형태로 남아 귀족들에게 규제력을 발휘하여 황제권력을 중심으로하는 정치질서를 상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향리세계를 규율하는 내부 구조로는 연령 의질서, 덕(德, 志行), 망(望;가치관의 체현자)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즉 향리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덕(耆德)기숙(耆宿)숙망(宿望)연장(年長)으로 지칭되는 자가 정치적 질서에 관계없이 배경(拜敬) 즉 예제적 행위의 동기가 된다는 점이다. 귀족에게는 여전히 ‘향당’이라는 것이 그 형성의 모태가 되고, 귀족으로서 존립을 보증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즉 귀족이 스스로를 귀속시킬 수 있는 향당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지배계층으로서의 귀족의 전제이다.
향망(貴族)과 향인과의 정의(情誼)관계는 북조에서는 오래 지속이 되었는데 남조사회는 희박화될 수밖에 없었다. 화북귀족이 변함없이 재지배자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향당사회에서 질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그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조 귀족들은 궁정귀족화 경향이 후기로 들어올수록 더욱 농후해져갔고 그에 따라 향당사회와의 괴리는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그 존립기반인 향당과의 괴리는 위기극복능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남조 귀족의 소멸을 가져왔다.
맺음말
이 시대의 귀족은 일반민과 격리된 우월한 존재였으며, 정치적 지위는 초왕조적으로 보장받았으며, 그 보장의 권한은 황제가 아닌 향당에 있었으며, 북래 교성귀족들은 실질적인 향당은 잃었지만 강남땅에 교군현을 설치함으로써 그 존속이 가능했고, 한편으로 북방의 복적지를 관념화시켜 인식함으로 향당과의 괴리를 메우려 했다.
위진남조의 귀족들은 점차 학문적 능력, 경제력, 행정능력과 치자의식을 잃어감으로 향론의 기대를 잃어갔다. ‘향당의 상실’이야말로 그들의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
후한정부에 실망했던 이들 청류세력들은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각기 자기가 기호하는 군벌에 참여하였다. 군벌간의 전투 속에 삼국으로 정립이 되었는데, 영천 및 북해그룹은 조위의 산하에 들어갔지만 오, 촉에도 일부가 들어갔다. 이들 각국에 분속되었던 청류파 사대부 사이에는 여전히 공통의 연대감정을 잃지 않고 상호연락을 취하면서 3국의 기초질서를 초월한 독자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조위에서는 영천그룹의 영수 순욱을 중심으로 영천북해그룹이 결속되고 그 외곽에 많은 명사와 민중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이 곧 삼국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 대표적 사대부가로부터 위진귀족이 형성된 것은 자연스런 결과이다. 위와 같이 위진귀족을 생성시킨 모태는 후한말 청류세력이고 이후 귀족의 존재양태는 청류세력의 구조 [향론의지지] 에 깊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향론구조를 제도화한 것은 구품관인법이지만 서진시대의 주대중정제가 설치됨으로써, 구품관인법은 본연의 구조원칙을 잃고 경직화해 버림으로써 귀족의 세습화 현상을 조장했고, 결과적으로 제도적인 귀족제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귀족의 세습화 현상은 이 향론 구조가 충분히 가능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다. 오랜 전란으로 향론그룹은 단절되고 제 3차 향론그룹이 자기 보전과 확대재생산을 위해 구품관인법을 자기 위주로 이용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귀족과 향당사회의 직접적 연결이 끊어진 후에도 향당사회가 일종의 관념형태로 남아 귀족들에게 규제력을 발휘하여 황제권력을 중심으로하는 정치질서를 상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향리세계를 규율하는 내부 구조로는 연령 의질서, 덕(德, 志行), 망(望;가치관의 체현자)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즉 향리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덕(耆德)기숙(耆宿)숙망(宿望)연장(年長)으로 지칭되는 자가 정치적 질서에 관계없이 배경(拜敬) 즉 예제적 행위의 동기가 된다는 점이다. 귀족에게는 여전히 ‘향당’이라는 것이 그 형성의 모태가 되고, 귀족으로서 존립을 보증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즉 귀족이 스스로를 귀속시킬 수 있는 향당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지배계층으로서의 귀족의 전제이다.
향망(貴族)과 향인과의 정의(情誼)관계는 북조에서는 오래 지속이 되었는데 남조사회는 희박화될 수밖에 없었다. 화북귀족이 변함없이 재지배자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향당사회에서 질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그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조 귀족들은 궁정귀족화 경향이 후기로 들어올수록 더욱 농후해져갔고 그에 따라 향당사회와의 괴리는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그 존립기반인 향당과의 괴리는 위기극복능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남조 귀족의 소멸을 가져왔다.
맺음말
이 시대의 귀족은 일반민과 격리된 우월한 존재였으며, 정치적 지위는 초왕조적으로 보장받았으며, 그 보장의 권한은 황제가 아닌 향당에 있었으며, 북래 교성귀족들은 실질적인 향당은 잃었지만 강남땅에 교군현을 설치함으로써 그 존속이 가능했고, 한편으로 북방의 복적지를 관념화시켜 인식함으로 향당과의 괴리를 메우려 했다.
위진남조의 귀족들은 점차 학문적 능력, 경제력, 행정능력과 치자의식을 잃어감으로 향론의 기대를 잃어갔다. ‘향당의 상실’이야말로 그들의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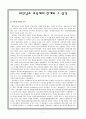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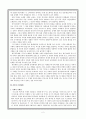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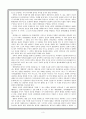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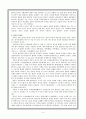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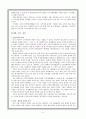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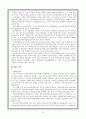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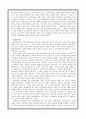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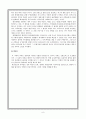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