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2. 무엇을 위한 글쓰기인가
3. 누구를 위하여 쓰는가
2. 무엇을 위한 글쓰기인가
3. 누구를 위하여 쓰는가
본문내용
도 품지 않고 있었다. 작가의 멸시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독자가 되어주는 것은 부르주아 자신들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작가가 은근히 자기들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작가의 투쟁을 위해서는 그 대상인 부르주아가 결국 존재해야 함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당대 작가란 반항자였지 결코 혁명가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작가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그들의 작품들은 그들이 멸시하는 척 했던 독자의 자유에 대한 절망적인 호소를 지니고 있었다. 요컨대 19세기의 문학은 청춘기의 문학이었다. 절약을 지상의 것으로 삼았던 사회의 변두리에서 사치스러운 축제를 벌이던 청춘기의 문학이었다. 그렇지만 역시 아쉬운 점은 남는다. 만약 작가가 하향적인 계급 이탈을 자진해서 받아들여, 자신의 예술에 새로움을 담았다면 부정성과 추상성을 떠나 구체적인 건설로 문학을 지향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글쓰기라는 예술의 본질이 심화될 수 있었을 것이며, 형식적인 사상의 자유와 정치적 민주주의 사이에서 수단이 아닌 사고의 영원한 주체로서 자유로운 인간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어떤 한 시대의 문학이 그 자립성 대한 또렷한 의식에 이르지 못하고 세간의 권력이나 이데올로기에 굴종할 때, 요컨대 문학이 무조건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그 자신을 생각할 때, 그것은 소외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견지에서, 12세기는 오직 신이라는 주제 아래 내용과 형식이 융합된 구체적이면서도 소회적인 문학의 모습이 나타난다. 세계가 신의 작품이라면 책은 세계의 거울이었다. 이데올로기 반영의 철저한 수단으로서의 문학, 그것은 소외된 문학이었다. ‘차라리’ 독자가 없을지언정 18세기,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며 문학은 자기회복에 무단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헌데, 작가의 독자는 이상적 독자와 현실적 독자 사이의 괴리에 놓인다는 추상적 보편성이라는 생각이 태어나게 된다. 17세기 작가는 이데올로기를 지닌 뚜렷한 귀족계급, ‘신사’의 무한정한 회귀를 바랐고, 19세기의 작가는 문단과 전문적인 독자의 무한정한 확대에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의 사실적 독자를 미래로 투영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무한정한 독자를 상상함으로서 작가에게 영예를 선사한다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이며 추상적인 보편성에 지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구체적 보편성이란 특정한 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바다의 침묵』과 리처드 라이트의 작품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다의 침묵』은 프랑스 사람들로 하여금 적의 협력 요청을 거부하게 하고자 쓰여진 작품으로서, 전쟁이 지속되는 내에서만 현실적 독자에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리처드 라이트의 작품들은 미국에 흑인 문제가 존재하는 한 살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초시대적 가치만을 중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요컨대 현실적인 문학의 본질을 온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계급 없는 사회에서 뿐이며, 오직 그런 사회에서만 작가는 그의 ‘주제’와 ‘독자’ 사이에 어떠한 종류의 어긋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독자가 구체적 보편자와 이리하게 된다면, 작가는 인간 전체의 자유에 대해 언급할 수 있게 된다. 결코 초시대적 추상적 인간에 대해서나 어느 시대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를 위해서가 아닌, 작가 자신의 동시대인(同時代人)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서정적 주관성과 객관적 증언 사이의 문학적 이율배반은 초극(超克)된다. 작가는 곧 독자와 같은 경험을 하는 독자 주체가 되며, 작가의 이야기는 곧 독자의 이야기가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때의 문학이야 말로 가장 완전하고 진실된 의미의 ‘인류학적’인 것이 될 것이다.
계급도 문단도 살롱도 어떠한 과분한 명예와 불명예도 없을 사회에서 작가는 성직의, 이데올로기의 그 어떤 것의 수호자, 선전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채롭고 구체적인 세계를 있는 그대로 되찾아 제시함으로써 문학은 완전히 그 자체를 의식화 하게 될 것이다. 문학의 기능은 구체적 보편자에게 구체적 보편자를 제시하는 데 있으며, 그 목적은 인간 모두의 자유를 호소하여 자유의 왕국이 실현되게 함에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은 유토피아적인 이야기이다. 현재로서는 이를 실현시킬 어떠한 수단도 지니지 않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회를 상상함으로써 문학이란 개념이 어떻게 순수하게 구현될 수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써야 하는 것이다.
어떤 한 시대의 문학이 그 자립성 대한 또렷한 의식에 이르지 못하고 세간의 권력이나 이데올로기에 굴종할 때, 요컨대 문학이 무조건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그 자신을 생각할 때, 그것은 소외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견지에서, 12세기는 오직 신이라는 주제 아래 내용과 형식이 융합된 구체적이면서도 소회적인 문학의 모습이 나타난다. 세계가 신의 작품이라면 책은 세계의 거울이었다. 이데올로기 반영의 철저한 수단으로서의 문학, 그것은 소외된 문학이었다. ‘차라리’ 독자가 없을지언정 18세기,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며 문학은 자기회복에 무단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헌데, 작가의 독자는 이상적 독자와 현실적 독자 사이의 괴리에 놓인다는 추상적 보편성이라는 생각이 태어나게 된다. 17세기 작가는 이데올로기를 지닌 뚜렷한 귀족계급, ‘신사’의 무한정한 회귀를 바랐고, 19세기의 작가는 문단과 전문적인 독자의 무한정한 확대에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의 사실적 독자를 미래로 투영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무한정한 독자를 상상함으로서 작가에게 영예를 선사한다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이며 추상적인 보편성에 지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구체적 보편성이란 특정한 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바다의 침묵』과 리처드 라이트의 작품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다의 침묵』은 프랑스 사람들로 하여금 적의 협력 요청을 거부하게 하고자 쓰여진 작품으로서, 전쟁이 지속되는 내에서만 현실적 독자에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리처드 라이트의 작품들은 미국에 흑인 문제가 존재하는 한 살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초시대적 가치만을 중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요컨대 현실적인 문학의 본질을 온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계급 없는 사회에서 뿐이며, 오직 그런 사회에서만 작가는 그의 ‘주제’와 ‘독자’ 사이에 어떠한 종류의 어긋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독자가 구체적 보편자와 이리하게 된다면, 작가는 인간 전체의 자유에 대해 언급할 수 있게 된다. 결코 초시대적 추상적 인간에 대해서나 어느 시대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를 위해서가 아닌, 작가 자신의 동시대인(同時代人)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서정적 주관성과 객관적 증언 사이의 문학적 이율배반은 초극(超克)된다. 작가는 곧 독자와 같은 경험을 하는 독자 주체가 되며, 작가의 이야기는 곧 독자의 이야기가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때의 문학이야 말로 가장 완전하고 진실된 의미의 ‘인류학적’인 것이 될 것이다.
계급도 문단도 살롱도 어떠한 과분한 명예와 불명예도 없을 사회에서 작가는 성직의, 이데올로기의 그 어떤 것의 수호자, 선전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채롭고 구체적인 세계를 있는 그대로 되찾아 제시함으로써 문학은 완전히 그 자체를 의식화 하게 될 것이다. 문학의 기능은 구체적 보편자에게 구체적 보편자를 제시하는 데 있으며, 그 목적은 인간 모두의 자유를 호소하여 자유의 왕국이 실현되게 함에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은 유토피아적인 이야기이다. 현재로서는 이를 실현시킬 어떠한 수단도 지니지 않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회를 상상함으로써 문학이란 개념이 어떻게 순수하게 구현될 수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써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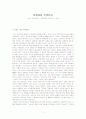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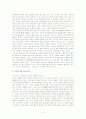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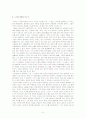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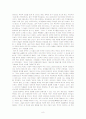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