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가구란 무엇인가
■ 가구의 기원과 발생 요인
■ 가구의 발생 요인과 유래
■ 가구 형성과 발달
■ 고대가구의 역사
■ 중세 및 근세 가구의 역사
■ 가구의 양식
■ 가구의 종류
■ 가구양식의 형성
■ 가구의 선택
■ 한국의 가구 역사
■ 한국의 전통가구
■ 가구의 기원과 발생 요인
■ 가구의 발생 요인과 유래
■ 가구 형성과 발달
■ 고대가구의 역사
■ 중세 및 근세 가구의 역사
■ 가구의 양식
■ 가구의 종류
■ 가구양식의 형성
■ 가구의 선택
■ 한국의 가구 역사
■ 한국의 전통가구
본문내용
바른 온돌과 우물마루식 판재를 깐 마루가 대표적입니다. 실내의 벽, 천장, 창호 등은 호지법(湖紙法)에 의한 한지를 발랐고, 마룻방 천장은 사량가구식(四樑架構式)으로 하여 서까래를 노출시키며 그 사이에 백색 회반죽 마감을 합니다. 대체로 건물 벽체는 나무기둥 사이에 흙과 회로 마감하였으며, 지붕은 서민인 경우 초가와 흙담, 중류 이상은 기와와 화강석기초를 가졌는데, 완만하게 곡선을 그린 지붕선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평면구성은 대가족제도로 인하여 중류 이상은 동(棟)과 칸으로 나누어 사랑채와 안채의 공간구획이 이루어졌고, 서민은 한 동에서 실(室)로 나누어 사랑방(男)과 안방(女)으로 구분됩니다. 중류 이상인 경우 신분에 따라 동의 외곽에 행랑채가 있고 주택의 뒤나 옆에는 사당(祠堂)과 별당(別堂)이 있습니다. 각 실의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채, 사랑방
남성의 거실이자 접객공간이며 서재를 겸하고 있다.
누마루
흔히 대청마루와 연결되어 있어 유학자들의 예(禮)를 논하는 장소
침방
사랑채에 배치하여 침실 기능을 하는 장소이다.
서고
서책의 보관 또는 독서를 위한 방이다.
안채, 안방
가장 폐쇄된 공간. 안주인이 거처. 남편과 직계비속 외는 출입이 금지.
건넌방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안방 건너편에 위치하여 자녀나 노부모가 거처.
웃방
안방 윗목에 위치한 공간으로 귀중품을 수장하는 장을 둔다.
마룻방
안방과 건넌방 중앙에 있으며, 관혼상제의 대사를 치르는 곳.
부엌
취사행동이 행해지는 곳이며 찬방/찬마루가 연이어 있다.
별채, 별당
본채와 분리되어 서예, 가무 기타 용도로 쓰이는 곳이다.
사당
선조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다.
행랑채 행랑방
대문채에 연결되어 노비를 비롯한 사역인이 거처하는 곳.
청지기방
청지기(비서)가 거처하는 방이고 사랑방과 인접하여 있다.
광, 측
광은 살림도구와 음식물을 저장하는 곳이며, 측은 화장실이다.
조선시대에는 목재를 주요재료로 하는 주택양식과 더불어 가구 역시 목재의 무늬를 잘 살린 형태로 발전되어 오늘날에도 널리 극찬되고 있지만, 형태뿐만 아니라 목공결구법 (木工結構法)에 의한 독특한 기술로써 독자적 방법을 나타낸 것은 우리나라 전통가구양식의 특색을 형성하였습니다.
(5) 한말~일제강점기
고종의 집정기는 조선시대 말기로서 새로운 개혁의 막을 올린 시기였습니다. 오랜 세월 유학의 영향으로 인한 지배층의 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민중중심의 동학사상이 전개되었고, 밖으로는 서구제국주의 열강과 일본에 의한 문호개방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에도 불구하고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1910년에 경술국치가 되면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휩쓸려 가구양식도 점차로 서구화되어갔습니다. 이때에 처음으로 서구문물의 혜택을 입은 곳은 바로 왕실이었습니다.
궁궐건축으로부터 실내장식, 가구, 공예품까지 서구화한 입식 형태로 변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입식 가구가 제작되었고 서구식 가구와 전통가구가 공용되었습니다. 그뒤 광복과 함께 가구양식은 전통양식에서 절충식 양식으로 변하여갔습니다. 현재 궁중에 수장된 것 중 당시 유입된 17, 18세기 서양의 르네상스, 로코코양식의 가구와 중국의 화류가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가구로는 서랍이 많이 달린 장과 차단자라 하여 중국의 차탁자와 같이 개구부(開口部)가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래의 의걸이장이 이불장으로 쓰이다가 현대의 양복장으로 변한 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잘 나타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뒤 마룻가 입식 생활의 접객공간으로 되면서, 소파가 등장하고 차탁자, 협탁(脇卓), 장식장 등의 서양가구가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가구』
한국의 전통가구는 장,농,반다지,문갑등 수납가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그 종류는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지만,가구 하나하나 마다의 크기나 모양,장식등 이 모두 달라 디자인의 다양성은 그폭이 매우 넓다. 장롱,문갑,사방탁자등은 안방의 중요한 가구로 자리잡고 있다.
사랑방 가구
의걸이 장
의걸이 장은 그 내부를 높게 만들고 그 안에 횟대라고 하는 긴 막내를 설치하여 자주 입는 옷을 그때그때 꺼내 입기 편하도록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현대에 사용되는 장롱은 이의거리의 장의 변형이다.
경축장
서책 및 문서를 보관하는 단층장으로 머릿장이라고도 한다.
서 장
책을 보관하는 장으로서 해충을 막는다 하여 오동서장이 일품 이다.
문 갑
문갑은 한쪽 벽에 한 쌍으로 놓아 실내에 강한 수평적인 요소를 부여하는 가구로서 주로 집문서나 중요한 문서류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문갑이라 불린다.
사방탁자
개방이 선반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탁자라고 하는데 선반이 정방형에 가까운 것을 사방탁자라고 한다.그것의 용도는 주로 붓 걸이,연적,도자기등을 장식적으로 올려 놓는데 사용하였다.
서 안
서안은 오늘날의 책상과 같은 것이다.서안은 보통 상 면과 한두 개의 서랍으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인데 , 상 면의 끝이 두루말이 처럼 살짝 올라가고,굽어진 호족형의 다리를 가진 것은 범상이라 부른다.이들은 모두 서안의 한 종류이다.
경 상
우너래 사찰에서 불경을 읽을 때 쓰는 것인데 뒤에 사대부집 서안으로 사용되었다.
고 비
조선시대 편지를 두루 말 이로 된 화선지에 썼기 때문에 고비는 이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다.두루 말이는 옆에서 일어놓도록 되어있어 전면은 막혀있는데 이전면에 음각,투각등의 정교한 장식과 대나무를 이용해 시원스러운 장식성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
필통,필가
필통은 붓을 보관하는 통.필가는 붓을 바닥에 걸쳐놓을 때 쓰는 도구 이다.
서 견 대
서책을 받치는 대로서 송판이 경사진 것과 부챗살 같이 폈다 접었다 하는 것이 있다.
함,통,궤
함은 도장함,문서함,서함,관모함 등.통은 탕 건통.망건통 화살통등,궤는 의류궤가 대표적으로 종이제가 많은 것이 특징 이다.
평 상
휴식용의 침대와 같은 상,살평상과 널평상이 있다.
연 상
연상은 가구로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섬세한 장식을 한 것이 많아 선비의 멋과 취미를 많이 담아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대체적으로 벼루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다.
바둑판- 바둑판은 방형의 통나무와 괴목판으로 만들었다.
가구의 역사
평면구성은 대가족제도로 인하여 중류 이상은 동(棟)과 칸으로 나누어 사랑채와 안채의 공간구획이 이루어졌고, 서민은 한 동에서 실(室)로 나누어 사랑방(男)과 안방(女)으로 구분됩니다. 중류 이상인 경우 신분에 따라 동의 외곽에 행랑채가 있고 주택의 뒤나 옆에는 사당(祠堂)과 별당(別堂)이 있습니다. 각 실의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채, 사랑방
남성의 거실이자 접객공간이며 서재를 겸하고 있다.
누마루
흔히 대청마루와 연결되어 있어 유학자들의 예(禮)를 논하는 장소
침방
사랑채에 배치하여 침실 기능을 하는 장소이다.
서고
서책의 보관 또는 독서를 위한 방이다.
안채, 안방
가장 폐쇄된 공간. 안주인이 거처. 남편과 직계비속 외는 출입이 금지.
건넌방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안방 건너편에 위치하여 자녀나 노부모가 거처.
웃방
안방 윗목에 위치한 공간으로 귀중품을 수장하는 장을 둔다.
마룻방
안방과 건넌방 중앙에 있으며, 관혼상제의 대사를 치르는 곳.
부엌
취사행동이 행해지는 곳이며 찬방/찬마루가 연이어 있다.
별채, 별당
본채와 분리되어 서예, 가무 기타 용도로 쓰이는 곳이다.
사당
선조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다.
행랑채 행랑방
대문채에 연결되어 노비를 비롯한 사역인이 거처하는 곳.
청지기방
청지기(비서)가 거처하는 방이고 사랑방과 인접하여 있다.
광, 측
광은 살림도구와 음식물을 저장하는 곳이며, 측은 화장실이다.
조선시대에는 목재를 주요재료로 하는 주택양식과 더불어 가구 역시 목재의 무늬를 잘 살린 형태로 발전되어 오늘날에도 널리 극찬되고 있지만, 형태뿐만 아니라 목공결구법 (木工結構法)에 의한 독특한 기술로써 독자적 방법을 나타낸 것은 우리나라 전통가구양식의 특색을 형성하였습니다.
(5) 한말~일제강점기
고종의 집정기는 조선시대 말기로서 새로운 개혁의 막을 올린 시기였습니다. 오랜 세월 유학의 영향으로 인한 지배층의 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민중중심의 동학사상이 전개되었고, 밖으로는 서구제국주의 열강과 일본에 의한 문호개방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에도 불구하고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1910년에 경술국치가 되면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휩쓸려 가구양식도 점차로 서구화되어갔습니다. 이때에 처음으로 서구문물의 혜택을 입은 곳은 바로 왕실이었습니다.
궁궐건축으로부터 실내장식, 가구, 공예품까지 서구화한 입식 형태로 변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입식 가구가 제작되었고 서구식 가구와 전통가구가 공용되었습니다. 그뒤 광복과 함께 가구양식은 전통양식에서 절충식 양식으로 변하여갔습니다. 현재 궁중에 수장된 것 중 당시 유입된 17, 18세기 서양의 르네상스, 로코코양식의 가구와 중국의 화류가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가구로는 서랍이 많이 달린 장과 차단자라 하여 중국의 차탁자와 같이 개구부(開口部)가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래의 의걸이장이 이불장으로 쓰이다가 현대의 양복장으로 변한 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잘 나타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뒤 마룻가 입식 생활의 접객공간으로 되면서, 소파가 등장하고 차탁자, 협탁(脇卓), 장식장 등의 서양가구가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가구』
한국의 전통가구는 장,농,반다지,문갑등 수납가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그 종류는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지만,가구 하나하나 마다의 크기나 모양,장식등 이 모두 달라 디자인의 다양성은 그폭이 매우 넓다. 장롱,문갑,사방탁자등은 안방의 중요한 가구로 자리잡고 있다.
사랑방 가구
의걸이 장
의걸이 장은 그 내부를 높게 만들고 그 안에 횟대라고 하는 긴 막내를 설치하여 자주 입는 옷을 그때그때 꺼내 입기 편하도록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현대에 사용되는 장롱은 이의거리의 장의 변형이다.
경축장
서책 및 문서를 보관하는 단층장으로 머릿장이라고도 한다.
서 장
책을 보관하는 장으로서 해충을 막는다 하여 오동서장이 일품 이다.
문 갑
문갑은 한쪽 벽에 한 쌍으로 놓아 실내에 강한 수평적인 요소를 부여하는 가구로서 주로 집문서나 중요한 문서류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문갑이라 불린다.
사방탁자
개방이 선반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탁자라고 하는데 선반이 정방형에 가까운 것을 사방탁자라고 한다.그것의 용도는 주로 붓 걸이,연적,도자기등을 장식적으로 올려 놓는데 사용하였다.
서 안
서안은 오늘날의 책상과 같은 것이다.서안은 보통 상 면과 한두 개의 서랍으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인데 , 상 면의 끝이 두루말이 처럼 살짝 올라가고,굽어진 호족형의 다리를 가진 것은 범상이라 부른다.이들은 모두 서안의 한 종류이다.
경 상
우너래 사찰에서 불경을 읽을 때 쓰는 것인데 뒤에 사대부집 서안으로 사용되었다.
고 비
조선시대 편지를 두루 말 이로 된 화선지에 썼기 때문에 고비는 이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다.두루 말이는 옆에서 일어놓도록 되어있어 전면은 막혀있는데 이전면에 음각,투각등의 정교한 장식과 대나무를 이용해 시원스러운 장식성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
필통,필가
필통은 붓을 보관하는 통.필가는 붓을 바닥에 걸쳐놓을 때 쓰는 도구 이다.
서 견 대
서책을 받치는 대로서 송판이 경사진 것과 부챗살 같이 폈다 접었다 하는 것이 있다.
함,통,궤
함은 도장함,문서함,서함,관모함 등.통은 탕 건통.망건통 화살통등,궤는 의류궤가 대표적으로 종이제가 많은 것이 특징 이다.
평 상
휴식용의 침대와 같은 상,살평상과 널평상이 있다.
연 상
연상은 가구로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섬세한 장식을 한 것이 많아 선비의 멋과 취미를 많이 담아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대체적으로 벼루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다.
바둑판- 바둑판은 방형의 통나무와 괴목판으로 만들었다.
가구의 역사
추천자료
 르네상스 건축
르네상스 건축 여성 복지정책의 현황
여성 복지정책의 현황 한국 목조건축의 이해
한국 목조건축의 이해 금속공예
금속공예 금속공예
금속공예 [연료전지] 연료전지에 대하여
[연료전지] 연료전지에 대하여 [아르누보 탄생배경][아르누보 특성][아르누보 건축][아르누보 복식][아르누보 문화][아르누...
[아르누보 탄생배경][아르누보 특성][아르누보 건축][아르누보 복식][아르누보 문화][아르누... 지구단위계획_국내사례_조사_및_분석서울시_한남지구_동해시_중심
지구단위계획_국내사례_조사_및_분석서울시_한남지구_동해시_중심 결혼이주여성의 문제점 및 사회복지대책 방안
결혼이주여성의 문제점 및 사회복지대책 방안 [가족][김씨][가족 의미][가족 유형][가족 역할][김씨 시조][우반동김씨][김유신][김씨열행록...
[가족][김씨][가족 의미][가족 유형][가족 역할][김씨 시조][우반동김씨][김유신][김씨열행록... 가정폭력
가정폭력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사회복지 역사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사회복지 역사 이케아 IKEA 기업분석,성공전략,SWOT분석및 이케아 마케팅전략 사례분석과 이케아 향후비전및...
이케아 IKEA 기업분석,성공전략,SWOT분석및 이케아 마케팅전략 사례분석과 이케아 향후비전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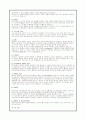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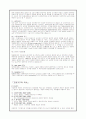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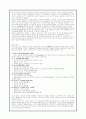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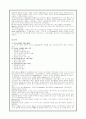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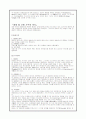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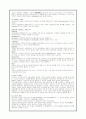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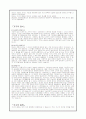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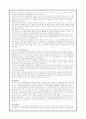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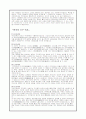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