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도덕화된 악"에서 "악의 정당화"로
Ⅲ. 클라이스트의 문학 세계에 나타난 악의 문학적 형상화
Ⅳ. 부정과 절망의 원칙: 메피스토펠레스적 악의 본성
Ⅴ. 근대성과 보들레르의 "문학적 악마주의"
Ⅵ. '악'의 주체와 구성원리: 고골과 도스또옙스끼
Ⅶ. 맺는 말
Ⅱ. "도덕화된 악"에서 "악의 정당화"로
Ⅲ. 클라이스트의 문학 세계에 나타난 악의 문학적 형상화
Ⅳ. 부정과 절망의 원칙: 메피스토펠레스적 악의 본성
Ⅴ. 근대성과 보들레르의 "문학적 악마주의"
Ⅵ. '악'의 주체와 구성원리: 고골과 도스또옙스끼
Ⅶ. 맺는 말
본문내용
바로 소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도스또옙스끼 문학의 백미는 이런 선과 악의 대비가 아니라, 초인사상을 물든 라스꼴리니꼬프가 서민의 기생충 같은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는 당위성에 관한 서술이다. 도스또옙스끼는 이 작품의 주요 플롯을, 빛나는 관념적 유희와 사변적 논리로 점철되어 있는 라스꼴리니꼬프의 \'초인사상\'으로 구성하고 있다. 나중에 『악령』에서 쉬갈료프의 \'소수 엘리트들의 창조적 권리와 다수 군중들의 희생 의무\'로 발전되는 이 사상에 따르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기를 꿈꾸는 절대적 이성의 경지에 이른 초인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행위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명제의 근본 논리에 따라, 이성적인 인식을 하는 자인 라스꼴리니꼬프는 자신이 궁극적으로 실현해나가려는 이상주의적 사회의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지몽매한 대중들을 얼마든지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변한다.
도스또옙스끼는 이성의 성좌에 다다른 것과도 같은 라스꼴리니꼬프의 관념적 논리가 얼마나 자기파괴적이며 인간들의 본성을 말살해 가는 것인가를 또 다른 관념적 진술을 통해 보여주지 않고, 밤거리 여자였던 소냐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예를 통해 암시적으로 서술한다. 시베리아에서 유형을 살고 있던 라스꼴리니꼬프가 자기를 따라와 묵묵하게 온갖 시련을 견뎌내고 있는 소냐의 모습에서 \"어느 날 문득 자기가 그토록 갈구했던 정신적 자유가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대지에 입을 맞춘다.\" 작품의 에필로그에 제시되어 있는 이 서술은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인간의 관념적 세계가, 무한한 대지에 맞닿아 있는 여성의 원시적 힘, 유순하지만 강인하며 시공간을 초월해 항상 존재해 온 여성의 시원성에 궁극적으로는 함몰되어 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이 내포하고 있는 독단적 자의성과 근본적 모순에 대해 통렬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던 도스또옙스끼는 이성의 사변적 논리와 인간의 지순한 영혼을 은유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인간들의 모든 관념과 인식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절대적인 공간을 상징하고 있다고 라스꼴리니꼬프가 맹신했던 초인사상은 『악령』에서 끼릴로프의 \'인신사상\'과 베르호벤스끼의 \'혁명사상\', 그리고 쉬갈료프의 \'엘리트의 독점적 권리\'로 진화해간다. 도스또옙스끼가 설정한 인신사상의 본질은 간략히 말해, 신이 부여한 목숨이란 한계를 인간 스스로 거부하고 자살함으로써, 인간은 초월적 존재인 신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으며, 마침내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역설적인 논리이다. 혁명사상과 엘리트의 독점적 권리라는 것은 절대적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 대중의 목숨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악마의 논리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악한 것으로 변질케 하는 악의 주체와 구성원리는 도스또옙스끼의 작품에서는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 『좁은 문』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도스또옙스끼의 작품 『악령』에 구현되어 있는 악의 의미에 대해 말하면서 도스또옙스끼가 날카로운 역설로 \'초월적 이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악\'을 고발하고 있다고 비평하고 있다. \"이 소설은 자기가 추구하는 이성적 관념에만 사로잡힌 개인들이 어떻게 하나의 도그마에 빠져들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도그마의 노예가 되고 마는가를 \'악마의 논리\'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Gide, Andre. Dostoevsky, Translated by A. Bennett. London, 1925, p. 95.
고 말한다.
도스또옙스끼는 러시아 인뗄리겐짜들이 서구에서 정립된 이성적 사유방식을 아무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 다음 그것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그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시대의 이념이 되기 위해서는 동시대인들의 인식과 긴밀히 소통하는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여야\"
) Bakhtin, Mikhail.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Edited and translated by Caryl Emers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see, 1984, p. 256.
하는데, 공동체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이성적 논리라는 전제조건 하에 온갖 사상이 인간들의 영혼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들었기 때문이었다.
도스또옙스끼는 스스로 절대적이라고 확신하는 이성의 사변적 논리나 초월적 존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종교의 관념적 유희, 사회 개조라는 이념 하에 대중을 약탈하는 혁명 노선의 도그마와 같은 단성악적 사유를 악의 근원이라고 해석한다. 그 이유는 『악령』에서 샤또프가 말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고, 인간을 위해 단 한순간이라도 고통을 당하거나 기꺼이 희생해 본 적이 전혀 없었다. 그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행위 한다면, 그것은 단지 자신들의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일뿐이다...\"
) Dostoevsky, Demons, Translated by Richard Pevear and Larissa Volokhonsky, New York: Vintage Classics, 1994, p. 38.
Ⅶ. 맺는 말
이상과 같은 악의 문학적 형성화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는 악의 의미란 결코 현실을 초월하여 규정될 수 없고 매 시대의 역사적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때로는 도덕적 담론에 대한 저항으로서,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으로서, 자본주의적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성적 사유에 대한 저항으로서 읽혀지고 있다. 물론 독일, 프랑스, 러시아 문학을 꿰뚫는 악의 공통적인 의미는 서구 문명의 진행 과정 속에서 찾아질 수 있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것의 문학적 형성화 양상 자체는 미묘한 차이점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악한 것의 서술\"과 \"악한 서술\" 간의 차이점은 예술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인식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앞으로 후자의 측면이 더욱 세밀하게 연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스또옙스끼는 이성의 성좌에 다다른 것과도 같은 라스꼴리니꼬프의 관념적 논리가 얼마나 자기파괴적이며 인간들의 본성을 말살해 가는 것인가를 또 다른 관념적 진술을 통해 보여주지 않고, 밤거리 여자였던 소냐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예를 통해 암시적으로 서술한다. 시베리아에서 유형을 살고 있던 라스꼴리니꼬프가 자기를 따라와 묵묵하게 온갖 시련을 견뎌내고 있는 소냐의 모습에서 \"어느 날 문득 자기가 그토록 갈구했던 정신적 자유가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대지에 입을 맞춘다.\" 작품의 에필로그에 제시되어 있는 이 서술은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인간의 관념적 세계가, 무한한 대지에 맞닿아 있는 여성의 원시적 힘, 유순하지만 강인하며 시공간을 초월해 항상 존재해 온 여성의 시원성에 궁극적으로는 함몰되어 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이 내포하고 있는 독단적 자의성과 근본적 모순에 대해 통렬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던 도스또옙스끼는 이성의 사변적 논리와 인간의 지순한 영혼을 은유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인간들의 모든 관념과 인식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절대적인 공간을 상징하고 있다고 라스꼴리니꼬프가 맹신했던 초인사상은 『악령』에서 끼릴로프의 \'인신사상\'과 베르호벤스끼의 \'혁명사상\', 그리고 쉬갈료프의 \'엘리트의 독점적 권리\'로 진화해간다. 도스또옙스끼가 설정한 인신사상의 본질은 간략히 말해, 신이 부여한 목숨이란 한계를 인간 스스로 거부하고 자살함으로써, 인간은 초월적 존재인 신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으며, 마침내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역설적인 논리이다. 혁명사상과 엘리트의 독점적 권리라는 것은 절대적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 대중의 목숨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악마의 논리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악한 것으로 변질케 하는 악의 주체와 구성원리는 도스또옙스끼의 작품에서는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 『좁은 문』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도스또옙스끼의 작품 『악령』에 구현되어 있는 악의 의미에 대해 말하면서 도스또옙스끼가 날카로운 역설로 \'초월적 이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악\'을 고발하고 있다고 비평하고 있다. \"이 소설은 자기가 추구하는 이성적 관념에만 사로잡힌 개인들이 어떻게 하나의 도그마에 빠져들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도그마의 노예가 되고 마는가를 \'악마의 논리\'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Gide, Andre. Dostoevsky, Translated by A. Bennett. London, 1925, p. 95.
고 말한다.
도스또옙스끼는 러시아 인뗄리겐짜들이 서구에서 정립된 이성적 사유방식을 아무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 다음 그것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그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시대의 이념이 되기 위해서는 동시대인들의 인식과 긴밀히 소통하는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여야\"
) Bakhtin, Mikhail.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Edited and translated by Caryl Emers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see, 1984, p. 256.
하는데, 공동체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이성적 논리라는 전제조건 하에 온갖 사상이 인간들의 영혼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들었기 때문이었다.
도스또옙스끼는 스스로 절대적이라고 확신하는 이성의 사변적 논리나 초월적 존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종교의 관념적 유희, 사회 개조라는 이념 하에 대중을 약탈하는 혁명 노선의 도그마와 같은 단성악적 사유를 악의 근원이라고 해석한다. 그 이유는 『악령』에서 샤또프가 말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고, 인간을 위해 단 한순간이라도 고통을 당하거나 기꺼이 희생해 본 적이 전혀 없었다. 그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행위 한다면, 그것은 단지 자신들의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일뿐이다...\"
) Dostoevsky, Demons, Translated by Richard Pevear and Larissa Volokhonsky, New York: Vintage Classics, 1994, p. 38.
Ⅶ. 맺는 말
이상과 같은 악의 문학적 형성화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는 악의 의미란 결코 현실을 초월하여 규정될 수 없고 매 시대의 역사적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때로는 도덕적 담론에 대한 저항으로서,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으로서, 자본주의적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성적 사유에 대한 저항으로서 읽혀지고 있다. 물론 독일, 프랑스, 러시아 문학을 꿰뚫는 악의 공통적인 의미는 서구 문명의 진행 과정 속에서 찾아질 수 있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것의 문학적 형성화 양상 자체는 미묘한 차이점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악한 것의 서술\"과 \"악한 서술\" 간의 차이점은 예술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인식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앞으로 후자의 측면이 더욱 세밀하게 연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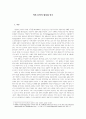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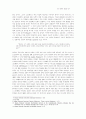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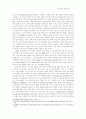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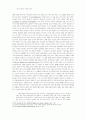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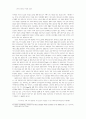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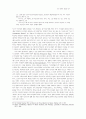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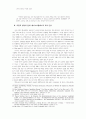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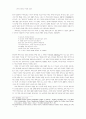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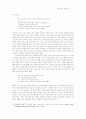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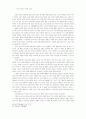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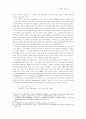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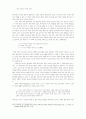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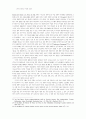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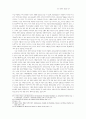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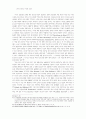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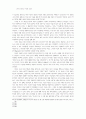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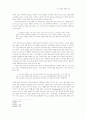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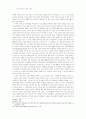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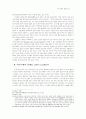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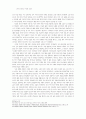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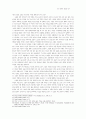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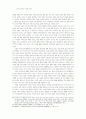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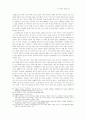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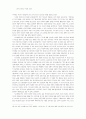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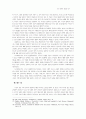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