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문제제기
■ 공포영화 부활하다
■ 공포영화 세가지
■ 마치며
■ 공포영화 부활하다
■ 공포영화 세가지
■ 마치며
본문내용
아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억압된 위협적인 소망을 내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 사람들은 이러한 욕망이 남의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곤 한다. 이 투사된 타자, 즉 주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내아닌 다른 사람이 영화에서 바로 괴물이나 살인자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점에서 우리가 꾸는 악몽과 공포영화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스크림 이전의 할로윈 13일의 금요일 같은 10대 슬래셔 영화들은 예외 없이 섹스나 마약, 술등의 금기를 깨버린 젊은이들을 가차없이 살해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들은 일종의 금기를 어긴 보복을 당하는 셈이다. 그런데 스크림에서 처럼 이상하게도 10대들은 이런 영화를 보면서 피해자 편만 드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향해 뒤를 쳐다봐하고 소리지르기도 하지만 태도가 돌변해 살인의 순간 우하고 환호하거나 오히려 살인을 재촉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청소년들에게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제물로 바치는 피의 축제가 호러영화인 셈. 어른들은 성적인 문란함을 허용하는 동시에 도덕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이러한 모순된 현실에 처해있는 10대들은 공포영화를 통해 자신들의 숨겨진 욕망이 실현되는 것을 바라보고 이러한 욕망이 처벌받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대리만족과 안도감을 동시에 얻는 것이다. 이중적인 가치관에 의한 이중적 만족이 슬래셔 영화의 진정한 노하우라면 거꾸로 스크림은 이러한 섹스 마약, 술에 대한 금기와 처벌의 규칙을 철저하게 해체한다. 더 이상의 허위의식을 거부한 체90년대 말 완전무장해제 되어 가는 미국의 성문화와 그 무의식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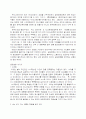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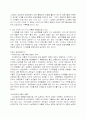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