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철학의 붕괴
2 철학과 문학
3.문학문화의 미래: 은유와 자아창조
4.맺는 말
2 철학과 문학
3.문학문화의 미래: 은유와 자아창조
4.맺는 말
본문내용
버릴 만큼 충분히 역사주의자이고 명목론자인 사람\"
) 같은 책, 22-23쪽.
이다. 즉 반어주의자는 자신의 믿음에 절대적인 근거나 본질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 형이상학자에 반대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의지하는 믿음의 궁극적 근거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 이상의 것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입장을 로티는 \'자문화 중심주의\'(ethnocentrism)라고 부른다. 아마도 이러한 다원주의적 세계 안에서 우리는 점차로 확장된 연대성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결코 과거의 철학이 추구했던 절대적이거나 보편적 진리의 가능성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진리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믿음 또한 포기할 것이다.
4. 맺는 말
우리는 지난 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점차 널리 확산되어 가는 로티의 목소리와 함께 새로운 세기를 맞고 있다. 아마도 새로운 세기에는 로티가 추구하는 다원주의는 점차 더 큰 폭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다원주의적 주장이 결코 로티가 생각하는 것처럼 낙관적인 귀결만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로티는 계속되는 다원적 분기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약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분명한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견해들이 진지하게 대처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다원적 분기를 허용했을 때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취향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적 심미주의나 퇴폐주의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언적(宣言的) 주장으로 일관하는 로티에게 가장 중요하게 물어져야 할 철학적 물음이다.
로티는 절대적인 것의 거부에 너무나 많은 힘을 기울이면서 이 물음에 관한 한 철학적 진지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로티가 말하는 진리와 의미, 그리고 경험과 도덕은 아무런 뿌리도 없이 떠도는 \'우연들\'의 이합집산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로티가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덜 우연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며, 또한 그것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세계다.
) 이 문제와 관련해서 로티가 부딪히게 된 숙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그가 받아들이고 있는 듀이의 실용주의 안에 이미 중요한 주제로 담겨져 있다. 그것은 \'신체화된 마음\'이라는 듀이의 논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몸의 중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티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러한 문제를 전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좀더 상세한 논의는 노양진, 「로티의 듀이 해석」, 김동식 편, 『로티와 과학과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7) 참조.
물리적 세계와의 직접적인 신체적 경험은 비록 전통적인 정초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절대적인 정초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만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기본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안정적 조건이다. 이러한 세계의 안정성을 간과하고 \'우연성\'으로만 치닫는 로티의 행보는 지적 안이함 아니면 낙관으로 가려진 의도적 \'전략\'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같은 책, 22-23쪽.
이다. 즉 반어주의자는 자신의 믿음에 절대적인 근거나 본질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 형이상학자에 반대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의지하는 믿음의 궁극적 근거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 이상의 것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입장을 로티는 \'자문화 중심주의\'(ethnocentrism)라고 부른다. 아마도 이러한 다원주의적 세계 안에서 우리는 점차로 확장된 연대성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결코 과거의 철학이 추구했던 절대적이거나 보편적 진리의 가능성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진리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믿음 또한 포기할 것이다.
4. 맺는 말
우리는 지난 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점차 널리 확산되어 가는 로티의 목소리와 함께 새로운 세기를 맞고 있다. 아마도 새로운 세기에는 로티가 추구하는 다원주의는 점차 더 큰 폭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다원주의적 주장이 결코 로티가 생각하는 것처럼 낙관적인 귀결만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로티는 계속되는 다원적 분기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약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분명한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견해들이 진지하게 대처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다원적 분기를 허용했을 때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취향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적 심미주의나 퇴폐주의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언적(宣言的) 주장으로 일관하는 로티에게 가장 중요하게 물어져야 할 철학적 물음이다.
로티는 절대적인 것의 거부에 너무나 많은 힘을 기울이면서 이 물음에 관한 한 철학적 진지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로티가 말하는 진리와 의미, 그리고 경험과 도덕은 아무런 뿌리도 없이 떠도는 \'우연들\'의 이합집산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로티가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덜 우연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며, 또한 그것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세계다.
) 이 문제와 관련해서 로티가 부딪히게 된 숙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그가 받아들이고 있는 듀이의 실용주의 안에 이미 중요한 주제로 담겨져 있다. 그것은 \'신체화된 마음\'이라는 듀이의 논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몸의 중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티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러한 문제를 전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좀더 상세한 논의는 노양진, 「로티의 듀이 해석」, 김동식 편, 『로티와 과학과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7) 참조.
물리적 세계와의 직접적인 신체적 경험은 비록 전통적인 정초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절대적인 정초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만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기본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안정적 조건이다. 이러한 세계의 안정성을 간과하고 \'우연성\'으로만 치닫는 로티의 행보는 지적 안이함 아니면 낙관으로 가려진 의도적 \'전략\'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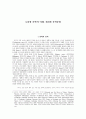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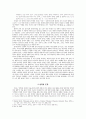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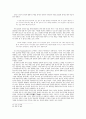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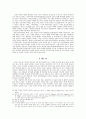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