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제 제기
국제주의적 시각
마르크스주의 법칙들의 종합
국가 자본주의 이론의 역사적 배경
'관료적으로 퇴보한 노동자 국가' 이론
노동 계급
맺음말
국제주의적 시각
마르크스주의 법칙들의 종합
국가 자본주의 이론의 역사적 배경
'관료적으로 퇴보한 노동자 국가' 이론
노동 계급
맺음말
본문내용
구실을 했다. 이것은 바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임금의 고전적 기능이다.(물론 임금 차이는 역시 서구 자본주의에서처럼 분열 지배에도 이바지했다.)
더구나 소련에서 개별 기업의 임금 책정은 실제로는 매우 자율적이었다. 경영자들은 서로 상여금이나 성과급 또는 노동기준량(노르마) 조작 등을 이용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경쟁을 벌였다. 이러한 일은 노사간 비밀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단체교섭권 등 노동 기본권이 크게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찾아 직장을 바꾸는 것으로 \'교섭력\'을 높였다. 젊은 노동자의 20퍼센트가 취업 첫 해에 직장을 바꿀 만큼 이직률이 높았다.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실업이 소련에는 없었으므로 소련은 자본주의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르바초프의 최고 경제 자문이었던 아벨 아간베기얀이 소련 학술원(과학 아카데미) 산하 노보시비르스크 경제·산업 조직 연구소 소장 시절인 1965년에 주요 도시의 실업률이 8퍼센트이고 소도시의 실업률은 20∼30퍼센트라고 지적했다는 사실을 드는 것으로 충분할지 모른다. 하지만 축적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에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가의 임금 수준 책정이 방지했기 때문에 기업은 축적률이 저조한 시기에도 장차 일손이 모자라게 되는 때를 대비해 대량 해고보다는 불안정 고용을 선호했다는 점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경제에 간접 비용을 부과하는 셈이었지만, 이점은 서구 자본주의의 사회 복지 혜택도 마찬가지이다.
맺음말
《사회주의-공상에서 과학으로》에서 엥겔스는 이렇게 예측했다.
… 자본주의 사회의 공식 대표자인 국가는 결국 생산에 대한 지도를 맡아야만 하게 될 것이다. … 그러나 주식회사와 트러스트로 또는 국가 소유로 변형된다 해서 생산력의 자본주의적 본질이 제거되지 않는다. … 형태가 어떻든 간에 현대 국가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기구이고 자본가들의 국가이며 총국민자본의 관념적 인격화다. 현대 국가가 생산력 장악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것은 더 많은 시민을 착취한다.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 곧 프롤레타리아로 남는다. 자본주의적 관계는 제거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정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정점에 이르면 그것은 넘어진다. 생산력의 국유는 충돌의 해결책이 아니지만 그 안에 해결책의 요소들을 이루는 기술적 조건들이 숨겨져 있다. 이 해결책은 … 사회가 공공연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생산력을 장악함으로써만 생겨날 수 있다. … 프롤레타리아가 공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그들은 사회화된 생산수단을 … 공공 재산으로 바꾼다.
엥겔스의 예측대로 그 뒤 세계 자본주의는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국가 자본주의로 전환했다. 그러나 국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혁명으로 대체된다는 그의 예측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 자본주의는 시장 자본주의로의 험난한-그리고 결국 불완전한- 전환에 착수했다. 자본주의적 관계가 \"넘어지는\" 것은 예정돼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조직된 계급 의식적 프롤레타리아의 존재에 달려 있다.
더구나 소련에서 개별 기업의 임금 책정은 실제로는 매우 자율적이었다. 경영자들은 서로 상여금이나 성과급 또는 노동기준량(노르마) 조작 등을 이용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경쟁을 벌였다. 이러한 일은 노사간 비밀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단체교섭권 등 노동 기본권이 크게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찾아 직장을 바꾸는 것으로 \'교섭력\'을 높였다. 젊은 노동자의 20퍼센트가 취업 첫 해에 직장을 바꿀 만큼 이직률이 높았다.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실업이 소련에는 없었으므로 소련은 자본주의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르바초프의 최고 경제 자문이었던 아벨 아간베기얀이 소련 학술원(과학 아카데미) 산하 노보시비르스크 경제·산업 조직 연구소 소장 시절인 1965년에 주요 도시의 실업률이 8퍼센트이고 소도시의 실업률은 20∼30퍼센트라고 지적했다는 사실을 드는 것으로 충분할지 모른다. 하지만 축적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에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가의 임금 수준 책정이 방지했기 때문에 기업은 축적률이 저조한 시기에도 장차 일손이 모자라게 되는 때를 대비해 대량 해고보다는 불안정 고용을 선호했다는 점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경제에 간접 비용을 부과하는 셈이었지만, 이점은 서구 자본주의의 사회 복지 혜택도 마찬가지이다.
맺음말
《사회주의-공상에서 과학으로》에서 엥겔스는 이렇게 예측했다.
… 자본주의 사회의 공식 대표자인 국가는 결국 생산에 대한 지도를 맡아야만 하게 될 것이다. … 그러나 주식회사와 트러스트로 또는 국가 소유로 변형된다 해서 생산력의 자본주의적 본질이 제거되지 않는다. … 형태가 어떻든 간에 현대 국가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기구이고 자본가들의 국가이며 총국민자본의 관념적 인격화다. 현대 국가가 생산력 장악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것은 더 많은 시민을 착취한다.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 곧 프롤레타리아로 남는다. 자본주의적 관계는 제거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정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정점에 이르면 그것은 넘어진다. 생산력의 국유는 충돌의 해결책이 아니지만 그 안에 해결책의 요소들을 이루는 기술적 조건들이 숨겨져 있다. 이 해결책은 … 사회가 공공연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생산력을 장악함으로써만 생겨날 수 있다. … 프롤레타리아가 공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그들은 사회화된 생산수단을 … 공공 재산으로 바꾼다.
엥겔스의 예측대로 그 뒤 세계 자본주의는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국가 자본주의로 전환했다. 그러나 국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혁명으로 대체된다는 그의 예측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 자본주의는 시장 자본주의로의 험난한-그리고 결국 불완전한- 전환에 착수했다. 자본주의적 관계가 \"넘어지는\" 것은 예정돼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조직된 계급 의식적 프롤레타리아의 존재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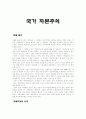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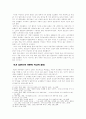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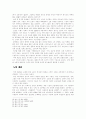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