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전 장병은 열세한 무기로 분전하다가 중상으로 기동이 어려운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국하였다. 이때 성첩과 문루가 파괴된 것을 1976년에 복원하는 동시에 당시 전사한 무명용사들의 무덤과 어재연의 쌍충비각을 보수, 정비하였다. 전쟁의 흔적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자연적인 지형들이 지금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관광객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급박한 상황들을 현재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자신의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전사한 장병들의 순의총을 보면서 착잡한 생각이 들었다.
강화해협을 찾아온 수많은 관광객들은 숨가쁘게 찾아온 수많은 관광객들은 숨가쁘게 전적지에 올라 그저 확 트인 시야와 자연 경관에 정신이 팔려 있을 뿐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알고 있는지. 역사의 흔적들은 그저 말없이 세월의 무상함만 말해 주는 것 같다.
광성보에서 301번 지방도로를 따라 강화읍으로 가는 곳에 고려 대장경판의 주조 장소로 추정되는 선원사 터가 있다. 선원사 터는 고려가 몽고의 난을 피해 강화로 도읍을 옮긴 후 당시 집권자인 최우가 고종 32년에 세운 절로써 대몽항쟁의 원찰이었으며 팔만대장경판이 완성된 산실이기도 한 절이었으나 조선 초 폐사된 후 현재까지 그 터만 남아 있으며 군데군데 주춧돌만이 당시를 말해 주고 있다. 선원사 터에서 다시 강화읍을 지나 부근리 고인돌로 향하였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포도밭을 조금 걸어가자 앞에 거대한 고인돌이 나타났다. 북쪽 경사면의 높은 동산 위에서 그 기슭의 평탄한 대지에 걸쳐 20∼30기로 추산되는 북방식 지석묘들이 산재하고 있다. 또한, 하점면 소재지로 향하는 도로변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밭 가운데 하나가 독립하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적 137호로 지정되어 있는 강화지석묘이다. 중부 이남의 북방식 지석묘로서는 최대규모에 속하는 것인데, 묘석의 길이 7.1m, 폭 5.5m나 되는 거석을 사용하였으며, 그 밑을 2개의 지석이 세워서 받다. 북방식 지석묘의 구조를 볼 때 4매의 지석으로 장방형의 석실을 구축하므로, 2매의 지석(마구리벽)은 유실된 듯하다. 지상높이 2.6m이고, 개석의 장축은 대략 남북을 가리키고 있다. 현재 남한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라고 한다. 고인돌을 쳐다보면서 인간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는 서서히 서쪽 산을 넘어가고 있다. 고인돌에 비친 석양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스산한 느낌을 주었다.
강화에서의 일정을 마치면서 연산군의 유배지였던 교동도를 답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연산군은 교동도에 유배된 지 2년 만에 생을 마감했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연산실록을 연산구일기라고 하여 제외시켰던 비운의 임금이다. 강화도는 어느 곳이나 우리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지역이다. 선사시대에서부터 현대까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사의 보고다. 이곳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은 강화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강화대교를 건넜다.
강화해협을 찾아온 수많은 관광객들은 숨가쁘게 찾아온 수많은 관광객들은 숨가쁘게 전적지에 올라 그저 확 트인 시야와 자연 경관에 정신이 팔려 있을 뿐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알고 있는지. 역사의 흔적들은 그저 말없이 세월의 무상함만 말해 주는 것 같다.
광성보에서 301번 지방도로를 따라 강화읍으로 가는 곳에 고려 대장경판의 주조 장소로 추정되는 선원사 터가 있다. 선원사 터는 고려가 몽고의 난을 피해 강화로 도읍을 옮긴 후 당시 집권자인 최우가 고종 32년에 세운 절로써 대몽항쟁의 원찰이었으며 팔만대장경판이 완성된 산실이기도 한 절이었으나 조선 초 폐사된 후 현재까지 그 터만 남아 있으며 군데군데 주춧돌만이 당시를 말해 주고 있다. 선원사 터에서 다시 강화읍을 지나 부근리 고인돌로 향하였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포도밭을 조금 걸어가자 앞에 거대한 고인돌이 나타났다. 북쪽 경사면의 높은 동산 위에서 그 기슭의 평탄한 대지에 걸쳐 20∼30기로 추산되는 북방식 지석묘들이 산재하고 있다. 또한, 하점면 소재지로 향하는 도로변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밭 가운데 하나가 독립하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적 137호로 지정되어 있는 강화지석묘이다. 중부 이남의 북방식 지석묘로서는 최대규모에 속하는 것인데, 묘석의 길이 7.1m, 폭 5.5m나 되는 거석을 사용하였으며, 그 밑을 2개의 지석이 세워서 받다. 북방식 지석묘의 구조를 볼 때 4매의 지석으로 장방형의 석실을 구축하므로, 2매의 지석(마구리벽)은 유실된 듯하다. 지상높이 2.6m이고, 개석의 장축은 대략 남북을 가리키고 있다. 현재 남한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라고 한다. 고인돌을 쳐다보면서 인간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는 서서히 서쪽 산을 넘어가고 있다. 고인돌에 비친 석양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스산한 느낌을 주었다.
강화에서의 일정을 마치면서 연산군의 유배지였던 교동도를 답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연산군은 교동도에 유배된 지 2년 만에 생을 마감했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연산실록을 연산구일기라고 하여 제외시켰던 비운의 임금이다. 강화도는 어느 곳이나 우리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지역이다. 선사시대에서부터 현대까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사의 보고다. 이곳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은 강화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강화대교를 건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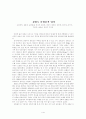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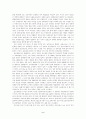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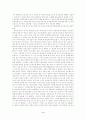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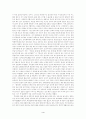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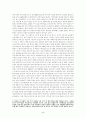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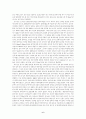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