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파란대문
(2) 섬
(3) 나쁜 남자
3. 결론
2. 본론
(1) 파란대문
(2) 섬
(3) 나쁜 남자
3. 결론
본문내용
두꺼운 책을 보란 듯이 들고 다니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누군가 놓고 간 지갑에서 큰돈을 훔치기도 하고, 서점에서 화집에 있는 그림을 몰래 훔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선화는 욕망이 가득한 여자임에도 그 욕망을 의식의 기저에 감추고, 착하고 순수한 존재를 표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성은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이 영화를 보고 시작은 나쁜 남자인지 나쁜 여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했으되, 결말은 누가 나쁜 남자인지 혹은 나쁜 여자인지 구분조차 애매모호하게, 아니 옳고 그름의 판단 자체가 무의미하게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한기를 나쁘지 않은 남자로 보게 되는가? 이 영화에서 시선은 한기의 시선이지만 관객은 선화라는 행위자의 감정을 따라가게 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관객이 동일시를 느끼게 되는 인물은 선화인 것이다. 선화가 한기를 나쁘지 않은 남자로 보게 되니까 관객도 선화에게 감정이입이 된 것이다. 관객이 희생자인 선화에게는 동정에 의해 거리감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도 작용할 것이다. 선화를 감정이입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객 설득에 성공한 점이 이 영화의 탁월한 점이다. 애초에 이 영화에서 한기의 시선은 감독의 주관적 시선과 일치할 것이다. 이 영화의 주제는 이런 남자가 나쁜 남자냐는 반어법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과 악, 2중적인 내면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선화를 통해 나타냈고, 우리가 악이라 치부하던 한기와 선화는 두 사람의 경계인 거울처럼 가깝고도 먼 거리에 함께 공존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각 시켜 주고 있다.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참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감추고 싶고 또 가려진 거짓된 위선이나 욕망의 자아에 대한 경계가 있거든 그 경계를 과감히 깨 부셔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3. 결론
감독은 끊임없이 모순 된 인간관계의 모습을 역설적이면서 적나라하게 끄집어 올리는데 정열을 쏟는다. 우리가 공공연히 비밀로 여기는 것들까지 오픈시킴으로써 떳떳하고자 한다. 마조히즘이라 일컫는 자기학대증에서 오는 희열도 그의 작품에서는 심심찮게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그는 수직적인 상하 관계를 거부하고 인간은 누구에게나 수평적 인간관계를 필요로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삶의 방향의 길을 잡는냐는 자신의 선택이고 의지다. 자신을 지켜낼 힘과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암울한 인간상을 그려냄은 절벽의 밑바닥을 체험함으로써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올라설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살고자하는 몸부림이 가득베어 있다. 칼끝으로 상대의 살갗을 도려내며 사랑을 고백하는 투의 기이한 가학과 자포자기와 맹목이 뒤섞인 김기덕의 세계에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을 느낄 수 있다.
영화는 환상과 현실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영화는 현실을 그대로 찍어서 보여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언어로만 느껴지기도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은 비정한 계급관계, 동정 없는 인간관계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니 영화를 찍는다고 해서 그런 현실이 마치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낙관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앓고 있는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김기덕 감독 만에 작품세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영화를 \"반추상 영화\"라 하는데 이는 사실적이지만 고통스러운 것들과 상상적이지만 희망의 세계가 만나는 어떤 경계 지점을 묘사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분명 영화를 만드는데 있어 시나리오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런데, 비제도권에서 온 김기덕 감독의 작품세계를 보다 보면 솔직히 시나리오부터 엉성함을 느낄 수 있다. 전체적인 구성과 네러티브, 그리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성과 폭력에 대한 엽기성을 뺀다면, 솔직히 아마추어적인 졸작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김기덕 감독의 작품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나에게 느끼게 해 준 점이 있다면, 바로 그의 영화 속에 담겨 있는 잔혹한 현실이다. 우리가 제도권 속에 살면서 도외시 해 오던 소외된 인간들의 냉혹한 현실세계는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감상하는데 있어 영화의 완성도와엽기성에 치우쳐 그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그가 영화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다시금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를 보고 시작은 나쁜 남자인지 나쁜 여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했으되, 결말은 누가 나쁜 남자인지 혹은 나쁜 여자인지 구분조차 애매모호하게, 아니 옳고 그름의 판단 자체가 무의미하게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한기를 나쁘지 않은 남자로 보게 되는가? 이 영화에서 시선은 한기의 시선이지만 관객은 선화라는 행위자의 감정을 따라가게 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관객이 동일시를 느끼게 되는 인물은 선화인 것이다. 선화가 한기를 나쁘지 않은 남자로 보게 되니까 관객도 선화에게 감정이입이 된 것이다. 관객이 희생자인 선화에게는 동정에 의해 거리감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도 작용할 것이다. 선화를 감정이입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객 설득에 성공한 점이 이 영화의 탁월한 점이다. 애초에 이 영화에서 한기의 시선은 감독의 주관적 시선과 일치할 것이다. 이 영화의 주제는 이런 남자가 나쁜 남자냐는 반어법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과 악, 2중적인 내면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선화를 통해 나타냈고, 우리가 악이라 치부하던 한기와 선화는 두 사람의 경계인 거울처럼 가깝고도 먼 거리에 함께 공존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각 시켜 주고 있다.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참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감추고 싶고 또 가려진 거짓된 위선이나 욕망의 자아에 대한 경계가 있거든 그 경계를 과감히 깨 부셔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3. 결론
감독은 끊임없이 모순 된 인간관계의 모습을 역설적이면서 적나라하게 끄집어 올리는데 정열을 쏟는다. 우리가 공공연히 비밀로 여기는 것들까지 오픈시킴으로써 떳떳하고자 한다. 마조히즘이라 일컫는 자기학대증에서 오는 희열도 그의 작품에서는 심심찮게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그는 수직적인 상하 관계를 거부하고 인간은 누구에게나 수평적 인간관계를 필요로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삶의 방향의 길을 잡는냐는 자신의 선택이고 의지다. 자신을 지켜낼 힘과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암울한 인간상을 그려냄은 절벽의 밑바닥을 체험함으로써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올라설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살고자하는 몸부림이 가득베어 있다. 칼끝으로 상대의 살갗을 도려내며 사랑을 고백하는 투의 기이한 가학과 자포자기와 맹목이 뒤섞인 김기덕의 세계에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을 느낄 수 있다.
영화는 환상과 현실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영화는 현실을 그대로 찍어서 보여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언어로만 느껴지기도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은 비정한 계급관계, 동정 없는 인간관계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니 영화를 찍는다고 해서 그런 현실이 마치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낙관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앓고 있는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김기덕 감독 만에 작품세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영화를 \"반추상 영화\"라 하는데 이는 사실적이지만 고통스러운 것들과 상상적이지만 희망의 세계가 만나는 어떤 경계 지점을 묘사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분명 영화를 만드는데 있어 시나리오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런데, 비제도권에서 온 김기덕 감독의 작품세계를 보다 보면 솔직히 시나리오부터 엉성함을 느낄 수 있다. 전체적인 구성과 네러티브, 그리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성과 폭력에 대한 엽기성을 뺀다면, 솔직히 아마추어적인 졸작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김기덕 감독의 작품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나에게 느끼게 해 준 점이 있다면, 바로 그의 영화 속에 담겨 있는 잔혹한 현실이다. 우리가 제도권 속에 살면서 도외시 해 오던 소외된 인간들의 냉혹한 현실세계는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감상하는데 있어 영화의 완성도와엽기성에 치우쳐 그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그가 영화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다시금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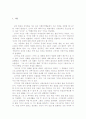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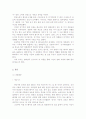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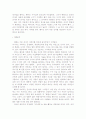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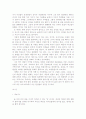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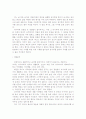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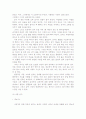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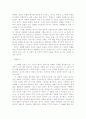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