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본 문
1) 연암 박지원의 사상과 문학관
2) 양반전에 대한 이해
가) 한국 문학의 사실주의
나) 「양반전」의 배경설
다) 「양반전」과 연암 박지원
라) 「양반전」에 대한 가치 평가
마) 「양반전」에 나타난 리얼리즘적 요소
3. 나오는 말
2. 본 문
1) 연암 박지원의 사상과 문학관
2) 양반전에 대한 이해
가) 한국 문학의 사실주의
나) 「양반전」의 배경설
다) 「양반전」과 연암 박지원
라) 「양반전」에 대한 가치 평가
마) 「양반전」에 나타난 리얼리즘적 요소
3. 나오는 말
본문내용
양반전을 쓴다.
라고 하여 「양반전」의 저술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작품의 제목과 함께 「양반전」의 성격을 풍자소설이라고 규정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 즉 「양반전」은 양반사회의 부패와 타락상, 양반계급의 우선과 횡포를 고발하여 일부 몰지각한 사대부의 각성을 촉구한 풍자소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양반사회와 양반계층에 대한 사실적 거론과 비판, 무의도식하는 양반계급의 실생활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사실적 드러냄 자체가 양반사회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반전」을 저술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양반전」은 몰락하는 봉건제의 조짐 속에서 나타난 양반들의 추악한 실상을 고발함과 동시에 새롭게 부상하는 계급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리얼리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회와 역사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매개체 노릇을 하는 점으로 볼 때 권위적이고 위선적인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새 계급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데 이는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계급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 나오는 말
<양반전>에서 우선 문제삼고 있는 것은 당대의 잘못된 선비관이다. 선비는 선비대로, 상민은 상민대로 선비의 정체성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비는 \'하늘이 준 벼슬\'로서 재물과는 무관한 것이며, 고단한 학문적 수련과 엄격한 자기 절제를 감내해야 하는 힘든 지위이다. 영귀하나 빈한하나 선비는 선비이며, 그에 맞게 처신하고 대우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매너리즘에 빠진 무능력한 선비들은 선비로서의 자존심도 버린 채 재물과 권세 앞에 비굴한 모습만 보이고, 자기정체성을 망각한 선비들은 신분을 특권 삼아 이권만 챙기고 있으니, 상민들 또한 선비의 참모습은 모른 채 그들을 놀고 먹는 신선이나 횡포한 도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늘이 준 벼슬\'인 선비의 신분이 하나의 이권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던 당대 현실이 신랄히 비판되고 있다.
그런데 당대인들의 잘못된 선비관과 선비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이러한 비판의 이면에는 선비로서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청년 연암의 내면적 고민과 위기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선비들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선비의 사회적 위상이 안팎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선비는 선비대로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스스로 자기정체성을 손상시키고 있고, 상민은 상민대로 그러한 선비들을 \'도둑놈\' 취급하며 돈만 있으면 선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 여기에 연암의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관습적 학문에 매몰된 선비들은 생계도 꾸리지 못하는 무능력에 빠져 선비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고, 이권 챙기기에 급급한 선비들은 천한 상민들만도 못하게 처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비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던 연암이 자기정체성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됨은 당연하다. 당대 선비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은 인지하고 있으나, 그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전망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청년 연암의 고민이 위기의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여 「양반전」의 저술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작품의 제목과 함께 「양반전」의 성격을 풍자소설이라고 규정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 즉 「양반전」은 양반사회의 부패와 타락상, 양반계급의 우선과 횡포를 고발하여 일부 몰지각한 사대부의 각성을 촉구한 풍자소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양반사회와 양반계층에 대한 사실적 거론과 비판, 무의도식하는 양반계급의 실생활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사실적 드러냄 자체가 양반사회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반전」을 저술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양반전」은 몰락하는 봉건제의 조짐 속에서 나타난 양반들의 추악한 실상을 고발함과 동시에 새롭게 부상하는 계급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리얼리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회와 역사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매개체 노릇을 하는 점으로 볼 때 권위적이고 위선적인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새 계급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데 이는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계급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 나오는 말
<양반전>에서 우선 문제삼고 있는 것은 당대의 잘못된 선비관이다. 선비는 선비대로, 상민은 상민대로 선비의 정체성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비는 \'하늘이 준 벼슬\'로서 재물과는 무관한 것이며, 고단한 학문적 수련과 엄격한 자기 절제를 감내해야 하는 힘든 지위이다. 영귀하나 빈한하나 선비는 선비이며, 그에 맞게 처신하고 대우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매너리즘에 빠진 무능력한 선비들은 선비로서의 자존심도 버린 채 재물과 권세 앞에 비굴한 모습만 보이고, 자기정체성을 망각한 선비들은 신분을 특권 삼아 이권만 챙기고 있으니, 상민들 또한 선비의 참모습은 모른 채 그들을 놀고 먹는 신선이나 횡포한 도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늘이 준 벼슬\'인 선비의 신분이 하나의 이권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던 당대 현실이 신랄히 비판되고 있다.
그런데 당대인들의 잘못된 선비관과 선비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이러한 비판의 이면에는 선비로서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청년 연암의 내면적 고민과 위기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선비들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선비의 사회적 위상이 안팎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선비는 선비대로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스스로 자기정체성을 손상시키고 있고, 상민은 상민대로 그러한 선비들을 \'도둑놈\' 취급하며 돈만 있으면 선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 여기에 연암의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관습적 학문에 매몰된 선비들은 생계도 꾸리지 못하는 무능력에 빠져 선비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고, 이권 챙기기에 급급한 선비들은 천한 상민들만도 못하게 처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비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던 연암이 자기정체성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됨은 당연하다. 당대 선비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은 인지하고 있으나, 그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전망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청년 연암의 고민이 위기의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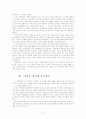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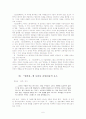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