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제례
2. 제례의 유래와 변천
3. 제사의 종류
4. 제수의 종류
5. 전통 제례순서
Ⅲ. 결 론
* 참고문헌 *
Ⅱ. 본 론
1. 제례
2. 제례의 유래와 변천
3. 제사의 종류
4. 제수의 종류
5. 전통 제례순서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잔반을 본래 자리에 올린다.
이어서 주인은 제상의 동쪽으로 옮겨 비위의 잔반을 고위의 잔반처럼 술을 따라 올린다.
이어서 주인은 향안의 남쪽(앞)에서 북쪽을 향해 선다.
그러면 동집사(東執事)가 주전자를 본래 자리에 놓고,
서집사(西執事)는 고위의 잔반을 받들어 주인의 왼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서고
동집사는 비위의 잔반을 받들어 주인의 오른 쪽 앞에서 서쪽을 향해 선다.
주인과 집사가 함께 꿇어앉으면 주인이 고위의 잔반을 받아 왼 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 손으로 잔을 집어 모사기(茅沙器)에 조금씩 세 번 지우고
만약 술이 남으면 퇴주기에 쏟은 다음 잔반을 집사에게 돌려준다.
이를 받은 서집사는 잔반을 고위의 본디 자리에 올린다.
이어서 비위의 잔반도 동집사에 의하여 고위의 잔반 절차와 같이 한다.
이때에 술잔을 흔히 향로 위에서 돌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이 예법이다.
아헌(亞獻) 때와 종헌(終獻) 때도 마찬가지다.
주인과 집사는 제자리로 돌아간다.
다른 참사자가 집사들의 도움을 받아 육적(肉炙)과 소금을 받들어 올린다.
집사는 메, 국, 탕과 같이 뚜껑을 덮은 제수의 뚜껑을 열어 각기 남쪽(그릇 앞)에 놓는다.
초헌 후에 제상에 올렸던 육적(肉炙)을 퇴상(退床)한다. 소금은 그대로 둔다.
(5) 독축(讀祝)
초헌 후 참사자가 모두 꿇어앉으면 축관이 옆에 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제주가 읽어도 되는데, 엄숙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야 한다.
축문 읽기가 끝나면 모두 일어나 두 번 절한다.
과거에는 독축 뒤에 곡(哭)을 했다.
(6) 아헌(亞獻)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원래는 주부(主婦)가 올린다.
이 때 집사는 여자가 된다.
주부가 올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주의 다음 가는 근친자가 올린다.
절차는 초헌 때와 같으나 모사에 술을 따르지 않는다.
\'육적(肉炙)\' 대신 그 자리에 \'어적(魚炙)\'을 올린다.
주부는 네 번 절한다.
(7) 종헌(終獻)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아헌자의 다음 가는 근친자가 아헌 때와 같이 한다.
흔히 멀리서 참례하러 온 참사자 가운데서 올리기도 하는데, 사위(女壻)나 외손(外孫)이 마땅하다.
잔은 7할쯤 부어서 올린다.
\'아헌\' 때 올렸던 어적(魚炙)은 그대로 두고,
계적(鷄炙) 또는 소적(蔬炙)을 올리며, 마지막의 술잔 비우기(退酒)는 하지 않는다.
(8) 첨작(添酌)
종헌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제주가 다시 신위 앞으로 나아가 끓어 앉으면
집사는 술 주전자를 들어 종헌 때 7할쯤 따라 올렸던 술잔에 세 번 첨작하여 술잔을 가득 채운다.
(9) 삽시정저(揷匙正箸)
첨작이 끝나면 주부가 메 그릇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메 그릇의 중앙에 꽂는다.
젓가락을 고른 뒤 어적이나 육적 위에 가지런히 옮겨 놓는다.
숟가락은 바닥(안쪽)이 동쪽으로 가게 한다.
삽시정저가 끝나면 제주는 두 번, 주부는 네 번 절한다.
(10) 합문(闔門)
참사자가 모두 잠시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기다린다.
대청 마루에 제상을 차렸으면 뜰 아래로 내려가 읍한 자세로 잠시 기다린다.
\'예서\'에는 서 있는 동안을 \'구식경(九食頃-아홉숟갈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약 8 9분)\'이라 했는데, 이 서 있는 동안은 잡담을 하며 서성거림 없이 조용하게 경건한 마음을 가진다.
주인과 주부가 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시립(侍立)한다.
단칸방의 경우에는 제자리에 엎드려 몇 분 동안 있다가 일어선다.
(11) 계문(啓門)
닫았던 문을 여는 절차이다.
축관이 헛기침을 세 번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참사자가 모두 뒤따라 들어간다.
(12) 헌다(獻茶)
갱을 내리고 물을 올린 뒤 메 세 술을 떠서 물에 말아 놓고 저를 고른다.
이때 참사자는 모두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인 상태로 잠시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든다.
(13) 철시복반(撤匙復飯)
숭늉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어 제자리에 놓고 메 뚜껑을 덮는다.
(14) 사신(辭神)
고인의 영혼을 전송하는 절차로서 참사자가 신위 앞에 일제히
두 번 절한 뒤 지방과 축문을 불사른다.
지방은 축관이 모셔온다.
신주일 때는 사당으로 모신다.
이로서 제사를 올리는 의식 절차는 모두 끝난다.
(15) 철상(撤床)
제상 위의 모든 제수를 집사가 뒤쪽에서부터 차례로 물린다.
(16) 음복(飮福)
참사자가 한자리에 앉아 제수를 나누어 먹는데 이를 음복이라 한다.
음복을 끝내기 전에는 제복을 벗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참사자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에게 제사 음식을 나누어주고 이웃 어른들을 모셔다가 대접하기도 했다.
Ⅲ. 결 론
오늘날에 와서 제례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기도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있으며, 새로운 종교의 영향으로 미신이라 하여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과거와 현재의 사고방식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사상이 변한 것은 사실이다.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유교가 모든 사회원리를 지배했던 사회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다르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고, 유교보다 기독교와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교적 제사만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제례가 사정에 따라 간소화하거나 또는 새로운 종교에 맞는 풍습으로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전통문화인 제사를 미신으로 치부하거나 또는 여행을 목적으로 지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제례는 조상에 대한 후손들의 공경심과 효심을 나타내는 의식으로써 당연한 것이지 미신으로 취급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의 참 의미를 새기고 현대에 맞는 의식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
한국인의 풍속 관혼상제, 어학시대사, 1995
최길성, 한국의 조상숭배, 예전사, 1986.
이영춘, 차례와 제사, 대원사, 1994.
김종혁, 조선의 관혼상제, 중심, 2002.
임돈희, 조상제례, 대원사, 1990.
최래옥, 한국구비문학대계 5-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어서 주인은 제상의 동쪽으로 옮겨 비위의 잔반을 고위의 잔반처럼 술을 따라 올린다.
이어서 주인은 향안의 남쪽(앞)에서 북쪽을 향해 선다.
그러면 동집사(東執事)가 주전자를 본래 자리에 놓고,
서집사(西執事)는 고위의 잔반을 받들어 주인의 왼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서고
동집사는 비위의 잔반을 받들어 주인의 오른 쪽 앞에서 서쪽을 향해 선다.
주인과 집사가 함께 꿇어앉으면 주인이 고위의 잔반을 받아 왼 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 손으로 잔을 집어 모사기(茅沙器)에 조금씩 세 번 지우고
만약 술이 남으면 퇴주기에 쏟은 다음 잔반을 집사에게 돌려준다.
이를 받은 서집사는 잔반을 고위의 본디 자리에 올린다.
이어서 비위의 잔반도 동집사에 의하여 고위의 잔반 절차와 같이 한다.
이때에 술잔을 흔히 향로 위에서 돌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이 예법이다.
아헌(亞獻) 때와 종헌(終獻) 때도 마찬가지다.
주인과 집사는 제자리로 돌아간다.
다른 참사자가 집사들의 도움을 받아 육적(肉炙)과 소금을 받들어 올린다.
집사는 메, 국, 탕과 같이 뚜껑을 덮은 제수의 뚜껑을 열어 각기 남쪽(그릇 앞)에 놓는다.
초헌 후에 제상에 올렸던 육적(肉炙)을 퇴상(退床)한다. 소금은 그대로 둔다.
(5) 독축(讀祝)
초헌 후 참사자가 모두 꿇어앉으면 축관이 옆에 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제주가 읽어도 되는데, 엄숙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야 한다.
축문 읽기가 끝나면 모두 일어나 두 번 절한다.
과거에는 독축 뒤에 곡(哭)을 했다.
(6) 아헌(亞獻)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원래는 주부(主婦)가 올린다.
이 때 집사는 여자가 된다.
주부가 올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주의 다음 가는 근친자가 올린다.
절차는 초헌 때와 같으나 모사에 술을 따르지 않는다.
\'육적(肉炙)\' 대신 그 자리에 \'어적(魚炙)\'을 올린다.
주부는 네 번 절한다.
(7) 종헌(終獻)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아헌자의 다음 가는 근친자가 아헌 때와 같이 한다.
흔히 멀리서 참례하러 온 참사자 가운데서 올리기도 하는데, 사위(女壻)나 외손(外孫)이 마땅하다.
잔은 7할쯤 부어서 올린다.
\'아헌\' 때 올렸던 어적(魚炙)은 그대로 두고,
계적(鷄炙) 또는 소적(蔬炙)을 올리며, 마지막의 술잔 비우기(退酒)는 하지 않는다.
(8) 첨작(添酌)
종헌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제주가 다시 신위 앞으로 나아가 끓어 앉으면
집사는 술 주전자를 들어 종헌 때 7할쯤 따라 올렸던 술잔에 세 번 첨작하여 술잔을 가득 채운다.
(9) 삽시정저(揷匙正箸)
첨작이 끝나면 주부가 메 그릇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메 그릇의 중앙에 꽂는다.
젓가락을 고른 뒤 어적이나 육적 위에 가지런히 옮겨 놓는다.
숟가락은 바닥(안쪽)이 동쪽으로 가게 한다.
삽시정저가 끝나면 제주는 두 번, 주부는 네 번 절한다.
(10) 합문(闔門)
참사자가 모두 잠시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기다린다.
대청 마루에 제상을 차렸으면 뜰 아래로 내려가 읍한 자세로 잠시 기다린다.
\'예서\'에는 서 있는 동안을 \'구식경(九食頃-아홉숟갈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약 8 9분)\'이라 했는데, 이 서 있는 동안은 잡담을 하며 서성거림 없이 조용하게 경건한 마음을 가진다.
주인과 주부가 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시립(侍立)한다.
단칸방의 경우에는 제자리에 엎드려 몇 분 동안 있다가 일어선다.
(11) 계문(啓門)
닫았던 문을 여는 절차이다.
축관이 헛기침을 세 번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참사자가 모두 뒤따라 들어간다.
(12) 헌다(獻茶)
갱을 내리고 물을 올린 뒤 메 세 술을 떠서 물에 말아 놓고 저를 고른다.
이때 참사자는 모두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인 상태로 잠시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든다.
(13) 철시복반(撤匙復飯)
숭늉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어 제자리에 놓고 메 뚜껑을 덮는다.
(14) 사신(辭神)
고인의 영혼을 전송하는 절차로서 참사자가 신위 앞에 일제히
두 번 절한 뒤 지방과 축문을 불사른다.
지방은 축관이 모셔온다.
신주일 때는 사당으로 모신다.
이로서 제사를 올리는 의식 절차는 모두 끝난다.
(15) 철상(撤床)
제상 위의 모든 제수를 집사가 뒤쪽에서부터 차례로 물린다.
(16) 음복(飮福)
참사자가 한자리에 앉아 제수를 나누어 먹는데 이를 음복이라 한다.
음복을 끝내기 전에는 제복을 벗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참사자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에게 제사 음식을 나누어주고 이웃 어른들을 모셔다가 대접하기도 했다.
Ⅲ. 결 론
오늘날에 와서 제례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기도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있으며, 새로운 종교의 영향으로 미신이라 하여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과거와 현재의 사고방식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사상이 변한 것은 사실이다.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유교가 모든 사회원리를 지배했던 사회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다르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고, 유교보다 기독교와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교적 제사만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제례가 사정에 따라 간소화하거나 또는 새로운 종교에 맞는 풍습으로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전통문화인 제사를 미신으로 치부하거나 또는 여행을 목적으로 지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제례는 조상에 대한 후손들의 공경심과 효심을 나타내는 의식으로써 당연한 것이지 미신으로 취급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의 참 의미를 새기고 현대에 맞는 의식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
한국인의 풍속 관혼상제, 어학시대사, 1995
최길성, 한국의 조상숭배, 예전사, 1986.
이영춘, 차례와 제사, 대원사, 1994.
김종혁, 조선의 관혼상제, 중심, 2002.
임돈희, 조상제례, 대원사, 1990.
최래옥, 한국구비문학대계 5-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추천자료
 현대적 시각에서 관혼상제례의 의미에 대한 재분석
현대적 시각에서 관혼상제례의 의미에 대한 재분석 전통놀이중 딱지치기, 고리걸기(고리던지기)유래 등
전통놀이중 딱지치기, 고리걸기(고리던지기)유래 등 전통 상차림에 대한 조사
전통 상차림에 대한 조사 [명절][북한의 명절][남한의 명절][한국의 명절][중국의 명절][일본의 명절][미국의 명절]북...
[명절][북한의 명절][남한의 명절][한국의 명절][중국의 명절][일본의 명절][미국의 명절]북... [명절][한국명절][우리나라명절][전통명절][한국전통명절][설날][정월대보름][한식][초파일][...
[명절][한국명절][우리나라명절][전통명절][한국전통명절][설날][정월대보름][한식][초파일][... 세계전통악기페어-컨벤션기획안 컨벤션기획서 컨벤션대학과제
세계전통악기페어-컨벤션기획안 컨벤션기획서 컨벤션대학과제 전통 된장 만들기
전통 된장 만들기 STS수업모형(학습,과학기술사회)의 개념, 목적, 가치와 STS수업모형(학습,과학기술사회)의 단...
STS수업모형(학습,과학기술사회)의 개념, 목적, 가치와 STS수업모형(학습,과학기술사회)의 단... [웹기반교육][WBI]웹기반학습(웹기반수업,교육, WBI) 특성, 교육적 기능, 웹기반학습(웹기반...
[웹기반교육][WBI]웹기반학습(웹기반수업,교육, WBI) 특성, 교육적 기능, 웹기반학습(웹기반... 한국전통건축(민가)
한국전통건축(민가)  한국전통가옥의실내구분
한국전통가옥의실내구분 [유아교육] 4-6세 유아를 위한 연령별 요리교육활동 - 만4세 : 꼬치 만들기 & 만5세 : ...
[유아교육] 4-6세 유아를 위한 연령별 요리교육활동 - 만4세 : 꼬치 만들기 & 만5세 : ... 전통적 문학교수 매체 - 문학매체의 준비와 유의점 및 문학교수매체의 종류, 교사의 역할과 ...
전통적 문학교수 매체 - 문학매체의 준비와 유의점 및 문학교수매체의 종류, 교사의 역할과 ... 교과교재 활용안(교재교구안)- 돌돌이(자연물 교구, 수조작영역), 캡슐약 소녀(한지 동화판, ...
교과교재 활용안(교재교구안)- 돌돌이(자연물 교구, 수조작영역), 캡슐약 소녀(한지 동화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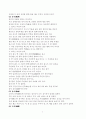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