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왜 ‘개념어’인가
2. ‘개념사’ 혹은 ‘개념연구’의 몇 가지 방식
3. 근대적 개념어의 형성: 용어의 상호 관련성
4. 근대 개념어 분포의 통계적 접근: 독립신문, 매일신문, 대한매일신보
의 통계
5. 민 관념의 두 층위
6. 천하의 민과 국의 민
7. 국민의 도덕: 민 관념의 집합성
8. 국가와 가족: ‘열정’의 역설
9. 국가와 ‘사적 열정’의 공공화
2. ‘개념사’ 혹은 ‘개념연구’의 몇 가지 방식
3. 근대적 개념어의 형성: 용어의 상호 관련성
4. 근대 개념어 분포의 통계적 접근: 독립신문, 매일신문, 대한매일신보
의 통계
5. 민 관념의 두 층위
6. 천하의 민과 국의 민
7. 국민의 도덕: 민 관념의 집합성
8. 국가와 가족: ‘열정’의 역설
9. 국가와 ‘사적 열정’의 공공화
본문내용
다. 앞서 본 梁啓超와 비교하자면, 梁啓超가 중국에는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으므로 국민을 통해 국가를 만들려고 한 경우라면, 福澤諭吉는 국가는 있으나 국민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국민\'을 창출하려고 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福澤諭吉의 리얼리즘은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작동합니다. \"민심의 향방은 일시적인 조치로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일본의 국민은 수백 년 동안 천황의 존재를 실감하지 못하고 단지 구전으로 들어왔을 뿐이다. 유신이라는 거사를 통해서 정치의 체제는 수백 년 전의 옛날로 돌아갔다고 하나 왕실과 국민의 사이에는 깊은 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왕제 일신의 근원은 국민이 패권정치를 혐오하고 왕실을 흠모한 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대의명분을 갑자기 상기한 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 권력이 왕실로 돌아간 이상 일본 국민으로서 그 왕실을 받들어야 함은 물론 당연한 의무이겠으나, 국민과 왕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정치적인 관계뿐이다. 그 정분으로 말하면 그것을 갑자기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國體論을 비판한 다음에는 기독교적인 사해동포주의를 비판합니다. \"현금의 정세를 보면 어딘들 나라를 세우지 않은 곳이 없고 나라를 세운 이상 정부를 만들지 않은 곳이 없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장사에 정성을 바친다. 정부는 전쟁을 잘 하고 국민은 이익을 많이 얻는다.\" 이것이 바로 부국강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私的 교제에 있어서는 이역만리의 사람을 벗으로 삼고 한번 만나서도 오래된 친구와 같이 상대할 수 있을 망정 나라와 나라의 교제에 있어서는 오직 두 가지 형태가 있을 따름이다.\" \"상업과 전쟁\"!. 이런 상황을 두고, \"대외 관계는 천지의 公道에 의한 것이며 반드시 서로 해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무역하고 자유롭게 왕래해서 오직 자연의 이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福澤諭吉은 냉정하게 반박합니다.
\"이런 주장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간의 사적 교제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그렇게 되어야겠지만 나라 사이의 교제와 개인의 사적 교제는 그 양상이 전혀 다른 것이다. 왕년에 봉건 시대에 있어서 이루어진 藩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모른단 말인가? 각 藩의 국민이 반드시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藩과 藩 사이의 교제에 있어서는 각자가 私的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 私는 藩 외부에 대한 私이며 藩 내부에 있어서는 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각 藩의 情實이라 함이 이것이다. 이 사적인 정실은 천지의 공도를 장려한다고 해서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藩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藩과 더불어 무궁히 전승되어야 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어진 메이지 체제를 승인하는 가운데 일본의 독립을 각성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왕과 국민은 정치적 관계일 뿐이며 그 안은 텅 비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으로 그 관계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 대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 관계는 결국 양육강식·부국강병의 논리를 대세로 한다, 그러므로 同權論이니 하는 것은 허명일 뿐이다, 일본의 독립이 중요하다! 『학문을 권함』의 제16장에서도 줄곧 \'독립정신\'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국민의 저항을 논할 때, \"사회를 염려하여 자기 몸을 괴롭히며 또는 하나뿐인 목숨을 희생하는 행위를 서양말로 martyrdom이라고 한다. 잃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이나 그에 의해 얻는 공덕은 내란의 전쟁에서 천만 명의 생명을 빼앗고 천만 엔의 재화를 헛되이 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주장은, 결국 \'독립정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福澤諭吉에게는 공적 정치 체제나 사적 영역의 확보라는 제도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열정\' \'힘\'이 끓어 넘치지 않는 상황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유명한 『丁丑公論』과 『瘠我慢の說』에서 계속되는 내란과 보복의 과정을 두고 \"인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가 아닌가 하는 공리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동기론 내지는 개인도덕론적 발상\"을 제거한 다음, \"대의명분은 公이며 겉으로 내세우는 것일 뿐이다. 염치절의는 私에 있으며 一身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공사 영역을 분리시킨 적이 있습니다. \"\'천하의 대세\'라는 객관적 법칙은 어디까지나 법칙이며, \'이기면 관군\'이라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사실\"이지만, \"이런 법칙이나 사실이 자아의 차원에서 충성 전이의 근거가 되고 구실이 되는 것에 후쿠자와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질서에의 공순\'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위로부터\' 또는 \'바깥으로부터\'의 문명개화를 지탱해 주는 정신으로 계속 살아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가산관료적 명분론에서 소외당해 현실의 주종관계에서 유리된 염치절의나 戰國 무사의 혼을, 사적 차원에서의 행동의 에너지로 삼아, 객관적으로는 문명의 정신(대내적 자유와 대외적 독립)을 추진시키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봉건적\'인 것을 대신하여 \'근대적\'인 것을 바꾸어 넣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던 해체를 이용하여, 그 구성계기의 역할을 전환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신채호가 情育을 통한 애국을 강조하면서 루소의 사회계약설이 결국은 \"사회의 불평에 대한 파괴성을 격발케 하는 수단이라 할지언정, 국가에 대한 애정을 기름이 아니\"라고 할 때, 한편에선 國粹에 대한 교육과 사랑을 촉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나의 정신과 권리가 남에게 치욕을 당할 때에, 칼과 총의 앞에 죽기를 무릅쓰고 강개 격렬하게 나아감은 감정의 작용이니, 감정이 없고야 어찌 사람의 노릇을 하며, 나라가 나라 노릇을 하리오.\"(「新敎育과 愛國」)입니다. 梁啓超와 유사하게 무사의 정신을 강조하고 고대의 불굴의 민족혼을 강조하는 신채호를 비웃는 일은 쉬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신채호 자신이 강조하는 바는 저항의 \'열정\' 쪽으로 변환해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만 문제는, 이미 내재하는 열정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부재하는 외부에서 끌어오려고 하였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福澤諭吉의 리얼리즘은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작동합니다. \"민심의 향방은 일시적인 조치로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일본의 국민은 수백 년 동안 천황의 존재를 실감하지 못하고 단지 구전으로 들어왔을 뿐이다. 유신이라는 거사를 통해서 정치의 체제는 수백 년 전의 옛날로 돌아갔다고 하나 왕실과 국민의 사이에는 깊은 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왕제 일신의 근원은 국민이 패권정치를 혐오하고 왕실을 흠모한 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대의명분을 갑자기 상기한 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 권력이 왕실로 돌아간 이상 일본 국민으로서 그 왕실을 받들어야 함은 물론 당연한 의무이겠으나, 국민과 왕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정치적인 관계뿐이다. 그 정분으로 말하면 그것을 갑자기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國體論을 비판한 다음에는 기독교적인 사해동포주의를 비판합니다. \"현금의 정세를 보면 어딘들 나라를 세우지 않은 곳이 없고 나라를 세운 이상 정부를 만들지 않은 곳이 없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장사에 정성을 바친다. 정부는 전쟁을 잘 하고 국민은 이익을 많이 얻는다.\" 이것이 바로 부국강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私的 교제에 있어서는 이역만리의 사람을 벗으로 삼고 한번 만나서도 오래된 친구와 같이 상대할 수 있을 망정 나라와 나라의 교제에 있어서는 오직 두 가지 형태가 있을 따름이다.\" \"상업과 전쟁\"!. 이런 상황을 두고, \"대외 관계는 천지의 公道에 의한 것이며 반드시 서로 해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무역하고 자유롭게 왕래해서 오직 자연의 이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福澤諭吉은 냉정하게 반박합니다.
\"이런 주장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간의 사적 교제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그렇게 되어야겠지만 나라 사이의 교제와 개인의 사적 교제는 그 양상이 전혀 다른 것이다. 왕년에 봉건 시대에 있어서 이루어진 藩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모른단 말인가? 각 藩의 국민이 반드시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藩과 藩 사이의 교제에 있어서는 각자가 私的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 私는 藩 외부에 대한 私이며 藩 내부에 있어서는 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각 藩의 情實이라 함이 이것이다. 이 사적인 정실은 천지의 공도를 장려한다고 해서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藩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藩과 더불어 무궁히 전승되어야 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어진 메이지 체제를 승인하는 가운데 일본의 독립을 각성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왕과 국민은 정치적 관계일 뿐이며 그 안은 텅 비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으로 그 관계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 대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 관계는 결국 양육강식·부국강병의 논리를 대세로 한다, 그러므로 同權論이니 하는 것은 허명일 뿐이다, 일본의 독립이 중요하다! 『학문을 권함』의 제16장에서도 줄곧 \'독립정신\'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국민의 저항을 논할 때, \"사회를 염려하여 자기 몸을 괴롭히며 또는 하나뿐인 목숨을 희생하는 행위를 서양말로 martyrdom이라고 한다. 잃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이나 그에 의해 얻는 공덕은 내란의 전쟁에서 천만 명의 생명을 빼앗고 천만 엔의 재화를 헛되이 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주장은, 결국 \'독립정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福澤諭吉에게는 공적 정치 체제나 사적 영역의 확보라는 제도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열정\' \'힘\'이 끓어 넘치지 않는 상황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유명한 『丁丑公論』과 『瘠我慢の說』에서 계속되는 내란과 보복의 과정을 두고 \"인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가 아닌가 하는 공리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동기론 내지는 개인도덕론적 발상\"을 제거한 다음, \"대의명분은 公이며 겉으로 내세우는 것일 뿐이다. 염치절의는 私에 있으며 一身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공사 영역을 분리시킨 적이 있습니다. \"\'천하의 대세\'라는 객관적 법칙은 어디까지나 법칙이며, \'이기면 관군\'이라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사실\"이지만, \"이런 법칙이나 사실이 자아의 차원에서 충성 전이의 근거가 되고 구실이 되는 것에 후쿠자와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질서에의 공순\'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위로부터\' 또는 \'바깥으로부터\'의 문명개화를 지탱해 주는 정신으로 계속 살아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가산관료적 명분론에서 소외당해 현실의 주종관계에서 유리된 염치절의나 戰國 무사의 혼을, 사적 차원에서의 행동의 에너지로 삼아, 객관적으로는 문명의 정신(대내적 자유와 대외적 독립)을 추진시키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봉건적\'인 것을 대신하여 \'근대적\'인 것을 바꾸어 넣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던 해체를 이용하여, 그 구성계기의 역할을 전환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신채호가 情育을 통한 애국을 강조하면서 루소의 사회계약설이 결국은 \"사회의 불평에 대한 파괴성을 격발케 하는 수단이라 할지언정, 국가에 대한 애정을 기름이 아니\"라고 할 때, 한편에선 國粹에 대한 교육과 사랑을 촉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나의 정신과 권리가 남에게 치욕을 당할 때에, 칼과 총의 앞에 죽기를 무릅쓰고 강개 격렬하게 나아감은 감정의 작용이니, 감정이 없고야 어찌 사람의 노릇을 하며, 나라가 나라 노릇을 하리오.\"(「新敎育과 愛國」)입니다. 梁啓超와 유사하게 무사의 정신을 강조하고 고대의 불굴의 민족혼을 강조하는 신채호를 비웃는 일은 쉬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신채호 자신이 강조하는 바는 저항의 \'열정\' 쪽으로 변환해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만 문제는, 이미 내재하는 열정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부재하는 외부에서 끌어오려고 하였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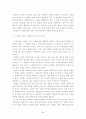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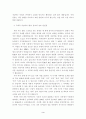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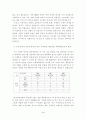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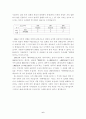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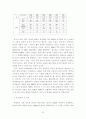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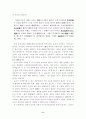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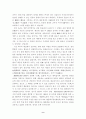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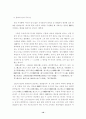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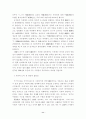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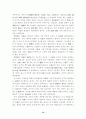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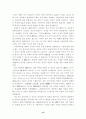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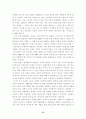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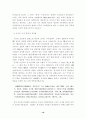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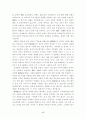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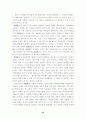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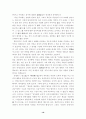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