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토피안 사회주의
2. 마르크스주의
3. 생디칼리즘
Ⅲ. 결론
Ⅱ. 본론
1. 유토피안 사회주의
2. 마르크스주의
3. 생디칼리즘
Ⅲ. 결론
본문내용
동과 제1 인터내셔널의 프루동주의자들로부터 생디카의 토대를 이루는 작업장이 자유롭고 분권화된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될 것이라는 신념을 획득하게 되었고 노동자의 궁극적인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과 아울러 강제적인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로부터 계급투쟁의 원리를, 블랑키스트들과 제1 인터내셔널의 바쿠닌주의자들, 그리고 프랑스의 혁명적 전통으로부터는 사회해방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엘리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19세기 말에는 아나키스트들과 결합, 새로운 형태인 혁명적 생디칼리즘을 탄생시켰다.
Ⅲ 결론
보고서를 작성하며 계속 생각을 했다. 바로 최근의 상황과 자본주의, 사회주의에 관해서이다. 어렸을 때 나는 반공영화 등을 보며 자랐다. 그런 이유로 내 머리 속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대표되어 있었고, 공산주의 = 나쁜 것 정도로 인식되어 있었다. 머릿속에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메시지가 메아리칠 정도였다.
이후 약간 철이 들었다. 그 때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눈에 들어왔다. 기아로 굶어 죽는 아이들, 삶에 의욕이 없어 보이는 북한 주민들의 눈빛. 그것들을 보며 나의 생각은 공산주의 = 사람들의 꿈을 빼앗아가는 사상 정도로 바뀌어갔다. 모든 것의 하향 평준화, 공산주의는 당시 장래에 되고 싶은 직업이 수십 종이 넘었던 나에게 있어 매우 위험하고도 무서운 사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나서 나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등의 영화를 접했고, 뉴스 등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메시지 등을 접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서서히 갖춰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후 되도록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립에 서서 두 사상을 바라보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름대로의 이상세계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상세계란 과연 무엇일까? 이상세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결과 나는 약간은 소극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상세계라는 형이상학적 개념에 대한 결론에 있어 그것을 역시 정신적인 것으로 결론 맺게 된 것이다. 모두에게 이상적인 세상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이 현실을 어떻게 직시하느냐에 따라 현실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세계라는 개념보다 약간 하위의, 가장 많은 사람에게 편안할 수 있는 현실은 과연 어디쯤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의외로 쉽게 결론이 나왔다. 그것은 분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운데쯤에 있는 사회이다. 그것은 역사가 말해준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슬로건 하에 점점 더 많은 대중이 의견을 낼 수 있는 현실 하에,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 하에 세상의 제도는 점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을 향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은 분명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세상을 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상분과 지음 <사회주의의 이론과 운동>, 1989
김교환 저 <사회주의의 어제와 오늘>, 2002
Ⅲ 결론
보고서를 작성하며 계속 생각을 했다. 바로 최근의 상황과 자본주의, 사회주의에 관해서이다. 어렸을 때 나는 반공영화 등을 보며 자랐다. 그런 이유로 내 머리 속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대표되어 있었고, 공산주의 = 나쁜 것 정도로 인식되어 있었다. 머릿속에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메시지가 메아리칠 정도였다.
이후 약간 철이 들었다. 그 때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눈에 들어왔다. 기아로 굶어 죽는 아이들, 삶에 의욕이 없어 보이는 북한 주민들의 눈빛. 그것들을 보며 나의 생각은 공산주의 = 사람들의 꿈을 빼앗아가는 사상 정도로 바뀌어갔다. 모든 것의 하향 평준화, 공산주의는 당시 장래에 되고 싶은 직업이 수십 종이 넘었던 나에게 있어 매우 위험하고도 무서운 사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나서 나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등의 영화를 접했고, 뉴스 등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메시지 등을 접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서서히 갖춰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후 되도록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립에 서서 두 사상을 바라보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름대로의 이상세계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상세계란 과연 무엇일까? 이상세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결과 나는 약간은 소극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상세계라는 형이상학적 개념에 대한 결론에 있어 그것을 역시 정신적인 것으로 결론 맺게 된 것이다. 모두에게 이상적인 세상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이 현실을 어떻게 직시하느냐에 따라 현실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세계라는 개념보다 약간 하위의, 가장 많은 사람에게 편안할 수 있는 현실은 과연 어디쯤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의외로 쉽게 결론이 나왔다. 그것은 분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운데쯤에 있는 사회이다. 그것은 역사가 말해준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슬로건 하에 점점 더 많은 대중이 의견을 낼 수 있는 현실 하에,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 하에 세상의 제도는 점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을 향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은 분명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세상을 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상분과 지음 <사회주의의 이론과 운동>, 1989
김교환 저 <사회주의의 어제와 오늘>,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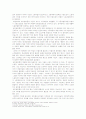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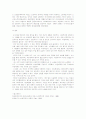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