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33편
34편
35편
36편
37편
38편
34편
35편
36편
37편
38편
본문내용
풍사이다.
[]者, 濕也。
색자 습야.
맥이 깔깔함은 습증이다.
身體煩疼, 風也。
신체번동 풍야.
몸이 화끈거리고 아픔은 풍이다.
不能轉側, 濕也。
불능전측 습야.
몸을 옆으로 돌릴 수 없음은 습이다.
乃風濕相之身體疼痛, 非傷寒骨節疼痛也。
내풍습상박지신체동통 비상한골절동통야.
풍습이 서로 치며 몸이 아픔은 상한의 골절이 아픔이 아니다.
與桂枝附子湯溫散其風濕, 從表而解也。
여계지부자탕온산기풍습 종표이해야.
계지부자탕을 투여하여 그 풍습사를 따뜻하게 발산함은 표부를 따라 해소함이다.
若脈浮實者, 則又當以麻黃加朮湯, 大發其風濕也,
약맥부실자 즉우당이마황가출탕 대발기풍습야.
만약 맥이 뜨고 실하면 또한 응당 마황가출탕으로써 그 풍습사를 발표한다.
如其人有是證, 雖大便硬[], 小便自利, 而不議下者, 以其非邪熱入裏之硬[], 乃風燥濕去之硬[], 故仍以桂枝附子湯。
여기인유시증 수대변경 소변자리 이불의하자 이기비사열입리지경 내풍조습거지경 고잉이계지부자탕.
만약 그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비록 대변이 단단하고 소변이 스스로 잘 나오니, 하법을 논의할 것이 없이, 사열이 속으로 들어간 단단한 변이 없으면, 풍조습이 제거된 단단함이므로, 계지부자탕으로써 치료한다.
去桂枝者, 以大便堅[], 小便自利, 不欲其發汗, 再奪津液也。
거계지자 이대변경 소변자리 불욕기발한 재탈진액야.
계지부자탕에서 계지를 제거함은 대변이 단단하고 소변은 저절로 잘 나오고, 그 땀을 내고자 하여 다시 진액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된다.
加白朮者, 以身重着濕在肌分, 用以佐附子逐水氣于皮中也。
가백출자 이신중착습재기분 용이좌부자축수기우피중야.
계지부자탕에 백출을 가미함은 몸이 무겁고 기분에 습이 부탁되어 있어서 부자를 도와서 피부속에 있는 수기를 구축하려고 사용함이다.
【集注】
집주
程林曰:風淫所勝, 則身煩疼;
정림왈 풍음소승 즉신번동.
정림이 말하길 풍이 이겨 넘치면 몸이 화끈거리고 아프다.
濕淫所勝, 則身體難轉側。
습음어승 즉신체난전측.
습사가 이기는 바에 넘치면 몸을 옆으로 돌리기 어렵다.
風濕相于營衛之間, 不干于[於]裏, 故不嘔不渴也。
풍습상박우영위지간 불간어리 고불구불갈야.
풍습이 서로 영위의 사이에서 때리니 속에서 간섭하지 않으므로 구토도 없고, 갈증도 없다.
脈浮爲風。
맥부위풍.
맥이 뜨면 풍사이다.
[]爲濕, 以其脈近于[於]虛, 故用桂枝附子湯溫經以散風濕。
색위습 이기맥근어허 고용계지부자탕온경이산풍습.
색맥은 습증이고 그 맥이 허약에 가까우므로 계지부자탕을 사용하여 경락을 따뜻하게 하여 풍습증을 발산함이다.
小便利者, 大便必硬[], 桂枝近于[於]解肌, 恐大汗故去之;
소변리자 대변필경 계지근어해기 공대한고거지.
소변이 잘 나오면 대변이 반드시 단단하니, 계지는 기육을 풀어줌에 가까우므로 크게 땀 날까 염려하므로 계지를 제거하였다.
白朮能去肌濕, 不妨乎內, 故加之。
백출능거기습 불방호내 고가지.
백출은 기육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안에서 방해받지 않으므로 가미하였다.
凡方後有如、如醉、如冒等狀者, 皆藥勢將行使然。
범방후유여충 여취 여모등상자 개약세장행사연.
계지부자탕을 복용후에 벌레가 기어가듯 하고, 취한 듯하고, 뒤집어 쓴 듯한 등의 증상이 있는 것은 모두 약의 세력이 장차 운행하려고 함이다.
周揚俊曰:傷寒至八九日, 亦云久矣。
주양준왈 상한지팔구일 역운구의.
주양준이 말하길 상한이 8~9일에 이름은 또한 오래됨을 말함이다.
旣不傳經, 復不入腑者, 因風濕持之也。
기불전경 부불입부자 인풍습지지야.
이미 경락에 전수하지 않고 다시 6부에 들어가지 않음은 풍습으로 인해 유지됨이다.
所現外證煩疼者風也, 不能轉側者濕也, 不嘔不渴者無裏證也, 其脈浮虛而, 正與相應。
소현외증번동자풍야 불능전측자습야 불구불갈자무리증야 기맥부허이색 정여상응.
표현되는 외부 증상에 화끈거리면서 아프면 풍증이고, 옆으로 돌아눕지 못함은 습증이고, 구토도 없고, 갈증도 없음은 리증이 없음이고, 맥이 부허하면서 깔깔하면 정기와 함께 상응함이다.
然後知風濕之邪, 在肌肉而不在筋節, 故以桂枝表之。
연후지풍습지사 재기육이부재근절 고이계지표지.
그런 연후에 풍습의 사기가 있음이 기육에 있고 근육 관절에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계지로써 발표하였다.
不發熱爲陽氣素虛, 故以附子逐濕。
불발열위양기소허 고이부자축습.
발열이 없음은 양기가 평소에 허약하므로 부자로써 습기를 구축하였다.
兩相合, 自不能留矣。
양상관합 자불능류의.
(얽을, 비끌어매다 관; -총14획; wan)
두가지가 서로 얽혀 합하니 스스로 머무를 수 없다.
<桂枝附子湯方>
계지부자탕방.
桂枝(去皮, 四兩) 附子(, 去皮, 破八片, 三枚) 甘草(炙, 二兩) 生薑(切, 三兩) 大棗(擘, 十二枚)
계지 거피 사량, 부자 포 거피 파팔편 삼매, 감초 자 삼량, 생강 절 삼량, 대조 벽 십이매.
껍질을 제거한 계지 160g구워서 껍질을 제거하여 8조객으로 깬 3매의 부자, 구운 감초 80g, 자른 생강 120g, 쪼갠 대추 12매.
右[上]五味, 以水六升, 煮取二升, 去滓, 分溫三服。
상오미 이수육승 자취이승 거재 분온삼복.
위의 5약미를 물 6되를 2되가 되게 달여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3번 나누어 복용한다.
<白朮附子湯方>
백출부자탕방.
白朮(二兩) 附子(, 去皮, 一枚半) 甘草(炙, 一兩) 生薑(切, 一兩半) 大棗(擘, 六枚)
백출이량, 부자 포 거피 일매반, 감초 자 일량, 생강 절 일량반, 대조 벽 육매.
백출 80g, 구워서 껍질을 제거한 부자 1매반, 구운 감초 40g, 자른 생강 60g, 쪼갠 대추 6매.
右[上] 五味, 以水三升, 煮取一升, 去滓, 分溫三服,
상오미 이수삼승 자취일승 거재 분온삼복.
위의 5약미를 물 3되를 1되가 되게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나눠 따뜻하게 3번에 걸쳐 복용해라.
一服覺身痺, 半日許再服, 三服都盡, 其人如冒狀勿怪, 卽是朮附幷走皮中, 逐水氣未得除故耳!
일복각신비 반일허재복 삼복도진 기인여모상물괴 즉시출부병주피중 축수기미득제고이.
한번 백출부자탕을 복용하면 몸이 저림을 깨닫고, 반일정도면 다시 복용하고, 3번 복용이 다 끝나면 그사람이 뒤집어 쓴 듯하니, 놀라지 말고, 이는 백출 부자가 피부 속을 달림이니, 수기를 구축함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者, 濕也。
색자 습야.
맥이 깔깔함은 습증이다.
身體煩疼, 風也。
신체번동 풍야.
몸이 화끈거리고 아픔은 풍이다.
不能轉側, 濕也。
불능전측 습야.
몸을 옆으로 돌릴 수 없음은 습이다.
乃風濕相之身體疼痛, 非傷寒骨節疼痛也。
내풍습상박지신체동통 비상한골절동통야.
풍습이 서로 치며 몸이 아픔은 상한의 골절이 아픔이 아니다.
與桂枝附子湯溫散其風濕, 從表而解也。
여계지부자탕온산기풍습 종표이해야.
계지부자탕을 투여하여 그 풍습사를 따뜻하게 발산함은 표부를 따라 해소함이다.
若脈浮實者, 則又當以麻黃加朮湯, 大發其風濕也,
약맥부실자 즉우당이마황가출탕 대발기풍습야.
만약 맥이 뜨고 실하면 또한 응당 마황가출탕으로써 그 풍습사를 발표한다.
如其人有是證, 雖大便硬[], 小便自利, 而不議下者, 以其非邪熱入裏之硬[], 乃風燥濕去之硬[], 故仍以桂枝附子湯。
여기인유시증 수대변경 소변자리 이불의하자 이기비사열입리지경 내풍조습거지경 고잉이계지부자탕.
만약 그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비록 대변이 단단하고 소변이 스스로 잘 나오니, 하법을 논의할 것이 없이, 사열이 속으로 들어간 단단한 변이 없으면, 풍조습이 제거된 단단함이므로, 계지부자탕으로써 치료한다.
去桂枝者, 以大便堅[], 小便自利, 不欲其發汗, 再奪津液也。
거계지자 이대변경 소변자리 불욕기발한 재탈진액야.
계지부자탕에서 계지를 제거함은 대변이 단단하고 소변은 저절로 잘 나오고, 그 땀을 내고자 하여 다시 진액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된다.
加白朮者, 以身重着濕在肌分, 用以佐附子逐水氣于皮中也。
가백출자 이신중착습재기분 용이좌부자축수기우피중야.
계지부자탕에 백출을 가미함은 몸이 무겁고 기분에 습이 부탁되어 있어서 부자를 도와서 피부속에 있는 수기를 구축하려고 사용함이다.
【集注】
집주
程林曰:風淫所勝, 則身煩疼;
정림왈 풍음소승 즉신번동.
정림이 말하길 풍이 이겨 넘치면 몸이 화끈거리고 아프다.
濕淫所勝, 則身體難轉側。
습음어승 즉신체난전측.
습사가 이기는 바에 넘치면 몸을 옆으로 돌리기 어렵다.
風濕相于營衛之間, 不干于[於]裏, 故不嘔不渴也。
풍습상박우영위지간 불간어리 고불구불갈야.
풍습이 서로 영위의 사이에서 때리니 속에서 간섭하지 않으므로 구토도 없고, 갈증도 없다.
脈浮爲風。
맥부위풍.
맥이 뜨면 풍사이다.
[]爲濕, 以其脈近于[於]虛, 故用桂枝附子湯溫經以散風濕。
색위습 이기맥근어허 고용계지부자탕온경이산풍습.
색맥은 습증이고 그 맥이 허약에 가까우므로 계지부자탕을 사용하여 경락을 따뜻하게 하여 풍습증을 발산함이다.
小便利者, 大便必硬[], 桂枝近于[於]解肌, 恐大汗故去之;
소변리자 대변필경 계지근어해기 공대한고거지.
소변이 잘 나오면 대변이 반드시 단단하니, 계지는 기육을 풀어줌에 가까우므로 크게 땀 날까 염려하므로 계지를 제거하였다.
白朮能去肌濕, 不妨乎內, 故加之。
백출능거기습 불방호내 고가지.
백출은 기육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안에서 방해받지 않으므로 가미하였다.
凡方後有如、如醉、如冒等狀者, 皆藥勢將行使然。
범방후유여충 여취 여모등상자 개약세장행사연.
계지부자탕을 복용후에 벌레가 기어가듯 하고, 취한 듯하고, 뒤집어 쓴 듯한 등의 증상이 있는 것은 모두 약의 세력이 장차 운행하려고 함이다.
周揚俊曰:傷寒至八九日, 亦云久矣。
주양준왈 상한지팔구일 역운구의.
주양준이 말하길 상한이 8~9일에 이름은 또한 오래됨을 말함이다.
旣不傳經, 復不入腑者, 因風濕持之也。
기불전경 부불입부자 인풍습지지야.
이미 경락에 전수하지 않고 다시 6부에 들어가지 않음은 풍습으로 인해 유지됨이다.
所現外證煩疼者風也, 不能轉側者濕也, 不嘔不渴者無裏證也, 其脈浮虛而, 正與相應。
소현외증번동자풍야 불능전측자습야 불구불갈자무리증야 기맥부허이색 정여상응.
표현되는 외부 증상에 화끈거리면서 아프면 풍증이고, 옆으로 돌아눕지 못함은 습증이고, 구토도 없고, 갈증도 없음은 리증이 없음이고, 맥이 부허하면서 깔깔하면 정기와 함께 상응함이다.
然後知風濕之邪, 在肌肉而不在筋節, 故以桂枝表之。
연후지풍습지사 재기육이부재근절 고이계지표지.
그런 연후에 풍습의 사기가 있음이 기육에 있고 근육 관절에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계지로써 발표하였다.
不發熱爲陽氣素虛, 故以附子逐濕。
불발열위양기소허 고이부자축습.
발열이 없음은 양기가 평소에 허약하므로 부자로써 습기를 구축하였다.
兩相合, 自不能留矣。
양상관합 자불능류의.
(얽을, 비끌어매다 관; -총14획; wan)
두가지가 서로 얽혀 합하니 스스로 머무를 수 없다.
<桂枝附子湯方>
계지부자탕방.
桂枝(去皮, 四兩) 附子(, 去皮, 破八片, 三枚) 甘草(炙, 二兩) 生薑(切, 三兩) 大棗(擘, 十二枚)
계지 거피 사량, 부자 포 거피 파팔편 삼매, 감초 자 삼량, 생강 절 삼량, 대조 벽 십이매.
껍질을 제거한 계지 160g구워서 껍질을 제거하여 8조객으로 깬 3매의 부자, 구운 감초 80g, 자른 생강 120g, 쪼갠 대추 12매.
右[上]五味, 以水六升, 煮取二升, 去滓, 分溫三服。
상오미 이수육승 자취이승 거재 분온삼복.
위의 5약미를 물 6되를 2되가 되게 달여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3번 나누어 복용한다.
<白朮附子湯方>
백출부자탕방.
白朮(二兩) 附子(, 去皮, 一枚半) 甘草(炙, 一兩) 生薑(切, 一兩半) 大棗(擘, 六枚)
백출이량, 부자 포 거피 일매반, 감초 자 일량, 생강 절 일량반, 대조 벽 육매.
백출 80g, 구워서 껍질을 제거한 부자 1매반, 구운 감초 40g, 자른 생강 60g, 쪼갠 대추 6매.
右[上] 五味, 以水三升, 煮取一升, 去滓, 分溫三服,
상오미 이수삼승 자취일승 거재 분온삼복.
위의 5약미를 물 3되를 1되가 되게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나눠 따뜻하게 3번에 걸쳐 복용해라.
一服覺身痺, 半日許再服, 三服都盡, 其人如冒狀勿怪, 卽是朮附幷走皮中, 逐水氣未得除故耳!
일복각신비 반일허재복 삼복도진 기인여모상물괴 즉시출부병주피중 축수기미득제고이.
한번 백출부자탕을 복용하면 몸이 저림을 깨닫고, 반일정도면 다시 복용하고, 3번 복용이 다 끝나면 그사람이 뒤집어 쓴 듯하니, 놀라지 말고, 이는 백출 부자가 피부 속을 달림이니, 수기를 구축함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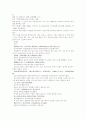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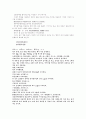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