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원생몽유록」을 통해 본 몽유 소설
(1) 몽유 소설 정의와 「원생몽유록」
(2) 몽유 소설의 구조
(3) 몽유 소설의 소설적 특징
Ⅳ. 결론
참고문헌
Ⅱ. 「원생몽유록」을 통해 본 몽유 소설
(1) 몽유 소설 정의와 「원생몽유록」
(2) 몽유 소설의 구조
(3) 몽유 소설의 소설적 특징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9년 남효온의 「六臣傳」사건으로 경색되어 버린다.
선조 9년 한 경연관(經筵官)에서 經 한자에서 선주에게 성삼문의 충절을 논하면서 남효온의 「六臣傳」을 읽기를 권한 적이 있었다. 선조는 이를 읽고 노발대발하면서, \"... 세조께서 天命을 받아 중홍을 이룬 것은 人力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 저 남효온이란 자는 어떤 놈이길래 감히 붓끝을 희롱하여 國事를 함부로 들추어 내니 이는 우리 왕조의 죄인이다.\"라 욕하면서 \"六臣傳을 거둬 불태우고 혹 이에 대해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자가 있어도 중벌로 다스리리라\"로 까지 하였다.(「선조실록」 권10, 9년 병자 7월 을유 참조)
이렇게 세조의 왕위찬탈이 일어난 지 근 100 여년 동안 역사적인 재평가는 물론 자유로운 발언조차 할 수 없던 시대가 이어졌으며 선조에 이르면 그 분위기가 더욱 경색되어 버리게 된다.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색되어만 가는 정국을 보면서 그 시대 사대부가 겪은 갈등이 응축되고 위와 같은 사회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임제의 「원생몽유록」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 史實(사실)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몽유시한이 비교적 짧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원생몽유록」의 몽유 시한은 실제 현실세계에서의 몽유시한과 거의 일치한다. 「원생몽유록」의 입몽 전 현실세계의 시간적 배경은 \'어느 한가윗 날 저녁\'으로, 침상에 가만히 기댄 채 잠이 든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게 몽유세계로 들어간 몽유자는 현실 세계의 시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즉 몽유세계의 시간적 배경도 밝은 달밤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 몽유시한도 현실세계에서 잠을 잔 시간과 일치되고 있는데 즉, 처음 부분에 제시되고 있는 밝은 달은 몽유세계가 끝나기 직전까지 그대로 떠 있으며 별다른 시간의 흐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몽유세계의 시한은 하루밤의 한 부분이다. 몽유 시한이 짧은 이유는 일정한 줄거리를 지닌 사건이 몽유세계에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몽유세계를 빌어서 계유정란이라는 이미 매듭지어진 역사적 사실의 부당성을 토로하고 비판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몽유의 시한은 굳이 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Ⅳ. 결 론
조선조는 봉건사회의 체계적 폐쇄 현상으로 꿈을 통해 자아욕구를 분출시키고 있는 몽유 소설이 성행하였다.
「원생몽유록」은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몽유 소설의 구조와 소설적 특징, 꿈의 장치가 가장 잘 정비된 최초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다. 곧 입몽과 각몽이 뚜렷이 나타나 있고 역사적 인물의 좌정-토론-시연이 몽중사건으로서 순차적 단락을 이루며 현실-꿈-현실로 순환하는 몽유 소설의 유형적 특징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생몽유록」은 몽유 소설의 구조를 이해하기에 매우 적합한 예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단종과 그를 위해 절사한 사육신을 작중인물로 설정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단종과 사육신의 심회를 표출하면서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판하여 몽유 소설의 특징인 꿈 속 세계를 통한 현실 사회의 비판을 이루어내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의를 갖는다.
이와 같이 꿈을 매개로 한 현실세계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의 현대문학에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 문헌
夢遊錄類 小說 作家의 現實認識 硏究 : 朝鮮 中期 作品을 中心으로, 金亨錫, 2003
夢遊錄 小說의 硏究 : 敍述樣式을 中心으로, 柳鍾國, 1987
夢遊錄小說의 敍述類型硏究, 梁彦錫, 1993
임병양란기 몽유록 연구, 윤덕진
夢遊 서사의 現實 認識 연구 : 「調信」「元生夢遊錄」「雲英傳」을 대상으로, 趙顯雨, 1999
夢字小說과 夢遊錄 小說에 나타난 幻夢構造 硏究, 鄭善娥, 1998
夢遊錄에 나타난 寓言의 방식과 의미 : 16·17세기 작품을 중심으로, 朴朱仙
선조 9년 한 경연관(經筵官)에서 經 한자에서 선주에게 성삼문의 충절을 논하면서 남효온의 「六臣傳」을 읽기를 권한 적이 있었다. 선조는 이를 읽고 노발대발하면서, \"... 세조께서 天命을 받아 중홍을 이룬 것은 人力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 저 남효온이란 자는 어떤 놈이길래 감히 붓끝을 희롱하여 國事를 함부로 들추어 내니 이는 우리 왕조의 죄인이다.\"라 욕하면서 \"六臣傳을 거둬 불태우고 혹 이에 대해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자가 있어도 중벌로 다스리리라\"로 까지 하였다.(「선조실록」 권10, 9년 병자 7월 을유 참조)
이렇게 세조의 왕위찬탈이 일어난 지 근 100 여년 동안 역사적인 재평가는 물론 자유로운 발언조차 할 수 없던 시대가 이어졌으며 선조에 이르면 그 분위기가 더욱 경색되어 버리게 된다.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색되어만 가는 정국을 보면서 그 시대 사대부가 겪은 갈등이 응축되고 위와 같은 사회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임제의 「원생몽유록」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 史實(사실)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몽유시한이 비교적 짧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원생몽유록」의 몽유 시한은 실제 현실세계에서의 몽유시한과 거의 일치한다. 「원생몽유록」의 입몽 전 현실세계의 시간적 배경은 \'어느 한가윗 날 저녁\'으로, 침상에 가만히 기댄 채 잠이 든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게 몽유세계로 들어간 몽유자는 현실 세계의 시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즉 몽유세계의 시간적 배경도 밝은 달밤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 몽유시한도 현실세계에서 잠을 잔 시간과 일치되고 있는데 즉, 처음 부분에 제시되고 있는 밝은 달은 몽유세계가 끝나기 직전까지 그대로 떠 있으며 별다른 시간의 흐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몽유세계의 시한은 하루밤의 한 부분이다. 몽유 시한이 짧은 이유는 일정한 줄거리를 지닌 사건이 몽유세계에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몽유세계를 빌어서 계유정란이라는 이미 매듭지어진 역사적 사실의 부당성을 토로하고 비판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몽유의 시한은 굳이 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Ⅳ. 결 론
조선조는 봉건사회의 체계적 폐쇄 현상으로 꿈을 통해 자아욕구를 분출시키고 있는 몽유 소설이 성행하였다.
「원생몽유록」은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몽유 소설의 구조와 소설적 특징, 꿈의 장치가 가장 잘 정비된 최초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다. 곧 입몽과 각몽이 뚜렷이 나타나 있고 역사적 인물의 좌정-토론-시연이 몽중사건으로서 순차적 단락을 이루며 현실-꿈-현실로 순환하는 몽유 소설의 유형적 특징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생몽유록」은 몽유 소설의 구조를 이해하기에 매우 적합한 예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단종과 그를 위해 절사한 사육신을 작중인물로 설정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단종과 사육신의 심회를 표출하면서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판하여 몽유 소설의 특징인 꿈 속 세계를 통한 현실 사회의 비판을 이루어내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의를 갖는다.
이와 같이 꿈을 매개로 한 현실세계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의 현대문학에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 문헌
夢遊錄類 小說 作家의 現實認識 硏究 : 朝鮮 中期 作品을 中心으로, 金亨錫, 2003
夢遊錄 小說의 硏究 : 敍述樣式을 中心으로, 柳鍾國, 1987
夢遊錄小說의 敍述類型硏究, 梁彦錫, 1993
임병양란기 몽유록 연구, 윤덕진
夢遊 서사의 現實 認識 연구 : 「調信」「元生夢遊錄」「雲英傳」을 대상으로, 趙顯雨, 1999
夢字小說과 夢遊錄 小說에 나타난 幻夢構造 硏究, 鄭善娥, 1998
夢遊錄에 나타난 寓言의 방식과 의미 : 16·17세기 작품을 중심으로, 朴朱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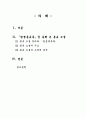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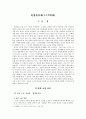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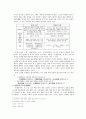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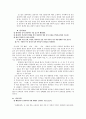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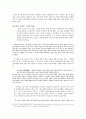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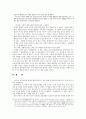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