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방법
Ⅱ. 본 론
1. 소월의 생애와 시대배경
2. 작품분석
3. 소월시에 나타난 한의 연구
1) 서설
⑴ 한에 대한 연구검토
⑵ 한의 정의
⑶ 한국적 한의 배경
2) 작품에 있어서의 한
⑴ 진달래꽃
⑵ 금잔디
Ⅲ. 결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방법
Ⅱ. 본 론
1. 소월의 생애와 시대배경
2. 작품분석
3. 소월시에 나타난 한의 연구
1) 서설
⑴ 한에 대한 연구검토
⑵ 한의 정의
⑶ 한국적 한의 배경
2) 작품에 있어서의 한
⑴ 진달래꽃
⑵ 금잔디
Ⅲ. 결 론
본문내용
디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일까? 스승 안서의 남다른 운율의식의 영향에서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자신의 한시나 영시에 대한 소양과 그 시들이 지니고 있는 견고한 운율구조에 접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과 아울러 피 속에 흘러온 민족의 선율 속에 나타나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운율적 요소들이 소월에 의하여 자각되고 재구성된 것이 소월의 운율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에 있어서 운율장치와 의미구조는 떼어낼 수 없는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한 편의 시가 성공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작품의 의미구조가 얼마나 정밀하게 운율적인 배려를 받고 있느냐 또는 운율장치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의미구조 속에 배어들어 있느냐에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금잔디>의 율격은 형식적이니 차원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의 의미를 봄의 생동감과 이를 맞는 시인의 환희의 감정과 밀접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음보의 율격에서 느껴지는 봄의 발랄한 생동감과 4음보의 율격에서 느껴 넘치는 즐거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작품의 의미를 그와 같은 방향 아래에서 고찰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소월시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는 \'정한의 세계\'와 이 작품은 별개의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 작품의 제5행에 나타나는 \'가신님 무덤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구절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신님 무덤가\'라는 구절이 제시하는 슬프고 음울한 이미지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 <금잔디>에서는 \'가신님\'이 제시하는 이미지보다는 바로 뒤에 계속되는 \'무덤가의 금잔디\' 그것도 \'붙는 불\'의 빛깔과 에너지로 돋아나고 있는 \'금잔디\'의 이미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금잔디> 한 편에서 \'심심산천에 붓는불은/가신님 무덤가의 금잔디\'가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만큼 역동적인 것이 없다. \'붓는 불\'은 모든 것은 불살라 버릴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닌 역동적 이미지로 일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별과 소멸과 그 슬픔, 그리고 부재와 음울한 그리움이 일전하여 소생의 기쁨과 넘치는 힘의 약동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널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공간인 \'심심산천\'은 그 골짜기 속에 누워 있는 가신님 무덤가에 까지도 생동하고 약동하는 봄의 기운이 넘치고 있고, \'가신님\'의 이미지는 이렇게 슬픔이나 그리움에 젖어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환생시켜주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변모되고 있다. <금잔디>는 생명감 넘치는 새로운 만남과 그 기쁨으로 상징으로 표상되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1920년대 이전에 나온 시인 가운데 가장 훌륭하나 시인의 한 사람으로 한국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시대를 살았던 민족의 시인은 그것을 비극으로 초월하기 보다는 한으로 남겨 동포들의 억눌림과 그 피맺힌 민족의 한이요 그 민족의 한을 조그만 작품 속에서 조국을 연인처럼 비유하여 애닮은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지마는 언젠가는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조국이 현재는 짓밟히고 있지마는 꼭 광복이 되리라 믿는 사상이 그의 시 세계에 소월 자신의 인간성으로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소월의 시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평가의 대립은 소월문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한의 문제에 있다고 보고 한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런데 소월시는 현실도피, 체념, 좌절의 표상인 낭만주의로 그 감상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불건전한 미의식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첫째 한의 문학적 측면에서 미의식을 소월의 시에만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한이란 원망이나 좌절의 감정이 그 자체의 객관적 투사를 통하여 종교적 혹은 문학으로 승화된 미적 요소를 지닌다고 보았다. 둘째 소월의 한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았다. 하나는 개인적인 문제요 다른 하나는 시대배경에서 문제다. 따라서 작품 분석도 개인적인 문제에서 님의 상실에서의 한과 조국의 상실에서의 한으로 고찰하였다. 님의 상실에서 비롯되는 한의 문제는 상실에서 오는 좌절이 아니라, 상실의 아픔은 님에 대한 더욱 농도가 짙은 사랑으로 승화시켰음을 보았다. 결과적으로 소월의 시가 현실도피, 좌절 등이라는 종래의 평가는 한의 잘못된 평가에 있었다고 보며 소월시가 지니고 있는 밝은 건강성에 대해서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 「들도리」「밧고랑 우해서」「저녁때」「개아미」등이 보여주는 넘치는 생명감과 삶에 대한 예찬도 고려해야 한다.
소월의 한은 님과 조국의 상실의 아픔을 아픔으로 받아들여 내면에서 정화의 단계를 거쳐 시로서 승화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참고 문헌
· 조인현,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사, 1956
· 김춘수, 「시 론」, 송원문화사, 1974
· 서정주, 「한국의 현대사」, 1949
· 김용직, 「김소월 전집」, 문장사, 1981
· 박두진, 「현대시의 이해와 체험」, 일조각, 1982
· 문덕수, 「현대시의 해석과 감상」, 이우, 1982
· 김열규, 「김소월연구」, 어문사, 1982
· 조지훈, 「조지훈 전집」, 일지사, 1973
· 천이두, 「한국문학과 한」, 이우, 1985
· 천이두, 「종합에의 의지」, 일지사, 1974
· 최원규, 「한국 현대시의 이해와 감상」, 1983
· 구중서, 「민족문학의 길」, 1985
· 문순태, \"한이란 무엇인가.\" (민족과 문학, 1980)
· 오세영, \"한의 윤리와 그 역설적 의미\" (문학사상 51호, 1976.12)
· 서정주, \"소월에 있어서의 정한과 처리\" (현대문학 5권 1호, 1959.6)
· 윤재근, \"시적 표현과 배경의 변용\" (Ⅱ문학비평 1권 3호)
· 오세영, 「한국낭만주의시연구」, 일지사, 1981
· 강무웅, 반성왕 공역, 「창작과 비평시」, 1981
· 김진국, \"소월의 시혼과 시학의 시\", 국어교육연구 제3집, 1983
· 김거중, 「청산과의 거리」, (문학과 인간, 자민 출판사, 1952)
· 서정주, 김소월론 특집, 1960
· 이성교, 한국현대시연구, (과학정보사, 1985)
· 김윤식, 식민지의 허무주의와 시의 선택, (문학사상 8호, 1973.5)
· 송명희, 소월시의 반성, (세계의 문학, 1979)
· 정창범, 배제의 서정 「심상」 13호, 1974.9
이러한 경험과 아울러 피 속에 흘러온 민족의 선율 속에 나타나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운율적 요소들이 소월에 의하여 자각되고 재구성된 것이 소월의 운율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에 있어서 운율장치와 의미구조는 떼어낼 수 없는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한 편의 시가 성공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작품의 의미구조가 얼마나 정밀하게 운율적인 배려를 받고 있느냐 또는 운율장치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의미구조 속에 배어들어 있느냐에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금잔디>의 율격은 형식적이니 차원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의 의미를 봄의 생동감과 이를 맞는 시인의 환희의 감정과 밀접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음보의 율격에서 느껴지는 봄의 발랄한 생동감과 4음보의 율격에서 느껴 넘치는 즐거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작품의 의미를 그와 같은 방향 아래에서 고찰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소월시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는 \'정한의 세계\'와 이 작품은 별개의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 작품의 제5행에 나타나는 \'가신님 무덤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구절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신님 무덤가\'라는 구절이 제시하는 슬프고 음울한 이미지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 <금잔디>에서는 \'가신님\'이 제시하는 이미지보다는 바로 뒤에 계속되는 \'무덤가의 금잔디\' 그것도 \'붙는 불\'의 빛깔과 에너지로 돋아나고 있는 \'금잔디\'의 이미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금잔디> 한 편에서 \'심심산천에 붓는불은/가신님 무덤가의 금잔디\'가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만큼 역동적인 것이 없다. \'붓는 불\'은 모든 것은 불살라 버릴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닌 역동적 이미지로 일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별과 소멸과 그 슬픔, 그리고 부재와 음울한 그리움이 일전하여 소생의 기쁨과 넘치는 힘의 약동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널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공간인 \'심심산천\'은 그 골짜기 속에 누워 있는 가신님 무덤가에 까지도 생동하고 약동하는 봄의 기운이 넘치고 있고, \'가신님\'의 이미지는 이렇게 슬픔이나 그리움에 젖어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환생시켜주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변모되고 있다. <금잔디>는 생명감 넘치는 새로운 만남과 그 기쁨으로 상징으로 표상되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1920년대 이전에 나온 시인 가운데 가장 훌륭하나 시인의 한 사람으로 한국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시대를 살았던 민족의 시인은 그것을 비극으로 초월하기 보다는 한으로 남겨 동포들의 억눌림과 그 피맺힌 민족의 한이요 그 민족의 한을 조그만 작품 속에서 조국을 연인처럼 비유하여 애닮은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지마는 언젠가는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조국이 현재는 짓밟히고 있지마는 꼭 광복이 되리라 믿는 사상이 그의 시 세계에 소월 자신의 인간성으로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소월의 시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평가의 대립은 소월문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한의 문제에 있다고 보고 한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런데 소월시는 현실도피, 체념, 좌절의 표상인 낭만주의로 그 감상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불건전한 미의식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첫째 한의 문학적 측면에서 미의식을 소월의 시에만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한이란 원망이나 좌절의 감정이 그 자체의 객관적 투사를 통하여 종교적 혹은 문학으로 승화된 미적 요소를 지닌다고 보았다. 둘째 소월의 한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았다. 하나는 개인적인 문제요 다른 하나는 시대배경에서 문제다. 따라서 작품 분석도 개인적인 문제에서 님의 상실에서의 한과 조국의 상실에서의 한으로 고찰하였다. 님의 상실에서 비롯되는 한의 문제는 상실에서 오는 좌절이 아니라, 상실의 아픔은 님에 대한 더욱 농도가 짙은 사랑으로 승화시켰음을 보았다. 결과적으로 소월의 시가 현실도피, 좌절 등이라는 종래의 평가는 한의 잘못된 평가에 있었다고 보며 소월시가 지니고 있는 밝은 건강성에 대해서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 「들도리」「밧고랑 우해서」「저녁때」「개아미」등이 보여주는 넘치는 생명감과 삶에 대한 예찬도 고려해야 한다.
소월의 한은 님과 조국의 상실의 아픔을 아픔으로 받아들여 내면에서 정화의 단계를 거쳐 시로서 승화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참고 문헌
· 조인현,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사, 1956
· 김춘수, 「시 론」, 송원문화사, 1974
· 서정주, 「한국의 현대사」, 1949
· 김용직, 「김소월 전집」, 문장사, 1981
· 박두진, 「현대시의 이해와 체험」, 일조각, 1982
· 문덕수, 「현대시의 해석과 감상」, 이우, 1982
· 김열규, 「김소월연구」, 어문사, 1982
· 조지훈, 「조지훈 전집」, 일지사, 1973
· 천이두, 「한국문학과 한」, 이우, 1985
· 천이두, 「종합에의 의지」, 일지사, 1974
· 최원규, 「한국 현대시의 이해와 감상」, 1983
· 구중서, 「민족문학의 길」, 1985
· 문순태, \"한이란 무엇인가.\" (민족과 문학, 1980)
· 오세영, \"한의 윤리와 그 역설적 의미\" (문학사상 51호, 1976.12)
· 서정주, \"소월에 있어서의 정한과 처리\" (현대문학 5권 1호, 1959.6)
· 윤재근, \"시적 표현과 배경의 변용\" (Ⅱ문학비평 1권 3호)
· 오세영, 「한국낭만주의시연구」, 일지사, 1981
· 강무웅, 반성왕 공역, 「창작과 비평시」, 1981
· 김진국, \"소월의 시혼과 시학의 시\", 국어교육연구 제3집, 1983
· 김거중, 「청산과의 거리」, (문학과 인간, 자민 출판사, 1952)
· 서정주, 김소월론 특집, 1960
· 이성교, 한국현대시연구, (과학정보사, 1985)
· 김윤식, 식민지의 허무주의와 시의 선택, (문학사상 8호, 1973.5)
· 송명희, 소월시의 반성, (세계의 문학, 1979)
· 정창범, 배제의 서정 「심상」 13호, 19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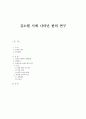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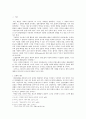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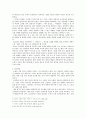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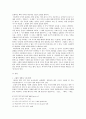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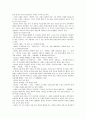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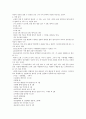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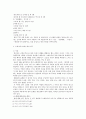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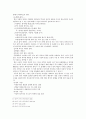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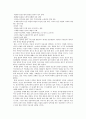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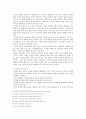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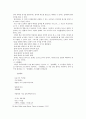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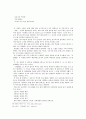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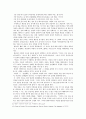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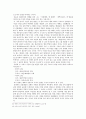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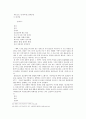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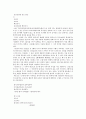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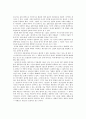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