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윤동주 시인의 생애
2. 민족시인, 저항시인 윤동주
3. 시에서 보여지는 윤동주의 내면세계
① 자화상 (1939. 9)
② 서시(序詩) (1941. 11. 20)
③ 또 다른 고향 (1941. 9)
④ 참회록 (1941. 1. 24)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윤동주 시인의 생애
2. 민족시인, 저항시인 윤동주
3. 시에서 보여지는 윤동주의 내면세계
① 자화상 (1939. 9)
② 서시(序詩) (1941. 11. 20)
③ 또 다른 고향 (1941. 9)
④ 참회록 (1941. 1. 24)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 있는 시라 할 수 있다.
④ 참회록 (1941. 1. 24)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滿)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윤동주의 시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현실에 의거하고 있는 강력한 저항시가 바로 이 시이다. 이 시는 1942년 1월24일에 쓰여진 시로서, 이로부터 5일 후인 1942년 1월 29일에 윤동주는 일본유학을 결정하고 창씨개명을 계출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보아 윤동주는 자신이 직접 창씨개명계를 계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각오했을 때 그 뼈아픈 욕됨으로 인해 이 시를 쓰게 된 것이다. 이는 「참회록」을 쓴 종이의 여백에 남겨진 ‘시인의 고백, 힘, 도항증명, 생존, 생활’과 같은 낙서들로도 증명이 된다. 그러므로 이 시는 일제가 강요하는 창씨개명에 굴복한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제의 의해 망한 ‘대한제국이란 왕조의 후예’로서 자신의 ‘얼굴’이 ‘이다지도 욕됨’을 참회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참회가 지닌 참된 의미는 그런 욕됨을 직시하는 것에만 있지 않았다. 그것은 동시에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을 기약하는 강한 자기다짐의 참회이기도 했다.
위의 시들에서 보여지 듯 윤동주의 시는 작품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자아성찰과 자기희생의 시대적 소명의식, 역사의식에서 중요한 의의와 저항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Ⅲ. 결론
윤동주의 동생인 윤일주 교수는 형에 대한 회고의 말에서 “그는 일본에 대학 적개심이 가하여 <하오니>나 <유까다>를 입은 조선 사람을 보면 메스껍다고 외면하였고, 친구들이 일본말로 이야기하여도 애써 우리말로 대하고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생활 중 도움을 주었던 당숙 윤영춘은 “말할적마다 시와 조선이라는 이름이 거의 말버릇처럼 입에서 자주 튀어나왔다고” 말한다.
한국의 얼이 일제의 탄압으로 깡그리 말살된 때에 윤동주는 끝까지 우리 시를 지켰다. 윤동주가 그런 환경 속에서 썼던 시들은 의욕적이다. 현실을 초월해서 인간의 내면의 고요한 세계를 더듬어 갔는데 그것을 무엇보다도 그의 동시에서 엿볼 수 있다. 그의 따스한 마음과 인간의 깊은 정신을 추구하는 기독교적인 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세계는 깊은 수렁 속에서 민족의 학대와 슬픈 모습도 그렸다. 다시 말하면 윤동주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때의 시의 정신은 기독교적 의식과 민족주의 의식이었던 것이다. 그는 참으로 뚜렷한 민족정신으로 일제 암흑기를 살아간 시인이며, 시대적 고뇌를 반항과 연속에서 곱게 여과하여 애틋하고 한 맺힌 감정으로 시를 썼다. 시를 씀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란 생각을 지렛대 삼아 물과 바람, 그리고 구름, 별, 달과 해로 비유될 수 있는 넉넉한 화해의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하늘에, 그의 시를 통해서 시대의 고뇌와 부끄러움, 슬픈 자아를 하늘에 일치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말로 시를 쓴다는 행위가 단순히 시를 쓴다는 것 이상으로 반역을 의미했던 그 시대, 자유와 인간 존엄과 순수를 용납하지 않던 시대적 조류 한가운데서 윤동주는 여린 몸짓으로 고고하게 홀로 서 있으려 했지만 일제는 무참하게 그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다. 단지 억압과 굴종의 큰 흐름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대의 물살은 그의 몸에 세차게 부딪쳐 왔고, 그는 생을 마감하면서 ‘저항’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순수’와 한국적 정서의 황금 부분을 세상에 남겼다. 일제는 그처럼 잔혹하게 스물일곱 살의 젊고 순결한 영혼의 시인 윤동주를 앗아갔지만 우리에게 윤동주는 그 일제 말기 암흑기에 찬란하게 빛나는 문화유산을 남긴 마지막 한 사람의 시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Ⅳ.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윤동주
김효중, ‘한국현대시의 향연’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9.
김병택, ‘한국 현대 시인론’ 국학자료원, 1995.
김수복, ‘윤동주, 별의노래’ 한람원, 1996.
성기조, ‘한국현대시인론’ 한국문화사, 1997.
이건청, ‘윤동주’ 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이성교, ‘한국 현대시인 연구’ 태학사, 1997.
④ 참회록 (1941. 1. 24)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滿)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윤동주의 시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현실에 의거하고 있는 강력한 저항시가 바로 이 시이다. 이 시는 1942년 1월24일에 쓰여진 시로서, 이로부터 5일 후인 1942년 1월 29일에 윤동주는 일본유학을 결정하고 창씨개명을 계출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보아 윤동주는 자신이 직접 창씨개명계를 계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각오했을 때 그 뼈아픈 욕됨으로 인해 이 시를 쓰게 된 것이다. 이는 「참회록」을 쓴 종이의 여백에 남겨진 ‘시인의 고백, 힘, 도항증명, 생존, 생활’과 같은 낙서들로도 증명이 된다. 그러므로 이 시는 일제가 강요하는 창씨개명에 굴복한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제의 의해 망한 ‘대한제국이란 왕조의 후예’로서 자신의 ‘얼굴’이 ‘이다지도 욕됨’을 참회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참회가 지닌 참된 의미는 그런 욕됨을 직시하는 것에만 있지 않았다. 그것은 동시에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을 기약하는 강한 자기다짐의 참회이기도 했다.
위의 시들에서 보여지 듯 윤동주의 시는 작품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자아성찰과 자기희생의 시대적 소명의식, 역사의식에서 중요한 의의와 저항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Ⅲ. 결론
윤동주의 동생인 윤일주 교수는 형에 대한 회고의 말에서 “그는 일본에 대학 적개심이 가하여 <하오니>나 <유까다>를 입은 조선 사람을 보면 메스껍다고 외면하였고, 친구들이 일본말로 이야기하여도 애써 우리말로 대하고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생활 중 도움을 주었던 당숙 윤영춘은 “말할적마다 시와 조선이라는 이름이 거의 말버릇처럼 입에서 자주 튀어나왔다고” 말한다.
한국의 얼이 일제의 탄압으로 깡그리 말살된 때에 윤동주는 끝까지 우리 시를 지켰다. 윤동주가 그런 환경 속에서 썼던 시들은 의욕적이다. 현실을 초월해서 인간의 내면의 고요한 세계를 더듬어 갔는데 그것을 무엇보다도 그의 동시에서 엿볼 수 있다. 그의 따스한 마음과 인간의 깊은 정신을 추구하는 기독교적인 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세계는 깊은 수렁 속에서 민족의 학대와 슬픈 모습도 그렸다. 다시 말하면 윤동주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때의 시의 정신은 기독교적 의식과 민족주의 의식이었던 것이다. 그는 참으로 뚜렷한 민족정신으로 일제 암흑기를 살아간 시인이며, 시대적 고뇌를 반항과 연속에서 곱게 여과하여 애틋하고 한 맺힌 감정으로 시를 썼다. 시를 씀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란 생각을 지렛대 삼아 물과 바람, 그리고 구름, 별, 달과 해로 비유될 수 있는 넉넉한 화해의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하늘에, 그의 시를 통해서 시대의 고뇌와 부끄러움, 슬픈 자아를 하늘에 일치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말로 시를 쓴다는 행위가 단순히 시를 쓴다는 것 이상으로 반역을 의미했던 그 시대, 자유와 인간 존엄과 순수를 용납하지 않던 시대적 조류 한가운데서 윤동주는 여린 몸짓으로 고고하게 홀로 서 있으려 했지만 일제는 무참하게 그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다. 단지 억압과 굴종의 큰 흐름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대의 물살은 그의 몸에 세차게 부딪쳐 왔고, 그는 생을 마감하면서 ‘저항’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순수’와 한국적 정서의 황금 부분을 세상에 남겼다. 일제는 그처럼 잔혹하게 스물일곱 살의 젊고 순결한 영혼의 시인 윤동주를 앗아갔지만 우리에게 윤동주는 그 일제 말기 암흑기에 찬란하게 빛나는 문화유산을 남긴 마지막 한 사람의 시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Ⅳ.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윤동주
김효중, ‘한국현대시의 향연’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9.
김병택, ‘한국 현대 시인론’ 국학자료원, 1995.
김수복, ‘윤동주, 별의노래’ 한람원, 1996.
성기조, ‘한국현대시인론’ 한국문화사, 1997.
이건청, ‘윤동주’ 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이성교, ‘한국 현대시인 연구’ 태학사,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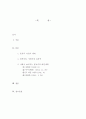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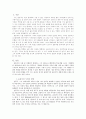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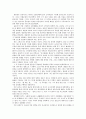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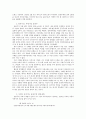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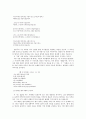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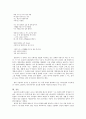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