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프랑스 문학과 영화의 관계사
♣영화사 초기의 경향 (1896-1910) : '촬영된 연극'으로서의 영화
♣소설의 영화화 시작 (1910-20)
♣시적 리얼리즘과 문예영화 (1935-1955)
♣작가 감독들의 문학 영화들
♣누벨 바그와 누보 로망 이후 (1955-)
2. 영화가 문학에 미치는 몇 가지 기술(記述)적 영향들
♣기본적 도구들 : 클로즈업과 트래블링
♣이미지-기호와 주관적 리얼리즘
♣서사의 문제 : 불연속적 서사와 허위의 서사화.
- 전통적 서사예술에서의 진실의 서사화
- 허위의 서사화 혹은 허위의 담론화의 기능과 의미
3. 문학과 영화의 공생의 길
♣영화사 초기의 경향 (1896-1910) : '촬영된 연극'으로서의 영화
♣소설의 영화화 시작 (1910-20)
♣시적 리얼리즘과 문예영화 (1935-1955)
♣작가 감독들의 문학 영화들
♣누벨 바그와 누보 로망 이후 (1955-)
2. 영화가 문학에 미치는 몇 가지 기술(記述)적 영향들
♣기본적 도구들 : 클로즈업과 트래블링
♣이미지-기호와 주관적 리얼리즘
♣서사의 문제 : 불연속적 서사와 허위의 서사화.
- 전통적 서사예술에서의 진실의 서사화
- 허위의 서사화 혹은 허위의 담론화의 기능과 의미
3. 문학과 영화의 공생의 길
본문내용
보여주는 허위의 유희들은, 우리의 일상적 맹목성을 깨우쳐주거나 우리의 이성과 의식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무의식의 지대를 드러내주는 기능을 갖는다. 페렉의 소설 『인생사용법 La Vie mode d\'emploi』(78)이나 『어느 미술애호가의 방 Un cabinet d\'amateur』(79)은 거짓의 서사화를 통한 속임수로 독자와의 유희를 즐기면서 동시에 독자에게 자신의 인식의 한계와 무의식적인 맹목성을 발견하게 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거짓보다 더 거짓된 허위의 구현. 이는 진실의 존재가 무의미해지고 온갖 허위의 담론이 진실의 담론을 기만하고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경멸 혹은 전복의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보드리야르가 『숙명적 전략 Les Strategies fatales』(1983)에서 말한 \'내파(implosion)\'의 기도와 유사한 것으로, 거짓으로 가득찬 세상에서 거짓보다 더 거짓된 극단적인 허위의 세계를 구축한 후, 그 허위의 세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의 의미를 유보시키고 소멸시켜려는 일종의 자기파괴적인 시도인 것이다. 이것은 데리다가 주장하는 해체론적 관점과도 연결되는데, 이처럼 허위의 세계를 통한 해체전략은 새로운 세계의 재구성보다는 현재 세계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더 큰 의의를 둔다.
셋째, 유희로서의 예술. 허위의 서사화는 유기적 체계를 통한 진실의 확립이나 통일성 및 동일성의 제시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보다는 작품의 생산 과정에 더 큰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한다. 예술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그 예술 행위 자체에 있으며, 그 행위 과정에서 얻는 기쁨이과 유희가 예술 창작의 진정한 목표인 것이다. 때문에 독자나 관객에도, 완성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구조적 완성도를 평가하는 일보다 작품의 창작과정에 질문을 던지며 거기에서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캐내도록 유도한다. 결국, 작가와 수용자가 만나는 곳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작품의 창작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진실성, 인과관계, 논리, 개연성 등에 의존하는 전통적 작품들의 진실의 서사화보다는 불연속성, 우연성, 상대성 등을 중요시하는 허위의 서사화가 이와 같은 예술에서의 유희의 의미를 추구하는데 더욱 적절한 것이다.
3. 문학과 영화의 공생의 길
지금까지 이 글의 논의는 갓 태어난 후발주자 영화가 문학을 앞질러 가는(물론 가시적이면서 부분적으로) 숨가쁜 과정을 쫓아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영화는 지금 불안하다. 보여줄 것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진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 역시 믿을 거라고는 결국 이야기뿐이라는 사고가 다시 팽배해지고 있다. 영화가 \'예술\'이고 예술이 현실을 표현하는 \'허구\'라면, 영화는 허구로서의 본분을 재인식하고 있는 중이다. 허구란, 비록 상황에 따라 또 다른 현실이 될 수 있을 지라도 대개의 경우는 현실과 실재 세계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다. 들뢰즈는 이 세계를 이미지의 총체로 보았지만, 예술은 불행히도 이미지의 총체가 되지 못한다. 이미지는 예술을 넘어서는 것이며, 예술은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 그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더 감동적으로, 더 그럴듯하게 들려줄 것인가? 그 \'이야기\' 기술의 정련과 시대 사회적인 맥락의 포착, 어차피 영화도 종국에는 이런 것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영화의 화려한 나머지 기법들은 사실 이 본연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탐구되고 소용되는 것뿐이다. 자칫 이야기와 기법의 문제로 들릴 수 있는 이것은, 내용과 형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에 관한 문제다.
소설과 영화의 뗄레야 뗄 수 없는 질긴 인연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소설과 영화는 결국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기본적인 임무의 대해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가 앞서가면 다른 하나는 그 전진의 성과물을 나눠 가질 것이고, 이 상호협조의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금은 영화가 앞서가는 시대다. 그러나 누가 아는가? 이 넓은 표현의 사막에서 요란함 몸짓으로 뒹굴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화의 가상한 노력이 식상해 보이는 날이 올지... 차라리 주저앉아 중얼거리는 소설의 목소리가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날이 올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여하튼 영화와 소설의 공생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둘은 서로에게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갈 것이다.
둘째, 거짓보다 더 거짓된 허위의 구현. 이는 진실의 존재가 무의미해지고 온갖 허위의 담론이 진실의 담론을 기만하고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경멸 혹은 전복의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보드리야르가 『숙명적 전략 Les Strategies fatales』(1983)에서 말한 \'내파(implosion)\'의 기도와 유사한 것으로, 거짓으로 가득찬 세상에서 거짓보다 더 거짓된 극단적인 허위의 세계를 구축한 후, 그 허위의 세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의 의미를 유보시키고 소멸시켜려는 일종의 자기파괴적인 시도인 것이다. 이것은 데리다가 주장하는 해체론적 관점과도 연결되는데, 이처럼 허위의 세계를 통한 해체전략은 새로운 세계의 재구성보다는 현재 세계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더 큰 의의를 둔다.
셋째, 유희로서의 예술. 허위의 서사화는 유기적 체계를 통한 진실의 확립이나 통일성 및 동일성의 제시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보다는 작품의 생산 과정에 더 큰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한다. 예술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그 예술 행위 자체에 있으며, 그 행위 과정에서 얻는 기쁨이과 유희가 예술 창작의 진정한 목표인 것이다. 때문에 독자나 관객에도, 완성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구조적 완성도를 평가하는 일보다 작품의 창작과정에 질문을 던지며 거기에서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캐내도록 유도한다. 결국, 작가와 수용자가 만나는 곳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작품의 창작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진실성, 인과관계, 논리, 개연성 등에 의존하는 전통적 작품들의 진실의 서사화보다는 불연속성, 우연성, 상대성 등을 중요시하는 허위의 서사화가 이와 같은 예술에서의 유희의 의미를 추구하는데 더욱 적절한 것이다.
3. 문학과 영화의 공생의 길
지금까지 이 글의 논의는 갓 태어난 후발주자 영화가 문학을 앞질러 가는(물론 가시적이면서 부분적으로) 숨가쁜 과정을 쫓아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영화는 지금 불안하다. 보여줄 것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진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 역시 믿을 거라고는 결국 이야기뿐이라는 사고가 다시 팽배해지고 있다. 영화가 \'예술\'이고 예술이 현실을 표현하는 \'허구\'라면, 영화는 허구로서의 본분을 재인식하고 있는 중이다. 허구란, 비록 상황에 따라 또 다른 현실이 될 수 있을 지라도 대개의 경우는 현실과 실재 세계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다. 들뢰즈는 이 세계를 이미지의 총체로 보았지만, 예술은 불행히도 이미지의 총체가 되지 못한다. 이미지는 예술을 넘어서는 것이며, 예술은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 그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더 감동적으로, 더 그럴듯하게 들려줄 것인가? 그 \'이야기\' 기술의 정련과 시대 사회적인 맥락의 포착, 어차피 영화도 종국에는 이런 것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영화의 화려한 나머지 기법들은 사실 이 본연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탐구되고 소용되는 것뿐이다. 자칫 이야기와 기법의 문제로 들릴 수 있는 이것은, 내용과 형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에 관한 문제다.
소설과 영화의 뗄레야 뗄 수 없는 질긴 인연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소설과 영화는 결국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기본적인 임무의 대해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가 앞서가면 다른 하나는 그 전진의 성과물을 나눠 가질 것이고, 이 상호협조의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금은 영화가 앞서가는 시대다. 그러나 누가 아는가? 이 넓은 표현의 사막에서 요란함 몸짓으로 뒹굴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화의 가상한 노력이 식상해 보이는 날이 올지... 차라리 주저앉아 중얼거리는 소설의 목소리가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날이 올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여하튼 영화와 소설의 공생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둘은 서로에게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갈 것이다.
추천자료
 자연주의 문학 (자연주의문학)
자연주의 문학 (자연주의문학) 동인지 문학의 등장과 근대문학의 지형변화 1
동인지 문학의 등장과 근대문학의 지형변화 1 1990년대 문학 - 리얼리즘, 포스트모더니즘 문학
1990년대 문학 - 리얼리즘, 포스트모더니즘 문학  [고전주의][고전주의문학][고전주의음악][고전주의미술]고전주의의 시대적 배경, 고전주의 발...
[고전주의][고전주의문학][고전주의음악][고전주의미술]고전주의의 시대적 배경, 고전주의 발... [포르투갈][포르투갈 문화][포르투갈 역사][포르투갈 문학][포르투갈 예술][관광지][제로니무...
[포르투갈][포르투갈 문화][포르투갈 역사][포르투갈 문학][포르투갈 예술][관광지][제로니무... 롤랑 바르트의 신화, 롤랑 바르트의 문학, 롤랑 바르트의 기호론,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론, ...
롤랑 바르트의 신화, 롤랑 바르트의 문학, 롤랑 바르트의 기호론,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론, ... [낭만주의][낭만파][미술][발레][문학][음악][과학기술][건축]낭만주의(낭만파) 미술, 낭만주...
[낭만주의][낭만파][미술][발레][문학][음악][과학기술][건축]낭만주의(낭만파) 미술, 낭만주... [아동문학] 서양 아동문학의 18세기 이전, 18세기와 19세기의 시대적 배경 및 특징 그리고 그...
[아동문학] 서양 아동문학의 18세기 이전, 18세기와 19세기의 시대적 배경 및 특징 그리고 그... [1990년대][포스트모더니즘][표현의 자유][민족문학][미디어][북한연극]1990년대의 포스트모...
[1990년대][포스트모더니즘][표현의 자유][민족문학][미디어][북한연극]1990년대의 포스트모... [서정시][서정시 개념][서정시 역사][서정시 창작과정][시적 화자][사회적 기능][중세문학]서...
[서정시][서정시 개념][서정시 역사][서정시 창작과정][시적 화자][사회적 기능][중세문학]서... [소설][리얼리즘][소설론][작가][로맨스][서사문학]소설과 리얼리즘, 소설과 소설론, 소설과 ...
[소설][리얼리즘][소설론][작가][로맨스][서사문학]소설과 리얼리즘, 소설과 소설론, 소설과 ... [탈식민성][희곡][아나키즘][문학비평][김지하][도가철학][문헌정보][탈식민지]탈식민성과 희...
[탈식민성][희곡][아나키즘][문학비평][김지하][도가철학][문헌정보][탈식민지]탈식민성과 희... (방통대) 상상력과문학(상상력에 관하여 바슐라르와 뒤랑) [상상력과문학 상상력] - 가스통 ...
(방통대) 상상력과문학(상상력에 관하여 바슐라르와 뒤랑) [상상력과문학 상상력] - 가스통 ... [문학교육론] 문학 텍스트 광고의 호소 전략 - 구성 형식(줄거리와 외부 평가, 작가 이미지와...
[문학교육론] 문학 텍스트 광고의 호소 전략 - 구성 형식(줄거리와 외부 평가, 작가 이미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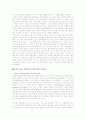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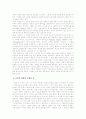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