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李鈺의 작가의식 연구
(1) 생애와 시대적 배경
(2) 교유한 인물과 사상
Ⅲ. 李鈺의 傳에 나타난 작가의식
(1) 시류와 세태의 비판
(2) 통치 제도와 지배층의 무능 비판
Ⅳ. 여성 인물전에 나타난 작가의식
(1) 사회제도의 불합리성과 세태 비판
(2) 인간 존엄성에 대한 긍정적 수용
Ⅴ. 결론
Ⅱ. 李鈺의 작가의식 연구
(1) 생애와 시대적 배경
(2) 교유한 인물과 사상
Ⅲ. 李鈺의 傳에 나타난 작가의식
(1) 시류와 세태의 비판
(2) 통치 제도와 지배층의 무능 비판
Ⅳ. 여성 인물전에 나타난 작가의식
(1) 사회제도의 불합리성과 세태 비판
(2) 인간 존엄성에 대한 긍정적 수용
Ⅴ. 결론
본문내용
고 그 다음은 임금이나 정승을 속이고,
또 그 다음은 백성을 속인다. 이홍 같은 속임질은 하질이니 족히 시비할 것도
없겠다. 그런데 천하를 속이는 자는 천하의 임금이 되며, 그 다음은 자기 몸을
영화롭게 하며, 그 다음은 집을 윤택하게 한다. 이홍 같은 자는 속임질로 마침내
법망에 걸려들었으니 남을 속인 것이 아니고 실은 자신을 속인 셈이다. 또한 슬픈
일이다.
「李泓傳」, 外史氏曰 大騙騙天下 其次騙君相 又其次騙民 若泓之騙末耳 何足道哉 然騙天下者 君天下 其次榮其身 又其次潤屋 而若泓者 卒以騙坐 非騙人也 自騙也 亦悲夫
라고 논평한다. 나라를 속이는 사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과 개탄이 보인다.
李泓의 사기 행각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부에 집착하는 기생과 승려, 아전의 행위도 함께 비판하고 있다.
金相烈, 앞의 논문, p.64
李鈺이 걱정하는 사기꾼은 온 천하를 속이고 임금ㆍ정승, 심지어 백성까지 속여먹는 사람이다. 작은 도둑은 몸을 망치고 큰 도둑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李鈺은 그러한 사회적 모순, 즉 큰 도둑을 고발하고자 한 것이다.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큰 도둑은 바로 지배층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작은 도둑과 큰 도둑을 양산해 내는 관리들의 무능과 부패를 李泓이라는 한 사기꾼을 빌어 지적하면서 남을 속여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그때까지 지배층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崔生員傳」에서는 李鈺이 미신의 폐해와 타파를 주장하면서 연약한 백성을 속이는 무당의 혹세무민을 고발하고 있다.
저 담장 남쪽에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은 원래 귀신이란 없어서 주인이
산 지 다섯 해가 되도록 나뭇잎 하나 놀라지 않았네. 그런데 마침 그 남쪽
이웃집 사람과 사이가 나빠져, 남쪽 이웃 사람이 그를 몹시 미워하여 밤마다
일어나 돌 서너 개씩을 던져 날렸지. 처음에는 그 집주인이 도둑의 짓이라
여기더니 그런 지 사흘이 지나자, 여자 무당을 맞이하여 큰 나무 밑에다가
떡을 진열해 놓고 신 내리는 말을 하며 방울을 흔들고 협을 두드리더군. 남쪽
이웃 사람은 그것을 알고 담 구멍으로 엿보고 슬며시 웃으며 다시 돌을 나무에
던져 가지에 맞추니 그 소리가 매우 컸지. 곁에 있는 나무까지 우수수 소리를
내었는데, 그 돌이 떡에 떨어져 공교롭게도 떡시루를 깼네. 무당은 혀를 떨며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버리고 달아나며 \'귀신의 노여움이 심하여 도저히 풀어
볼 수가 없군요\' 했지.
「崔生員傳」, 吾嘗見墻之南有屋 素無鬼 主人宅之五載 木葉不驚 適與其南 生 交惡 生疾之 每夜起 輒飛下三四石 初以爲偸也 至三日 乃延女巫 陳餠於大樹下 方語鈴鼓 生 之 從墻隙匿笑 復以石 其樹 磯於祉 其響甚威 樹之旁立者 皆 鳴 石墜於餠 巧而破甑 巫舌顫不能語 而走曰 鬼怒甚 不可解也 南隣生 亦恐其久則覺 遂止
귀신은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는 것이다. 귀신이란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존재다.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귀신을 매개로 하여 연약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무당의 그릇된 행위가 무서운 것이다.
무당이 이치에도 닿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崔生員이 무당의 맹랑함을 발견하는 것은 선비인 崔生員이 어느 날 서울로 가다가 무당이 굿하는 것을 보고 미신의 폐단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굿판을 휘젓고 사당을 불태웠다. 그 후 세월이 지난 뒤 崔生員은 다시 그곳을 들렀다. 사당을 발견하고 그 근처에서 노숙을 하다가 벽을 사이에 두고 무당이 \'우리 신보다 崔生員이 10배나 더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고 불평하는 것을 직접 듣게 된다. 죽지도 않은 崔生員을 무당은 신으로 추켜세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말의 뜻도 이해하지 못한 무당이나 죽지도 않은 사람을 신으로 추대하는 것이나 모두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행위인 것이며 이와 같은 무당의 기만적 행위를 한 인물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金相烈, 앞의 논문, p. 65∼66.
이 작품은 작은 굿판을 벌여 백성을 어지럽히고 속여 온 무당과 미신의 폐해를 고발하면서 하루 속히 타파되어야 할 사회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2) 통치 제도와 지배층의 무능 비판
18세기 농촌 사회에서 유출된 민생들이 일부는 산에 들어가 군도가 되고, 일부는 도시의 거지로 떼를 지어 온갖 행패를 부린 사회 현상을 배경으로 시대의 정치의 문란과 관리들의 무능으로 인해 당대 백성들의 비참한 삶과 인간성 상실의 한 단면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成進士傳」이다. 「成進士傳」에서는 사기와 협박을 하는 행위가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세속이 타락하는 것으로 보고 그 원인을 관리의 무능함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거지가 굶어 죽은 시신을 짊어지고 남의 집에 가서 일부러 집 주인에게 트집을 잡은 후 싸움을 하다가 집 주인이 자기 동료를 죽인 것처럼 해서 협박을 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작가는 \'간교함이 날로 심해지고 사기가 날로 들끓고 있다\'는 것으로 세속의 타락을 비판한다.
金相烈, 앞의 논문, p.63.
李鈺이 이런 이야기를 작품화 한 것은 인간성이 상실된 사람의 무서운 모습과 공갈과 협박이 횡행하는 사회상에 대한 폭로이다.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인간의 간사한 모습이나 양심이 실종된 세태를 보여주는데 있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그렇게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을 고발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거지나 군도는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떠돌이 신세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이들을 양산해낸 사회와 국가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 낸 것은 통치 계층의 무능과 통치 방식의 불 합리에 그 원인이 있다고 고발ㆍ비판한 것이다.
그때 만약 성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옥사가 성립됐을 것이고, 옥사가
성립되면 법을 담당한 자가 반드시 \'죄가 의심스럽다\'고 하여 여러 해 동안
판결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성씨로서는 또한 억울하지 않겠는가? 아! 진실로
서문표같이 밝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어 법을 맡았다면 거지가 감히 이런
또 그 다음은 백성을 속인다. 이홍 같은 속임질은 하질이니 족히 시비할 것도
없겠다. 그런데 천하를 속이는 자는 천하의 임금이 되며, 그 다음은 자기 몸을
영화롭게 하며, 그 다음은 집을 윤택하게 한다. 이홍 같은 자는 속임질로 마침내
법망에 걸려들었으니 남을 속인 것이 아니고 실은 자신을 속인 셈이다. 또한 슬픈
일이다.
「李泓傳」, 外史氏曰 大騙騙天下 其次騙君相 又其次騙民 若泓之騙末耳 何足道哉 然騙天下者 君天下 其次榮其身 又其次潤屋 而若泓者 卒以騙坐 非騙人也 自騙也 亦悲夫
라고 논평한다. 나라를 속이는 사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과 개탄이 보인다.
李泓의 사기 행각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부에 집착하는 기생과 승려, 아전의 행위도 함께 비판하고 있다.
金相烈, 앞의 논문, p.64
李鈺이 걱정하는 사기꾼은 온 천하를 속이고 임금ㆍ정승, 심지어 백성까지 속여먹는 사람이다. 작은 도둑은 몸을 망치고 큰 도둑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李鈺은 그러한 사회적 모순, 즉 큰 도둑을 고발하고자 한 것이다.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큰 도둑은 바로 지배층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작은 도둑과 큰 도둑을 양산해 내는 관리들의 무능과 부패를 李泓이라는 한 사기꾼을 빌어 지적하면서 남을 속여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그때까지 지배층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崔生員傳」에서는 李鈺이 미신의 폐해와 타파를 주장하면서 연약한 백성을 속이는 무당의 혹세무민을 고발하고 있다.
저 담장 남쪽에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은 원래 귀신이란 없어서 주인이
산 지 다섯 해가 되도록 나뭇잎 하나 놀라지 않았네. 그런데 마침 그 남쪽
이웃집 사람과 사이가 나빠져, 남쪽 이웃 사람이 그를 몹시 미워하여 밤마다
일어나 돌 서너 개씩을 던져 날렸지. 처음에는 그 집주인이 도둑의 짓이라
여기더니 그런 지 사흘이 지나자, 여자 무당을 맞이하여 큰 나무 밑에다가
떡을 진열해 놓고 신 내리는 말을 하며 방울을 흔들고 협을 두드리더군. 남쪽
이웃 사람은 그것을 알고 담 구멍으로 엿보고 슬며시 웃으며 다시 돌을 나무에
던져 가지에 맞추니 그 소리가 매우 컸지. 곁에 있는 나무까지 우수수 소리를
내었는데, 그 돌이 떡에 떨어져 공교롭게도 떡시루를 깼네. 무당은 혀를 떨며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버리고 달아나며 \'귀신의 노여움이 심하여 도저히 풀어
볼 수가 없군요\' 했지.
「崔生員傳」, 吾嘗見墻之南有屋 素無鬼 主人宅之五載 木葉不驚 適與其南 生 交惡 生疾之 每夜起 輒飛下三四石 初以爲偸也 至三日 乃延女巫 陳餠於大樹下 方語鈴鼓 生 之 從墻隙匿笑 復以石 其樹 磯於祉 其響甚威 樹之旁立者 皆 鳴 石墜於餠 巧而破甑 巫舌顫不能語 而走曰 鬼怒甚 不可解也 南隣生 亦恐其久則覺 遂止
귀신은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는 것이다. 귀신이란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존재다.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귀신을 매개로 하여 연약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무당의 그릇된 행위가 무서운 것이다.
무당이 이치에도 닿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崔生員이 무당의 맹랑함을 발견하는 것은 선비인 崔生員이 어느 날 서울로 가다가 무당이 굿하는 것을 보고 미신의 폐단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굿판을 휘젓고 사당을 불태웠다. 그 후 세월이 지난 뒤 崔生員은 다시 그곳을 들렀다. 사당을 발견하고 그 근처에서 노숙을 하다가 벽을 사이에 두고 무당이 \'우리 신보다 崔生員이 10배나 더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고 불평하는 것을 직접 듣게 된다. 죽지도 않은 崔生員을 무당은 신으로 추켜세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말의 뜻도 이해하지 못한 무당이나 죽지도 않은 사람을 신으로 추대하는 것이나 모두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행위인 것이며 이와 같은 무당의 기만적 행위를 한 인물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金相烈, 앞의 논문, p. 65∼66.
이 작품은 작은 굿판을 벌여 백성을 어지럽히고 속여 온 무당과 미신의 폐해를 고발하면서 하루 속히 타파되어야 할 사회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2) 통치 제도와 지배층의 무능 비판
18세기 농촌 사회에서 유출된 민생들이 일부는 산에 들어가 군도가 되고, 일부는 도시의 거지로 떼를 지어 온갖 행패를 부린 사회 현상을 배경으로 시대의 정치의 문란과 관리들의 무능으로 인해 당대 백성들의 비참한 삶과 인간성 상실의 한 단면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成進士傳」이다. 「成進士傳」에서는 사기와 협박을 하는 행위가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세속이 타락하는 것으로 보고 그 원인을 관리의 무능함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거지가 굶어 죽은 시신을 짊어지고 남의 집에 가서 일부러 집 주인에게 트집을 잡은 후 싸움을 하다가 집 주인이 자기 동료를 죽인 것처럼 해서 협박을 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작가는 \'간교함이 날로 심해지고 사기가 날로 들끓고 있다\'는 것으로 세속의 타락을 비판한다.
金相烈, 앞의 논문, p.63.
李鈺이 이런 이야기를 작품화 한 것은 인간성이 상실된 사람의 무서운 모습과 공갈과 협박이 횡행하는 사회상에 대한 폭로이다.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인간의 간사한 모습이나 양심이 실종된 세태를 보여주는데 있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그렇게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을 고발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거지나 군도는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떠돌이 신세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이들을 양산해낸 사회와 국가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 낸 것은 통치 계층의 무능과 통치 방식의 불 합리에 그 원인이 있다고 고발ㆍ비판한 것이다.
그때 만약 성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옥사가 성립됐을 것이고, 옥사가
성립되면 법을 담당한 자가 반드시 \'죄가 의심스럽다\'고 하여 여러 해 동안
판결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성씨로서는 또한 억울하지 않겠는가? 아! 진실로
서문표같이 밝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어 법을 맡았다면 거지가 감히 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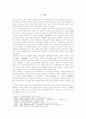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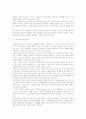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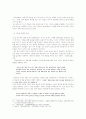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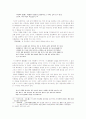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