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영정시대의 소설
제2장 중국문학의 일 방계로 본 한자소설
제3장 「삼한습유」
제4장 대문호 박지원과 그의 작품
제5장 「장화홍련전」과 기타 공안류
제6장 걸작 「춘향전」의 출현과 의의
제7장 「춘향전」이후의 염정소설
제8장 전대 계승의 문학
제2장 중국문학의 일 방계로 본 한자소설
제3장 「삼한습유」
제4장 대문호 박지원과 그의 작품
제5장 「장화홍련전」과 기타 공안류
제6장 걸작 「춘향전」의 출현과 의의
제7장 「춘향전」이후의 염정소설
제8장 전대 계승의 문학
본문내용
대가 산백의 무덤에 곡한 것은 로미오가 불붙는 듯한 피끓는 가슴을 가지고 연이의 총상에 곡함과 같이 순결한 사랑의 권화인 양축의 간단한 기록을 부연하여 방대하고도 역량있는 대작품에까지 진전시킨 곳에 작자의 기교일반을 엿볼 수 있다.
제4절 「옥단춘전」
평양 기생인 옥단춘이 종으로는 영남민요와 횡으로는 산대도감 각본과 어떤 관계를 가졌을까? 민요나 각본은 모두 노래이다. 노래는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표현인 만큼 어느 옛날에 평양에 유명하던 옥단춘이 전국적으로 화제가되고 찬사가 붙고 따라서 노래에도 오른 듯하다. 옥단춘이 과연 실재하였다고 하면, 남은 남원을 무대로 한 「춘향전」에 대하여 북은 서경을 배경으로 한 옥단춘의 호일대가 될 것이며 「옥단춘전」의 후반이「춘향전」의 후반과 서로 문합하는 것도 양자의 사이에 어떤 교섭이 있지 않은가 하고 의심한다.
암행어사 혈룡과 몽룡, 춘향과 옥단춘, 구상의 유사, 체재로 보든지 내용으로 보든지「춘향전」과 바로 한 쌍의 자매편이라고 하겠다. 여걸 「월영낭자전」도 최희성과 호월영의 정사를 그린 승작(勝作)이다.
제8장 전대 계승의 문학
제 1절 「서운전」(월봉기)과 「옥소전」의 유행
『태평광기』에 있는「최위자전」이 변하여 명대의 소설 「소지현나삼재합」이 되었으며, 소지헌은 즉 소운이다. 청대에 이르러서 이로써 다시 「백나삼」전기를 지었다. 대저 비극적 요소를 많이 가진 복수류는 가장 독자의 마음을 끄는 것으로 정염류와 병행하여 일시의 세호(世好)에 던져 문단을 풍미하는 것이니 종래와 같이 취미와 형식이 단조한 소설계에 이 소설의 수입이야말로 일대 파문을 던졌다. 그러므로 그는 즉시 번역되어 「소운전」이나 「옥소전」등의 여러 가지의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소운전」잡고
이는 대개 어느 실담일는지도 알 수 없으나 소위가 수적에게 봉변하여 그의 자식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대통은 『금고기관』의 「채소저인욕보구」의 장면을 새겨보게 한다. 중국의 지리와 이국적 취미를 이해치 못하는 이에게는 부자연한 느낌을 많이 준다. 본서는 민간에 흔히「월봉기」,「월봉산기」,「소학사전」의 명칭으로도 유행되지만 연대가 승정이므로 숙종 이후 즉 영정시대나 그 후에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제2절 기타 계승되어 오는 작품
이때에는 장회소설(章回小說) 항상 매회마다 끝을 \"그러면 이 결말은 어떻게 될는지 다음회의 이야기를 기다려 주시오\"라는 의미의 말로 매듭짓고, 다음 장으로 옮겨간다. 이러한 형식의 발생은 송대(宋代)에 연단(演壇)에서 강석사(講釋師)들이 장편의 강담을 몇 회로 나누어 구연(口演)할 때에 이용한 기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 소설 형식은 원(元)·명(明) 시대에 《삼국지연의》 《수호지》 《서유기》 등에 의하여 완성되었고, 청대(淸代)의 《유림외사(儒林外史)》 《홍루몽》 등을 거쳐, 관료비판을 주제로 한 \'견책소설(譴責小說)\'에 이르기까지 답습되어 왔다.
의 장편물도 상당히 발달되어 「임화정연」의 번역, 「한당유사」의 창작도 이때의 일이다. 「하진양문록」같은 것도 이때의 작이 아닌가 한다. 당시의 장회소설을 예거한다면 [다음 세 작품이 있다]
「석화룡전」 : 대명 정관 연간에 소주(蘇州) 석화룡의 사실.
「이학사전」 : 대명 가정 연간에 청주(淸州) 이현경의 사실.
「사대장전」 : 진 소홍현 사안(史安) 의 사실을 와철(訛綴:거짓되게 꾸밈)
기타「장국진전」: 이와 같은 장군 전기는 장회소설은 아닐지라도 필마단기(匹馬單騎)로 송 천자를 구원하는 만고충신 위왕 「현수문전」과, 부인 장애원과 함께 [부인인] 장은 관장으로 [이대봉]자기는 의병장으로 전장에 임하여 개선한 후 연애의 숙원을 달한 「이대봉전」(일명 「봉황대」)같은 것과 더불어 이
제4절 「옥단춘전」
평양 기생인 옥단춘이 종으로는 영남민요와 횡으로는 산대도감 각본과 어떤 관계를 가졌을까? 민요나 각본은 모두 노래이다. 노래는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표현인 만큼 어느 옛날에 평양에 유명하던 옥단춘이 전국적으로 화제가되고 찬사가 붙고 따라서 노래에도 오른 듯하다. 옥단춘이 과연 실재하였다고 하면, 남은 남원을 무대로 한 「춘향전」에 대하여 북은 서경을 배경으로 한 옥단춘의 호일대가 될 것이며 「옥단춘전」의 후반이「춘향전」의 후반과 서로 문합하는 것도 양자의 사이에 어떤 교섭이 있지 않은가 하고 의심한다.
암행어사 혈룡과 몽룡, 춘향과 옥단춘, 구상의 유사, 체재로 보든지 내용으로 보든지「춘향전」과 바로 한 쌍의 자매편이라고 하겠다. 여걸 「월영낭자전」도 최희성과 호월영의 정사를 그린 승작(勝作)이다.
제8장 전대 계승의 문학
제 1절 「서운전」(월봉기)과 「옥소전」의 유행
『태평광기』에 있는「최위자전」이 변하여 명대의 소설 「소지현나삼재합」이 되었으며, 소지헌은 즉 소운이다. 청대에 이르러서 이로써 다시 「백나삼」전기를 지었다. 대저 비극적 요소를 많이 가진 복수류는 가장 독자의 마음을 끄는 것으로 정염류와 병행하여 일시의 세호(世好)에 던져 문단을 풍미하는 것이니 종래와 같이 취미와 형식이 단조한 소설계에 이 소설의 수입이야말로 일대 파문을 던졌다. 그러므로 그는 즉시 번역되어 「소운전」이나 「옥소전」등의 여러 가지의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소운전」잡고
이는 대개 어느 실담일는지도 알 수 없으나 소위가 수적에게 봉변하여 그의 자식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대통은 『금고기관』의 「채소저인욕보구」의 장면을 새겨보게 한다. 중국의 지리와 이국적 취미를 이해치 못하는 이에게는 부자연한 느낌을 많이 준다. 본서는 민간에 흔히「월봉기」,「월봉산기」,「소학사전」의 명칭으로도 유행되지만 연대가 승정이므로 숙종 이후 즉 영정시대나 그 후에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제2절 기타 계승되어 오는 작품
이때에는 장회소설(章回小說) 항상 매회마다 끝을 \"그러면 이 결말은 어떻게 될는지 다음회의 이야기를 기다려 주시오\"라는 의미의 말로 매듭짓고, 다음 장으로 옮겨간다. 이러한 형식의 발생은 송대(宋代)에 연단(演壇)에서 강석사(講釋師)들이 장편의 강담을 몇 회로 나누어 구연(口演)할 때에 이용한 기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 소설 형식은 원(元)·명(明) 시대에 《삼국지연의》 《수호지》 《서유기》 등에 의하여 완성되었고, 청대(淸代)의 《유림외사(儒林外史)》 《홍루몽》 등을 거쳐, 관료비판을 주제로 한 \'견책소설(譴責小說)\'에 이르기까지 답습되어 왔다.
의 장편물도 상당히 발달되어 「임화정연」의 번역, 「한당유사」의 창작도 이때의 일이다. 「하진양문록」같은 것도 이때의 작이 아닌가 한다. 당시의 장회소설을 예거한다면 [다음 세 작품이 있다]
「석화룡전」 : 대명 정관 연간에 소주(蘇州) 석화룡의 사실.
「이학사전」 : 대명 가정 연간에 청주(淸州) 이현경의 사실.
「사대장전」 : 진 소홍현 사안(史安) 의 사실을 와철(訛綴:거짓되게 꾸밈)
기타「장국진전」: 이와 같은 장군 전기는 장회소설은 아닐지라도 필마단기(匹馬單騎)로 송 천자를 구원하는 만고충신 위왕 「현수문전」과, 부인 장애원과 함께 [부인인] 장은 관장으로 [이대봉]자기는 의병장으로 전장에 임하여 개선한 후 연애의 숙원을 달한 「이대봉전」(일명 「봉황대」)같은 것과 더불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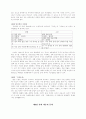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