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漢대
Ⅱ漢대의 문학- 樂府詩, 古詩
Ⅲ 결론
Ⅱ漢대의 문학- 樂府詩, 古詩
Ⅲ 결론
본문내용
처량히 울고
風率已 써늘한 바람은 옷깃을 파고드니
遊子寒無衣 떠도는 몸 따뜻한 옷 한 벌 없구나
錦衾遺洛浦 낙포에 두고 온 그리운 내 사람
同袍與我違 평생을 한 이불 덮어야 하거늘
獨宿累長夜 긴긴밤 홀로 지새기 얼마이던가?
夢想見容輝 꿈에라도 님의 얼굴 보았으면
良人惟古歡 오직 기뻤던 추억뿐이로다
枉駕惠前綏 몸을 굽혀 수레 위에 날 태우고
願得常巧笑 웃음 짓는 내 모습 늘 보자시며
手同車歸 내손 꼬옥 잡고 수레 함께 몰던 님
來不須臾 잠시 잠깐 꿈에라도 오셨으면
又不處重 이다지도 빈방이 괴롭지 않을 것을
亮無晨風翼 날개 없는 수리(鷹)어니
焉能凌風飛 바람에 날개 얹고 님 보러 어이 갈고
眄以適意 하염없이 바라보며 애타는 이 마음
引領遙相 문에 기대어 초점 없이 바라보며
徒倚懷感傷 아련한 추억 속을 배회하자니
垂涕沾雙扉凜凜: 한기가 심하게 도는 것
: 땅강아지 밤에 불빛을 보면 울며 나는데 그 울음소리가 지렁이 울음과 비슷하다.
: 맹렬 洛浦: 낙수가에
同袍: 한 이불 덥다. 引領: 목이 빠지도록,
徙倚: 배회하다. 扉: 문
容輝: 낭군의 얼굴 須臾: 아주 짧은 시각
晨風: 매, 수리 凌風: 바람을 타고
眄: 내리깔고 쳐다봄
눈가를 적시느니 눈물이로다.
孟冬寒氣至
孟冬寒氣至 겨울이라 날마다 추운데
北風何慘慄 북풍은 왜 이다지 살을 에이느냐
愁多知夜長 밤이 긴 것은 수심이 많아서 인가
仰觀星列 날마다 밤하늘에 뭇별을 바라 본다
三五明月滿 삼오라 둥근 보름달
四五蟾缺 사오라 달속에 토끼도 이즈러져
客從遠方來 멀리서 날찾아온 길손이
遺我一書札 한장의 서찰을 건네주었었지
上言長相思 그립고 사랑한다로 시작해
下言久離別 오랜 이별이란 슬픈 한이라 했지
置書懷袖中 소매속에 간직한 이편지
三歲字不滅 삼년이 흘렀어도 한자인들 잊었을가
一心抱區區 일심으로 사랑하는 그마음을
懼君不識察三五:음력 十五日(3x5=15)
四五:음력 二十日(4x5=20)
三歲:삼년 三年
區區:서로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慘慄: 지극히 슬픈 것, 혹독하게 추운 것
蟾: 달 속에 토끼가 방아 찧는 전설,
행여나 내 잊을까 근심이라네.
客從遠方來
客從遠方來 먼 데서 날 찾아온 손님이
遺我一端綺 반 필의 비단을 전해 주웠습니다
相去萬餘里 만 리나 떨어져 살아도
故人心爾 늘 님께선 날 생각하고 계시죠
文彩雙鴛鴦 한 쌍의 원앙새 수놓은 비단인데
裁合歡被 옷을 지으면 올마다 따스할 님의 정
著以長相思 다정하고 사랑한단 뜻이 랍니다
緣以結不解 한번 맺은 인연은 끊을 수 없음은
以膠投漆中 아교풀로 붙힌 위에 칠을 한 것 같아서
誰能別離此一端: 반 필의 옷감
合歡: 남녀가 얽히는 것, 야합(夜合 잠자리를 함께 하다)
우리 풍속에도 신혼 첫날밤에 신랑 신부는 합환주 (合歡酒)를 먼저마시고 다음에 옷을 벗는다.
膠: 접착제, 아교풀.
아무도 이 견고함을 못 떼어놓지요.
明月何皎皎
이 시는 어떤 정경을 보고 새로운 감정이 일어난 것으로 한 젊은 여인이 멀리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는 시이다. 밝은 달이 하늘에 떠있는데 혼자서 규방을 지키며 잠을 이루지 못하여 옷을 걸치고 밖에 나와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보아도 여전히 외로이 서있는 혼자일 뿐, 다시 집으로 들어오니, 더욱 외롭고 무료하여 견딜 수 없다.
明月何皎皎 달빛은 어쩌라고 우라지게 밝아서
照我羅床緯 휘장 뚫고 생과부 부푼 가슴 더듬나
憂愁不能寐 이래저래 시름에 잠 못 이룰 때
攬衣起徘徊 달빛이 옷깃을 당기니 안달이로다
客行雖云樂 님께선 뜻이 있어 떠돈다지만
不如早旋歸 그게 어데 내 품보다 나은 일인가?
出戶獨徨 문 열고 튀어나와 타는 가슴 식히는데
愁思當告誰 한 맺힌 시름을 호소할 곳 없으니
引領還入房 고개를 떨군 채 빈방으로 돌아와
淚下沾裳衣 떨어지는 눈물로 치마폭을 적신다.
Ⅲ 결론
문학사적으로 볼 때 漢나라 때 이룩한 가장 큰 공헌은 바로 武帝 때에 정식으로 樂府를 세웠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선 시기에 이미 樂府令이라는 관직이 설치되기도 했지만, 이때에 와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정비되어 시가를 채집하고 악기에 맞추어 음악화 시키는 담당 관리를 두었다. 그리하여 서정적인 시가를 포함한 아름답고 애잔한 가요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한 중엽부터는 문인들도 자각이 생기기 시작하여 그들의 작품에 어느 정도의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賦>나 산문은 여전히 의고적이고 수사를 중요시하였지만 樂府詩라던가, 樂府詩로부터 발달한 五言古詩는 가벼운 리듬과 청신한 문장으로 새로운 서정의 세계를 개척하여 개성적인 문학이 발전하게 하였다. 민간에서 널리 구전되던 시들을 채집한 것은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였지만, 한 대의 樂府처럼 정식화되지는 않았었다. 漢대의 樂府의 설치는 그동안 전해져오던 시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漢대의 시가 문학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漢대에 정형화되어 발달한 樂府詩와 五言古詩는 후대의 문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어 唐대에는 시가 문학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발판을 마련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리하여 후세의 시인들도 樂府詩와 五言古詩를 많이 창작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들의 발전의 뒷면에는 漢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기 때문에 문인들이 그들의 문화생활을 잘 즐기고 시를 많이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樂府詩와 五言古詩는 漢나라에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시가문학이지만,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후대에도 많은 시인들에 의해서 지어졌다. 樂府詩는 특히 당나라 백거이가 新樂府 운동을 일으킬 만큼 시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고, 五言古詩도 역시 후대의 많은 시인들에 의해서 창작되었다. 樂府詩와 五言古詩는 어쩌면 시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중국문학사」, 김학주 저, 신아사
「악부시선」, 김학주 저, 명문당
「황하에 흐르는 명시」, 이해원 저, 현학사
「중국 역대 명시 감상」, 윤정현 저, 문음사
「역사 따라 배우는 중국문학사」, 이수웅 저, 다락원
「중국의 어제와 오늘」, 왕순홍 저, 평민사
「그림으로 읽는 중국 문학 오천년」, 빙심 외 3인 저, 예담
「중국 문학 산책」, 김해명, 백산 서당
風率已 써늘한 바람은 옷깃을 파고드니
遊子寒無衣 떠도는 몸 따뜻한 옷 한 벌 없구나
錦衾遺洛浦 낙포에 두고 온 그리운 내 사람
同袍與我違 평생을 한 이불 덮어야 하거늘
獨宿累長夜 긴긴밤 홀로 지새기 얼마이던가?
夢想見容輝 꿈에라도 님의 얼굴 보았으면
良人惟古歡 오직 기뻤던 추억뿐이로다
枉駕惠前綏 몸을 굽혀 수레 위에 날 태우고
願得常巧笑 웃음 짓는 내 모습 늘 보자시며
手同車歸 내손 꼬옥 잡고 수레 함께 몰던 님
來不須臾 잠시 잠깐 꿈에라도 오셨으면
又不處重 이다지도 빈방이 괴롭지 않을 것을
亮無晨風翼 날개 없는 수리(鷹)어니
焉能凌風飛 바람에 날개 얹고 님 보러 어이 갈고
眄以適意 하염없이 바라보며 애타는 이 마음
引領遙相 문에 기대어 초점 없이 바라보며
徒倚懷感傷 아련한 추억 속을 배회하자니
垂涕沾雙扉凜凜: 한기가 심하게 도는 것
: 땅강아지 밤에 불빛을 보면 울며 나는데 그 울음소리가 지렁이 울음과 비슷하다.
: 맹렬 洛浦: 낙수가에
同袍: 한 이불 덥다. 引領: 목이 빠지도록,
徙倚: 배회하다. 扉: 문
容輝: 낭군의 얼굴 須臾: 아주 짧은 시각
晨風: 매, 수리 凌風: 바람을 타고
眄: 내리깔고 쳐다봄
눈가를 적시느니 눈물이로다.
孟冬寒氣至
孟冬寒氣至 겨울이라 날마다 추운데
北風何慘慄 북풍은 왜 이다지 살을 에이느냐
愁多知夜長 밤이 긴 것은 수심이 많아서 인가
仰觀星列 날마다 밤하늘에 뭇별을 바라 본다
三五明月滿 삼오라 둥근 보름달
四五蟾缺 사오라 달속에 토끼도 이즈러져
客從遠方來 멀리서 날찾아온 길손이
遺我一書札 한장의 서찰을 건네주었었지
上言長相思 그립고 사랑한다로 시작해
下言久離別 오랜 이별이란 슬픈 한이라 했지
置書懷袖中 소매속에 간직한 이편지
三歲字不滅 삼년이 흘렀어도 한자인들 잊었을가
一心抱區區 일심으로 사랑하는 그마음을
懼君不識察三五:음력 十五日(3x5=15)
四五:음력 二十日(4x5=20)
三歲:삼년 三年
區區:서로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慘慄: 지극히 슬픈 것, 혹독하게 추운 것
蟾: 달 속에 토끼가 방아 찧는 전설,
행여나 내 잊을까 근심이라네.
客從遠方來
客從遠方來 먼 데서 날 찾아온 손님이
遺我一端綺 반 필의 비단을 전해 주웠습니다
相去萬餘里 만 리나 떨어져 살아도
故人心爾 늘 님께선 날 생각하고 계시죠
文彩雙鴛鴦 한 쌍의 원앙새 수놓은 비단인데
裁合歡被 옷을 지으면 올마다 따스할 님의 정
著以長相思 다정하고 사랑한단 뜻이 랍니다
緣以結不解 한번 맺은 인연은 끊을 수 없음은
以膠投漆中 아교풀로 붙힌 위에 칠을 한 것 같아서
誰能別離此一端: 반 필의 옷감
合歡: 남녀가 얽히는 것, 야합(夜合 잠자리를 함께 하다)
우리 풍속에도 신혼 첫날밤에 신랑 신부는 합환주 (合歡酒)를 먼저마시고 다음에 옷을 벗는다.
膠: 접착제, 아교풀.
아무도 이 견고함을 못 떼어놓지요.
明月何皎皎
이 시는 어떤 정경을 보고 새로운 감정이 일어난 것으로 한 젊은 여인이 멀리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는 시이다. 밝은 달이 하늘에 떠있는데 혼자서 규방을 지키며 잠을 이루지 못하여 옷을 걸치고 밖에 나와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보아도 여전히 외로이 서있는 혼자일 뿐, 다시 집으로 들어오니, 더욱 외롭고 무료하여 견딜 수 없다.
明月何皎皎 달빛은 어쩌라고 우라지게 밝아서
照我羅床緯 휘장 뚫고 생과부 부푼 가슴 더듬나
憂愁不能寐 이래저래 시름에 잠 못 이룰 때
攬衣起徘徊 달빛이 옷깃을 당기니 안달이로다
客行雖云樂 님께선 뜻이 있어 떠돈다지만
不如早旋歸 그게 어데 내 품보다 나은 일인가?
出戶獨徨 문 열고 튀어나와 타는 가슴 식히는데
愁思當告誰 한 맺힌 시름을 호소할 곳 없으니
引領還入房 고개를 떨군 채 빈방으로 돌아와
淚下沾裳衣 떨어지는 눈물로 치마폭을 적신다.
Ⅲ 결론
문학사적으로 볼 때 漢나라 때 이룩한 가장 큰 공헌은 바로 武帝 때에 정식으로 樂府를 세웠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선 시기에 이미 樂府令이라는 관직이 설치되기도 했지만, 이때에 와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정비되어 시가를 채집하고 악기에 맞추어 음악화 시키는 담당 관리를 두었다. 그리하여 서정적인 시가를 포함한 아름답고 애잔한 가요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한 중엽부터는 문인들도 자각이 생기기 시작하여 그들의 작품에 어느 정도의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賦>나 산문은 여전히 의고적이고 수사를 중요시하였지만 樂府詩라던가, 樂府詩로부터 발달한 五言古詩는 가벼운 리듬과 청신한 문장으로 새로운 서정의 세계를 개척하여 개성적인 문학이 발전하게 하였다. 민간에서 널리 구전되던 시들을 채집한 것은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였지만, 한 대의 樂府처럼 정식화되지는 않았었다. 漢대의 樂府의 설치는 그동안 전해져오던 시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漢대의 시가 문학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漢대에 정형화되어 발달한 樂府詩와 五言古詩는 후대의 문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어 唐대에는 시가 문학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발판을 마련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리하여 후세의 시인들도 樂府詩와 五言古詩를 많이 창작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들의 발전의 뒷면에는 漢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기 때문에 문인들이 그들의 문화생활을 잘 즐기고 시를 많이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樂府詩와 五言古詩는 漢나라에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시가문학이지만,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후대에도 많은 시인들에 의해서 지어졌다. 樂府詩는 특히 당나라 백거이가 新樂府 운동을 일으킬 만큼 시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고, 五言古詩도 역시 후대의 많은 시인들에 의해서 창작되었다. 樂府詩와 五言古詩는 어쩌면 시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중국문학사」, 김학주 저, 신아사
「악부시선」, 김학주 저, 명문당
「황하에 흐르는 명시」, 이해원 저, 현학사
「중국 역대 명시 감상」, 윤정현 저, 문음사
「역사 따라 배우는 중국문학사」, 이수웅 저, 다락원
「중국의 어제와 오늘」, 왕순홍 저, 평민사
「그림으로 읽는 중국 문학 오천년」, 빙심 외 3인 저, 예담
「중국 문학 산책」, 김해명, 백산 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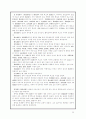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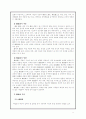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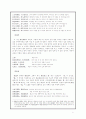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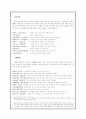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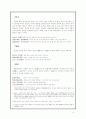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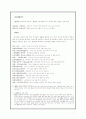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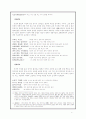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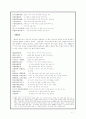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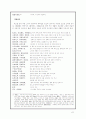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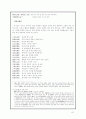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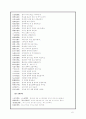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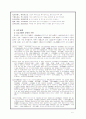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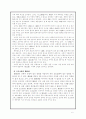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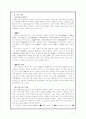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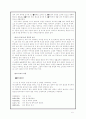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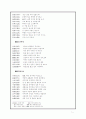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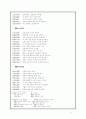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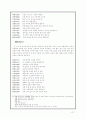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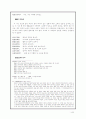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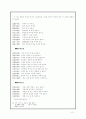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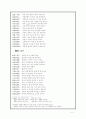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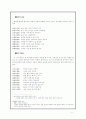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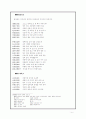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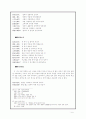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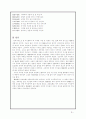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