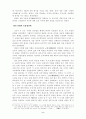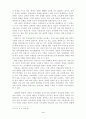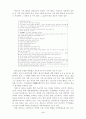목차
1) 成宗대 지배체제의 정비
불교 폐단의 시정과 유교 제도·문물의 정비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책
2) 중앙집권적 귀족정치의 이념과 최승로의 시무책
오조정적평
시무28조
3) 정치적 지배세력의 상황과 성격
정치적 지배 세력의 상황
당시 지배세력의 성격
불교 폐단의 시정과 유교 제도·문물의 정비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책
2) 중앙집권적 귀족정치의 이념과 최승로의 시무책
오조정적평
시무28조
3) 정치적 지배세력의 상황과 성격
정치적 지배 세력의 상황
당시 지배세력의 성격
본문내용
올려 성종의 개혁정치에 반영하게 하였다.
또한 과거에 합격한 유학자, 이를테면 성종의 배향공신 중 한명이었던 서희와 백사유, 유방헌, 김심언, 정우현 등도 정계에 많이 등용되어 중앙집권 체제에 힘썼다. 그 밖에 지공거를 지낸 유학자들까지 합쳐 약 22명의 인물을 보았을 때에, 성종의 지배세력은 신라 6두품 계열과 유신 계열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한 체제정비를 꾀했던 성종의 의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당시 지배세력의 성격
고려왕조는 계속적인 전쟁과 지방 호족들의 힘에 의하여 개창되고 후삼국 통일을 달성하여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고려 초에는 지방의 호족 출신이나 무공공신들이 핵심적인 지배세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종대에 들어 안정기로 접어든 고려는 중앙 집권적 유교정치를 필요로 하였으므로 전문적인 유신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방에 지지기반이 없는 유신들은 물론이고 호족 출신의 관료들도 중아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기반을 닦아 나아가게 되었다. 이들은 중앙에서 관직의 세습을 꾀하여 하나의 문벌 가문을 이욱하였는데, 그 예로 최승로 가문과 서희의 가문, 한언공의 가문 등이 있다.
성종대의 지배세력은 중앙에서의 관직생활을 바탕으로 권력과 정치적 지위를 축적해 갔다. 따라서 관직의 세습을 가능케 한 고려시대의 음서도 대략 성종조 무렵에 성립되었을 것이다. “(성종 16, 목종 즉위년)十二月 御威鳳樓 頒赦.. 文武官加一級 五品二上者 授蔭職”(<高麗史節要> 권 2). “穆宗卽位敎 文武五品以上者 授蔭職”(<高麗史> 권 75). 한국사 권 12 p.180 에서 발췌.
(음서에 대한 실제적인 사료는 목종 즉위년에 처음 보이지만 이미 성종대부터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성종대의 지배세력들이 서서히 귀족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관직생활의 대가로 전시과라는 토지를 받음으로써 경제적인 토대를 구축해 가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현종 12년에 보이는 功蔭田의 존재도 이미 성종대 무렵에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된다.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점차 경제적 부 역시도 세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중앙관료로 귀족화되기 시작하면서 지방에 남아 있던 그들의 친족과는 구분되기 시작했으며, 이 것에서 중앙관료가 범죄를 범했을때 고향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歸鄕이 형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성종대의 지배세력은 신라의 6두품 계열, 과거 합격자를 비롯한 유신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것은 유교적 정치이념을 추구한 당시의 상황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도 약간의 대립과 갈등은 있었는데, 최승로 계열과 서희 계열이 그것이다. 최승로 계열은 적극적으로 성종의 유교정책과 중화정책을 지지하였고 서희 계열은 이러한 성종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통을 중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보장을 토대로 자신들의 지위를 세습시키고자 하였으며, 여기서 음서제와 공음전, 귀향죄 등이 탄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에 합격한 유학자, 이를테면 성종의 배향공신 중 한명이었던 서희와 백사유, 유방헌, 김심언, 정우현 등도 정계에 많이 등용되어 중앙집권 체제에 힘썼다. 그 밖에 지공거를 지낸 유학자들까지 합쳐 약 22명의 인물을 보았을 때에, 성종의 지배세력은 신라 6두품 계열과 유신 계열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한 체제정비를 꾀했던 성종의 의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당시 지배세력의 성격
고려왕조는 계속적인 전쟁과 지방 호족들의 힘에 의하여 개창되고 후삼국 통일을 달성하여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고려 초에는 지방의 호족 출신이나 무공공신들이 핵심적인 지배세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종대에 들어 안정기로 접어든 고려는 중앙 집권적 유교정치를 필요로 하였으므로 전문적인 유신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방에 지지기반이 없는 유신들은 물론이고 호족 출신의 관료들도 중아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기반을 닦아 나아가게 되었다. 이들은 중앙에서 관직의 세습을 꾀하여 하나의 문벌 가문을 이욱하였는데, 그 예로 최승로 가문과 서희의 가문, 한언공의 가문 등이 있다.
성종대의 지배세력은 중앙에서의 관직생활을 바탕으로 권력과 정치적 지위를 축적해 갔다. 따라서 관직의 세습을 가능케 한 고려시대의 음서도 대략 성종조 무렵에 성립되었을 것이다. “(성종 16, 목종 즉위년)十二月 御威鳳樓 頒赦.. 文武官加一級 五品二上者 授蔭職”(<高麗史節要> 권 2). “穆宗卽位敎 文武五品以上者 授蔭職”(<高麗史> 권 75). 한국사 권 12 p.180 에서 발췌.
(음서에 대한 실제적인 사료는 목종 즉위년에 처음 보이지만 이미 성종대부터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성종대의 지배세력들이 서서히 귀족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관직생활의 대가로 전시과라는 토지를 받음으로써 경제적인 토대를 구축해 가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현종 12년에 보이는 功蔭田의 존재도 이미 성종대 무렵에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된다.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점차 경제적 부 역시도 세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중앙관료로 귀족화되기 시작하면서 지방에 남아 있던 그들의 친족과는 구분되기 시작했으며, 이 것에서 중앙관료가 범죄를 범했을때 고향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歸鄕이 형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성종대의 지배세력은 신라의 6두품 계열, 과거 합격자를 비롯한 유신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것은 유교적 정치이념을 추구한 당시의 상황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도 약간의 대립과 갈등은 있었는데, 최승로 계열과 서희 계열이 그것이다. 최승로 계열은 적극적으로 성종의 유교정책과 중화정책을 지지하였고 서희 계열은 이러한 성종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통을 중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보장을 토대로 자신들의 지위를 세습시키고자 하였으며, 여기서 음서제와 공음전, 귀향죄 등이 탄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