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주현군과 주진군
1) 주현군과 농민
(1)주현군의성립
(2) 주현군의 성격
2) 주진군과 국방체제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3) 주진군의 임무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1) 주현군과 농민
(1)주현군의성립
(2) 주현군의 성격
2) 주진군과 국방체제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3) 주진군의 임무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본문내용
방법과 공성 무기를 동원하여 귀주성을 함락시키려고 했으나 박서의 지휘 하에 귀주 수비군은 성을 굳게 지켜냈다. 고려군은 이후에도 끝까지 귀주성을 빼앗기지 않았지만 고려와 몽고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통에 고종 19년 정월 어쩔 수 없이 몽고군에 항복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귀주성 방어에 주진군의 역할이 컸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바일 것이다.
귀주성 방어에서 드러나 있는 것처럼 주진군의 전술은 주진을 둘러싼 성에 의지하여 굳게 지키는 堅壁固守를 기본으로 하였는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틈을 보아 성의 병력을 이끌고 나가 적을 공격하는 引兵出擊의 전술을 행하여 적에게 타격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백성과 재물을 모두 성 안이나 섬으로 옮기는 한편 그 나머지는 전부 불살라 적이 거처할 집과 양식을 없애는 淸野戰術을 병행하기도 했다. 견벽고수의 전술 수행을 위해서는 적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성곽이 중요했으므로 양계 주진의 성에는 망루를 비롯하여 적의 공격을 견디어 낼 수 있는 각종 시설물들과 성을 지키기 위한 무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아울러 지구전인 견벽고수의 전술을 성공시키기 위해 군량의 확보를 위한 屯田이 설치되어 있었다.
적군의 본격적인 침입에 대한 방어 외에도 주진군은 戍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戍는 규모가 작은 성책으로써 소수의 주둔군만이 있었다는 점에서 수의 존재는 접적지역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있었던 주진군의 전방초소와도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방수군의 최고 지휘관인 防戍將軍이 주진군의 지휘계통이 아니었다는 점은 양계 주진에는 도령 이하 장상장교들의 지휘를 받는 주진군과 방수장군이 지휘하는 방수군이라는, 지휘계통이 다른 두 개의 군사조직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州鎭軍의 상비군은 각 주진의 주민들 중 무재가 있는 자를 선군하여 구성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주진군의 예비군적인 부대들 역시도 각 주진에 거주하였던 주민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상비군에 소속된 군인들 중 장상장교 된 이가 있었다는 기록과 주진군의 최고 지휘관인 도령이 각 주진의 지방 세력가들이었다는 점은 상비군의 군인들은 물론 지휘관들까지도 각 주진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이밖에 원주지에 가족을 남겨두고 주진에 입거한 군인인 州鎭入居軍人 역시도 주진군에 넣어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投化軍의 존재에서 투화한 여진인들 중 주진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진군에는 兩班에서부터 所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신분의 소유자들이 소속되어 있었지만 주진군 소속 군인의 대부분은 농민이었을 것이다. 가령 백정군은 州鎭屯田軍으로서 둔전의 경작에 동원되었을 것이고, 주진의 상비군들도 토지를 소유하고 농경에 종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양계에서 거두어들인 조세는 군수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점에서 크게 보아 주진군은 둔전의 경작에 종사하건 그렇지 않았던 屯田軍的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귀주성 방어에서 드러나 있는 것처럼 주진군의 전술은 주진을 둘러싼 성에 의지하여 굳게 지키는 堅壁固守를 기본으로 하였는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틈을 보아 성의 병력을 이끌고 나가 적을 공격하는 引兵出擊의 전술을 행하여 적에게 타격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백성과 재물을 모두 성 안이나 섬으로 옮기는 한편 그 나머지는 전부 불살라 적이 거처할 집과 양식을 없애는 淸野戰術을 병행하기도 했다. 견벽고수의 전술 수행을 위해서는 적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성곽이 중요했으므로 양계 주진의 성에는 망루를 비롯하여 적의 공격을 견디어 낼 수 있는 각종 시설물들과 성을 지키기 위한 무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아울러 지구전인 견벽고수의 전술을 성공시키기 위해 군량의 확보를 위한 屯田이 설치되어 있었다.
적군의 본격적인 침입에 대한 방어 외에도 주진군은 戍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戍는 규모가 작은 성책으로써 소수의 주둔군만이 있었다는 점에서 수의 존재는 접적지역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있었던 주진군의 전방초소와도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방수군의 최고 지휘관인 防戍將軍이 주진군의 지휘계통이 아니었다는 점은 양계 주진에는 도령 이하 장상장교들의 지휘를 받는 주진군과 방수장군이 지휘하는 방수군이라는, 지휘계통이 다른 두 개의 군사조직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州鎭軍의 상비군은 각 주진의 주민들 중 무재가 있는 자를 선군하여 구성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주진군의 예비군적인 부대들 역시도 각 주진에 거주하였던 주민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상비군에 소속된 군인들 중 장상장교 된 이가 있었다는 기록과 주진군의 최고 지휘관인 도령이 각 주진의 지방 세력가들이었다는 점은 상비군의 군인들은 물론 지휘관들까지도 각 주진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이밖에 원주지에 가족을 남겨두고 주진에 입거한 군인인 州鎭入居軍人 역시도 주진군에 넣어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投化軍의 존재에서 투화한 여진인들 중 주진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진군에는 兩班에서부터 所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신분의 소유자들이 소속되어 있었지만 주진군 소속 군인의 대부분은 농민이었을 것이다. 가령 백정군은 州鎭屯田軍으로서 둔전의 경작에 동원되었을 것이고, 주진의 상비군들도 토지를 소유하고 농경에 종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양계에서 거두어들인 조세는 군수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점에서 크게 보아 주진군은 둔전의 경작에 종사하건 그렇지 않았던 屯田軍的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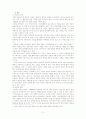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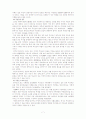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