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고조선의 건국신화
2) 동이족과 그 문화권
(1) 지석묘(고인돌) 문화
(2) 비파형청동단검문화
3) 고조선의 주민과 예맥
4) 고조선의 건국연대
5)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1) 고조선의 위치문제
(2) 문헌에 나타난 고조선의 영역
3.결론
2. 본론
1) 고조선의 건국신화
2) 동이족과 그 문화권
(1) 지석묘(고인돌) 문화
(2) 비파형청동단검문화
3) 고조선의 주민과 예맥
4) 고조선의 건국연대
5)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1) 고조선의 위치문제
(2) 문헌에 나타난 고조선의 영역
3.결론
본문내용
다는 요동중심설을 1960년대 이후 북한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학계의 공식적 견해로 자리잡은 요동중심설은 실학자들의 연구성과와 이를 계승한 민족주의 사학자로 지칭되는 신채호와 정인보 등의 견해를 계승한 것이다. 요동중심설은 大凌河를 고조선의 국경선인 沛水로 보고 오니하를 왕검성의 浿水라고 비정하여 고조선의 중심지를 오늘날의 蓋平으로 보는 견해이다.
다. 중심지 이동설
고조선의 중심지이동설은 요동중심설과 대동강 중심설의 절충적 측면이 강한 견해로서 두 지역에 공존하는 고고학적 자료와 고조선 관련 문헌의 합리적 해석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즉 전기 고조선의 중심지는 요동지역이었으나 후기에는 중국세력의 확장에 따라 그 중심지를 한반도 서북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논리이다.
고조선의 중심지이동설은 우선 사료에 나타나는 이른바 기자동래설을 중시하여 이를 기자족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요령지방 청동기문화의 담당자는 조선족이었고 연의 동방진출에 의하여 고조선의 중심지가 동쪽으로 이동하였다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중심지 이동설의 또다른 견해로는 고조선의 발전과 전개과정을 기왕에 진행한 신라형성사 연구의 틀을 원용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조선의 위치문제에 대해 이동론적 입장에서 서술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초기 고조선의 중심지는 요동이었는데 뒤에 燕將 秦開 의 공격에 의해 평양지역으로 이동하였다고 본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고조선 후기에 중심지가 이동하였다는 견해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2) 문헌에 나타난 고조선의 영역
가. 춘추전국시기 고조선의 영역
고조선과 관련된 문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사의 전개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속에서 고조선의 존재 시기와 정치적 성격 및 지리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선진시대 문헌에 나타나 있는 조선은 적어도 기원전 7세기경 춘추시대의 중국인들이 교역을 한 대상이었으며 정치적 복속문제도 염두해 두고 있는 존재였다. 또한 전국시대 문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연나라와의 지역적 인접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지명으로 열양요동 등이 나타나 있다. 전국 초기의 고조선은 연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세와 대등한 정치군사적 역량을 보여주는 등 연에 대해 위협세력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중반 연의 昭王 때에 이루어진 진개에 의한 동호 공략과 고조선 공략으로 고조선은 연에 의해 서쪽 경계의 영역을 축소당하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나. 진의 중국통일과 고조선의 영역
진에 의한 중국의 통일시기에는 앞서 연의 동방침략에 의해 구축된 고조선과의 경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치적 관계가 보다 밀접하게 전개되었다.
진한대 요동의 위치에 관한 현재의 논의는 요하라는 견해와 난하라는 견해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조선의 중심지가 한반도인가 또는 현재의 요동지역인가라는 문제 및 고조선의 강역이 어디까지 미쳤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이다.
3.결론
고조선은 중국세력과의 끊임없는 갈등속에서 때로는 일시적으로 복속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립을 견지하면서 계속 연진세력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이 시기에 고조선의 정치군사적 역량이 연진과 같은 중국세력을 상대할 만큼의 국가적 수준이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조선은 중국의 하나라보다 무려 1백여년이나 앞서 실존했던 국가였으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민족의 뿌리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에 위치한 북방식 고인돌(지석묘)
남한에서 가장 큰 북방식 고인돌로 덮개돌의 무게가 무려 50t에 달한다
1963년 사적 제137호로 지정됐다
보충지도
다. 중심지 이동설
고조선의 중심지이동설은 요동중심설과 대동강 중심설의 절충적 측면이 강한 견해로서 두 지역에 공존하는 고고학적 자료와 고조선 관련 문헌의 합리적 해석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즉 전기 고조선의 중심지는 요동지역이었으나 후기에는 중국세력의 확장에 따라 그 중심지를 한반도 서북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논리이다.
고조선의 중심지이동설은 우선 사료에 나타나는 이른바 기자동래설을 중시하여 이를 기자족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요령지방 청동기문화의 담당자는 조선족이었고 연의 동방진출에 의하여 고조선의 중심지가 동쪽으로 이동하였다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중심지 이동설의 또다른 견해로는 고조선의 발전과 전개과정을 기왕에 진행한 신라형성사 연구의 틀을 원용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조선의 위치문제에 대해 이동론적 입장에서 서술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초기 고조선의 중심지는 요동이었는데 뒤에 燕將 秦開 의 공격에 의해 평양지역으로 이동하였다고 본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고조선 후기에 중심지가 이동하였다는 견해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2) 문헌에 나타난 고조선의 영역
가. 춘추전국시기 고조선의 영역
고조선과 관련된 문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사의 전개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속에서 고조선의 존재 시기와 정치적 성격 및 지리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선진시대 문헌에 나타나 있는 조선은 적어도 기원전 7세기경 춘추시대의 중국인들이 교역을 한 대상이었으며 정치적 복속문제도 염두해 두고 있는 존재였다. 또한 전국시대 문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연나라와의 지역적 인접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지명으로 열양요동 등이 나타나 있다. 전국 초기의 고조선은 연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세와 대등한 정치군사적 역량을 보여주는 등 연에 대해 위협세력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중반 연의 昭王 때에 이루어진 진개에 의한 동호 공략과 고조선 공략으로 고조선은 연에 의해 서쪽 경계의 영역을 축소당하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나. 진의 중국통일과 고조선의 영역
진에 의한 중국의 통일시기에는 앞서 연의 동방침략에 의해 구축된 고조선과의 경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치적 관계가 보다 밀접하게 전개되었다.
진한대 요동의 위치에 관한 현재의 논의는 요하라는 견해와 난하라는 견해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조선의 중심지가 한반도인가 또는 현재의 요동지역인가라는 문제 및 고조선의 강역이 어디까지 미쳤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이다.
3.결론
고조선은 중국세력과의 끊임없는 갈등속에서 때로는 일시적으로 복속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립을 견지하면서 계속 연진세력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이 시기에 고조선의 정치군사적 역량이 연진과 같은 중국세력을 상대할 만큼의 국가적 수준이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조선은 중국의 하나라보다 무려 1백여년이나 앞서 실존했던 국가였으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민족의 뿌리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에 위치한 북방식 고인돌(지석묘)
남한에서 가장 큰 북방식 고인돌로 덮개돌의 무게가 무려 50t에 달한다
1963년 사적 제137호로 지정됐다
보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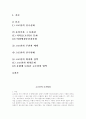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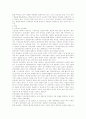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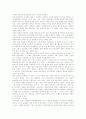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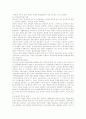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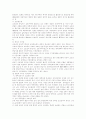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