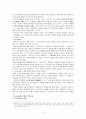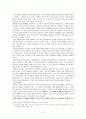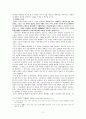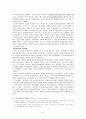목차
1. 백제의 기원
1) 백제 초기사를 보는 시각
2) 건국설화
3) 건국집단의 기원과 주민구성
2. 백제의 성립과 발전
1) 백제국과 목지국
2) 백제국 성장의 배경
3) 백제국의 성장
4)정복전쟁과 마한통합
1) 백제 초기사를 보는 시각
2) 건국설화
3) 건국집단의 기원과 주민구성
2. 백제의 성립과 발전
1) 백제국과 목지국
2) 백제국 성장의 배경
3) 백제국의 성장
4)정복전쟁과 마한통합
본문내용
利 등의 항복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가야정벌」은 군사적인 무력침공이라기보다는 백제를 정점으로 낙동강 하류의 7국이 동맹을 맺거나 통교하게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설화적으로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백제가 가야지역에 진출한 이유는 왜와의 교역로를 확고하게 장악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이외에도 고구려와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후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근초고왕 19년(364) 구조 등 백제 사신 3명이 왜와의 통교를 위해 파견되고, 근초고왕 22년 백제가 신라와 동시에 왜에 교역단을 파견하였는데, 백제와 신라 양국은 왜와의 독점적인 교역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였으나 백제측의 우세로 끝나게 되었다. 이후 백제는 왜와의 교역 독점을 통해 동아시아 교역권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침미다례와 비리 등에 대한 정벌은 교역로의 확보와 마한 잔여세력의 통합이라는 측면이 결부되었을 것이다. 침미다례는 마한 잔여세력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세력으로 지금의 강진이나 해남지역으로 비정되며, 비리 등도 대개 오늘날의 전남 해안지방에 비정되어 근초고왕 24년 이전 백제의 영토는 이미 노령산맥 이북까지 확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통합은 내부의 지배세력들을 온존시키면서 이들을 통한 공납적 지배의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다. 근초고왕대의 마한통합은 불완전한 것이어서 일원적인 지방제도의 정비와 지방관의 파견으로까지 진전되지는 못하였으나 이때부터 백제는 전체 마한 세력을 대표하게 되었다.
낙랑대방의 축출 이후 고구려와의 관계는 4세기 전반부터 중반까지는 자료의 공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완충지대가 없어 국경을 직접 맞닿게 된 양국이 대방의 옛땅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팽팽하던 긴장관계는 마침내 근초고왕 24년(고구려 고국원왕 39) 폭발하였는데 이때 백제는 황주에서 신계를 잇는 선까지 진출하였던 것 같다.
대고구려전의 성공적인 수행, 왜와의 교역로 확보와 가야지역에 대한 영량력 증대, 마한 잔여세력의 통합이 일단락된 후, 근초고왕은 佰濟國王으로서 북부 마한연맹의 영도권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馬韓主」가 아니라 전체 마한을 아우른 「百濟王」을 칭하게 되었다. 근초고왕 27년(372) 왕은 동진에 사신을 보냈고, ‘鎭東將軍 領樂浪太守’에 제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伯濟國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흡수되어 들어온 다양한 세력들의 활동과 경험들을 백제 전체의 역사로 용해시키고, 왕실 내부적으로 초고계를 근간으로 하는 일원적 계보를 마련하는 목적성을 띤- 백제 조정의 공식적인 역사서인 《書記》가 편찬되었다. 물론 내용의 많은 부분이 당시 근초고왕의 치적을 과시하는 데 할애되었을 것이다. 당시 백제의 국력과 왕권의 성장은 서울시 석촌동 3호분 이 무덤은 시기적으로 4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에 해당되는, 한 변의 길이가 50m에 달하는 초대형의 적석묘이다.
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묻힌 피장자는 근초고왕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초고왕 19년(364) 구조 등 백제 사신 3명이 왜와의 통교를 위해 파견되고, 근초고왕 22년 백제가 신라와 동시에 왜에 교역단을 파견하였는데, 백제와 신라 양국은 왜와의 독점적인 교역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였으나 백제측의 우세로 끝나게 되었다. 이후 백제는 왜와의 교역 독점을 통해 동아시아 교역권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침미다례와 비리 등에 대한 정벌은 교역로의 확보와 마한 잔여세력의 통합이라는 측면이 결부되었을 것이다. 침미다례는 마한 잔여세력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세력으로 지금의 강진이나 해남지역으로 비정되며, 비리 등도 대개 오늘날의 전남 해안지방에 비정되어 근초고왕 24년 이전 백제의 영토는 이미 노령산맥 이북까지 확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통합은 내부의 지배세력들을 온존시키면서 이들을 통한 공납적 지배의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다. 근초고왕대의 마한통합은 불완전한 것이어서 일원적인 지방제도의 정비와 지방관의 파견으로까지 진전되지는 못하였으나 이때부터 백제는 전체 마한 세력을 대표하게 되었다.
낙랑대방의 축출 이후 고구려와의 관계는 4세기 전반부터 중반까지는 자료의 공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완충지대가 없어 국경을 직접 맞닿게 된 양국이 대방의 옛땅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팽팽하던 긴장관계는 마침내 근초고왕 24년(고구려 고국원왕 39) 폭발하였는데 이때 백제는 황주에서 신계를 잇는 선까지 진출하였던 것 같다.
대고구려전의 성공적인 수행, 왜와의 교역로 확보와 가야지역에 대한 영량력 증대, 마한 잔여세력의 통합이 일단락된 후, 근초고왕은 佰濟國王으로서 북부 마한연맹의 영도권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馬韓主」가 아니라 전체 마한을 아우른 「百濟王」을 칭하게 되었다. 근초고왕 27년(372) 왕은 동진에 사신을 보냈고, ‘鎭東將軍 領樂浪太守’에 제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伯濟國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흡수되어 들어온 다양한 세력들의 활동과 경험들을 백제 전체의 역사로 용해시키고, 왕실 내부적으로 초고계를 근간으로 하는 일원적 계보를 마련하는 목적성을 띤- 백제 조정의 공식적인 역사서인 《書記》가 편찬되었다. 물론 내용의 많은 부분이 당시 근초고왕의 치적을 과시하는 데 할애되었을 것이다. 당시 백제의 국력과 왕권의 성장은 서울시 석촌동 3호분 이 무덤은 시기적으로 4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에 해당되는, 한 변의 길이가 50m에 달하는 초대형의 적석묘이다.
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묻힌 피장자는 근초고왕으로 추정되고 있다.
키워드
추천자료
 과학교육 성립 배경의 변천
과학교육 성립 배경의 변천 고구려의 성립과 발달과정
고구려의 성립과 발달과정 신라의 성립과 변천
신라의 성립과 변천 삼국의 정립과 발전
삼국의 정립과 발전 한국 고대국가 구조와 부체제 논쟁
한국 고대국가 구조와 부체제 논쟁 신라의 성립과 변천
신라의 성립과 변천 부체제의_성립과_그_구조
부체제의_성립과_그_구조 초기 국가의 성립
초기 국가의 성립 [고구려][고구려시대][고구려문화][고구려의 문화][삼국시대]고구려의 성립, 고구려의 정복활...
[고구려][고구려시대][고구려문화][고구려의 문화][삼국시대]고구려의 성립, 고구려의 정복활... [차(茶)][차(茶) 기원][차(茶) 역사][차(茶) 성분][차(茶) 효능]차(茶)의 기원, 차(茶)의 개...
[차(茶)][차(茶) 기원][차(茶) 역사][차(茶) 성분][차(茶) 효능]차(茶)의 기원, 차(茶)의 개... 고대사회의 구조와 중세사회의 성립
고대사회의 구조와 중세사회의 성립 궁예, 견훤, 왕건 - 후 삼국의 성립, 궁예와 견훤의 몰락, 와건의 통일과 그 배경
궁예, 견훤, 왕건 - 후 삼국의 성립, 궁예와 견훤의 몰락, 와건의 통일과 그 배경 일본역사(일본사)와 고대국가성립, 고대사회, 일본역사(일본사)와 봉건사회, 율령정치, 일본...
일본역사(일본사)와 고대국가성립, 고대사회, 일본역사(일본사)와 봉건사회, 율령정치, 일본... 역사 과목 정리삼국의 발전에 관한 내용정리
역사 과목 정리삼국의 발전에 관한 내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