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 관청수공업
(1) 관청수공업의 관리체계
(2) 관청수공업의 내부분업
(3) 관청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2) 소 수공업
(1) 소 수공업의 형성
(2) 수공업 소의 구조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3) 민간수공업
(1) 민간수공업의 분업과 관청수공업
(2) 농촌의 가내수공업
(3) 민간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4) 사원수공업
1) 관청수공업
(1) 관청수공업의 관리체계
(2) 관청수공업의 내부분업
(3) 관청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2) 소 수공업
(1) 소 수공업의 형성
(2) 수공업 소의 구조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3) 민간수공업
(1) 민간수공업의 분업과 관청수공업
(2) 농촌의 가내수공업
(3) 민간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4) 사원수공업
본문내용
가내수공업이었다. 농민들의 가내수공업은 대체로 자가수요를 위한 의료생산과 관부에 납부하기 위한 포물류의 생산이었다.
고려의 직조수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모시 직조업과 마직업이었다. 베는 고려시대 농민들의 기본적인 옷감으로서 사회적 수요가 많았으므로 민간수공업으로 광범하게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모시 직조업도 비교적 광범위한 소비대상을 가진 생산부문이었다. 당시에 모시와 베는 그 대부분이 농민들의 가내수공업으로 생산되었는데 그들은 자체의 수요 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공물로서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농민들의 가내수공업으로 직조수공업이 발전한 것과 함께 참대제품과 자리수공업 및 제지수공업이 또한 민간수공업으로서 발전하였다. 경상도 양산은 일찍부터 참대산지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산주민들은 참대제품 수공업을 중요한 생업의 하나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므로 양산 주민들은 집집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대로 각종 용구들을 만들어 딴 물건과 교환하였으며 의식, 조세 그리고 공물도 전적으로 참대수공업에 의존하는 형편이었다.
이와 함께 고려시대에는 민간수공업으로서 왕골을 원료로 하여 돗자리를 엮으며 방석이나 그 밖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자리수공업이 발전하였다. 당시에 왕골돗자리와 방석들은 만화석, 만화방석 등의 이름으로 외국에 수출되어 호평을 받았다. 돗자리방석 등을 만드는 수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경상도의 일부지역들은 자리수공업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그 중에서도 경상도 안동지방은 대표적인 자리수공업산지였다.
제지업도 한층 발전하여 질적으로도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 전주는 종이의 명산지로 알려졌으며, 특히 명표지는 그 질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고려시기에는 전주의 명표지 뿐만 아니라 백추지견지청지아청지 등 다양한 종이들이 생산되었다. 특히 견지는 마치 누에 고치실로 만든 것같이 희고 질기며 고상한 품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까지 호평을 받았다.
고려시대의 직조품들은 상품으로서 널리 유통되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베는 현물화폐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이리하여 직조업과 시장과의 관련이 강화되었고, 그것이 직조수공업의 발전을 자극한 요인이 되었다. 한편 수공업 중심지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폐쇄적인 자연경제가 지배하는 조건 아래에서도, 수공업 상품생산이 일정한 정도로 발전하였음을 말해 준다.
(3) 민간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고려시대에 수공업자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혹한 수탈을 당하였다. 관청수공업장에 징발된 수공업자들과 所 수공업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공업자들은 수공업제품들을 지방관원들에게 납부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을 대상으로 징수할 각종 수공업제품의 양을 규정하였다. 이런 수취의 양은 그 자체만으로도 과중한 것이었다.
수공업자들은 자기들의 노동생산물을 공물로 내야 했을 뿐만아니라 수시로 각종 부역노동에 징발되어 기술노동을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해야만 했고 또한 군대에 복무하는 의무도 져야 했다. 수공업자들은 고려초기이래 계속 진행된 수도의 성과 궁전 건축에 수시로 징발되었다. 당시에는 수도 개경의 도성건축을 비롯하여 서북동북지방의 국방경비를 위하여 많은 성들이 축조되었다.
고려시기에 수공업자들은 귀족층의 불교승상 때문에 끊임없이 진행되던 사원축조에도 자주 징발되어 부역노동을 강요당하였다. 이러한 건축공사는 단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공업자들은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생계를 위한 수공업경영마저 지탱할 수 없었다.
고려시기의 수공업자들은 또한 일품군이란 명목으로 지방군에 포함되어 공역군으로 복무하였다. 고려시기의 주현에는 지방군이 조직되어 해당 지방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해당 주현군의 부대편성은 중앙군과 마찬가지로 보승정용 등이 있었으며 그밖에 일품군이 있었다. 주현의 지방공병부대로서의 일품군은 북계동계를 제외한 중부 이남의 이른바 5도의 주군현에 배치되어 있었다. 일품군 외에 또한 2, 3품군이 있었는데 이들은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외독자들로서 자기 마을에 그대로 있으면서 향토보위도 하고 부모봉양도 하게끔 편성된 공역군이었다. 그러나 부모가 죽으면 일반 일품군과 마찬가지로 주현의 공역군으로 복무하여야 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민간수공업자들은 그들이 생산한 노동생산물을 공물이란 명목으로 현물 그대로 수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품군, 공장, 전장이란 명목으로 군대에 끌려나가 공역군으로서 고된 기술노동을 강요당하였다. 특히 각 주의 일품군은 2교대로 나뉘어 가을에 맞교대를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품군에 징발되면 공농일치의 원칙에 기초하여 생활하던 수공업자들은 농사철을 잃기 마련이었다. 이렇게 최소한의 생활도 영위할 수 없었던 수공업자들의 생활형편은 매우 비참했다. 그러나 직접 생산자인 민간수공업자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들의 생산활동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적지 않은 기술을 개발시켰다.
4) 사원수공업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발달하고 사원경제가 향상되었으므로 사원의 수와 승려의 수가 증가하였고, 따라서 사원의 수공업품 수요가 증대되어 스스로 이를 지급하기에 이르러 사원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사원수공업은 대개 직포업과 제와업, 그리고 제염업 등에서 발달하였는데 처음에는 자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운영된 것이었으나 차차 생산이 증대하여 민간의 수요들을 조달하기에 이르렀다.
사원에서는 직물류를 짜는 이외에도 기와를 굽는 승려도 있었다. 즉 충렬왕이 승려 六然을 강화도에 보내 琉璃瓦를 굽게 하였으며 육연은 광주의 義安土를 가져다가 黃丹을 많이 사용해서 유리와를 구웠는데 품질과 색상이 아주 뛰어나 시상들이 파는 것보다 우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유리와 같은 것은 승려들이 직접 생산했다기 보다는 사원노비들이 주된 생산자였다고 여겨진다.
사원의 이러한 수공업품들은 자가수요에 충당되기도 하였지만, 그 제품의 질이 일반 민간수공업품보다 우수하여 상품으로서도 중요한 구실을 하여 상업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원의 상행위는 사원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많은 폐단을 야기시켰다.
고려의 직조수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모시 직조업과 마직업이었다. 베는 고려시대 농민들의 기본적인 옷감으로서 사회적 수요가 많았으므로 민간수공업으로 광범하게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모시 직조업도 비교적 광범위한 소비대상을 가진 생산부문이었다. 당시에 모시와 베는 그 대부분이 농민들의 가내수공업으로 생산되었는데 그들은 자체의 수요 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공물로서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농민들의 가내수공업으로 직조수공업이 발전한 것과 함께 참대제품과 자리수공업 및 제지수공업이 또한 민간수공업으로서 발전하였다. 경상도 양산은 일찍부터 참대산지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산주민들은 참대제품 수공업을 중요한 생업의 하나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므로 양산 주민들은 집집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대로 각종 용구들을 만들어 딴 물건과 교환하였으며 의식, 조세 그리고 공물도 전적으로 참대수공업에 의존하는 형편이었다.
이와 함께 고려시대에는 민간수공업으로서 왕골을 원료로 하여 돗자리를 엮으며 방석이나 그 밖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자리수공업이 발전하였다. 당시에 왕골돗자리와 방석들은 만화석, 만화방석 등의 이름으로 외국에 수출되어 호평을 받았다. 돗자리방석 등을 만드는 수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경상도의 일부지역들은 자리수공업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그 중에서도 경상도 안동지방은 대표적인 자리수공업산지였다.
제지업도 한층 발전하여 질적으로도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 전주는 종이의 명산지로 알려졌으며, 특히 명표지는 그 질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고려시기에는 전주의 명표지 뿐만 아니라 백추지견지청지아청지 등 다양한 종이들이 생산되었다. 특히 견지는 마치 누에 고치실로 만든 것같이 희고 질기며 고상한 품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까지 호평을 받았다.
고려시대의 직조품들은 상품으로서 널리 유통되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베는 현물화폐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이리하여 직조업과 시장과의 관련이 강화되었고, 그것이 직조수공업의 발전을 자극한 요인이 되었다. 한편 수공업 중심지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폐쇄적인 자연경제가 지배하는 조건 아래에서도, 수공업 상품생산이 일정한 정도로 발전하였음을 말해 준다.
(3) 민간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고려시대에 수공업자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혹한 수탈을 당하였다. 관청수공업장에 징발된 수공업자들과 所 수공업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공업자들은 수공업제품들을 지방관원들에게 납부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을 대상으로 징수할 각종 수공업제품의 양을 규정하였다. 이런 수취의 양은 그 자체만으로도 과중한 것이었다.
수공업자들은 자기들의 노동생산물을 공물로 내야 했을 뿐만아니라 수시로 각종 부역노동에 징발되어 기술노동을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해야만 했고 또한 군대에 복무하는 의무도 져야 했다. 수공업자들은 고려초기이래 계속 진행된 수도의 성과 궁전 건축에 수시로 징발되었다. 당시에는 수도 개경의 도성건축을 비롯하여 서북동북지방의 국방경비를 위하여 많은 성들이 축조되었다.
고려시기에 수공업자들은 귀족층의 불교승상 때문에 끊임없이 진행되던 사원축조에도 자주 징발되어 부역노동을 강요당하였다. 이러한 건축공사는 단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공업자들은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생계를 위한 수공업경영마저 지탱할 수 없었다.
고려시기의 수공업자들은 또한 일품군이란 명목으로 지방군에 포함되어 공역군으로 복무하였다. 고려시기의 주현에는 지방군이 조직되어 해당 지방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해당 주현군의 부대편성은 중앙군과 마찬가지로 보승정용 등이 있었으며 그밖에 일품군이 있었다. 주현의 지방공병부대로서의 일품군은 북계동계를 제외한 중부 이남의 이른바 5도의 주군현에 배치되어 있었다. 일품군 외에 또한 2, 3품군이 있었는데 이들은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외독자들로서 자기 마을에 그대로 있으면서 향토보위도 하고 부모봉양도 하게끔 편성된 공역군이었다. 그러나 부모가 죽으면 일반 일품군과 마찬가지로 주현의 공역군으로 복무하여야 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민간수공업자들은 그들이 생산한 노동생산물을 공물이란 명목으로 현물 그대로 수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품군, 공장, 전장이란 명목으로 군대에 끌려나가 공역군으로서 고된 기술노동을 강요당하였다. 특히 각 주의 일품군은 2교대로 나뉘어 가을에 맞교대를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품군에 징발되면 공농일치의 원칙에 기초하여 생활하던 수공업자들은 농사철을 잃기 마련이었다. 이렇게 최소한의 생활도 영위할 수 없었던 수공업자들의 생활형편은 매우 비참했다. 그러나 직접 생산자인 민간수공업자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들의 생산활동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적지 않은 기술을 개발시켰다.
4) 사원수공업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발달하고 사원경제가 향상되었으므로 사원의 수와 승려의 수가 증가하였고, 따라서 사원의 수공업품 수요가 증대되어 스스로 이를 지급하기에 이르러 사원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사원수공업은 대개 직포업과 제와업, 그리고 제염업 등에서 발달하였는데 처음에는 자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운영된 것이었으나 차차 생산이 증대하여 민간의 수요들을 조달하기에 이르렀다.
사원에서는 직물류를 짜는 이외에도 기와를 굽는 승려도 있었다. 즉 충렬왕이 승려 六然을 강화도에 보내 琉璃瓦를 굽게 하였으며 육연은 광주의 義安土를 가져다가 黃丹을 많이 사용해서 유리와를 구웠는데 품질과 색상이 아주 뛰어나 시상들이 파는 것보다 우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유리와 같은 것은 승려들이 직접 생산했다기 보다는 사원노비들이 주된 생산자였다고 여겨진다.
사원의 이러한 수공업품들은 자가수요에 충당되기도 하였지만, 그 제품의 질이 일반 민간수공업품보다 우수하여 상품으로서도 중요한 구실을 하여 상업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원의 상행위는 사원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많은 폐단을 야기시켰다.
추천자료
 [사회복지][사회복지운동단체][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체계][...
[사회복지][사회복지운동단체][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체계][... 류마티스관절염(류머티즘, 류머티스)의 발병과 원인, 류마티스관절염(류머티즘, 류머티스)의 ...
류마티스관절염(류머티즘, 류머티스)의 발병과 원인, 류마티스관절염(류머티즘, 류머티스)의 ... [현대사회와 범죄] 과제 국내의 대형범죄 고대성추행, 민간인불법사찰
[현대사회와 범죄] 과제 국내의 대형범죄 고대성추행, 민간인불법사찰 [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 중 노인의 ‘자살’을 주제로 하여 공공과 민간의 사회...
[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 중 노인의 ‘자살’을 주제로 하여 공공과 민간의 사회... 유아교육기관 평가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과제에 대해 제시하시오
유아교육기관 평가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과제에 대해 제시하시오 [관광산업유치]관광산업유치의 카드도입, 관광산업유치의 외국인투자(외국인직접투자, 외투),...
[관광산업유치]관광산업유치의 카드도입, 관광산업유치의 외국인투자(외국인직접투자, 외투),... 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탐구하고, 한가지 정책을 제시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는 방안에...
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탐구하고, 한가지 정책을 제시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는 방안에...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 중 노인의 자살을 주제로 하여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 중 노인의 자살을 주제로 하여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 사회복지시설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 사회복지시설의 동향을 대해 논하시오...
사회복지시설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 사회복지시설의 동향을 대해 논하시오...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환경, 운영관리, 건강과 영양, ...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환경, 운영관리, 건강과 영양, ...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용자관점, 민간기관 관점, 국가나 사...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용자관점, 민간기관 관점, 국가나 사... 사회복지의 재원(공공재원과 민간재원)
사회복지의 재원(공공재원과 민간재원) 사회복지의 주체(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의 재원)
사회복지의 주체(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의 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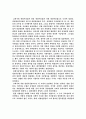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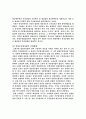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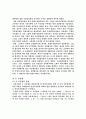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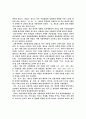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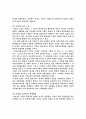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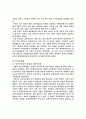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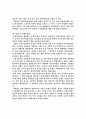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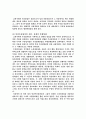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