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차례
성석제
- 웃음 속에 숨어 있는 슬픔의 미학 -
작가 연보
Ⅰ. 서론
성석제의 소설과 웃음
Ⅱ. 본론
1. 모자라는 인물
2. 반전의 웃음
3. 웃다가 우는 웃음
4. 작은 웃음
5. 글에서 피어나는 웃음
Ⅲ. 결론
성석제의 웃음과 문학 속에서의 웃음
Ⅳ. 참고자료
성석제
- 웃음 속에 숨어 있는 슬픔의 미학 -
작가 연보
Ⅰ. 서론
성석제의 소설과 웃음
Ⅱ. 본론
1. 모자라는 인물
2. 반전의 웃음
3. 웃다가 우는 웃음
4. 작은 웃음
5. 글에서 피어나는 웃음
Ⅲ. 결론
성석제의 웃음과 문학 속에서의 웃음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은 역사의 진실이나 법의 정의, 과학의 절대성, 수학의 보편성을 들어 절대적 진리나 위대한 진실을 표방한다. 이들은 각자의 언어가 사용자의 편견이나 개인적인 욕망에 물들지 않고 객관으로 진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석제는 어차피 인간의 말 속에는 거짓말이 담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역사는 승리자들에 의한 속임수이며, 경제학과 수학 역시 “거짓된 진실”을 유포하여 훨씬 악질적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다. 목욕탕에서 한 거구의 사내가 다른 욕객과 떨어져 고독하게 목욕을 하고 있는데 팔뚝에 ‘착하게 살자’라는 문신을 새기고 있었다는 이야기나 「세계화」가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성석제의 소설은 깊이를 지니게 된다.
2. 반전의 웃음.
성석제 소설 전반에는 황당함이 짙게 깔려 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황당한 사건들, 관계없이 따라오는 결말과 앞에 전개된 이야기를 모두 뒤엎는 결말 등 작은 사건에서 결말에 이르기까지 소설 속에서 황당함은 끊이지 않는다. 예상치 못했던 황당함은 소설에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석제 소설을 읽는 독자는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얼굴을 찌푸리거나 무릎을 치면서 혹은 배를 움켜쥐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황만근은 그날의 일을 수백 수천 번도 더 말했지만 처음과 다르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 그나저나 토끼가 너무 컸다. 토끼의 귀가 황만근의 머리보다 더 높이 솟아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토끼는 입을 움직이며 사람의 말을 했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토끼의 입술이 갈라진 사이로 황만근의 엄지손가락만한 날카로운 이가 반짝였다. 무슨 불빛이 있어서 반짝이기까지 했느냐고. 초봄이라 토끼고개에는 눈이 채 녹지 않고 있었다. 하다못해 별빛에라도.
“그기 뭔 소리라?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니가 뭐라꼬 집에 못간다 카나. 귀신이마 썩 물러가고 토끼만 착 엎디리라. 내가 너를 타고서라도 집에 갈란다.”
거대한 토끼는 황만근이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비린 냄새를 풍기면서 느릿하고 탁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집에 못 간다.”
황만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친 황만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표현이다)에 빨려드는 파리처럼 쑤욱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황만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힘을 썼다. 황만근을 빨아들이려는 공간은 아무것도 잡히자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려 들어오지 않는 황만근을 마저 끌어들이기 위해 온몸을 떨면서 뒷말을 든 채 버티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부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토끼는 황만근을 향해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나를 놓아라” 하고 말했다. 황만근은 오기가 나서 “택도 없는 소리 말거라. 니를 탕으로 끓이서 우리 어무이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서 먹어치울 끼다. 니 가죽을 빗기서 어무이 목도리를 하고 내 토시를 하고 장갑을 할 끼다. 니는 인자 죽었다, 자슥아” 하고 소리쳤다. 토끼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네 팔을 빼겠느냐.” 황만근은 팔을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고 있는데 토끼가 그렇게 물어오자 할말이 없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내 소원을 세 가지 들어주기 전에는 니까잇 거는 못 간다” 하고 말했다.
“네 소원이 뭐냐?”
“우리 어무이가 팥죽 할마이겉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팥죽 할마이란 팥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늘 팥죽을 쑤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째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씨는 모른다.)
토끼는 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몸을 소스라치게 떨더니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들어주었다. 그 다음은?”
“여우 겉은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
“송편을 세 번 먹으면 네 집으로 올 거다. 다음은 무엇이냐?”
“떡두깨(떡두꺼비) 겉은 아들이다.”
“마누라가 들어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준다. 이제 나를 놓아라.”
“내가 언제 니를 잡았나. 니가 가뿌리만 되지, 바보 자슥아.”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을 무섭게 부풀리더니 황만근의 얼굴에 뜨겁고 매운 김을 내뿜었다. 황만근이 눈을 뜨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간신히 눈을 떠보니 어느새 자신의 팔이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황만근의 주변에는 토끼 털이 무수히 떨어져 바늘처럼 바짝이고 있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中-
성석제는 픽션을 의식하지 않게 하는 리얼리티로 소설을 이끌어가다가 어느 특정한 부분에 완전한 허구의 이야기를 삽입한다. 이것은 무협지나 판타지를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다시 말해 전기적 요소를 소설 속에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법이 독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시킨다. 성석제는 이렇듯 비현실적인 얘기를 진지하게 마치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 양 진지하게 풀어나간다. 독자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진지하게 말하는 이야기꾼의 이야기에 웃음을 느끼게 된다.
바로 요 앞 파출소 앞에서 그 친구를 적발했는데, 첨엔 좋은 말로 타일러서 집에 보낼라 캤어요. 그러나 이 젊은 친구가 얼굴을 홍시겉이 빨가이 해가이고 뻘건 대낮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왜 하니, 단속을 할라마 측정을 해보라고 빠락빠락 대드는데 고마 덧정이 없데요. 지가 암만 객지에 와 산다 캐도, 객지에서는 십 년 아래는 호형호제라 캐도 여가 어덴데 지 맘대로 할라캐. 우리 파출소에 음주측정기가 없는 거를 알고서 그란 모양인데 이런 경우 우린 곧이곧대로 합니다이. 시범 케이스로다, 인생공부를 좀 시켜야겠다 해서 백차에 태와가이고 측정기가 있는 본서로 보냈심다. 오래간만에 본서에 들어간께 우리 직원들이 인사닦을 데가 좀 많겠심니까. 인사를 하는 동안에 이 인간이 온다간다 말도 없이 토
2. 반전의 웃음.
성석제 소설 전반에는 황당함이 짙게 깔려 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황당한 사건들, 관계없이 따라오는 결말과 앞에 전개된 이야기를 모두 뒤엎는 결말 등 작은 사건에서 결말에 이르기까지 소설 속에서 황당함은 끊이지 않는다. 예상치 못했던 황당함은 소설에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석제 소설을 읽는 독자는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얼굴을 찌푸리거나 무릎을 치면서 혹은 배를 움켜쥐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황만근은 그날의 일을 수백 수천 번도 더 말했지만 처음과 다르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 그나저나 토끼가 너무 컸다. 토끼의 귀가 황만근의 머리보다 더 높이 솟아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토끼는 입을 움직이며 사람의 말을 했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토끼의 입술이 갈라진 사이로 황만근의 엄지손가락만한 날카로운 이가 반짝였다. 무슨 불빛이 있어서 반짝이기까지 했느냐고. 초봄이라 토끼고개에는 눈이 채 녹지 않고 있었다. 하다못해 별빛에라도.
“그기 뭔 소리라?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니가 뭐라꼬 집에 못간다 카나. 귀신이마 썩 물러가고 토끼만 착 엎디리라. 내가 너를 타고서라도 집에 갈란다.”
거대한 토끼는 황만근이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비린 냄새를 풍기면서 느릿하고 탁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집에 못 간다.”
황만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친 황만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표현이다)에 빨려드는 파리처럼 쑤욱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황만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힘을 썼다. 황만근을 빨아들이려는 공간은 아무것도 잡히자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려 들어오지 않는 황만근을 마저 끌어들이기 위해 온몸을 떨면서 뒷말을 든 채 버티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부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토끼는 황만근을 향해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나를 놓아라” 하고 말했다. 황만근은 오기가 나서 “택도 없는 소리 말거라. 니를 탕으로 끓이서 우리 어무이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서 먹어치울 끼다. 니 가죽을 빗기서 어무이 목도리를 하고 내 토시를 하고 장갑을 할 끼다. 니는 인자 죽었다, 자슥아” 하고 소리쳤다. 토끼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네 팔을 빼겠느냐.” 황만근은 팔을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고 있는데 토끼가 그렇게 물어오자 할말이 없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내 소원을 세 가지 들어주기 전에는 니까잇 거는 못 간다” 하고 말했다.
“네 소원이 뭐냐?”
“우리 어무이가 팥죽 할마이겉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팥죽 할마이란 팥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늘 팥죽을 쑤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째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씨는 모른다.)
토끼는 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몸을 소스라치게 떨더니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들어주었다. 그 다음은?”
“여우 겉은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
“송편을 세 번 먹으면 네 집으로 올 거다. 다음은 무엇이냐?”
“떡두깨(떡두꺼비) 겉은 아들이다.”
“마누라가 들어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준다. 이제 나를 놓아라.”
“내가 언제 니를 잡았나. 니가 가뿌리만 되지, 바보 자슥아.”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을 무섭게 부풀리더니 황만근의 얼굴에 뜨겁고 매운 김을 내뿜었다. 황만근이 눈을 뜨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간신히 눈을 떠보니 어느새 자신의 팔이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황만근의 주변에는 토끼 털이 무수히 떨어져 바늘처럼 바짝이고 있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中-
성석제는 픽션을 의식하지 않게 하는 리얼리티로 소설을 이끌어가다가 어느 특정한 부분에 완전한 허구의 이야기를 삽입한다. 이것은 무협지나 판타지를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다시 말해 전기적 요소를 소설 속에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법이 독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시킨다. 성석제는 이렇듯 비현실적인 얘기를 진지하게 마치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 양 진지하게 풀어나간다. 독자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진지하게 말하는 이야기꾼의 이야기에 웃음을 느끼게 된다.
바로 요 앞 파출소 앞에서 그 친구를 적발했는데, 첨엔 좋은 말로 타일러서 집에 보낼라 캤어요. 그러나 이 젊은 친구가 얼굴을 홍시겉이 빨가이 해가이고 뻘건 대낮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왜 하니, 단속을 할라마 측정을 해보라고 빠락빠락 대드는데 고마 덧정이 없데요. 지가 암만 객지에 와 산다 캐도, 객지에서는 십 년 아래는 호형호제라 캐도 여가 어덴데 지 맘대로 할라캐. 우리 파출소에 음주측정기가 없는 거를 알고서 그란 모양인데 이런 경우 우린 곧이곧대로 합니다이. 시범 케이스로다, 인생공부를 좀 시켜야겠다 해서 백차에 태와가이고 측정기가 있는 본서로 보냈심다. 오래간만에 본서에 들어간께 우리 직원들이 인사닦을 데가 좀 많겠심니까. 인사를 하는 동안에 이 인간이 온다간다 말도 없이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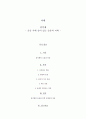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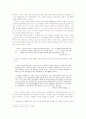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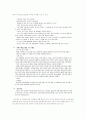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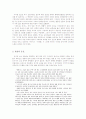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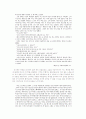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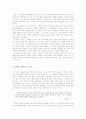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