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머리말
Ⅱ.몸말
1)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의 편찬과정
2)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의 比較
- 編纂主體와 體裁 -
3)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의 比較
- 歷史認識 -
4)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의 共通點
5)《高麗史》와 《高麗史節要》의 사학사적 의의
Ⅲ. 맺음말
Ⅱ.몸말
1)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의 편찬과정
2)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의 比較
- 編纂主體와 體裁 -
3)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의 比較
- 歷史認識 -
4)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의 共通點
5)《高麗史》와 《高麗史節要》의 사학사적 의의
Ⅲ. 맺음말
본문내용
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원래 富國强兵이나 領土擴張정책은 왕도이념과 背馳되는 공리주의적 패도이념에 가까운 것이다. 《高麗史》와 《高麗史節要》가 고려전기를 다 같이 긍정하는 이면에는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고려전기 문화가 가진 漢唐文化的 요소, 功利的 요소를 그대로 수긍하는 자세에서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中華와 夷狄을 엄밀하게 차별하지 않는 태도는 곧 華夷意識이 그만큼 미약함을 의미하며 이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尊王事大사상이 철저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 風水圖讖사상가또는 釋老人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지 않고, 그들의 행적에 큰 비중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이것도 두 사서가 異端사상에 대해 보여준 관용성과 포용성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高麗史》와 《高麗史節要》는 하나는 왕의 干涉에 의하여 修史官의 자의가 많이 屈折된 사서요,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사서라는 차이점은 있으나 그러한 정치성의 차이를 제외하고 본다면 15세기의 실용주의적 문화풍토위에서 탄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韓永愚, 〈高麗史 高麗史節要의 比較硏究〉, 1981, pp.32~35
5)《高麗史》와 《高麗史節要》의 사학사적 의의
《高麗史》는 60여년 간에 걸쳐 여러번 개수된 작품으로서 정도전의 《高麗國史》보다 훨씬 훌륭한 사서임은 말할 것도 없다. 정도전은 고려조의 용어들을 제후국에 맞는 용어로 변개하였으나, 《高麗史》는 과거의 사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계기로 역사 서술에서 과거에 쓰던 용어와 명칭을 당시의 것 그대로 쓴다는 원칙이 하나의 확고한 관례로서 굳혀졌다. 고려조에 쓰이던 왕에 대한 칭호와 관제의 명칭은 사실 그대로 기술되었으나, 명을 사대하고 있는 입장의 조선으로서는 서술 체제에 있어서 천자의 기록인 本紀라고 표기하지 않고 世家라고 하였다. 《高麗史》에서 世家라는 명칭을 써서 스스로 諸侯國의 지체를 주장한 명분론의 내용은 고려후기의 시련을 경험한 李朝初의 자기전통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동아세계질서에의 귀속논리이며, 단순한 自己卑下라기보다는 세계에 대한 시야의 확대로 해석되기도 한다. 閔賢九, 〈高麗史에 反映된 名分論의 性格〉, 《韓國古典심포지움》, 일조각, 1980, pp.96~103
또한 《高麗史》는《高麗國史》에 비하여 자료가 많이 보완되었다. 번거로운 폐단이 있더라도 소략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관철되어, 가능한 한 많은 사료가 보완되었다. 37권의 《高麗國史》가 139권으로 늘어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高麗史》는 앞서 지적했듯이 조선 건국을 합리화 하는데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국초의 흥분된 감정이 점차 가라앉고 조선 건국이 반석위에 놓여가자 조선 건국에 반대한 정몽주 등도 충신으로 다루는 그나마 객관적인 태도가 나올 수 있었다.
《高麗史》는 기전체,《高麗史節要》는 편년체의 역사 서술로서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서이다. 이 두 사서는 비교적 사실 그대로 전하려는 객관성, 사료 수집의 충실성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사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鄭求福 〈朝鮮前期의 歷史敍述〉《韓國中世史學史》(Ⅱ) -朝鮮前期篇-, 景仁文化社, 2002, pp.46~47
Ⅲ. 맺음말
太祖代에 새롭게 시작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려는 작업은 고려왕조를 중흥시키려는 입장이 아닌 고려왕조 멸망의 必然性과 李朝건국의 正當性을 밝히는 것이 대전제가 되었다. 그러나 李王室과 혁명파 사대부, 그리고 혁명에 가담하지 않은 사대부의 세 정치 세력간의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무려 5代에 걸쳐서 완성되었다. 文宗代에 완성된 《高麗史》와 《高麗史節要》는 외형상으로는 서로 보완 관계를 가지는 듯 하면서 내면적으로 군신간의 상충된 이해관계가 반영된 사서가 되었다. 《高麗史》는 세종대에 짜여진 골격을 토대로 하여, 元史의 體裁를 따라 편찬된 까닭에 근본적으로 친왕적인 사서가 되었고 그리하여 《高麗史》는 전반적으로 편찬자의 주관이 제약되고, 그나마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유학자들의 손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사대적인 명분론에 입각한 儒敎史觀에 의하여 편찬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한계도 분명 있다. 《高麗史節要》는 《高麗史》와는 다른 신료중심의 편년체사서를 또 만들어냄으로써 친왕적 사서를 克服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高麗史》와《高麗史節要》는 서로를 보완하는 사서가 되었으며 그 후의 사서편찬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高麗史》와 《高麗史節要》는 하나는 왕의 干涉에 의하여 修史官의 자의가 많이 屈折된 사서요,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사서라는 차이점은 있으나 그러한 정치성의 차이를 제외하고 본다면 15세기의 실용주의적 문화풍토위에서 탄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韓永愚, 〈高麗史 高麗史節要의 比較硏究〉, 1981, pp.32~35
5)《高麗史》와 《高麗史節要》의 사학사적 의의
《高麗史》는 60여년 간에 걸쳐 여러번 개수된 작품으로서 정도전의 《高麗國史》보다 훨씬 훌륭한 사서임은 말할 것도 없다. 정도전은 고려조의 용어들을 제후국에 맞는 용어로 변개하였으나, 《高麗史》는 과거의 사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계기로 역사 서술에서 과거에 쓰던 용어와 명칭을 당시의 것 그대로 쓴다는 원칙이 하나의 확고한 관례로서 굳혀졌다. 고려조에 쓰이던 왕에 대한 칭호와 관제의 명칭은 사실 그대로 기술되었으나, 명을 사대하고 있는 입장의 조선으로서는 서술 체제에 있어서 천자의 기록인 本紀라고 표기하지 않고 世家라고 하였다. 《高麗史》에서 世家라는 명칭을 써서 스스로 諸侯國의 지체를 주장한 명분론의 내용은 고려후기의 시련을 경험한 李朝初의 자기전통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동아세계질서에의 귀속논리이며, 단순한 自己卑下라기보다는 세계에 대한 시야의 확대로 해석되기도 한다. 閔賢九, 〈高麗史에 反映된 名分論의 性格〉, 《韓國古典심포지움》, 일조각, 1980, pp.96~103
또한 《高麗史》는《高麗國史》에 비하여 자료가 많이 보완되었다. 번거로운 폐단이 있더라도 소략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관철되어, 가능한 한 많은 사료가 보완되었다. 37권의 《高麗國史》가 139권으로 늘어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高麗史》는 앞서 지적했듯이 조선 건국을 합리화 하는데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국초의 흥분된 감정이 점차 가라앉고 조선 건국이 반석위에 놓여가자 조선 건국에 반대한 정몽주 등도 충신으로 다루는 그나마 객관적인 태도가 나올 수 있었다.
《高麗史》는 기전체,《高麗史節要》는 편년체의 역사 서술로서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서이다. 이 두 사서는 비교적 사실 그대로 전하려는 객관성, 사료 수집의 충실성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사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鄭求福 〈朝鮮前期의 歷史敍述〉《韓國中世史學史》(Ⅱ) -朝鮮前期篇-, 景仁文化社, 2002, pp.46~47
Ⅲ. 맺음말
太祖代에 새롭게 시작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려는 작업은 고려왕조를 중흥시키려는 입장이 아닌 고려왕조 멸망의 必然性과 李朝건국의 正當性을 밝히는 것이 대전제가 되었다. 그러나 李王室과 혁명파 사대부, 그리고 혁명에 가담하지 않은 사대부의 세 정치 세력간의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무려 5代에 걸쳐서 완성되었다. 文宗代에 완성된 《高麗史》와 《高麗史節要》는 외형상으로는 서로 보완 관계를 가지는 듯 하면서 내면적으로 군신간의 상충된 이해관계가 반영된 사서가 되었다. 《高麗史》는 세종대에 짜여진 골격을 토대로 하여, 元史의 體裁를 따라 편찬된 까닭에 근본적으로 친왕적인 사서가 되었고 그리하여 《高麗史》는 전반적으로 편찬자의 주관이 제약되고, 그나마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유학자들의 손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사대적인 명분론에 입각한 儒敎史觀에 의하여 편찬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한계도 분명 있다. 《高麗史節要》는 《高麗史》와는 다른 신료중심의 편년체사서를 또 만들어냄으로써 친왕적 사서를 克服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高麗史》와《高麗史節要》는 서로를 보완하는 사서가 되었으며 그 후의 사서편찬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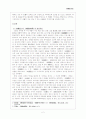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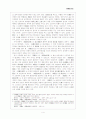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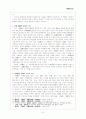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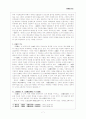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