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영옥 시인의 약력
2. 이영옥 시인의 작품에 대해서……
3. 이영옥 시인의 구체적인 작품 감상
- 단단한 뼈, 사랑에 대한 짤막한 질문,마지막 봄날에 대한 변명, 돛배
제작소 등
4. 끝내며……
2. 이영옥 시인의 작품에 대해서……
3. 이영옥 시인의 구체적인 작품 감상
- 단단한 뼈, 사랑에 대한 짤막한 질문,마지막 봄날에 대한 변명, 돛배
제작소 등
4. 끝내며……
본문내용
모르겠다는 생각을 품었는데, 부산남항 방파제에서 한 낚시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죠. 그는 실제로 배를 탔지만 지금은 배에 페인트칠작업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했습니다. 마도로스였던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초라한 현실에서 오는 gap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의 말을 수첩에 옮겨 적었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돛배를 만들다가 끝내는 출항하지 못하고 환멸을 느끼고 말거란 생각이 들었죠. 지금 경제구조와 부조리한 것들을 시에서 말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모르더군요.
< 민박집에 세워진 과녁 > - 이영옥
눈 그친 민박집으로
하얀 입김을 불며
파도와 갈매기가 맨 처음 찾아왔다.
그 집의 담벼락은 파도가 칠 때마다
오래된 틀니처럼 흔들거렸다.
화장실로 가는 좁다란 통로에는
널반지로 만든 과녁이 세워져 있고
칠이 벗겨진 숫자들은 원판안에 멈춰 있었다.
여름 한철 동안 피서객들이
인형이나 담배에 배팅하며 활을 당겼을
화살과 활이 떠난 과녁은
바람이 들락거리는 구멍들을 안고 혼자 서 있다.
미닫이 사이로 파도의 시린 발목이 보인다.
비닐장판 위에 지져진 담배자국은
검은 몽돌처럼 침묵했고
그쳤던 눈발이 다시 사나워졌다.
나는 내 안에 조준된 화살을 힘껏 쏘았다.
결과는 경계의 안이거나 바깥일 것이다.
과녁에 뚫린 수많은 구멍들도
알고보면
한때 온몸의 정신을 집중하여
생을 관통하려 했던 흔적임을 알겠다.
* <민박집에 세워진 과녁>에 대한 감상(생각)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한때 머물고 떠나는 민박집과 많은 화살과 활이 잠시 머물고 떠난 과녁의 운명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즐거움을 위해 잠시 찾고 이내 떠나 혼자가 되는 민박집과 과녁은 자신의 몸에 수많은 구멍과 외로움을 안고 그 자리에 서 있다. 오래된 틀니처럼 덜컹거리고 칠이 다 벗겨져 흉해진 몰골로 그저 제자리에 묵묵히 서있다.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모습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자신과 만나고 헤어지며, 결국 외로운 존재로 남아 혼자이다. 스스로 자신에게 많은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거친 바람과 파도를 피해 과녁을 향해 조준한다. 결과는 성공일수도, 실패일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실패의 흔적들도 결국 모두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한 흔적들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정신의 집중이다.
시어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과녁은 동그랗다. 색깔로 동그라미의 크기를 표시한다. 날아가는 화살도 타원을 그리며 꽂힌다. 활도 타원형이다. 과녁의 구멍도 동그랗다. 과녁을 맞추는 눈도 동그랗고, 우리의 삶은 직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곡선, 동그랗게 반복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동그란 삶을 집어삼킨다. 성난 파도처럼 사람은 민박집도 집어삼킬 정도이다. 사람, 파도, 민박집도 화살도 과녁도 모두 시간 이미지임을 느낀다.
* <민박집에 세워진 과녁>에 대한 Q & A
Q. 화살과 우리들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에 민박집이라는 소재를 가져온 것은, 누구나 잠시 들렸다가 돌아가는 곳이 민박집이고 화살도 잠시 꽂혔다가 금방 나가는 것과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지만, 민박집과 과녁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시인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A. 이영옥 시인의 말씀
구멍이라는 것은 흔적이기도 합니다. 삶의 블랙홀 같은, 명중이 되든 불발이 되든, 어느 개인으로 보면 구멍 하나하나가 다 소중할 거란 생각을 하며 쓴 시입니다. 장판위의 몽돌처럼 입을 다문 담배자국도 그러한 맥락에서 어떤 한 사람이 고통스런 삶을 이겨내기 위해 잠시 들렀던 민박집의 소중한 흔적이라고 저는 본 것입니다.
◇ 이영옥 시인이 생각하는 ‘시’란?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있다면?
가령, 바람이 심한 날 밖에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제멋대로 흔들리는 나뭇잎이며 행인들의 옷자락, 헝클어지는 머리카락, 뿌옇게 일어나 달리다가 흩어지는 모래바람…… 그런 것들을 몸소 느끼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보면 모든 것들이 어디론가 날려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어떤 현상이, 풍경이, 사진이, 눈물이, 사랑이, 사건이, 이별이, 만남이 생겼다가 곧 사라지게 되겠죠. 그냥 둔다면 그것은 흘러가 버리고 사라지게 되겠지요. 인간의 기억이란 한계가 있는 법이고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바로 시라고 생각합니다. 시라는 것은 그런 것들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기억의 낱개들을 묶어주고, 삶을 요약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함축적이고 조탁된 언어로, 은유와 상징과 환유와 자신의 철학이 담긴, 누가 읽더라도 울림을 줄 수 있는 글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시란, 아무렇게나 흘려버릴 수 있는 것들을 ‘무의미한 것들을 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시 작업이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빈부, 학벌, 지역, 성별 기타 등등의 차이 없이 진실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시가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 참 마음에 들어요. 언젠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옷차림이 허술한 일용잡부 일 것 같은 한 아저씨가 시집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릴 수가 없더라구요. 내가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시대를 대변할만한 굉장한 시를 쓸 수는 없겠지만, 내가 느끼는 일상에서의 사소한 것들이 잘 표현된다면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요. 무심코 흘려버릴 수도 있는 것들을 꼼꼼히 지켜보고 밝은 것의 어두운 뒷면까지 보는 진정한 시인의 조망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끝내며……
처음에는 이영옥 시인이 정말 어둡고 우울한 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의 선택과 주제가 가볍지 않고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영옥 시인은 죽음을 영원으로 승화시킨 밝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문학은 결코 앉아서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고 생각을 나눠야 하고 작가의 깊은 생각과 경험을 나눠 받으면서까지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민박집에 세워진 과녁 > - 이영옥
눈 그친 민박집으로
하얀 입김을 불며
파도와 갈매기가 맨 처음 찾아왔다.
그 집의 담벼락은 파도가 칠 때마다
오래된 틀니처럼 흔들거렸다.
화장실로 가는 좁다란 통로에는
널반지로 만든 과녁이 세워져 있고
칠이 벗겨진 숫자들은 원판안에 멈춰 있었다.
여름 한철 동안 피서객들이
인형이나 담배에 배팅하며 활을 당겼을
화살과 활이 떠난 과녁은
바람이 들락거리는 구멍들을 안고 혼자 서 있다.
미닫이 사이로 파도의 시린 발목이 보인다.
비닐장판 위에 지져진 담배자국은
검은 몽돌처럼 침묵했고
그쳤던 눈발이 다시 사나워졌다.
나는 내 안에 조준된 화살을 힘껏 쏘았다.
결과는 경계의 안이거나 바깥일 것이다.
과녁에 뚫린 수많은 구멍들도
알고보면
한때 온몸의 정신을 집중하여
생을 관통하려 했던 흔적임을 알겠다.
* <민박집에 세워진 과녁>에 대한 감상(생각)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한때 머물고 떠나는 민박집과 많은 화살과 활이 잠시 머물고 떠난 과녁의 운명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즐거움을 위해 잠시 찾고 이내 떠나 혼자가 되는 민박집과 과녁은 자신의 몸에 수많은 구멍과 외로움을 안고 그 자리에 서 있다. 오래된 틀니처럼 덜컹거리고 칠이 다 벗겨져 흉해진 몰골로 그저 제자리에 묵묵히 서있다.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모습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자신과 만나고 헤어지며, 결국 외로운 존재로 남아 혼자이다. 스스로 자신에게 많은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거친 바람과 파도를 피해 과녁을 향해 조준한다. 결과는 성공일수도, 실패일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실패의 흔적들도 결국 모두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한 흔적들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정신의 집중이다.
시어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과녁은 동그랗다. 색깔로 동그라미의 크기를 표시한다. 날아가는 화살도 타원을 그리며 꽂힌다. 활도 타원형이다. 과녁의 구멍도 동그랗다. 과녁을 맞추는 눈도 동그랗고, 우리의 삶은 직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곡선, 동그랗게 반복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동그란 삶을 집어삼킨다. 성난 파도처럼 사람은 민박집도 집어삼킬 정도이다. 사람, 파도, 민박집도 화살도 과녁도 모두 시간 이미지임을 느낀다.
* <민박집에 세워진 과녁>에 대한 Q & A
Q. 화살과 우리들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에 민박집이라는 소재를 가져온 것은, 누구나 잠시 들렸다가 돌아가는 곳이 민박집이고 화살도 잠시 꽂혔다가 금방 나가는 것과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지만, 민박집과 과녁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시인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A. 이영옥 시인의 말씀
구멍이라는 것은 흔적이기도 합니다. 삶의 블랙홀 같은, 명중이 되든 불발이 되든, 어느 개인으로 보면 구멍 하나하나가 다 소중할 거란 생각을 하며 쓴 시입니다. 장판위의 몽돌처럼 입을 다문 담배자국도 그러한 맥락에서 어떤 한 사람이 고통스런 삶을 이겨내기 위해 잠시 들렀던 민박집의 소중한 흔적이라고 저는 본 것입니다.
◇ 이영옥 시인이 생각하는 ‘시’란?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있다면?
가령, 바람이 심한 날 밖에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제멋대로 흔들리는 나뭇잎이며 행인들의 옷자락, 헝클어지는 머리카락, 뿌옇게 일어나 달리다가 흩어지는 모래바람…… 그런 것들을 몸소 느끼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보면 모든 것들이 어디론가 날려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어떤 현상이, 풍경이, 사진이, 눈물이, 사랑이, 사건이, 이별이, 만남이 생겼다가 곧 사라지게 되겠죠. 그냥 둔다면 그것은 흘러가 버리고 사라지게 되겠지요. 인간의 기억이란 한계가 있는 법이고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바로 시라고 생각합니다. 시라는 것은 그런 것들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기억의 낱개들을 묶어주고, 삶을 요약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함축적이고 조탁된 언어로, 은유와 상징과 환유와 자신의 철학이 담긴, 누가 읽더라도 울림을 줄 수 있는 글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시란, 아무렇게나 흘려버릴 수 있는 것들을 ‘무의미한 것들을 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시 작업이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빈부, 학벌, 지역, 성별 기타 등등의 차이 없이 진실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시가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 참 마음에 들어요. 언젠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옷차림이 허술한 일용잡부 일 것 같은 한 아저씨가 시집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릴 수가 없더라구요. 내가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시대를 대변할만한 굉장한 시를 쓸 수는 없겠지만, 내가 느끼는 일상에서의 사소한 것들이 잘 표현된다면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요. 무심코 흘려버릴 수도 있는 것들을 꼼꼼히 지켜보고 밝은 것의 어두운 뒷면까지 보는 진정한 시인의 조망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끝내며……
처음에는 이영옥 시인이 정말 어둡고 우울한 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의 선택과 주제가 가볍지 않고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영옥 시인은 죽음을 영원으로 승화시킨 밝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문학은 결코 앉아서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고 생각을 나눠야 하고 작가의 깊은 생각과 경험을 나눠 받으면서까지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키워드
추천자료
 서정주의 친일행위에 대한 평가
서정주의 친일행위에 대한 평가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연구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연구 [인문과학] 오정희의 동경
[인문과학] 오정희의 동경 <신라초> , <동천>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 샤머니즘 , 유교 , 노장사상 등에서 불교로 ...
<신라초> , <동천>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 샤머니즘 , 유교 , 노장사상 등에서 불교로 ... 백석시 연구
백석시 연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고 작품 내용 정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고 작품 내용 정리 [인문과학] 황지우의 시 세계
[인문과학] 황지우의 시 세계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조세희) 독후감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조세희) 독후감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독후감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독후감 김영하작가의 오빠가 돌아왔다에 대한..
김영하작가의 오빠가 돌아왔다에 대한.. 현대작가론(은희경)
현대작가론(은희경)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공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공 -조세희  [감상문, 분석] 미망(未忘) _ 김원일 저
[감상문, 분석] 미망(未忘) _ 김원일 저 「아제 아제 바라아제」 - 작가소개와 줄거리, 두 인물과 종파의 대결구도, 깨달음의 길 _ 한...
「아제 아제 바라아제」 - 작가소개와 줄거리, 두 인물과 종파의 대결구도, 깨달음의 길 _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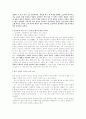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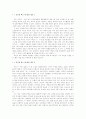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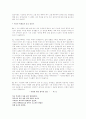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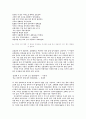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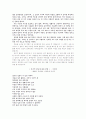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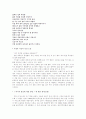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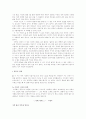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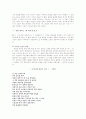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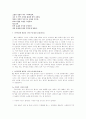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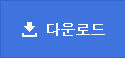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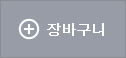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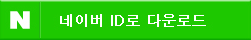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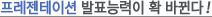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