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족함이 없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다. 시작과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모든 정황을 설명하며 끝내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이 이야기는 현세의 좌절과 기약 없는 꿈의 실현을 먼 미래로 미루어 놓고 있지만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히 전하고 있다.
마을과 마을의 닭소리가 서로 접하여 있으며, 아름답지 않은 꽃과 과실의 나무는 말라서 없어지고 추하고 악한 것이 스스로 소멸하고 ,기후는 화창하고 사시의 계절이 순조로우며 질병이 사라진 세상, 탐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커지지 아니하고 은근하며 사람마다 평등하여 모두 한가지 뜻으로 서로를 보게 되매 기쁘고 즐거워하며, 착한 말로 오가는 뜻이 똑같아서 차별함이 없게 되는 사람들. 서로 싸우고 죽이며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무수한 고통을 가져왔던 부귀가 이제는 돌조각처럼 아끼고 탐내지 않게 된 그러한 곳은,
어느 숲속이든 산속이든 아니면 바다의 안개 속에 가려진 섬이든 실재하지 않았다.
대동세상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목숨 가운데서 문득 빛나던 것이 있었으니 ,스스로의 가슴속에 이미 저러한 세계의 실상이 생생하게 담겨졌다는 깨달음이었다.
역(易)에 이르기를 미제(未濟)의 뜻이 해가 바닷속에 잠겨 있으므로 장차 밝게 떠오를 것을 안다 하였으매, 티끌처럼 수많은 생령(生靈)들의 뜻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으랴. 황석영, 위의 책, 12권,p348
나오며
기억에 남는 구절이 하나 있다.
따지고 보면 모기의 앵앵거리는 소리,파리의 윙윙대는 소리며 장인붙이들의 뚝딱거리는 소리,선비들이 글 읽는 소리,개굴개굴하는 소리,이 모든 천하의 소리가 모두 밥을 구하자는 것들이었다. 황석영, 위의 책, 10권,p8
이것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 만물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장길산을 집필한 것이리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태어난 자의 숙명이고 하나의 짐이며 또한 소임이기도 하다. 바로 밥을 구하는 것. 생존을 위해 싸웠던 그들의 처절함이 글을 읽는 내내 마음속에 어떤 울림으로 다가왔다.
앞서 언급했었듯이 이렇게 1974년의 한국사회 속의 장길산은 유신체체 아래 결집된 민중의 힘을 모으는 담론으로서의 역할로 우리에게 다가왔었다.
그리고 2005년 현재에 이 소설을 읽는 지금의 독자들에게는 또 어떤 코드로써 장길산은 다가오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마을과 마을의 닭소리가 서로 접하여 있으며, 아름답지 않은 꽃과 과실의 나무는 말라서 없어지고 추하고 악한 것이 스스로 소멸하고 ,기후는 화창하고 사시의 계절이 순조로우며 질병이 사라진 세상, 탐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커지지 아니하고 은근하며 사람마다 평등하여 모두 한가지 뜻으로 서로를 보게 되매 기쁘고 즐거워하며, 착한 말로 오가는 뜻이 똑같아서 차별함이 없게 되는 사람들. 서로 싸우고 죽이며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무수한 고통을 가져왔던 부귀가 이제는 돌조각처럼 아끼고 탐내지 않게 된 그러한 곳은,
어느 숲속이든 산속이든 아니면 바다의 안개 속에 가려진 섬이든 실재하지 않았다.
대동세상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목숨 가운데서 문득 빛나던 것이 있었으니 ,스스로의 가슴속에 이미 저러한 세계의 실상이 생생하게 담겨졌다는 깨달음이었다.
역(易)에 이르기를 미제(未濟)의 뜻이 해가 바닷속에 잠겨 있으므로 장차 밝게 떠오를 것을 안다 하였으매, 티끌처럼 수많은 생령(生靈)들의 뜻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으랴. 황석영, 위의 책, 12권,p348
나오며
기억에 남는 구절이 하나 있다.
따지고 보면 모기의 앵앵거리는 소리,파리의 윙윙대는 소리며 장인붙이들의 뚝딱거리는 소리,선비들이 글 읽는 소리,개굴개굴하는 소리,이 모든 천하의 소리가 모두 밥을 구하자는 것들이었다. 황석영, 위의 책, 10권,p8
이것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 만물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장길산을 집필한 것이리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태어난 자의 숙명이고 하나의 짐이며 또한 소임이기도 하다. 바로 밥을 구하는 것. 생존을 위해 싸웠던 그들의 처절함이 글을 읽는 내내 마음속에 어떤 울림으로 다가왔다.
앞서 언급했었듯이 이렇게 1974년의 한국사회 속의 장길산은 유신체체 아래 결집된 민중의 힘을 모으는 담론으로서의 역할로 우리에게 다가왔었다.
그리고 2005년 현재에 이 소설을 읽는 지금의 독자들에게는 또 어떤 코드로써 장길산은 다가오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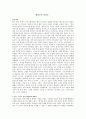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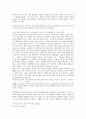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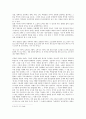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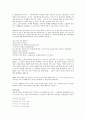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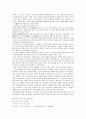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