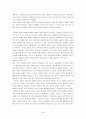본문내용
보여주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와 연구(경제, 정치, 심지어 도박까지)들은 집단이 탁월한 개인보다 더 나은 답을 더 일관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답은 천재가 아닌 대중의 손에 있다. ... 어떤 상황에서 집단은 놀랄 만큼 똑똑하며,
때로는 집단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
따라서 특별히 지적 능력이뛰어난 사람들이 집단을 지배해야 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구성원 대부분이 특별히 박식 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집단적으로는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경제학자 허버트 사이먼이 말했듯이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속에서 살고 있다."
-제임스 서로위키, <대중의 지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완벽한 정답을 얻어낼 수는 없다. 하지만 어디에서나 완벽의 답은 없겠지만 최선의 답은 존재할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이 시대에는 현명한 소수의 판단 보다 평범한 대중의 판단이 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한다.
오늘날의 환경은 과거에 비하여 너무나 복잡하다. 환경이 불완전하고 가변적이다. 이것 때문에 조직에서도 과거의 정태적인 관료제(Bureaucracy) 조직보다 동태성이나 환경적응성을 강조하는 애드호크라시(Adhocracy)가 적절한 조직인 것과 같다. 과거에는 환경에 매우 정태적이었다. 그래서 현명한 소수에 의한 판단이 대중의 판단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올바르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과거의 환경은 비교적 단순했기 때문에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적절한 해답이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는 그렇지 않다. 환경이 굉장히 가변적이고 불안하다. 그래서 소수의 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 그렇게 때문에 여러 사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주 소소한 것 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보다 나은 정답을 이끌어 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대적 관점에서 대중의 지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시적 조류가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에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대중의 어리석음을 이야기 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대중을 그렇게 매도했을 이는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서 현대의 방식으로 변해왔듯이 미래에는 보다 더 많은 의견의 수렴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야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답은 천재가 아닌 대중의 손에 있다. ... 어떤 상황에서 집단은 놀랄 만큼 똑똑하며,
때로는 집단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
따라서 특별히 지적 능력이뛰어난 사람들이 집단을 지배해야 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구성원 대부분이 특별히 박식 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집단적으로는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경제학자 허버트 사이먼이 말했듯이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속에서 살고 있다."
-제임스 서로위키, <대중의 지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완벽한 정답을 얻어낼 수는 없다. 하지만 어디에서나 완벽의 답은 없겠지만 최선의 답은 존재할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이 시대에는 현명한 소수의 판단 보다 평범한 대중의 판단이 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한다.
오늘날의 환경은 과거에 비하여 너무나 복잡하다. 환경이 불완전하고 가변적이다. 이것 때문에 조직에서도 과거의 정태적인 관료제(Bureaucracy) 조직보다 동태성이나 환경적응성을 강조하는 애드호크라시(Adhocracy)가 적절한 조직인 것과 같다. 과거에는 환경에 매우 정태적이었다. 그래서 현명한 소수에 의한 판단이 대중의 판단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올바르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과거의 환경은 비교적 단순했기 때문에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적절한 해답이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는 그렇지 않다. 환경이 굉장히 가변적이고 불안하다. 그래서 소수의 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 그렇게 때문에 여러 사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주 소소한 것 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보다 나은 정답을 이끌어 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대적 관점에서 대중의 지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시적 조류가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에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대중의 어리석음을 이야기 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대중을 그렇게 매도했을 이는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서 현대의 방식으로 변해왔듯이 미래에는 보다 더 많은 의견의 수렴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야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추천자료
 본질주의의 배경, 교육원리와 비판
본질주의의 배경, 교육원리와 비판 인터넷·모바일과 대중문화
인터넷·모바일과 대중문화 인터넷·모바일과 대중문화
인터넷·모바일과 대중문화 페미니즘과 광고(소비문화의 관점에서)
페미니즘과 광고(소비문화의 관점에서) 초등국어과 교재의 특징과 구성원리에 관한 고찰
초등국어과 교재의 특징과 구성원리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아동집단)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아동집단) 가출청소년을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효과성 검증
가출청소년을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효과성 검증 프뢰벨
프뢰벨 제7장. 학습에 대한 인지적 관점
제7장. 학습에 대한 인지적 관점 [경영자와 법률환경] 지적재산권과 퇴직금지급규정을 통해 살펴 본 디지털컨텐츠산업의 법률...
[경영자와 법률환경] 지적재산권과 퇴직금지급규정을 통해 살펴 본 디지털컨텐츠산업의 법률... 파시즘에 대하여 [이데올로기 관점으로 접근]
파시즘에 대하여 [이데올로기 관점으로 접근] 지능 측정의 방법과 학습능력
지능 측정의 방법과 학습능력 아동발달단계(아동발달과정) 독서능력발달단계, 표현, 아동발달단계(아동발달과정) 연령별발...
아동발달단계(아동발달과정) 독서능력발달단계, 표현, 아동발달단계(아동발달과정) 연령별발... 관료제官僚制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관점 및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딜레마와 조화가능성
관료제官僚制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관점 및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딜레마와 조화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