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論
Ⅱ. 生涯 및 時代的 背景
Ⅲ. 圃隱 의 思想
Ⅳ. 詩世界
1) 士大夫로서의 포부와 豪放한 기운
2)性理學的 思想이 담긴 詩
3)나그네의 회포(客懷)
4) 愛國忠節 意識
Ⅴ. 結論
◇ 참고문헌 ◇
Ⅱ. 生涯 및 時代的 背景
Ⅲ. 圃隱 의 思想
Ⅳ. 詩世界
1) 士大夫로서의 포부와 豪放한 기운
2)性理學的 思想이 담긴 詩
3)나그네의 회포(客懷)
4) 愛國忠節 意識
Ⅴ. 結論
◇ 참고문헌 ◇
본문내용
千石 풍류 아는 태수는 이천 석의 녹봉이니
邂逅故人三百杯 해후한 친구와 삼백 잔 술을 드네
直欲夜深吹玉笛 바로 밤이 깊어지자 옥피리를 부노니
高攀明月共徘徊 높이 오른 밝은 달이 함께 같이 배회하네.
위의 시는 중구일에 자신의 고향인 익양의 태수와 함께 새로 지은 명원루에 올라 느낀 회포를 읊은 것이다. 『小華詩評』에서는 이안눌이 명원루에 와 정몽주의 작품을 보고 和韻에 고심하다가 가까스로 한 구절을 얻은 일화를 말한 후, 결국 이것의 넓고 원대한 기상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비평하였다.
이러한 그의 호방한 기질은 다음 시에서도 나타난다.
欲展平生氣浩然 평생에 기른 호연지기를 펴려면
須來甘露寺樓前 모름지기 감로사 누각 앞에 서보시라.
甕城畵角斜陽裏 옹성의 화각소리가 지는 해 속에 울리고,
瓜浦歸帆細雨邊 과포로 돌아오는 배 가랑비 맞고 있네.
古尙留梁歲月 옛 가마에는 여전히 양나라 세월 머물고
高軒直壓楚山天 높은 누각은 바로 초나라 산천을 누르는구나.
登臨半日逢僧話 올라서 반나절 동안 중을 만나 이야기 나누니
忘却東韓路八千 우리나라로 가는 팔천리 길을 내 잊어버렸구나.
이 시는 포은이 중국 조정에 사신으로 갔다가 다경루에 올라 지은 시이다. 春亭 卞季良은 이 시를 두고 “豪邁峻壯하여 거리낌 없는 걸출한 기상이 있다.”고 평하였으며, 曺伸도 『聞鎖錄』에서 이 시의 3~4구를 豪壯하다고 평하고 있다. 다경루는 중국 강소성 북고산 감로사 내에 있는 누대이다. 이곳은 주변 풍광이 매우 아름다워서 일찍이 소동파를 비롯한 많은 시인들이 그 절경을 노래하였다. 특히 함련(聯)은 다경루에 올라가서 바라본 遠景을 묘사한 것으로, 『소문쇄록』의 평과 같이 탁트인 視界가 가슴이 후련할 정도로 한 번 바라봄에 다함이 없어서 호연지기가 느껴진다.
『芝峰類說』에서는 고려의 시인들 중 정몽주의 시풍을 “豪邁”하다 말했고, 『谷詩話』에서는 고려와 조선의 시인들을 품평하면서 그를 “豪”하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말만 조금 달리 했을 뿐 『小華詩評』에서 제시한 “호방”이란 표현과 대동소이한 의미로 쓰였다고 하겠다. 이렇듯 그의 시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기풍은 호방이란 한 마디로 요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후대의 여러 시화집에서 포은시의 가장 대표적인 품격으로 호방함을 거론하게 되었으며, 포은시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로 ‘호방함’을 꼽게 되었다.
2) 性理學的 思想이 담긴 詩
포은은 당대의 巨儒인 목은 이색으로부터 東方理學之祖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 포은의 성리학적 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만한 자료는 거의 남아 전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포은집』에 전하는 그의 시 몇 편을 자료로 삼을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在深淵或躍如 깊은 못에 잠겨 있다가 때로 뛰어 오르기도 하는데,
子思何取著于書 자사자는 어느 것을 취해 중용에 적었을까.
但將眼孔分明見 그저 뜨인 눈으로 분명히 살펴보면,
物物眞成潑潑魚 사물은 저마다 참으로 퍼떡이는 물고기와 같은 것을. 정몽주, <湖中觀魚> 其一. 『圃隱集』 권1.
이 시는 이른바 『중용』 제 12장에서 『시경』 大雅 <旱麓>장의 ‘솔개는 하늘에 닿을 듯 날아 오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어오르네.’ ‘鳶飛戾天 魚躍于淵’
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그 아래 위를 살피라는 말이다.’ ‘言其上下察也’
라고 한 것을 근거로 지은 것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의 만물은 각각의 이치를 가지고 순행하는 바, 그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 도를 체득하여야 한다는 것이 유가의 논리이다. 연못에서 뛰어 오르는 물고기를 보면서 물고기 자체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 가운데에서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제목의 두 번째 시에서는 궤변만 늘어놓는다면서 장자를 비판하였다.
魚應非我我非魚 물고기는 내가 아니오, 나 또한 물고기가 아니라네.
物理參差本不齊 사물의 이치는 들쭉날쭉 본래 가지런하지 않다네.
一卷莊生濠上論 장자에 실려있는 장자와 혜자의 호상 논쟁은,
至今千載使人迷 이제까지 천 년토록 사람들을 미혹시키네.
이 시의 소재는 『장자』추수편에 실려 널리 알려진 이른바 호상논쟁이다. 장자와 혜자가 호수가 다리 위를 거닐고 있다가, 호수 속의 물고기를 보고 장자가 물고기는 즐거운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혜자는 그대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 물음에 대하여 장자는, 그대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느냐고 되물었다는 것이다. 결국, 장자는 자신을 미루어 물고기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한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포은은 사람과 물고기는 서로 다른 존재이므로, 그 존재들이 지니고 있는 이치 또한 각각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고기가 즐거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질 일이 아니라, 물고기를 통하여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즐거움을 체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나그네의 회포(客懷)
포은의 생애는 잦은 從軍과 使行으로 인한 나그네 생활의 연속이었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생애애도 다루었듯이 포은은 수차례 전장에 나갔었고, 수차례 사신으로 외국을 다녀왔다. 그런 까닭에 그의 시 전반에 ‘가고픈 마음(歸心)’ 과 ‘정처없음(無定止)’ 이 드러난다.
客心今日轉凄然 나그네 심정 오늘은 더욱 더 처량하여
臨水登山海邊 氣 찬 바닷가에 임한 산으로 올랐네.
腹裏有書還誤國 뱃속에는 오히려 나라 그르칠 글이 있고
囊中無藥可延年 주머니엔 목숨을 늘일만한 약은 없네.
龍愁歲暮藏深壑 용은 歲暮를 근심해 깊은 골에 숨었고
鶴喜秋晴上碧天 학은 맑은 가을을 기뻐해 푸른 하늘로 오르네.
手折黃花聊一醉 손으로 국화 꺾어 애오라지 취해 보니
美人如玉隔雲烟 옥같은 미인은 구름 안개를 사이했네. 鄭夢周, 「彦陽重陽節」
이 작품은 언양의 유배 중에 중양절을 맞아 자신의 회포를 쓴 것이다. 당의 유종원이 멀리 유배를 와서 자기 동생과의 이별을 읊은 시의 운을 차운해, 정몽주 자신도 처량하면서 꽉 막혀 풀 데 없이 갑갑한 심경을 이 시로 표현해 내었다. 유배 온 지 벌써 일 년이나 된 시점에 새삼 쓸쓸한 자신의 신세를 돌이켜 보고 있는 것이 주된 정조이다. 중양절이라 한 해의 제액을
邂逅故人三百杯 해후한 친구와 삼백 잔 술을 드네
直欲夜深吹玉笛 바로 밤이 깊어지자 옥피리를 부노니
高攀明月共徘徊 높이 오른 밝은 달이 함께 같이 배회하네.
위의 시는 중구일에 자신의 고향인 익양의 태수와 함께 새로 지은 명원루에 올라 느낀 회포를 읊은 것이다. 『小華詩評』에서는 이안눌이 명원루에 와 정몽주의 작품을 보고 和韻에 고심하다가 가까스로 한 구절을 얻은 일화를 말한 후, 결국 이것의 넓고 원대한 기상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비평하였다.
이러한 그의 호방한 기질은 다음 시에서도 나타난다.
欲展平生氣浩然 평생에 기른 호연지기를 펴려면
須來甘露寺樓前 모름지기 감로사 누각 앞에 서보시라.
甕城畵角斜陽裏 옹성의 화각소리가 지는 해 속에 울리고,
瓜浦歸帆細雨邊 과포로 돌아오는 배 가랑비 맞고 있네.
古尙留梁歲月 옛 가마에는 여전히 양나라 세월 머물고
高軒直壓楚山天 높은 누각은 바로 초나라 산천을 누르는구나.
登臨半日逢僧話 올라서 반나절 동안 중을 만나 이야기 나누니
忘却東韓路八千 우리나라로 가는 팔천리 길을 내 잊어버렸구나.
이 시는 포은이 중국 조정에 사신으로 갔다가 다경루에 올라 지은 시이다. 春亭 卞季良은 이 시를 두고 “豪邁峻壯하여 거리낌 없는 걸출한 기상이 있다.”고 평하였으며, 曺伸도 『聞鎖錄』에서 이 시의 3~4구를 豪壯하다고 평하고 있다. 다경루는 중국 강소성 북고산 감로사 내에 있는 누대이다. 이곳은 주변 풍광이 매우 아름다워서 일찍이 소동파를 비롯한 많은 시인들이 그 절경을 노래하였다. 특히 함련(聯)은 다경루에 올라가서 바라본 遠景을 묘사한 것으로, 『소문쇄록』의 평과 같이 탁트인 視界가 가슴이 후련할 정도로 한 번 바라봄에 다함이 없어서 호연지기가 느껴진다.
『芝峰類說』에서는 고려의 시인들 중 정몽주의 시풍을 “豪邁”하다 말했고, 『谷詩話』에서는 고려와 조선의 시인들을 품평하면서 그를 “豪”하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말만 조금 달리 했을 뿐 『小華詩評』에서 제시한 “호방”이란 표현과 대동소이한 의미로 쓰였다고 하겠다. 이렇듯 그의 시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기풍은 호방이란 한 마디로 요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후대의 여러 시화집에서 포은시의 가장 대표적인 품격으로 호방함을 거론하게 되었으며, 포은시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로 ‘호방함’을 꼽게 되었다.
2) 性理學的 思想이 담긴 詩
포은은 당대의 巨儒인 목은 이색으로부터 東方理學之祖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 포은의 성리학적 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만한 자료는 거의 남아 전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포은집』에 전하는 그의 시 몇 편을 자료로 삼을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在深淵或躍如 깊은 못에 잠겨 있다가 때로 뛰어 오르기도 하는데,
子思何取著于書 자사자는 어느 것을 취해 중용에 적었을까.
但將眼孔分明見 그저 뜨인 눈으로 분명히 살펴보면,
物物眞成潑潑魚 사물은 저마다 참으로 퍼떡이는 물고기와 같은 것을. 정몽주, <湖中觀魚> 其一. 『圃隱集』 권1.
이 시는 이른바 『중용』 제 12장에서 『시경』 大雅 <旱麓>장의 ‘솔개는 하늘에 닿을 듯 날아 오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어오르네.’ ‘鳶飛戾天 魚躍于淵’
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그 아래 위를 살피라는 말이다.’ ‘言其上下察也’
라고 한 것을 근거로 지은 것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의 만물은 각각의 이치를 가지고 순행하는 바, 그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 도를 체득하여야 한다는 것이 유가의 논리이다. 연못에서 뛰어 오르는 물고기를 보면서 물고기 자체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 가운데에서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제목의 두 번째 시에서는 궤변만 늘어놓는다면서 장자를 비판하였다.
魚應非我我非魚 물고기는 내가 아니오, 나 또한 물고기가 아니라네.
物理參差本不齊 사물의 이치는 들쭉날쭉 본래 가지런하지 않다네.
一卷莊生濠上論 장자에 실려있는 장자와 혜자의 호상 논쟁은,
至今千載使人迷 이제까지 천 년토록 사람들을 미혹시키네.
이 시의 소재는 『장자』추수편에 실려 널리 알려진 이른바 호상논쟁이다. 장자와 혜자가 호수가 다리 위를 거닐고 있다가, 호수 속의 물고기를 보고 장자가 물고기는 즐거운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혜자는 그대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 물음에 대하여 장자는, 그대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느냐고 되물었다는 것이다. 결국, 장자는 자신을 미루어 물고기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한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포은은 사람과 물고기는 서로 다른 존재이므로, 그 존재들이 지니고 있는 이치 또한 각각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고기가 즐거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질 일이 아니라, 물고기를 통하여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즐거움을 체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나그네의 회포(客懷)
포은의 생애는 잦은 從軍과 使行으로 인한 나그네 생활의 연속이었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생애애도 다루었듯이 포은은 수차례 전장에 나갔었고, 수차례 사신으로 외국을 다녀왔다. 그런 까닭에 그의 시 전반에 ‘가고픈 마음(歸心)’ 과 ‘정처없음(無定止)’ 이 드러난다.
客心今日轉凄然 나그네 심정 오늘은 더욱 더 처량하여
臨水登山海邊 氣 찬 바닷가에 임한 산으로 올랐네.
腹裏有書還誤國 뱃속에는 오히려 나라 그르칠 글이 있고
囊中無藥可延年 주머니엔 목숨을 늘일만한 약은 없네.
龍愁歲暮藏深壑 용은 歲暮를 근심해 깊은 골에 숨었고
鶴喜秋晴上碧天 학은 맑은 가을을 기뻐해 푸른 하늘로 오르네.
手折黃花聊一醉 손으로 국화 꺾어 애오라지 취해 보니
美人如玉隔雲烟 옥같은 미인은 구름 안개를 사이했네. 鄭夢周, 「彦陽重陽節」
이 작품은 언양의 유배 중에 중양절을 맞아 자신의 회포를 쓴 것이다. 당의 유종원이 멀리 유배를 와서 자기 동생과의 이별을 읊은 시의 운을 차운해, 정몽주 자신도 처량하면서 꽉 막혀 풀 데 없이 갑갑한 심경을 이 시로 표현해 내었다. 유배 온 지 벌써 일 년이나 된 시점에 새삼 쓸쓸한 자신의 신세를 돌이켜 보고 있는 것이 주된 정조이다. 중양절이라 한 해의 제액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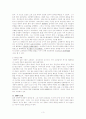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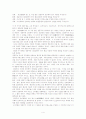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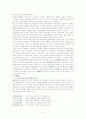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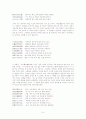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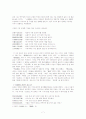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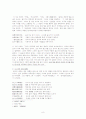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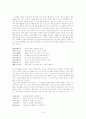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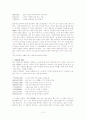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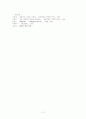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