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변법(變法)운동의 형성배경
2.강유위의 변법론 및 그의 활동
3.호남성에서의 개혁
4.중앙에서의 개혁
5.변법운동의 좌절
6.변법운동의 목표
7. 변법의 정치이념
8. 변법의 철학적 기초-담사동의 도기론
Ⅲ. 마치며
Ⅱ. 본론
1. 변법(變法)운동의 형성배경
2.강유위의 변법론 및 그의 활동
3.호남성에서의 개혁
4.중앙에서의 개혁
5.변법운동의 좌절
6.변법운동의 목표
7. 변법의 정치이념
8. 변법의 철학적 기초-담사동의 도기론
Ⅲ. 마치며
본문내용
초하여 자신들의 개혁안을 제출하였고 그것의 정치적 실현을 위한 노력이 變法운동이었다.
3. 變法과 變道
譚嗣同의 道器論은 양무운동의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엽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양무파의 철학적 기초는 바로 道의 불변에 대한 의식과 거기에서 파생된 절충주의이다. 여기서 譚嗣同은 법과 道의 연결성을 말하고 있다. 법이란 道가 흐려져서 변한 것으로 그 진정한 의의는 道를 구현하는 구체적 장치라는 데 있는 것이다. 이처럼 道와 법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때 變法의 주장은 필연적으로 變道의 주장과 맞물리게 되고 그러한 기초 위에서 양무파의 수준을 뛰어넘는 개혁의 폭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變道에 의해 뒷받침되는 變法의 구조는 어떠한가. 譚嗣同 變法사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축은 今法(오늘날의 法)·古法(옛날의 法)·西法(서양의 法)이다. 譚嗣同은 變法派로서 그릇된 今法을 개혁해서 古法의 정신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勢가 달라졌으므로 古法은 회복되어야 할 하나의 경지로서 존재할 뿐이지 현실적 대안은 西法에서 온다. 결국 譚嗣同 變法론의 실내용은 西法의 전폭적 수용에 있다.
4. 聖人의 道
譚嗣同의 變法論에서 古法에 해당하는 것이 道器論에서는 聖人의 道이다. 그런데 중국철학사에서 성인의 道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원래 儒家의 가르침이자 儒者들이 도달해야 될 경지였다. 譚嗣同에게도 聖人의 道는 완전무결한 것이며 變法과 무관하게 자신의 가치를 보장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聖人의 道가 완전무결한 것이라면 변道를 주장하는 그의 變法론과는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 聖人의 道는 變法과 무관하게 가치를 보장받는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變法을 해야 聖人의 道가 보존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變法을 통해서 보존될 수 있다는 聖人의 道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聖人의 道는 \'器에 충실함\' 그 자체이며 \'聖人의 道의 체현\'이란 바로 당 시대의 器에 충실함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다. 왜 譚嗣同은 變法론에서 \'古法\'이라는 이상적 과거를 설정하고 있을까? 또 왜 道器論에서 \'聖人의 道\'라는 이상적 경지를 설정하고 있을까? 이러한 틀은 譚嗣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康有爲로 대표되는 變法파에게 공통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고통 외에 자기 것을 버리고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이 추가됨을 의미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가 바로 옛 聖人에게 개혁의 내용을 가탁하고 聖人 이후의 역사를 타락된 역사로서 단죄하는 방식이었다.
5. 譚嗣同 道器論의 봉건전통에 대한 비판
(1) 봉건名敎비판의 내용
譚嗣同의 網常의 개혁은 變法을 양무운동과 구별짓는 요소이자 여타의 개혁들이 가능하게끔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즉 變法파는 網常에 대한 비판을 통해 봉건적 구조의 변경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譚嗣同의 網常비판은 전제군주제에 대한 비판으로 집중되게 된다. 網常의 폐해는 그것이 지칭하는 각 윤리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군주지배라는 중심 축으로 수렴되어 봉건적 지배구조의 각 부문으로 기능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에 譚嗣同은 동중서 이래 절대적 권위로 합리화 되어온 군주에 대해 결정적 비판을 가한다.
(2)봉건名敎비판의 논리
봉건名敎비판의 논리는 바로 網常윤리가 名敎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名敎의 성격은 첫째 網常윤리의 본질이라는 점, 둘째 참다운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점, 셋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 넷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배하는 道구라는 점, 등이다. 정리하면 名敎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현실을 규정하기 위해 만든 이름이며 그 이름의 기능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譚嗣同이 網常윤리의 본질로서 파악한 名敎의 정체이다. 봉건名敎는 자연법칙의 불변성으로 인간사회법칙의 불변성을 논증하는 방식이었다. 譚嗣同은 천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명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신분질서 정당화 방식을 전면 탈피한 것이다. 이처럼 천의 영역으로부터 명을 분리시켜내는 작업은 곧 사회과학적 인식의 출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이란 연구대상이 인간작위의 산물이며, 인간작위의 산물인 한 일정한 조건 속에 성립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어야 할 윤리가 名敎라는 매개를 통해 폭압스러운 지배의 道구로 변하게 되었는가. 名敎의 폐단은 바로 명과 그것이 표현해야할 참다운 가르침(實)이 전도되어 버리는 데서 유래하고 있다. 譚嗣同이 지적하고 있듯이 名이란 그 자체로는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名이 건강한 名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표현해야 할 實에 튼튼히 뿌리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譚嗣同이 비판한 名敎란 바로 實에서 괴리된 名으로 교화를 일삼는 것이다. 실제 중국역사를 지배한 것은 유가의 탈을 쓴 법가였다는 자조섞인 비판도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사 비판에서는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하나는 유가와 법가 사이의 교량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순자의 학문이 비판되고 황종휘·왕부지와 같이 군주전제를 비판한 학자들이 높게 평가된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공자에 대한 높은 평가이다.
지금까지 譚嗣同이 名-實의 논리로서 봉건名敎에 가한 비판을 살펴보았다. 그 방식이나 강道에 있어서 그때까지 유례없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道器論이 道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었듯 봉건名敎에 대한 비판도 윤리 그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網常윤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윤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譚嗣同의 오륜 중 붕우관계에 대한 견해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Ⅲ. 마치며
여기서 무술변법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과 실패 그리고 변법론의 정치이론과 철학적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다. 무술변법운동은 청일전쟁 이후 양무운동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나왔으며 비록 실패하였지만 변법운동에는 여러 서구사회에 맞서서 대항하려는 근대적인 요소들이 있으며 중국인들의 변화에 대한 노력으로 크게 평가되고 있다.
3. 變法과 變道
譚嗣同의 道器論은 양무운동의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엽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양무파의 철학적 기초는 바로 道의 불변에 대한 의식과 거기에서 파생된 절충주의이다. 여기서 譚嗣同은 법과 道의 연결성을 말하고 있다. 법이란 道가 흐려져서 변한 것으로 그 진정한 의의는 道를 구현하는 구체적 장치라는 데 있는 것이다. 이처럼 道와 법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때 變法의 주장은 필연적으로 變道의 주장과 맞물리게 되고 그러한 기초 위에서 양무파의 수준을 뛰어넘는 개혁의 폭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變道에 의해 뒷받침되는 變法의 구조는 어떠한가. 譚嗣同 變法사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축은 今法(오늘날의 法)·古法(옛날의 法)·西法(서양의 法)이다. 譚嗣同은 變法派로서 그릇된 今法을 개혁해서 古法의 정신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勢가 달라졌으므로 古法은 회복되어야 할 하나의 경지로서 존재할 뿐이지 현실적 대안은 西法에서 온다. 결국 譚嗣同 變法론의 실내용은 西法의 전폭적 수용에 있다.
4. 聖人의 道
譚嗣同의 變法論에서 古法에 해당하는 것이 道器論에서는 聖人의 道이다. 그런데 중국철학사에서 성인의 道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원래 儒家의 가르침이자 儒者들이 도달해야 될 경지였다. 譚嗣同에게도 聖人의 道는 완전무결한 것이며 變法과 무관하게 자신의 가치를 보장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聖人의 道가 완전무결한 것이라면 변道를 주장하는 그의 變法론과는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 聖人의 道는 變法과 무관하게 가치를 보장받는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變法을 해야 聖人의 道가 보존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變法을 통해서 보존될 수 있다는 聖人의 道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聖人의 道는 \'器에 충실함\' 그 자체이며 \'聖人의 道의 체현\'이란 바로 당 시대의 器에 충실함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다. 왜 譚嗣同은 變法론에서 \'古法\'이라는 이상적 과거를 설정하고 있을까? 또 왜 道器論에서 \'聖人의 道\'라는 이상적 경지를 설정하고 있을까? 이러한 틀은 譚嗣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康有爲로 대표되는 變法파에게 공통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고통 외에 자기 것을 버리고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이 추가됨을 의미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가 바로 옛 聖人에게 개혁의 내용을 가탁하고 聖人 이후의 역사를 타락된 역사로서 단죄하는 방식이었다.
5. 譚嗣同 道器論의 봉건전통에 대한 비판
(1) 봉건名敎비판의 내용
譚嗣同의 網常의 개혁은 變法을 양무운동과 구별짓는 요소이자 여타의 개혁들이 가능하게끔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즉 變法파는 網常에 대한 비판을 통해 봉건적 구조의 변경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譚嗣同의 網常비판은 전제군주제에 대한 비판으로 집중되게 된다. 網常의 폐해는 그것이 지칭하는 각 윤리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군주지배라는 중심 축으로 수렴되어 봉건적 지배구조의 각 부문으로 기능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에 譚嗣同은 동중서 이래 절대적 권위로 합리화 되어온 군주에 대해 결정적 비판을 가한다.
(2)봉건名敎비판의 논리
봉건名敎비판의 논리는 바로 網常윤리가 名敎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名敎의 성격은 첫째 網常윤리의 본질이라는 점, 둘째 참다운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점, 셋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 넷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배하는 道구라는 점, 등이다. 정리하면 名敎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현실을 규정하기 위해 만든 이름이며 그 이름의 기능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譚嗣同이 網常윤리의 본질로서 파악한 名敎의 정체이다. 봉건名敎는 자연법칙의 불변성으로 인간사회법칙의 불변성을 논증하는 방식이었다. 譚嗣同은 천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명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신분질서 정당화 방식을 전면 탈피한 것이다. 이처럼 천의 영역으로부터 명을 분리시켜내는 작업은 곧 사회과학적 인식의 출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이란 연구대상이 인간작위의 산물이며, 인간작위의 산물인 한 일정한 조건 속에 성립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어야 할 윤리가 名敎라는 매개를 통해 폭압스러운 지배의 道구로 변하게 되었는가. 名敎의 폐단은 바로 명과 그것이 표현해야할 참다운 가르침(實)이 전도되어 버리는 데서 유래하고 있다. 譚嗣同이 지적하고 있듯이 名이란 그 자체로는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名이 건강한 名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표현해야 할 實에 튼튼히 뿌리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譚嗣同이 비판한 名敎란 바로 實에서 괴리된 名으로 교화를 일삼는 것이다. 실제 중국역사를 지배한 것은 유가의 탈을 쓴 법가였다는 자조섞인 비판도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사 비판에서는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하나는 유가와 법가 사이의 교량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순자의 학문이 비판되고 황종휘·왕부지와 같이 군주전제를 비판한 학자들이 높게 평가된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공자에 대한 높은 평가이다.
지금까지 譚嗣同이 名-實의 논리로서 봉건名敎에 가한 비판을 살펴보았다. 그 방식이나 강道에 있어서 그때까지 유례없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道器論이 道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었듯 봉건名敎에 대한 비판도 윤리 그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網常윤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윤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譚嗣同의 오륜 중 붕우관계에 대한 견해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Ⅲ. 마치며
여기서 무술변법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과 실패 그리고 변법론의 정치이론과 철학적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다. 무술변법운동은 청일전쟁 이후 양무운동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나왔으며 비록 실패하였지만 변법운동에는 여러 서구사회에 맞서서 대항하려는 근대적인 요소들이 있으며 중국인들의 변화에 대한 노력으로 크게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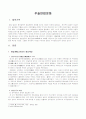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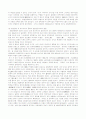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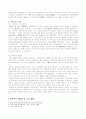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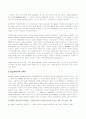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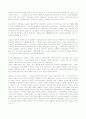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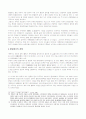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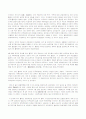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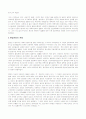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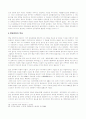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