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기적 고찰
Ⅲ. 1960년대 시대적 고찰.
Ⅳ.「서울, 1964년, 겨울」작품 분석.
Ⅴ. 나오며
Ⅱ. 전기적 고찰
Ⅲ. 1960년대 시대적 고찰.
Ⅳ.「서울, 1964년, 겨울」작품 분석.
Ⅴ. 나오며
본문내용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한갓 소유물로 전락한 자신들을 다시 소유할 수 있는 자기로 만들어 주는 유일한 현실적 계기이다.
2. 후반부-자본주의 논리와 인간소외
후반부는 ‘사내’의 등장으로 시작한다. 전반부에서 언어가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란 인간들의 관계이므로 그 관계를 이어줄 매개가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적 일상의 구조에서는 ‘돈’이 그 매개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과 인간을 소통시키는 매개는 될 수 없다.
“미안하지만 제가 함께 가도 괜찮을까요? 제게 돈은 얼마 있습니다만….”
이라고 그 사내는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 힘없는 음성으로 봐서는 꼭 끼워 달라는 건 아니라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는 것 같기도 했다. 나와 안은 잠깐 얼굴을 마주 보고 나서,
“아저씨 술값만 있다면….”
이 장면은 자본주의적 인간관계의 타락상, 즉 인간관계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현실을 냉소적으로 묘사하지만, 그렇다고 김과 안이 제 몫의 술값을 조건으로만 제의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제의를 승낙한 것은 사내의 힘없는 음성에 담긴 간절함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차림새와 달이 돈은 얼마든지 대겠다는 사내는 아냐의 시체를 팔아 뜻하지 않게 생긴 돈을 함께 처분할 동행을 구하고 있다. 작품의 후반부는 시체 판 돈을 소비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중국집, 양품점, 귤, 택시비로 돈을 쓰고, 결국 불길 속에 남은 돈을 전부 던짐으로서 돈을 다 써버린 사내는 결국 그 날 밤 자살한다. 사랑하던 아내의 주검이 돈 몇 품으로 쉽게 맞바꾸어 질 수 있다는 비정한 현실과 이에 대한 내면서 저항으로서 하룻밤 사이에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자살한다는 결말이 자본주의적 인간관계에 대한 작가의 냉소적 시선이 들어난다.
한 인간의 존재가 불가 몇 천원의 돈으로 교환된다는 사실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이다. ‘교환’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중심원리이다. 작품은 인간의 생명마저 교환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풍자한다. 돈의 출처가 밝혀지면서 독자들이 연민과 동시에 짙은 허무감을 느끼는 까닭은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한 자본주의의 집요한 손길이 마침내 인간의 죽음마저 지배한다는 현실 때문이다.
Ⅴ. 나오며
김승옥은 1960년대 서울이라는 도시를 뛰어난 감수성으로 그려내었다. 그의 감수성의 바탕을 이룬 것은 순천출신의 서울대생, 순천사건으로 인한 아버지의 죽음 등과 같은 개인적 여건과 4ㆍ19혁명과, 5ㆍ16군사정권, 고속경제성장과 같은 정치ㆍ경제적인 사회적 여건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감수성으로 그가 그려낸 1960년대의 서울은 사회의 틈 사이에서 자기가 소멸되고, 대량소비 사회의 시작으로 인간적인 것을 뒤덮고 휩쓸어가는 물신화가 일어나고, 타인과의 벽을 사이에 두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혼자 역시 될 수 없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의 주체는 일상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서울, 1964년, 겨울」에서도 자본주의적 교환 구조라는 일상성의 세계의 구성 원리를 풍자적으로 묘사하지만 작품의 등장인물은 결국 아무 말 없이 일상을 선택한다. 그러나 김승옥은 일상 속에서 ‘자기’의 문제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짚어낸다. 고독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모습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확실하게 당대의 문제성을 지적해낸다. 그 밑바탕에는 타인과의 소통의지, 그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의 관계 모색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새로 인식되고 있다. 타인과의 소통의 문제, 인간소외의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 후반부-자본주의 논리와 인간소외
후반부는 ‘사내’의 등장으로 시작한다. 전반부에서 언어가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란 인간들의 관계이므로 그 관계를 이어줄 매개가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적 일상의 구조에서는 ‘돈’이 그 매개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과 인간을 소통시키는 매개는 될 수 없다.
“미안하지만 제가 함께 가도 괜찮을까요? 제게 돈은 얼마 있습니다만….”
이라고 그 사내는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 힘없는 음성으로 봐서는 꼭 끼워 달라는 건 아니라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는 것 같기도 했다. 나와 안은 잠깐 얼굴을 마주 보고 나서,
“아저씨 술값만 있다면….”
이 장면은 자본주의적 인간관계의 타락상, 즉 인간관계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현실을 냉소적으로 묘사하지만, 그렇다고 김과 안이 제 몫의 술값을 조건으로만 제의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제의를 승낙한 것은 사내의 힘없는 음성에 담긴 간절함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차림새와 달이 돈은 얼마든지 대겠다는 사내는 아냐의 시체를 팔아 뜻하지 않게 생긴 돈을 함께 처분할 동행을 구하고 있다. 작품의 후반부는 시체 판 돈을 소비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중국집, 양품점, 귤, 택시비로 돈을 쓰고, 결국 불길 속에 남은 돈을 전부 던짐으로서 돈을 다 써버린 사내는 결국 그 날 밤 자살한다. 사랑하던 아내의 주검이 돈 몇 품으로 쉽게 맞바꾸어 질 수 있다는 비정한 현실과 이에 대한 내면서 저항으로서 하룻밤 사이에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자살한다는 결말이 자본주의적 인간관계에 대한 작가의 냉소적 시선이 들어난다.
한 인간의 존재가 불가 몇 천원의 돈으로 교환된다는 사실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이다. ‘교환’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중심원리이다. 작품은 인간의 생명마저 교환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풍자한다. 돈의 출처가 밝혀지면서 독자들이 연민과 동시에 짙은 허무감을 느끼는 까닭은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한 자본주의의 집요한 손길이 마침내 인간의 죽음마저 지배한다는 현실 때문이다.
Ⅴ. 나오며
김승옥은 1960년대 서울이라는 도시를 뛰어난 감수성으로 그려내었다. 그의 감수성의 바탕을 이룬 것은 순천출신의 서울대생, 순천사건으로 인한 아버지의 죽음 등과 같은 개인적 여건과 4ㆍ19혁명과, 5ㆍ16군사정권, 고속경제성장과 같은 정치ㆍ경제적인 사회적 여건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감수성으로 그가 그려낸 1960년대의 서울은 사회의 틈 사이에서 자기가 소멸되고, 대량소비 사회의 시작으로 인간적인 것을 뒤덮고 휩쓸어가는 물신화가 일어나고, 타인과의 벽을 사이에 두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혼자 역시 될 수 없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의 주체는 일상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서울, 1964년, 겨울」에서도 자본주의적 교환 구조라는 일상성의 세계의 구성 원리를 풍자적으로 묘사하지만 작품의 등장인물은 결국 아무 말 없이 일상을 선택한다. 그러나 김승옥은 일상 속에서 ‘자기’의 문제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짚어낸다. 고독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모습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확실하게 당대의 문제성을 지적해낸다. 그 밑바탕에는 타인과의 소통의지, 그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의 관계 모색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새로 인식되고 있다. 타인과의 소통의 문제, 인간소외의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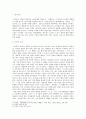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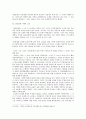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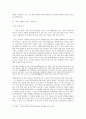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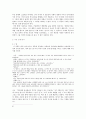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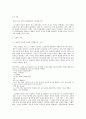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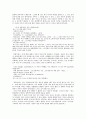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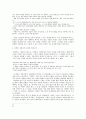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