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요서경략(說)에 대한 여러 견해
Ⅲ. 요서경략 기사의 분석
Ⅳ. 요서경략설의 문제점
1. 기록 이외의 증거 부족
2. 중국 대륙으로 진출할 만큼 항해술이 발달했었나
3. 낙랑 ․ 대방의 요서이동과 『송서』․『남제서』
Ⅴ. 요서경략설의 실체
Ⅵ. 맺음말
Ⅱ. 요서경략(說)에 대한 여러 견해
Ⅲ. 요서경략 기사의 분석
Ⅳ. 요서경략설의 문제점
1. 기록 이외의 증거 부족
2. 중국 대륙으로 진출할 만큼 항해술이 발달했었나
3. 낙랑 ․ 대방의 요서이동과 『송서』․『남제서』
Ⅴ. 요서경략설의 실체
Ⅵ. 맺음말
본문내용
없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각 사서를 편찬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 지금은 편찬 연대가 가장 빠른 『송서』가 가장 존중되어야 할 사료인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수십 년 만에 일부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객관성,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위의 지명들은 우리에게 작위적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우선, 『양서』의 ‘백제군’은 국호를 그대로 군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어색하며, ‘진평’이라는 지명도 그것이 ‘진나라 때’ 내지 ‘진나라 말기’라는 시기 설정과 함께 매우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할 뿐 아니라 북평군의 잘못인 듯한 느낌마저 갖게 한다. 마침 북위는 서기 432년에 낙랑교군을 유주로 옮기면서 소속 현인 조선현을 따로 떼어낸 난하유역의 북평군에 편입시켰다고 하는바, 이로써 북평군과 낙랑(조선)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셈이 된다.
용어와 지명에서 사서마다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아마도 낙랑교군이 설치되면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때로는 ‘조선’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도 하였던 ‘낙랑’이 자진해서 모용부(慕容部)에 귀의한 다음 요서지역에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교군을 성립시켰다는 사실이 일단 주목되는데다가 대동강유역에 그대로 남은 옛 낙랑인들과의 관계 또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서기 313~314년에 대동강유역의 낙랑군과 남쪽의 대방군이 고구려의 공격으로 멸망한 이후에 상당수의 유민세력은 백제에 흡수되었을 터인데, 이들과 대릉하 방면의 낙랑교군 사이에 작용하는 일종의 심리적 혈연적 연대감을 백제측에서 외교 무역 활동에 적극 이용할 경우 그것은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백제의 요서경략설은 바로 이러한 시대 상황을 남조(南朝)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와중에 성립한 듯하다.
Ⅵ. 맺음말
“정복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백제는 수군을 정비하여 중국의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였고, 이어서 산둥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였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백제의 요서 진출에 관한 내용은 우리의 어깨를 으쓱하게 할만하다. 교과서로 공부하던 학생 시절의 나와, 함께 공부하던 동기들은 모두 이 사실을 확인된 진실인양 믿었고 공부하고 외워서 시험을 치렀다. 그러나 고등학교 문을 나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나에게 수많은 자료들은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 믿을 수 없는 것이라 일러주고 있다.
‘그 당시 거대한 제국이나 패권국이 아니고서야 어찌 왕 또는 제후를 임명할 수 있으며, 직할지를 통치하는 태수를 둘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으로 백제의 요서영유(遼西領有)와 중원 제패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 축소지향적 해석에 머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라 하여 그것을 믿고 따라 확인된 사실인양 신봉한다면 그것은 국수주의적인 태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요서경략설’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면 어느 것보다도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요서경략설’에 관한 여러 문헌사료가 중국 남조의 사서에는 남아있는데 우리 측의 기록에는 직접적으로 요서 진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 따라서 우리 측의 기록과 유물, 유적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기록이라 하여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또한 우리 측의 기록이 없다하여 중국의 사료를 무시할 수도 없다. 이는 아직도 ‘요서경략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아직까지 확인된 바로는 4세기 근초고왕代의 백제는 왕성한 정복활동을 하였으며 중국, 왜와의 활발한 교역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축적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멀리 중국에도 진출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해볼만 하다. 그러나 아직 사서 기록 외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이것이 사실(史實)로서 인정되려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강종훈,〈백제 대륙진출설의 제문제〉,《한국고대사논총》4, 한국고대사회연구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1
김기섭,《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2000
김상기,〈百濟의 遼西經略에 대하여〉,《白山學報》3, 1967.
유원재,《중국정사 백제전 연구》, 학연문화사, 1993
이민수,〈百濟의 遼西經略에 關한 考察〉,《論文集 : 한사대학》, 韓國社會事業大學, 1980
그리고 사실 위의 지명들은 우리에게 작위적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우선, 『양서』의 ‘백제군’은 국호를 그대로 군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어색하며, ‘진평’이라는 지명도 그것이 ‘진나라 때’ 내지 ‘진나라 말기’라는 시기 설정과 함께 매우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할 뿐 아니라 북평군의 잘못인 듯한 느낌마저 갖게 한다. 마침 북위는 서기 432년에 낙랑교군을 유주로 옮기면서 소속 현인 조선현을 따로 떼어낸 난하유역의 북평군에 편입시켰다고 하는바, 이로써 북평군과 낙랑(조선)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셈이 된다.
용어와 지명에서 사서마다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아마도 낙랑교군이 설치되면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때로는 ‘조선’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도 하였던 ‘낙랑’이 자진해서 모용부(慕容部)에 귀의한 다음 요서지역에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교군을 성립시켰다는 사실이 일단 주목되는데다가 대동강유역에 그대로 남은 옛 낙랑인들과의 관계 또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서기 313~314년에 대동강유역의 낙랑군과 남쪽의 대방군이 고구려의 공격으로 멸망한 이후에 상당수의 유민세력은 백제에 흡수되었을 터인데, 이들과 대릉하 방면의 낙랑교군 사이에 작용하는 일종의 심리적 혈연적 연대감을 백제측에서 외교 무역 활동에 적극 이용할 경우 그것은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백제의 요서경략설은 바로 이러한 시대 상황을 남조(南朝)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와중에 성립한 듯하다.
Ⅵ. 맺음말
“정복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백제는 수군을 정비하여 중국의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였고, 이어서 산둥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였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백제의 요서 진출에 관한 내용은 우리의 어깨를 으쓱하게 할만하다. 교과서로 공부하던 학생 시절의 나와, 함께 공부하던 동기들은 모두 이 사실을 확인된 진실인양 믿었고 공부하고 외워서 시험을 치렀다. 그러나 고등학교 문을 나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나에게 수많은 자료들은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 믿을 수 없는 것이라 일러주고 있다.
‘그 당시 거대한 제국이나 패권국이 아니고서야 어찌 왕 또는 제후를 임명할 수 있으며, 직할지를 통치하는 태수를 둘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으로 백제의 요서영유(遼西領有)와 중원 제패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 축소지향적 해석에 머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라 하여 그것을 믿고 따라 확인된 사실인양 신봉한다면 그것은 국수주의적인 태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요서경략설’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면 어느 것보다도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요서경략설’에 관한 여러 문헌사료가 중국 남조의 사서에는 남아있는데 우리 측의 기록에는 직접적으로 요서 진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 따라서 우리 측의 기록과 유물, 유적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기록이라 하여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또한 우리 측의 기록이 없다하여 중국의 사료를 무시할 수도 없다. 이는 아직도 ‘요서경략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아직까지 확인된 바로는 4세기 근초고왕代의 백제는 왕성한 정복활동을 하였으며 중국, 왜와의 활발한 교역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축적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멀리 중국에도 진출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해볼만 하다. 그러나 아직 사서 기록 외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이것이 사실(史實)로서 인정되려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강종훈,〈백제 대륙진출설의 제문제〉,《한국고대사논총》4, 한국고대사회연구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1
김기섭,《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2000
김상기,〈百濟의 遼西經略에 대하여〉,《白山學報》3, 1967.
유원재,《중국정사 백제전 연구》, 학연문화사, 1993
이민수,〈百濟의 遼西經略에 關한 考察〉,《論文集 : 한사대학》, 韓國社會事業大學,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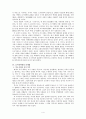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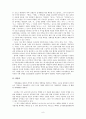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