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論
Ⅱ. 高麗 初期의 王室婚姻과 異性后妃
1. 太祖의 婚姻
가. 太祖 婚姻의 시기별 推移
나. 태조 후 비 가문의 정치적 활동
2. 太祖 子女의 婚姻
가. 惠宗의 婚姻
나. 定宗의 婚姻
Ⅳ. 結論
Ⅱ. 高麗 初期의 王室婚姻과 異性后妃
1. 太祖의 婚姻
가. 太祖 婚姻의 시기별 推移
나. 태조 후 비 가문의 정치적 활동
2. 太祖 子女의 婚姻
가. 惠宗의 婚姻
나. 定宗의 婚姻
Ⅳ. 結論
본문내용
의 공로에 대한 포상의 의미였을 것이다. 또한 이때 정종의 배우자에게 무력적 능력과 같은 것이 필요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결혼 당시에는 맏형인 혜종이 아직 태자로 있었고 연령도 30대 초반이므로 제 2왕자인 堯(定宗)에게 왕위가 넘어가리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 경우 요의 배우자를 배출한 박영규 집안에 거는 기대는 그들의 무력적 능력이라기보다는 명문가로서의 신분적 위치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박영규 집안이 신라왕족일 것이라는 추측은 이 같은 상황에서 가능하게 된다. 소
정종의 제 3비는 청주인 김경률의 딸이며 혜종 비 청주원부인과 자매간이다. 이들이 혼인이 맺어지게 된 데에는 혜종 대의 정국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혜종 2년에 왕규가 왕제인 요(定宗)와 소(光宗)를 다른 뜻을 품고 있다고 참소하자 혜종은 아우에 대한 신뢰의 표시를 내지는 그들의 세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자신의 공주를 아우인 소에게 출가시켰다고 한다. 작은 동생인 소에게 딸을 시집보낼 정도라면 큰 동생인 요에게도 일정한 배려를 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혜종은 자신의 처제를 요와 혼인시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종은 태조 생전에 부왕이 주선하는 대로 신라 왕족이면서 후백제 왕실과도 혈연으로 맺어진 박영규의 두 딸을 동시에 후 비로 맞고, 또 혜종 재위 중에는 혜종의 장인인 청주인 김경률의 딸을 제 3비로 맞아 들여 일단 왕실과 혼인한 전력이 있는 집안에서만 재차 후 비를 맞고 있다. 이는 혜종이 태조와 혼인관계를 맺은 집안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문에서도 후 비를 맞았던 것과 비교하여 더욱 폐쇄적인 단계로 혼인관계가 고정되어 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려 왕실 혼인의 단계적 폐쇄성은 이미 고려 왕실이 폭넓은 지방세력의 후원 하에 그들과 연합하여 정권을 유지할 필요성이 감소되어 감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소수의 지배세력 위에서 왕실의 권위를 독점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하여 다음 단계에 와서 고려 왕실은 왕족내혼을 맺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Ⅲ. 結論
본론의 내용은 고려초기 왕실에서 행해지던 혼인형태와, 그로 인해 족내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근원적 배경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다. 요약하면
태조는 즉위 이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29명의 후 비와 혼인하였는데, 시기에 따라 혼인 양상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궁예의 휘하장군으로 활동하던 시기에는 출동지역 부호 가의 딸을, 왕위에 오른 후에는 지방 요충지 호족의 딸을 후 비로 맞아들였으며, 후삼국 통일 이후에는 신라 왕족과의 혼인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태조의 장인들은 태조를 추대하고 고려를 건국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도 있고, 중국에 대한 외교활동 등 학문적 능력으로 태조를 보필한 인물도 있으며, 후백제와의 치열한 접전 지역에서 귀부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도 있다. 그리고 태조 후 비를 배출한 지역을 살펴보면, 전국 각 도에서 후 비를 배출하였는데,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근거지를 주축으로 하고 신라지역인 경주 및 후백제 계열과도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러므로 이 기간 중의 왕실혼인의 최대 관심은, 후삼국을 통합하여 통일 국가를 이루려는 태조의 국가적 과제를 혈족 적 연계를 통해 완성하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시기별 혼인양상이 변화하면서 아울러 동일 가문에서 연속적으로 혼인하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이는 고려 왕실의 혼인이 폭넓은 지방사회의 토착세력을 중앙의 지배세력으로 전화시키려는 노력 대신에 이미 중앙 정치 세력화한 인물들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이를 영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일부가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고려 왕실이 이미 국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를 옹호하는 인물들을 주변에 포열하여 그들의 협조 하에 왕조 권력이 영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태조에서 정종에 이르는 고려 초기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방체제가 혼인관계 속에서도 수용되었던 시기이며, 또 한편으로는 광종 때에 왕실 족내혼이 맺어질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기 위한 기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는 과도기의 혼인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골품질서를 존중하던 신라 왕실이 진골 왕족 이외의 인물을 왕비로 삼을 수 없었던 전례를 깨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도적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고려 왕실 혼인은 족내혼 후 비와 異性后妃를 왕후로 맞이하고, 모계의 왕족 여부에 상관없이 왕자의 왕위계승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고려 초기에 왕실혼인의 커다란 두 가지 유형이 이미 정해졌으므로, 이후의 왕들은 이 유형 가운데 어느 것이든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고려 초기의 왕실혼인이 갖는 독출적 사회현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Ⅰ. 基本資料
《高麗史》, 延世大學校 東方學硏究所, 1995.
《高麗史節要》, 東國文化社, 1960.
《高麗時代 后妃》, 민음사, 1992.
《三國史記》, 景仁文化社, 1973.
《三國遺事》, 景仁文化社, 1973.
《東國通鑑》, 조선광문회, 1911.
《東文選》, 徐居正, 민족문화추진회, 1997.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1968∼1970.
《高麗名賢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1973∼1980.
《韓國中世社會史資料集》, 許興植編, 亞細亞文化社, 1972.
《三國史節要》, 亞細亞文化社, 1973.
Ⅱ. 論 文
강만길, 《고려토지제도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鄭容淑, 《高麗王室 族內婚硏究》, 새문사, 1988.
洪承基, 《고려귀족사회와 奴婢》, 일조각, 1983.
申圭東, 〈한국의 婚姻制度〉, 《成均法學》7, 1962.
金泰永, 〈三國遺事에 보이는 一然의 歷史意識에 대하여〉, 《 熙史學》5, 1974.
―, 〈고려후기 士類層의 現實認識〉, 《창작과 비평》44, 1977.
閔賢九, 〈고려후기 권문세족의 성립〉, 《湖南文化硏究》6, 1974.
―, 〈고려사에 反映된 名分論의 性格〉, 《震檀學報》40, 1975.
朴敬子, 〈견훤의 세력과 對王建關係〉, 《淑大史論》11, 12 합집, 1982.
정종의 제 3비는 청주인 김경률의 딸이며 혜종 비 청주원부인과 자매간이다. 이들이 혼인이 맺어지게 된 데에는 혜종 대의 정국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혜종 2년에 왕규가 왕제인 요(定宗)와 소(光宗)를 다른 뜻을 품고 있다고 참소하자 혜종은 아우에 대한 신뢰의 표시를 내지는 그들의 세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자신의 공주를 아우인 소에게 출가시켰다고 한다. 작은 동생인 소에게 딸을 시집보낼 정도라면 큰 동생인 요에게도 일정한 배려를 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혜종은 자신의 처제를 요와 혼인시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종은 태조 생전에 부왕이 주선하는 대로 신라 왕족이면서 후백제 왕실과도 혈연으로 맺어진 박영규의 두 딸을 동시에 후 비로 맞고, 또 혜종 재위 중에는 혜종의 장인인 청주인 김경률의 딸을 제 3비로 맞아 들여 일단 왕실과 혼인한 전력이 있는 집안에서만 재차 후 비를 맞고 있다. 이는 혜종이 태조와 혼인관계를 맺은 집안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문에서도 후 비를 맞았던 것과 비교하여 더욱 폐쇄적인 단계로 혼인관계가 고정되어 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려 왕실 혼인의 단계적 폐쇄성은 이미 고려 왕실이 폭넓은 지방세력의 후원 하에 그들과 연합하여 정권을 유지할 필요성이 감소되어 감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소수의 지배세력 위에서 왕실의 권위를 독점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하여 다음 단계에 와서 고려 왕실은 왕족내혼을 맺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Ⅲ. 結論
본론의 내용은 고려초기 왕실에서 행해지던 혼인형태와, 그로 인해 족내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근원적 배경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다. 요약하면
태조는 즉위 이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29명의 후 비와 혼인하였는데, 시기에 따라 혼인 양상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궁예의 휘하장군으로 활동하던 시기에는 출동지역 부호 가의 딸을, 왕위에 오른 후에는 지방 요충지 호족의 딸을 후 비로 맞아들였으며, 후삼국 통일 이후에는 신라 왕족과의 혼인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태조의 장인들은 태조를 추대하고 고려를 건국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도 있고, 중국에 대한 외교활동 등 학문적 능력으로 태조를 보필한 인물도 있으며, 후백제와의 치열한 접전 지역에서 귀부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도 있다. 그리고 태조 후 비를 배출한 지역을 살펴보면, 전국 각 도에서 후 비를 배출하였는데,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근거지를 주축으로 하고 신라지역인 경주 및 후백제 계열과도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러므로 이 기간 중의 왕실혼인의 최대 관심은, 후삼국을 통합하여 통일 국가를 이루려는 태조의 국가적 과제를 혈족 적 연계를 통해 완성하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시기별 혼인양상이 변화하면서 아울러 동일 가문에서 연속적으로 혼인하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이는 고려 왕실의 혼인이 폭넓은 지방사회의 토착세력을 중앙의 지배세력으로 전화시키려는 노력 대신에 이미 중앙 정치 세력화한 인물들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이를 영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일부가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고려 왕실이 이미 국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를 옹호하는 인물들을 주변에 포열하여 그들의 협조 하에 왕조 권력이 영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태조에서 정종에 이르는 고려 초기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방체제가 혼인관계 속에서도 수용되었던 시기이며, 또 한편으로는 광종 때에 왕실 족내혼이 맺어질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기 위한 기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는 과도기의 혼인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골품질서를 존중하던 신라 왕실이 진골 왕족 이외의 인물을 왕비로 삼을 수 없었던 전례를 깨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도적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고려 왕실 혼인은 족내혼 후 비와 異性后妃를 왕후로 맞이하고, 모계의 왕족 여부에 상관없이 왕자의 왕위계승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고려 초기에 왕실혼인의 커다란 두 가지 유형이 이미 정해졌으므로, 이후의 왕들은 이 유형 가운데 어느 것이든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고려 초기의 왕실혼인이 갖는 독출적 사회현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Ⅰ. 基本資料
《高麗史》, 延世大學校 東方學硏究所, 1995.
《高麗史節要》, 東國文化社, 1960.
《高麗時代 后妃》, 민음사, 1992.
《三國史記》, 景仁文化社, 1973.
《三國遺事》, 景仁文化社, 1973.
《東國通鑑》, 조선광문회, 1911.
《東文選》, 徐居正, 민족문화추진회, 1997.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1968∼1970.
《高麗名賢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1973∼1980.
《韓國中世社會史資料集》, 許興植編, 亞細亞文化社, 1972.
《三國史節要》, 亞細亞文化社, 1973.
Ⅱ. 論 文
강만길, 《고려토지제도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鄭容淑, 《高麗王室 族內婚硏究》, 새문사, 1988.
洪承基, 《고려귀족사회와 奴婢》, 일조각, 1983.
申圭東, 〈한국의 婚姻制度〉, 《成均法學》7, 1962.
金泰永, 〈三國遺事에 보이는 一然의 歷史意識에 대하여〉, 《 熙史學》5, 1974.
―, 〈고려후기 士類層의 現實認識〉, 《창작과 비평》44, 1977.
閔賢九, 〈고려후기 권문세족의 성립〉, 《湖南文化硏究》6, 1974.
―, 〈고려사에 反映된 名分論의 性格〉, 《震檀學報》40, 1975.
朴敬子, 〈견훤의 세력과 對王建關係〉, 《淑大史論》11, 12 합집, 1982.
추천자료
 경복궁을 다녀와서 (사진과 함께 첨부 되었으며 자세한 유적 조사와 함께 개인적인 감상을 적...
경복궁을 다녀와서 (사진과 함께 첨부 되었으며 자세한 유적 조사와 함께 개인적인 감상을 적... 조선후기 여성사
조선후기 여성사 조선시대 및 일제강점기의 교육사회
조선시대 및 일제강점기의 교육사회 조선시대 성풍속
조선시대 성풍속 구지가(龜旨歌)의 해석과 내용연구
구지가(龜旨歌)의 해석과 내용연구 여성 노동시장에서의 적극적 조치
여성 노동시장에서의 적극적 조치 [족보][족보의 종류][족보의 용어][족보의 체제][족보의 내용][족보와 양반의식]족보의 종류,...
[족보][족보의 종류][족보의 용어][족보의 체제][족보의 내용][족보와 양반의식]족보의 종류,... 동성동본금혼제 실태와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존폐론 의견
동성동본금혼제 실태와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존폐론 의견 역사교육과 교수법 지도안 세안 - 고등학교 국사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역사교육과 교수법 지도안 세안 - 고등학교 국사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역사 교수학습지도안
역사 교수학습지도안 역사신문(11-11)
역사신문(11-11) 한국사 - 공민왕의 일대기
한국사 - 공민왕의 일대기 [여성사] 조선시대의 여성
[여성사] 조선시대의 여성 공녀와 환향녀의 정의
공녀와 환향녀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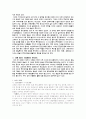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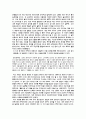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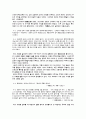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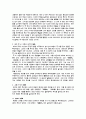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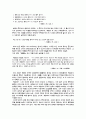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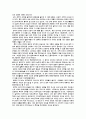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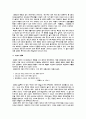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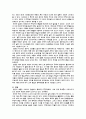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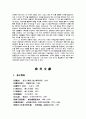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