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不法原人給與에 대한 橫領問題>
Ⅰ. 序
1. 制度의 意義 및 趣旨
2. 論議의 方向
Ⅱ.本
1. 要 件
2. 效 果
3. 學說의 檢討와 批判
4. 대상 판결
5.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Ⅲ. 結
1. 結 論
2. 餘 論
Ⅰ. 序
1. 制度의 意義 및 趣旨
2. 論議의 方向
Ⅱ.本
1. 要 件
2. 效 果
3. 學說의 檢討와 批判
4. 대상 판결
5.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Ⅲ. 結
1. 結 論
2. 餘 論
본문내용
귀속문제가 아닌 “불법원인에 의한 위탁이 신뢰관계에 의한 보관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姜東氾, 前揭論文, 193면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적 가치있는 출연”이란 소유권이전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계약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종국적인 이익”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의도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할 따름 예컨대, 불법한 채무부담을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만약 이 상태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한다면 저당권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 그 불법한 채무의 이행강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지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시키는 것만을 불법원인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민사판례가 불법한 목적으로 금전을 위탁한 경우도 민법 제746조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불법한 송금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위탁한 사례에서 민법 제746조에 의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등)
다만 결과적으로도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규정에 따라 위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불법원인위탁의 경우에는 소유권귀속문제는 불법원인급부와는 다르다. 불법원인급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 의사로 급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소유권은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그 반사적 효과로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전원합의체판결은 소위 “불법원인급부”에 관한 판결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불법원인위탁의 경우는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비추어 반환청구가 금지되어야 하므로 소유권에 따른 반환청구도 거부되는 것이지 급여자가 그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급여자는 수익자에게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급여자와 수익자의 약정내용은 급여자가 수익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보호할 가치있는 권리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없다.(행정법상의 공권이론이 반사적 이익과 공권을 구분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ㄷ. 위탁신임관계의 문제
횡령죄의 본질은 신뢰에 기초한 위탁관계의 침해, 즉 배신성에 있다. 즉 횡령죄는 범죄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는 보호가치 없는 신뢰의 파괴에 불과하므로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강동범, 전게논문, 194면 ; 박상기, 전게서, 352면 등
그러나, 횡령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양자간의 신뢰관계를 보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피해자의 소유권의 보호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위 견해는 소위 불법원인위탁의 경우 민법 제756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상 소유권이 급여자에게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는 보호가치가 없는 신뢰관계의 파괴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수익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급여자의 소유권이 파괴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인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위 견해는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신뢰관계라고 말하고 있다. 그 견해대로 불법한 목적을 이루는데 협력해야 할 신뢰관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가 임의로 불법한 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다시 급부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민법상으로도 긍정되고 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더 나아가 형사적으로도 보호되고 권장되어야 할 또 하나의 신뢰관계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수익자는 급부자의 물건을 위탁받으면서 이와 동시에 적어도 급부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인 의미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며 이는 형사상으로 보호되어야 할 신뢰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하는 수익자의 무단착복은 범죄라고 구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ㄹ. 법질서 조화의 문제
불법원인급여물은 민사상 반환청구권을 상실한 재물이므로 이를 횡령죄로 처벌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어쩌면 민법, 형법간의 모순된 법질서를 용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민사상 수익자로서는 급여물을 급부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무단 착복이 처벌된다는 것은 어색한 법해석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형법은 개인의 소유권을 시작으로 하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생활질서의 유지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민법은 개인간의 이해, 법률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양자는 목적, 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경제생활질서의 유지라고 하는 형법의 목적에서 보면 피해자가 민법상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 경제생활질서를 침해하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는 충분한 합리성이 있는 것이다. 吉村 弘, 不法原因給付と橫領罪の成否について, 刑事法セミナⅢ 刑法各論(下), 法務總合硏究所 編, 新山社出版株式會社, 1991. 145면
(7) 批判
생각건대 횡령죄의 성부는 피해자의 보호필요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가벌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며,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도 횡령죄에 의하여 보호해야 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요한다. 그러나 민법 제 746의 취지에 비추어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반환청구할 수 없게 된 재물의 소유권은 수령자에게 이전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도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 위탁물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타인의 재물임을 전제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해야 한다. 다만 불법원인급여라 할지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기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적 가치있는 출연”이란 소유권이전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계약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종국적인 이익”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의도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할 따름 예컨대, 불법한 채무부담을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만약 이 상태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한다면 저당권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 그 불법한 채무의 이행강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지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시키는 것만을 불법원인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민사판례가 불법한 목적으로 금전을 위탁한 경우도 민법 제746조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불법한 송금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위탁한 사례에서 민법 제746조에 의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등)
다만 결과적으로도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규정에 따라 위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불법원인위탁의 경우에는 소유권귀속문제는 불법원인급부와는 다르다. 불법원인급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 의사로 급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소유권은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그 반사적 효과로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전원합의체판결은 소위 “불법원인급부”에 관한 판결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불법원인위탁의 경우는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비추어 반환청구가 금지되어야 하므로 소유권에 따른 반환청구도 거부되는 것이지 급여자가 그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급여자는 수익자에게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급여자와 수익자의 약정내용은 급여자가 수익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보호할 가치있는 권리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없다.(행정법상의 공권이론이 반사적 이익과 공권을 구분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ㄷ. 위탁신임관계의 문제
횡령죄의 본질은 신뢰에 기초한 위탁관계의 침해, 즉 배신성에 있다. 즉 횡령죄는 범죄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는 보호가치 없는 신뢰의 파괴에 불과하므로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강동범, 전게논문, 194면 ; 박상기, 전게서, 352면 등
그러나, 횡령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양자간의 신뢰관계를 보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피해자의 소유권의 보호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위 견해는 소위 불법원인위탁의 경우 민법 제756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상 소유권이 급여자에게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는 보호가치가 없는 신뢰관계의 파괴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수익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급여자의 소유권이 파괴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인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위 견해는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신뢰관계라고 말하고 있다. 그 견해대로 불법한 목적을 이루는데 협력해야 할 신뢰관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가 임의로 불법한 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다시 급부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민법상으로도 긍정되고 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더 나아가 형사적으로도 보호되고 권장되어야 할 또 하나의 신뢰관계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수익자는 급부자의 물건을 위탁받으면서 이와 동시에 적어도 급부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인 의미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며 이는 형사상으로 보호되어야 할 신뢰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하는 수익자의 무단착복은 범죄라고 구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ㄹ. 법질서 조화의 문제
불법원인급여물은 민사상 반환청구권을 상실한 재물이므로 이를 횡령죄로 처벌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어쩌면 민법, 형법간의 모순된 법질서를 용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민사상 수익자로서는 급여물을 급부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무단 착복이 처벌된다는 것은 어색한 법해석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형법은 개인의 소유권을 시작으로 하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생활질서의 유지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민법은 개인간의 이해, 법률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양자는 목적, 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경제생활질서의 유지라고 하는 형법의 목적에서 보면 피해자가 민법상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 경제생활질서를 침해하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는 충분한 합리성이 있는 것이다. 吉村 弘, 不法原因給付と橫領罪の成否について, 刑事法セミナⅢ 刑法各論(下), 法務總合硏究所 編, 新山社出版株式會社, 1991. 145면
(7) 批判
생각건대 횡령죄의 성부는 피해자의 보호필요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가벌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며,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도 횡령죄에 의하여 보호해야 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요한다. 그러나 민법 제 746의 취지에 비추어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반환청구할 수 없게 된 재물의 소유권은 수령자에게 이전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도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 위탁물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타인의 재물임을 전제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해야 한다. 다만 불법원인급여라 할지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기
추천자료
 약물(마약류) 남용의 원인 및 예방 전략과 치료
약물(마약류) 남용의 원인 및 예방 전략과 치료 청소년 비행 문제의 다양한 원인과 예방대책
청소년 비행 문제의 다양한 원인과 예방대책 군대 내 폭력에 관하여 발생원인, 예방 및 해결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군대 내 폭력에 관하여 발생원인, 예방 및 해결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낙태문제] 낙태의 원인 및 이유 에 대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낙태문제] 낙태의 원인 및 이유 에 대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낙태문제] 낙태의 원인 및 이유 에 대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낙태문제] 낙태의 원인 및 이유 에 대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사회보장론 산재은폐 및 산재불승인의 원인, 특징,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2년 추천 우수 레...
사회보장론 산재은폐 및 산재불승인의 원인, 특징,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2년 추천 우수 레... [A+평가 레포트]고령화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A+평가 레포트]고령화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여성 불평등의 정의, 원인, 사회적 불평등, 입사, 승진, 보육, 육아휴직, 임금, 해고, 변화, ...
여성 불평등의 정의, 원인, 사회적 불평등, 입사, 승진, 보육, 육아휴직, 임금, 해고, 변화, ...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제 5공화국 (10.26 발생원인, 5.17 비상계엄, 서울의 봄, 사북사태, 12.12군사쿠테타, 5.18 ...
제 5공화국 (10.26 발생원인, 5.17 비상계엄, 서울의 봄, 사북사태, 12.12군사쿠테타, 5.18 ... [여성학과제] 성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 (전자발찌,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화학적거세,정신병...
[여성학과제] 성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 (전자발찌,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화학적거세,정신병... 낙태란,낙태를 하는 원인,기독교에서 본 낙태의 관점,긍정적 입장 VS 부정적 입장,낙태 법률,...
낙태란,낙태를 하는 원인,기독교에서 본 낙태의 관점,긍정적 입장 VS 부정적 입장,낙태 법률,... 한부모가족의 개념,한부모가족의 원인분석,한부모가족의 현황분석,한부모가족의 실태 및 사례...
한부모가족의 개념,한부모가족의 원인분석,한부모가족의 현황분석,한부모가족의 실태 및 사례...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와 경험 등 학...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와 경험 등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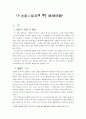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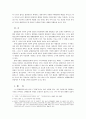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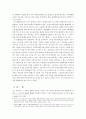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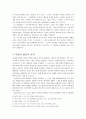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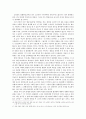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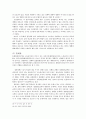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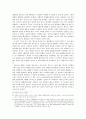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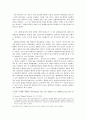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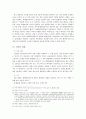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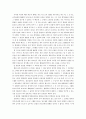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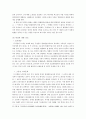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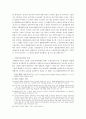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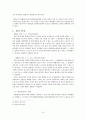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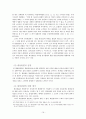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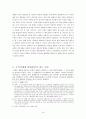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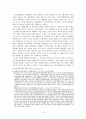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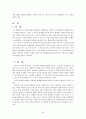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