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관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매우 소박하게 보이는 건물이다.
1칸은 문을 내어 정전의 안팎으로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하였다.
<악공청>
종묘제례 때 음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연습하고 악기를 준비하며 대기하던 곳이다.
정전과 영녕전의 악공청이 별도로 있었으며 마루와 방이 있던 간소한 건물이었다.
정전과 영녕전의 악공청은 원 상태로의 복원이 되어 있지 않으며,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어 내부 구조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종묘제례
조선 역대의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종묘의 제향예절.
1975년 5월 3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어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신위는 종묘 정전과 조묘인 영녕전에 나뉘어 봉안되어 있다. 정전의 19실에는 태조~순종의 48위의 신주를, 영녕전의 15실에는 태조의 5대조 목조~장조의, 주로 추존된 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한 32위의 신주를 각각 모시고 있다. 조선시대의 종묘제향은 왕이 친림하는 대사로서 사직과 함께 길례였다. 제사는 사가와 마찬가지로 밤중에 지냈으며, 임금을 비롯한 왕세자, 여러 제관, 문무백관, 무·아악사 등 7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조선시대의 본전 제향은 4맹삭 상순, 즉 1 ·4 ·7 ·10월의 각 10일 이내와 납일, 즉 동지 후 셋째 술일에 대향을 드렸고, 매월 삭망과 5속일에는 소사를 지냈다. 한편, 영녕전의 대향제는 4월과 8월 상순에 행하였다. 그러나 8 ·15광복 후부터 종묘·영녕전의 제향은 매년 5월 첫 일요일에 봉행한다.
제례 절차는, ① 선행절차, ② 취위, ③ 영신, ④ 행농나례, ⑤ 진찬, ⑥ 초헌, ⑦ 아헌례, ⑧ 종헌례, ⑨ 음복례, ⑩ 철변두, ⑪ 망료, ⑫ 제후처리의 순으로 진행된다. 종묘제향은, 일제 강점기에는 이왕가에서 지냈고, 광복 후에는 전주이씨 종문에서 섭행하고 있다. 또, 종묘제례에는 음악과 무용이 따르는데, 음악은 《보태평》 《정대업》이 연주되고, 무용은 팔일무(:64명이 춤추는 文舞와 武舞)가 연행된다. 음악과 무용은 현재 국립국악원의 악사와 무인들이 대행한다.
※종묘제례악
조선 역대 군왕의 신위를 모시는 종묘와 영녕전의 제향에 쓰이는 음악.
1964년 12월 7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어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종묘의 향사는 역대 음력으로 4맹삭 즉, 1·4·7·10월과 납향일 등 모두 5회에 걸쳐 받들어 왔으나 근년에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주관으로 5월 첫 일요일에 한번 받들고 있다.
조선의 종묘가 이룩된 것은 1395년(태조 4)이며 이 때의 종묘제례악에는 당악·향악·아악 등을 두루 써왔다. 1425년(세종 7) 세종대왕은 친히 종묘에 제향하고 환궁한 뒤 이조판서 허조에게 \"종묘대제에 먼저 당악을 쓰고 겨우 종헌에서야 향악을 쓰니 앞으로는 조고 신령께서 생시에 익히 들으시던 향악으로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떠할지 맹사성과 의논하라\"고 하였고, 중국 음악이론가 박연과 사대적 유신들의 반대 속에서도 \"우리의 향악을 버릴 수 없다\"라는 굳은 의지로 마침내 1435년(세종 17) 우리의 향악으로 《보태평》 11곡(曲)과 《정대업》 15곡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에는 제사음악이 아니고 조종의 공덕을 기리고 개국 창업의 어려움을 길이 기념하기 위하여 국초의 고취악과 향악을 참작하여 만들었던 것이며, 이것이 종묘의 제례악으로 채택된 것은 1463년(세조 9)이었다. 세조는 \"《정대업》과 《보태평》은 그 성용이 성대하므로 종묘에 쓰지 않음은 가석타\"(세조실록)하여 최항에게 명하여 간단히 간추려 고치게 한 후 제례악으로 채택케 하였다.
이와 같이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된 《보태평》과 《정대업》은 500여 년 동안 전승되면서 변화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연주되고 있다. 《보태평》은 조종의 문덕을 내용으로 한 것이고 《정대업》은 무공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종묘제례악은 등가와 헌가 두 곳에 악기를 진설하고 식차에 따라 등가와 헌가에서 교대로 주악하는 것이 문묘와 똑같다.
맨 처음 영신례는 희문곡을 9번 반복하는데 이를 희문구성이라 하며 일무는 문무이고 헌가에서 주악한다. 두 번째는 전폐례로서 등가에서 전폐 희문이 연주되고 문무가 행해진다. 세 번째는 진찬례이며 헌가에서 진찬곡이 연주되고 일무는 없다. 네 번째는 첫잔을 드리는 초헌례로 헌관이 제1실 신위 앞으로 가기 전까지는 희문을 연주하고, 그 후부터는 등가에서 《보태평》 11곡을 모두 연주하며 일무는 문무를 춘다. 다음 아헌과 종헌례는 함께 헌가에서 《정대업》 11곡을 연주하며 일무는 무무를 춘다. 일곱 번째는 철변두의 순서로 등가에서 진찬이 연주되고 마지막 송신례는 헌가에서 진찬을 연주한다.
종묘악의 선법은 《보태평》은 청황종조 치선법(:sol선법)으로 되었고, 《정대업》 주음은 《보태평》과 같으나 선법은 우선법(:la선법)으로 작곡되어 한국음계의 고유한 두 가지 특성을 잘 발휘하고 있으며 악곡 구조면에 있어 거의 완벽을 자랑할 만하다. 이에 쓰이는 악기에는, 아악기로 편종·편경·축, 당악기로 방향·장고·아쟁·당피리 따위, 그리고 한국 고유의 횡취악기인 대금 등이 있으며 매우 다채롭고 화려한 구색이다.
종묘제례 때 부르는 노래는 종묘악장이라 하며 순한문으로 된 이 노래를 제향 절차에 따라 음악에 맞추어 부른다. 그리고 제향에서는 절차에 따라 춤도 추는데 이 때의 춤을 일무라고 한다.
《보태평》 음악에 맞추어 추는 춤을 보태평지무 즉, 문무라고 하며, 《정대업》 음악에 맞추어 추는 춤을 정대업지무 즉, 무무라고 하는데, 이 일무는 종묘제향에서 음악과 함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문무는 왼손에 약, 오른손에 적을 들고 추며, 무무는 앞의 석 줄은 검, 뒤의 석 줄은 창을 들고 춘다. 이 일무는 원래는 6일무였지만 지금은 8일무로 64명이 춘다. 종묘제향은 8·15광복 전까지 연 4회 실시해 오다가 광복과 함께 한때 자취를 감추었으나 1969년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주선으로 다시 부활, 매년 1회 봉행하고 있다.
1칸은 문을 내어 정전의 안팎으로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하였다.
<악공청>
종묘제례 때 음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연습하고 악기를 준비하며 대기하던 곳이다.
정전과 영녕전의 악공청이 별도로 있었으며 마루와 방이 있던 간소한 건물이었다.
정전과 영녕전의 악공청은 원 상태로의 복원이 되어 있지 않으며,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어 내부 구조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종묘제례
조선 역대의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종묘의 제향예절.
1975년 5월 3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어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신위는 종묘 정전과 조묘인 영녕전에 나뉘어 봉안되어 있다. 정전의 19실에는 태조~순종의 48위의 신주를, 영녕전의 15실에는 태조의 5대조 목조~장조의, 주로 추존된 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한 32위의 신주를 각각 모시고 있다. 조선시대의 종묘제향은 왕이 친림하는 대사로서 사직과 함께 길례였다. 제사는 사가와 마찬가지로 밤중에 지냈으며, 임금을 비롯한 왕세자, 여러 제관, 문무백관, 무·아악사 등 7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조선시대의 본전 제향은 4맹삭 상순, 즉 1 ·4 ·7 ·10월의 각 10일 이내와 납일, 즉 동지 후 셋째 술일에 대향을 드렸고, 매월 삭망과 5속일에는 소사를 지냈다. 한편, 영녕전의 대향제는 4월과 8월 상순에 행하였다. 그러나 8 ·15광복 후부터 종묘·영녕전의 제향은 매년 5월 첫 일요일에 봉행한다.
제례 절차는, ① 선행절차, ② 취위, ③ 영신, ④ 행농나례, ⑤ 진찬, ⑥ 초헌, ⑦ 아헌례, ⑧ 종헌례, ⑨ 음복례, ⑩ 철변두, ⑪ 망료, ⑫ 제후처리의 순으로 진행된다. 종묘제향은, 일제 강점기에는 이왕가에서 지냈고, 광복 후에는 전주이씨 종문에서 섭행하고 있다. 또, 종묘제례에는 음악과 무용이 따르는데, 음악은 《보태평》 《정대업》이 연주되고, 무용은 팔일무(:64명이 춤추는 文舞와 武舞)가 연행된다. 음악과 무용은 현재 국립국악원의 악사와 무인들이 대행한다.
※종묘제례악
조선 역대 군왕의 신위를 모시는 종묘와 영녕전의 제향에 쓰이는 음악.
1964년 12월 7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어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종묘의 향사는 역대 음력으로 4맹삭 즉, 1·4·7·10월과 납향일 등 모두 5회에 걸쳐 받들어 왔으나 근년에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주관으로 5월 첫 일요일에 한번 받들고 있다.
조선의 종묘가 이룩된 것은 1395년(태조 4)이며 이 때의 종묘제례악에는 당악·향악·아악 등을 두루 써왔다. 1425년(세종 7) 세종대왕은 친히 종묘에 제향하고 환궁한 뒤 이조판서 허조에게 \"종묘대제에 먼저 당악을 쓰고 겨우 종헌에서야 향악을 쓰니 앞으로는 조고 신령께서 생시에 익히 들으시던 향악으로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떠할지 맹사성과 의논하라\"고 하였고, 중국 음악이론가 박연과 사대적 유신들의 반대 속에서도 \"우리의 향악을 버릴 수 없다\"라는 굳은 의지로 마침내 1435년(세종 17) 우리의 향악으로 《보태평》 11곡(曲)과 《정대업》 15곡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에는 제사음악이 아니고 조종의 공덕을 기리고 개국 창업의 어려움을 길이 기념하기 위하여 국초의 고취악과 향악을 참작하여 만들었던 것이며, 이것이 종묘의 제례악으로 채택된 것은 1463년(세조 9)이었다. 세조는 \"《정대업》과 《보태평》은 그 성용이 성대하므로 종묘에 쓰지 않음은 가석타\"(세조실록)하여 최항에게 명하여 간단히 간추려 고치게 한 후 제례악으로 채택케 하였다.
이와 같이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된 《보태평》과 《정대업》은 500여 년 동안 전승되면서 변화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연주되고 있다. 《보태평》은 조종의 문덕을 내용으로 한 것이고 《정대업》은 무공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종묘제례악은 등가와 헌가 두 곳에 악기를 진설하고 식차에 따라 등가와 헌가에서 교대로 주악하는 것이 문묘와 똑같다.
맨 처음 영신례는 희문곡을 9번 반복하는데 이를 희문구성이라 하며 일무는 문무이고 헌가에서 주악한다. 두 번째는 전폐례로서 등가에서 전폐 희문이 연주되고 문무가 행해진다. 세 번째는 진찬례이며 헌가에서 진찬곡이 연주되고 일무는 없다. 네 번째는 첫잔을 드리는 초헌례로 헌관이 제1실 신위 앞으로 가기 전까지는 희문을 연주하고, 그 후부터는 등가에서 《보태평》 11곡을 모두 연주하며 일무는 문무를 춘다. 다음 아헌과 종헌례는 함께 헌가에서 《정대업》 11곡을 연주하며 일무는 무무를 춘다. 일곱 번째는 철변두의 순서로 등가에서 진찬이 연주되고 마지막 송신례는 헌가에서 진찬을 연주한다.
종묘악의 선법은 《보태평》은 청황종조 치선법(:sol선법)으로 되었고, 《정대업》 주음은 《보태평》과 같으나 선법은 우선법(:la선법)으로 작곡되어 한국음계의 고유한 두 가지 특성을 잘 발휘하고 있으며 악곡 구조면에 있어 거의 완벽을 자랑할 만하다. 이에 쓰이는 악기에는, 아악기로 편종·편경·축, 당악기로 방향·장고·아쟁·당피리 따위, 그리고 한국 고유의 횡취악기인 대금 등이 있으며 매우 다채롭고 화려한 구색이다.
종묘제례 때 부르는 노래는 종묘악장이라 하며 순한문으로 된 이 노래를 제향 절차에 따라 음악에 맞추어 부른다. 그리고 제향에서는 절차에 따라 춤도 추는데 이 때의 춤을 일무라고 한다.
《보태평》 음악에 맞추어 추는 춤을 보태평지무 즉, 문무라고 하며, 《정대업》 음악에 맞추어 추는 춤을 정대업지무 즉, 무무라고 하는데, 이 일무는 종묘제향에서 음악과 함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문무는 왼손에 약, 오른손에 적을 들고 추며, 무무는 앞의 석 줄은 검, 뒤의 석 줄은 창을 들고 춘다. 이 일무는 원래는 6일무였지만 지금은 8일무로 64명이 춘다. 종묘제향은 8·15광복 전까지 연 4회 실시해 오다가 광복과 함께 한때 자취를 감추었으나 1969년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주선으로 다시 부활, 매년 1회 봉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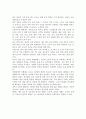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