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 propose
2. <만전춘 별사>, 원전(原典)의 확정
3. 연구사 개관 및 그동안의 <만전춘 별사> 연구방향
4. <만전춘 별사>의 해석 문제
5. <만전춘 별사>의 작자(writer) 문제(이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사 정리)
6. 부끄러운 역사의 흔적, 고려시대 공녀(貢女)제도
7. 고려시대 사회상을 바탕으로 한 <만전춘 별사> 새로운 해석
8. 맺음말
2. <만전춘 별사>, 원전(原典)의 확정
3. 연구사 개관 및 그동안의 <만전춘 별사> 연구방향
4. <만전춘 별사>의 해석 문제
5. <만전춘 별사>의 작자(writer) 문제(이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사 정리)
6. 부끄러운 역사의 흔적, 고려시대 공녀(貢女)제도
7. 고려시대 사회상을 바탕으로 한 <만전춘 별사> 새로운 해석
8. 맺음말
본문내용
이기지 못하여 우물에 빠져 죽는 자가 있는가하면, 목을 매어 죽는 자도 있다. 또한 기가 막혀 기절하는 자도 있고, 피눈물을 쏟고 실명(失明)하는 자도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고려인들은 홀로 무슨 죄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옛날에 동해에 원한을 품은 여자가 있으므로 3년 한재(旱災)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 고려에는 원한을 품은 여자가 그 얼마인가? 해마다 나라에 수재와 한재가 끊이지 않고 백성이 굶주려 죽는 자가 많은 것은 이러한 원한이 모여서 생기는 괴변이 아니겠는가?” 《고려사》, 열전22, 이곡
공녀로 뽑혀 이역만리 중국 땅으로 끌려가야만 할 운명에 처한 처녀들과 그 가족 친지들의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중에는 헤어짐을 앞둔 연인도 있었을 것이다. 떠나가야 하는 여자와 그 여자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남자. 사랑하는 연인이 이국땅으로 떠나야하는 상황에서,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한 남자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후대에까지 기록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현재의 <만전춘 별사>가 아니었을까?
1연에서 화자는 임과 함께 있는 밤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날이 밝으면 헤어져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2연에서, 사랑하는 연인은 이미 자신의 옆에 없고, 화자는 ‘임 없는 내가 어찌 잠을 잘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임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활짝 핀 복숭아꽃으로 인해 더욱 더 짙어지고 있다.
3연에서는, 임과 같이 평생을 함께하고, 죽어서도 같이하자고 약속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약속을 저버리고 떠나간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나타난다.
4연은 1~3연과는 달리 비유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 속의 화자도 앞선 1~3연과는 다르게 해석된다.
연인을 떠나보내고 그리움이 깊어진 남자는 멀리 원나라까지 연인을 찾아갔을 지도 모른다. 4연은 그러한 고려시대 평민남자(<만전춘 별사> 원래의 화자)에게 원나라 사람이 하는 이야기이다.
‘아련 비올하’는 지금까지의 연구사에서도 ‘어린 오리새끼’ 혹은 ‘연약한 오리’로 해석되었었다. 이 연약한 오리는, 당시 원나라 사람들이 고려 사람을 보는 시각을 나타낸 것이었다. 당시 두 나라는 강한 수직적 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 백성들 사이에도 우러러보고 얕보는 시각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원나라 사람이 말한다.
“고려사람아, 고려사람아, 작은 나라 고려의 사람아.” “여울(=고려)은 어디 두고 연못(=원나라)에 왔느냐 (=어찌하여 고려땅을 떠나 멀리 원나라까지 왔느냐?)” “원나라로 인해 (고려가) 얼면 고려땅도 (살기) 좋은데, 고려땅도 좋은데. (=고려땅이 우리 원나라에 의해 정복되면 고려땅고 살기 좋아질 것이라는 의미 = 고려에서 살기 힘들어서 왔느냐?)”
5연의 ‘남산옥산금수산’ 또한 지금도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이다. 성현경 선생님은,
“남산옥산금수산은 각각 따뜻한 아랫목, 옥베개, 수놓은 비단이불을 뜻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여성남성을 상징한다.” 《한국고전시가 작품론》1, 집문당, 1992, Page 322 - <만전춘별사 재론>, 성현경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5 - <만전춘별사의 구조>
고 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산(山)’이라는 어휘 그 자체에 집중해, ‘남산옥산금수산’을 당시 원나라의 지명으로 보고자 한다. 앞선 4연에서 원나라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화자는 “남산옥산금수산이 (둘러싸고) 있는 이 원나라 땅에서 사향각시(자신의 연인)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5연에서 전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 연에서, 연인에게 “평생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그가 먼 이국땅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연인을 만나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인을 찾고자 하는 다짐을 스스로 한 번 더 하고 있는 것인지는 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8. 맺음말
<만전춘 별사>는 그동안 노랫말의 풀이에 따라 약간씩의 다른 해석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만날 수 없는 임에 대한 그리움동경’이라는 연구관점의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여기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지금까지 공녀제도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전춘 별사>의 새로운 작자(writer)를 찾아내고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 내었다. 그동안은 <만전춘 별사>가 단순히 한 고려 여성의 사랑을 담은 노래나, 남녀 간의 성행위를 묘사한 작품으로만 알려져 왔었지만, 조금 더 시각을 달리하면 작자도 달라지고 또 충분히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 수많은 처녀들이 이국땅으로 끌려갔던, 저승사자와도 같았던 공녀제도가 있던 그 시기에 고려의 한 남자가 <만전춘 별사>을 불렀다. 이 작품에는 한 여자의 지고지순한 남자 사랑 못지않은 한 남자의 굳고 강직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만전춘 별사>야 말로 인간 사랑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잘 표현한 작품이 아닌가 정리해본다. 만전춘 별사의 남성화자는, 그의 만전춘은 고려시대 Fly to the Sky의 사랑노래가 아니었을까……
▷ 참고 문헌 ◁
《고려국어가요의 해석》, 최철 지음, 연세대학교출판부, 1996,
- Page 242~253 <만전춘 별사>
《고려가요의 문학사회학》, 임기중 엮음, 경운출판사, 1993
- Page 299~316, <만전춘 별사의 일탈과 허위의식> 장영우
《새로 고친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박병채 저, 국학자료원, 1994
- Page 278~294, <만전춘 별사>
《고려가요(高麗歌謠)연구(硏究)》, 국어국문학회, 정음사, 1979
《국문학개론》, 김광순 외 저, 새문사, 2006
《5백년 고려사》, 박종기 저, 푸른역사, 1999
《중세시대의 환관과 공녀》, 정구선 지음, 국학자료원, 2004
《야사로 보는 고려의 역사2》, 최범서 지음, 가람기획, 2005
《중국으로 끌려간 우리 여인들의 역사 - 공녀(貢女)》, 정구선 지음, 국학자료원, 2002
《만전춘별사 歌劇論文攷(가극론문고)》, 여증동 엮음, 전주교대논문집 제1집, 1967
공녀로 뽑혀 이역만리 중국 땅으로 끌려가야만 할 운명에 처한 처녀들과 그 가족 친지들의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중에는 헤어짐을 앞둔 연인도 있었을 것이다. 떠나가야 하는 여자와 그 여자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남자. 사랑하는 연인이 이국땅으로 떠나야하는 상황에서,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한 남자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후대에까지 기록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현재의 <만전춘 별사>가 아니었을까?
1연에서 화자는 임과 함께 있는 밤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날이 밝으면 헤어져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2연에서, 사랑하는 연인은 이미 자신의 옆에 없고, 화자는 ‘임 없는 내가 어찌 잠을 잘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임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활짝 핀 복숭아꽃으로 인해 더욱 더 짙어지고 있다.
3연에서는, 임과 같이 평생을 함께하고, 죽어서도 같이하자고 약속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약속을 저버리고 떠나간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나타난다.
4연은 1~3연과는 달리 비유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 속의 화자도 앞선 1~3연과는 다르게 해석된다.
연인을 떠나보내고 그리움이 깊어진 남자는 멀리 원나라까지 연인을 찾아갔을 지도 모른다. 4연은 그러한 고려시대 평민남자(<만전춘 별사> 원래의 화자)에게 원나라 사람이 하는 이야기이다.
‘아련 비올하’는 지금까지의 연구사에서도 ‘어린 오리새끼’ 혹은 ‘연약한 오리’로 해석되었었다. 이 연약한 오리는, 당시 원나라 사람들이 고려 사람을 보는 시각을 나타낸 것이었다. 당시 두 나라는 강한 수직적 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 백성들 사이에도 우러러보고 얕보는 시각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원나라 사람이 말한다.
“고려사람아, 고려사람아, 작은 나라 고려의 사람아.” “여울(=고려)은 어디 두고 연못(=원나라)에 왔느냐 (=어찌하여 고려땅을 떠나 멀리 원나라까지 왔느냐?)” “원나라로 인해 (고려가) 얼면 고려땅도 (살기) 좋은데, 고려땅도 좋은데. (=고려땅이 우리 원나라에 의해 정복되면 고려땅고 살기 좋아질 것이라는 의미 = 고려에서 살기 힘들어서 왔느냐?)”
5연의 ‘남산옥산금수산’ 또한 지금도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이다. 성현경 선생님은,
“남산옥산금수산은 각각 따뜻한 아랫목, 옥베개, 수놓은 비단이불을 뜻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여성남성을 상징한다.” 《한국고전시가 작품론》1, 집문당, 1992, Page 322 - <만전춘별사 재론>, 성현경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5 - <만전춘별사의 구조>
고 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산(山)’이라는 어휘 그 자체에 집중해, ‘남산옥산금수산’을 당시 원나라의 지명으로 보고자 한다. 앞선 4연에서 원나라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화자는 “남산옥산금수산이 (둘러싸고) 있는 이 원나라 땅에서 사향각시(자신의 연인)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5연에서 전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 연에서, 연인에게 “평생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그가 먼 이국땅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연인을 만나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인을 찾고자 하는 다짐을 스스로 한 번 더 하고 있는 것인지는 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8. 맺음말
<만전춘 별사>는 그동안 노랫말의 풀이에 따라 약간씩의 다른 해석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만날 수 없는 임에 대한 그리움동경’이라는 연구관점의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여기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지금까지 공녀제도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전춘 별사>의 새로운 작자(writer)를 찾아내고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 내었다. 그동안은 <만전춘 별사>가 단순히 한 고려 여성의 사랑을 담은 노래나, 남녀 간의 성행위를 묘사한 작품으로만 알려져 왔었지만, 조금 더 시각을 달리하면 작자도 달라지고 또 충분히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 수많은 처녀들이 이국땅으로 끌려갔던, 저승사자와도 같았던 공녀제도가 있던 그 시기에 고려의 한 남자가 <만전춘 별사>을 불렀다. 이 작품에는 한 여자의 지고지순한 남자 사랑 못지않은 한 남자의 굳고 강직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만전춘 별사>야 말로 인간 사랑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잘 표현한 작품이 아닌가 정리해본다. 만전춘 별사의 남성화자는, 그의 만전춘은 고려시대 Fly to the Sky의 사랑노래가 아니었을까……
▷ 참고 문헌 ◁
《고려국어가요의 해석》, 최철 지음, 연세대학교출판부, 1996,
- Page 242~253 <만전춘 별사>
《고려가요의 문학사회학》, 임기중 엮음, 경운출판사, 1993
- Page 299~316, <만전춘 별사의 일탈과 허위의식> 장영우
《새로 고친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박병채 저, 국학자료원, 1994
- Page 278~294, <만전춘 별사>
《고려가요(高麗歌謠)연구(硏究)》, 국어국문학회, 정음사, 1979
《국문학개론》, 김광순 외 저, 새문사, 2006
《5백년 고려사》, 박종기 저, 푸른역사, 1999
《중세시대의 환관과 공녀》, 정구선 지음, 국학자료원, 2004
《야사로 보는 고려의 역사2》, 최범서 지음, 가람기획, 2005
《중국으로 끌려간 우리 여인들의 역사 - 공녀(貢女)》, 정구선 지음, 국학자료원, 2002
《만전춘별사 歌劇論文攷(가극론문고)》, 여증동 엮음, 전주교대논문집 제1집, 1967
추천자료
 성서해석에 있어서 편집비평과 구조주의비평의 비교연구
성서해석에 있어서 편집비평과 구조주의비평의 비교연구 폴 리쾨르의 해석학 연구
폴 리쾨르의 해석학 연구 [동서양고전 (A+완성형)] 프로이트의 『 꿈의 해석 』 독후감(서평) -6장 중심
[동서양고전 (A+완성형)] 프로이트의 『 꿈의 해석 』 독후감(서평) -6장 중심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 근대 중국의 해석 을 읽고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 근대 중국의 해석 을 읽고 청산별곡 각 연에 대한 해석 및 작자에 대한 견해
청산별곡 각 연에 대한 해석 및 작자에 대한 견해 서경별곡 연구 - 해석과 쟁점
서경별곡 연구 - 해석과 쟁점  서경별곡 해석과 연구의 쟁점
서경별곡 해석과 연구의 쟁점 [대중문화][팝][가요순위프로그램][음반산업][음악산업][대중음악][가요][대중가요]대중문화...
[대중문화][팝][가요순위프로그램][음반산업][음악산업][대중음악][가요][대중가요]대중문화... [고대가요][구지가]고대가요 구지가의 배경설화와 고대가요 구지가의 원문, 고대가요 구지가...
[고대가요][구지가]고대가요 구지가의 배경설화와 고대가요 구지가의 원문, 고대가요 구지가... 쌍화점의 해석과 담겨 있는 의미, 나아가 현대적 논의(악장으로서)
쌍화점의 해석과 담겨 있는 의미, 나아가 현대적 논의(악장으로서) 청산별곡(靑山別曲) 작품해석
청산별곡(靑山別曲) 작품해석 대중음악(대중가요) 성격과 양적성장, 대중음악(대중가요)과 문화현실, 대중음악(대중가요)과...
대중음악(대중가요) 성격과 양적성장, 대중음악(대중가요)과 문화현실, 대중음악(대중가요)과... [특허청구범위해석][특허청구범위해석 일반원칙][특허청구범위해석과 외국의 판례]특허청구범...
[특허청구범위해석][특허청구범위해석 일반원칙][특허청구범위해석과 외국의 판례]특허청구범... [헌법해석][헌법해석 자의성][헌법해석과 통합주의 헌법관][헌법해석과 헌법][헌법]헌법해석...
[헌법해석][헌법해석 자의성][헌법해석과 통합주의 헌법관][헌법해석과 헌법][헌법]헌법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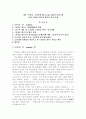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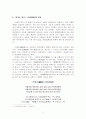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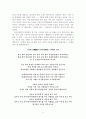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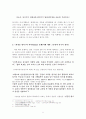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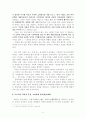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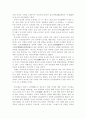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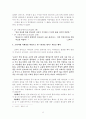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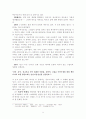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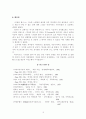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