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광주 비엔날레 : 열풍변주곡
2. 첫 장 _ 뿌리를 찾아서: 아시아 이야기를 펼치다.
3.마지막 장 _ 길을 찾아서: 세계 도시 다시 그리다.
2. 첫 장 _ 뿌리를 찾아서: 아시아 이야기를 펼치다.
3.마지막 장 _ 길을 찾아서: 세계 도시 다시 그리다.
본문내용
Lives in Gwangju”이다. 이 작품의 두 작가가 전라도 출생에 바로 이웃 학교인 조선대학교 출신이라 왠지 모르게 반가웠던 것 같다. 두 작가 중 정기현은 1999년부터 ‘집’을 테마로 한 영상설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 ‘집’은 가장 기본적 개념의 삶의 무대이며 잠재적인 활력으로 가득한 공간이라고 한다. 진시영은 영상매체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우리의 현재, 그 사이의 기억영역,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편집하여 다시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 내는 작업을 보여준다고 한다. 이번 작품은 개인이 성장하면서 지나온 길을 광주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적하는데, 그것을 세대별로 선발된 시민들의 사소한 일들을 통해 현 시점에서 영상이야기로 엮어내는 작업이다. 광주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연결하는 이 작업은 전시실 중앙에 설치된 약 2미터 높이의 전망대 같은 구조물로 형상화된다. 관객들이 직접 올라가 전체 전시를 조망할 수 있는 이 구조물 외벽에는 인터뷰 아카이브의 영상을 보여주는 모니터와 함께, 광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을 관객과 공유할 수 있는 간판들이 벽면 가득 부착되었다. 내가 태어나서 쭉 살아온 광주의 모습이 참 반가웠다. 물론 아주 낯선 간판들, 사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눈에 익은 그런 모습들도 많았다.
다음은 임민욱 작가의 ‘오리지널 라이브클럽’이다. 이 작품은 사진이 없다.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여자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끔 하는게 작가의 의도라고 한다. 이 “오리지널 라이브클럽”은 남성들의 출입을 배제시키는 여성전용 공간이다. 언어적 주체인 남성들의 글로벌한 게임과 미술의 소통매체가 되어 온 여성성을 역이용, 차용하는 이 공간 입구에는 남성전용클럽이 상투적으로 제공하는 여성의 성적이미지들이 상영되고, 공간내부에는 여성들만의 행위에 관계되는 설치물들이 배치된다. 이 공간 내부에 대한 묘사는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만 외부로 소통, 전달되거나 혹은 좌절될 것이다. 여기서의 좌절은 생존방식과 유형에 관한 고찰에서 출발하는 실존적 좌절로부터, 비엔날레와 같은 전지구적 미술 네트워크와 지역, 개인 간의 소통적 좌절 등, 크고 작은 좌절들을 대변한다. 이 작품 중 특히나 인상깊었던 것은 방 한가운데에 떡하니 놓여있는 복사기였다. 자신의 엉덩이같은 부분들을 복사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장의 복사한 종이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는 바지를 입은 채로 그대로, 또 어떤 이는 팬티만 입은채로, 또 어떤 이는 그도 입지 않고 엉덩이만 찍은 사진도 있었다. 감춰왔던 자신의 욕망을 나타내보자, 이런 의미였던 것 같다.
그 외에도 참으로 많은 작품들이 있었다. 넓은 공간 속에서 많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며 나름대로 감상해보고 작가의 의도도 생각해보았다. 그런데 비엔날레를 보면서 생각보다 예술이라는게 그리 어려운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꼭 미술을 전공해서 미술가에의해서만 탄생하는게 예술이 아니라 나같이 과학을 하는 사람, 지리를 배우는 사람, 역사를 배우는 사람, 회사를 다니는 사람,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자신의 뜻을 갖고 형상을 만들고, 그리면서 표현을 하면, 그리고 그 뜻을 남들이 알아주면 그게 바로 예술인 것 같다. 나도 조금 더 세상을 살고 어느 정도 나라는 존재에 대해 알게 되면 내이름을 주제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과연 시도는 할 수 있을런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언제나 완성이 될지, 어떤 모양이 될지 궁금하다. 그 모양이 아름다울 수도, 무서울 수도, 가벼울 수도, 무거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은 임민욱 작가의 ‘오리지널 라이브클럽’이다. 이 작품은 사진이 없다.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여자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끔 하는게 작가의 의도라고 한다. 이 “오리지널 라이브클럽”은 남성들의 출입을 배제시키는 여성전용 공간이다. 언어적 주체인 남성들의 글로벌한 게임과 미술의 소통매체가 되어 온 여성성을 역이용, 차용하는 이 공간 입구에는 남성전용클럽이 상투적으로 제공하는 여성의 성적이미지들이 상영되고, 공간내부에는 여성들만의 행위에 관계되는 설치물들이 배치된다. 이 공간 내부에 대한 묘사는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만 외부로 소통, 전달되거나 혹은 좌절될 것이다. 여기서의 좌절은 생존방식과 유형에 관한 고찰에서 출발하는 실존적 좌절로부터, 비엔날레와 같은 전지구적 미술 네트워크와 지역, 개인 간의 소통적 좌절 등, 크고 작은 좌절들을 대변한다. 이 작품 중 특히나 인상깊었던 것은 방 한가운데에 떡하니 놓여있는 복사기였다. 자신의 엉덩이같은 부분들을 복사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장의 복사한 종이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는 바지를 입은 채로 그대로, 또 어떤 이는 팬티만 입은채로, 또 어떤 이는 그도 입지 않고 엉덩이만 찍은 사진도 있었다. 감춰왔던 자신의 욕망을 나타내보자, 이런 의미였던 것 같다.
그 외에도 참으로 많은 작품들이 있었다. 넓은 공간 속에서 많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며 나름대로 감상해보고 작가의 의도도 생각해보았다. 그런데 비엔날레를 보면서 생각보다 예술이라는게 그리 어려운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꼭 미술을 전공해서 미술가에의해서만 탄생하는게 예술이 아니라 나같이 과학을 하는 사람, 지리를 배우는 사람, 역사를 배우는 사람, 회사를 다니는 사람,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자신의 뜻을 갖고 형상을 만들고, 그리면서 표현을 하면, 그리고 그 뜻을 남들이 알아주면 그게 바로 예술인 것 같다. 나도 조금 더 세상을 살고 어느 정도 나라는 존재에 대해 알게 되면 내이름을 주제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과연 시도는 할 수 있을런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언제나 완성이 될지, 어떤 모양이 될지 궁금하다. 그 모양이 아름다울 수도, 무서울 수도, 가벼울 수도, 무거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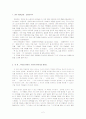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