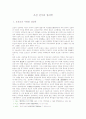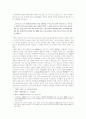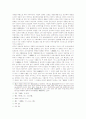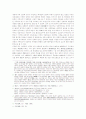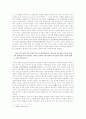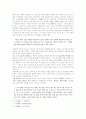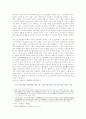목차
Ⅰ. 조선초의 사회와 성리학
Ⅱ. 朝鮮初의 性理學 受容과 佛敎批判
Ⅲ. 性理學 理解의 深化
Ⅳ. 性理學의 內面化와 實踐
Ⅱ. 朝鮮初의 性理學 受容과 佛敎批判
Ⅲ. 性理學 理解의 深化
Ⅳ. 性理學의 內面化와 實踐
본문내용
다” 中宗實錄 권27, 中宗 11년 12월 丙子조.
고 주장한 후 조광조 등이 상소하여 없앨 것을 요청하자 처음에는 왕이 허락하지 않다가 조광조가 계속 그 폐해를 극론하자 마침내 혁파되었다.
昭格署革罷라는 비성리학적 요소의 제거와 더불어 사람들에 의해 비성리학적인 요소로 배격된 것은 국초 이래 만연된 詞章 중시라는 풍조였다. 이들 기묘사림들에게는 詞章之學이나 박학하기만 한 章句之學은 몸에 절실한 학문이 아니어서 경세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배격했다. 이들은 사장은 理學에서 말한 末枝에 지나지 않으며 ‘文以載道’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본이 되는 理學을 체득하면 詞章은 저절로 익혀진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념아래 侍講官 柳庸謹은 “詞章은 사실 理學에서 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장은 그것을 배워도 혹시 할 수 없는 자가 있으나 이학은 그것을 배워서 할 수 없는 자가 없습니다” 中宗實錄 권30, 中宗 12년 8월 庚申조.
하여 사장을 배격하고 이학을 숭상할 것을 청하였는데 사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당시의 기묘사림들에게는 공통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훈구파에 속한 유학자들은 詞章이 末이라고는 하지만 理學을 장려한다고 해서 眞儒가 쉽게 배출되는 것도 아니고 세종대처럼 학문이 융성했을 때도 사장이 숭상되었고 事大와 交隣의 외교를 함에 사장은 매우 중대하여 권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유자들로 하여금 사장과 이학을 함께 익히게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中宗實錄 권27, 中宗 12년 8월 乙未조.
이러한 사장과 이학의 대립은 단순한 학문관의 차이가 아니라 과거제도와 관련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 중종 13년 司諫 孔瑞麟은,
우리 나라의 학문이 文華詞藝로서 학술을 삼았는데 옛사람이 학술이라 한 것과는 다른 듯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頌表로 취했는데 殿試에서는 반드시 對策으로 해야 합니다. 策에서 그 사람의 학문을 볼 수 있으므로 옛날 大庭之對에서는 반드시 策으로 했던 것입니다. 前年의 別試에서도 역시 詞章으로 사람을 취했기 때문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이 登第하지 못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中宗實錄 권32, 中宗 13년 3월 丁未조.
하여, 과거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학을 위주로 할 것을 건의하였다. 사림들의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져 중종 14년 賢良科가 설치되고 金湜 등 28인이 발탁되게 된다. 이러한 이학을 중시하는 정책이 시행된 결과 理學을 貴하게 여기고 詞章을 末枝로 보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져서 작문능력이 크게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였지만 實錄에는 당시 儒者들이 趙光祖 등을 본받아 近思錄小學大學 등만 읽고 詞章에 힘쓰지 않아 문장이 성종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초학자들도 參禪하는 것 같이 하루종일 端坐만 하고 독서는 하지 않아 師長들이 걱정했다는 기록이 나온다(中宗實錄 권29, 中宗 12년 8월 庚戌조 및 권34, 13년 8월 戊子조).
전반적으로 성리학 공부가 유자들의 필수적인 교양으로 되고 성리학이 영남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성리학풍의 진작을 위해 기묘사림들이 무엇보다 노력한 것은 小學近思錄性理大全 등을 간인, 보급하여 성리학적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한편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소학의 가치는 각별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조광조김안국김정국기준 등 대부분의 사림들이 進講에 참여하여 소학을 널리 보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김안국은 소학보급에 더욱 적극적이었는데 그는 慶尙, 全羅監司로 있으면서 程愈의 集成小學을 간인하고 소학을 권하는 시70여 수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종 13년에는 諺解小學이 나오게 되었고 소학의 보급확산과 함께 성리학적 가치관이 보편화되자 朱子家禮의 실시, 鄕約의 보급 등 사림을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적 사회질서의 정착도 함께 진행되어 갔다.
소학의 보급과 더불어 성리학 이해의 심화와 이론적 근거를 위해 近思錄性理大全의 연구도 아울러 진행되었다. 성리대전은 세종대부터 성리학의 이해를 위해 널리 연구된 책이지만 중종대에 와서는 근사록이 특히 중시되고 많이 진강되었다는 사실은 성리학에 관한 넓은 지식과 전반적인 이해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성리학 이해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근사록은 奇峻 등의 건의에 의하여 경연에서 강의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그 수장인 太極圖說은 天地萬物의 理致를 구비한 것으로 중시되어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되었다. 中宗實錄 권26, 中宗 11년 10월 辛酉조.
당시 朴祥과 李彦迪은 기묘사림보다는 한 세대 이후의 젊은 학자들이었으나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중종 11년 박상의 辨無極說, 12,3년에 이언적의 書忘齊忘機堂無極太極說後答忘機堂書 등 성리학적 세계관의 본격적 이해를 알리는 글들이 나오게 되었다. 晦齋의 書忘齊忘機堂無極太極說後를 보면 그는 孫叔暾曺漢輔 등 선배의 無極太極說에 개입, 忘齊說은 陸象山설이라 하고 忘機堂答書는 周濂溪에 근본하고 있으나 儒家의 寂而感으로 보지 않고 佛敎의 寂而滅로 본 異端의 嫌疑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글들에서 理先氣後의 理氣關係를 분명히 하고 있어 조선성리학이 朱子中心의 性理學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성리학이 널리 보급되고 이해되기 시작하자 성리학적 입장에서의 사회질서 정립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는데 小學, 二倫行實圖, 孝經, 女訓 등의 언해와 보급을 통한 성리학적 윤리규범의 보편화가 추진되는 한편 사림이 중심이 되어 향촌의 자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향약의 보급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중종 10년 향약의 전국적인 시행이 건의된 이래 향약운동은 경상도뿐 아니라 기호지방에서도 성과를 거두게 되어 성리학적 이념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묘사림이 주축이 된 사림들의 성리학에 입각한 사회질서 재편성 시도는 훈구파의 반발로 야기된 己卯士禍(중종 14년, 1519)로 좌절되지만 기묘사림에 의해 형성된 실천적 성리학은 이후 조선성리학의 성격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고 주장한 후 조광조 등이 상소하여 없앨 것을 요청하자 처음에는 왕이 허락하지 않다가 조광조가 계속 그 폐해를 극론하자 마침내 혁파되었다.
昭格署革罷라는 비성리학적 요소의 제거와 더불어 사람들에 의해 비성리학적인 요소로 배격된 것은 국초 이래 만연된 詞章 중시라는 풍조였다. 이들 기묘사림들에게는 詞章之學이나 박학하기만 한 章句之學은 몸에 절실한 학문이 아니어서 경세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배격했다. 이들은 사장은 理學에서 말한 末枝에 지나지 않으며 ‘文以載道’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본이 되는 理學을 체득하면 詞章은 저절로 익혀진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념아래 侍講官 柳庸謹은 “詞章은 사실 理學에서 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장은 그것을 배워도 혹시 할 수 없는 자가 있으나 이학은 그것을 배워서 할 수 없는 자가 없습니다” 中宗實錄 권30, 中宗 12년 8월 庚申조.
하여 사장을 배격하고 이학을 숭상할 것을 청하였는데 사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당시의 기묘사림들에게는 공통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훈구파에 속한 유학자들은 詞章이 末이라고는 하지만 理學을 장려한다고 해서 眞儒가 쉽게 배출되는 것도 아니고 세종대처럼 학문이 융성했을 때도 사장이 숭상되었고 事大와 交隣의 외교를 함에 사장은 매우 중대하여 권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유자들로 하여금 사장과 이학을 함께 익히게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中宗實錄 권27, 中宗 12년 8월 乙未조.
이러한 사장과 이학의 대립은 단순한 학문관의 차이가 아니라 과거제도와 관련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 중종 13년 司諫 孔瑞麟은,
우리 나라의 학문이 文華詞藝로서 학술을 삼았는데 옛사람이 학술이라 한 것과는 다른 듯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頌表로 취했는데 殿試에서는 반드시 對策으로 해야 합니다. 策에서 그 사람의 학문을 볼 수 있으므로 옛날 大庭之對에서는 반드시 策으로 했던 것입니다. 前年의 別試에서도 역시 詞章으로 사람을 취했기 때문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이 登第하지 못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中宗實錄 권32, 中宗 13년 3월 丁未조.
하여, 과거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학을 위주로 할 것을 건의하였다. 사림들의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져 중종 14년 賢良科가 설치되고 金湜 등 28인이 발탁되게 된다. 이러한 이학을 중시하는 정책이 시행된 결과 理學을 貴하게 여기고 詞章을 末枝로 보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져서 작문능력이 크게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였지만 實錄에는 당시 儒者들이 趙光祖 등을 본받아 近思錄小學大學 등만 읽고 詞章에 힘쓰지 않아 문장이 성종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초학자들도 參禪하는 것 같이 하루종일 端坐만 하고 독서는 하지 않아 師長들이 걱정했다는 기록이 나온다(中宗實錄 권29, 中宗 12년 8월 庚戌조 및 권34, 13년 8월 戊子조).
전반적으로 성리학 공부가 유자들의 필수적인 교양으로 되고 성리학이 영남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성리학풍의 진작을 위해 기묘사림들이 무엇보다 노력한 것은 小學近思錄性理大全 등을 간인, 보급하여 성리학적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한편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소학의 가치는 각별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조광조김안국김정국기준 등 대부분의 사림들이 進講에 참여하여 소학을 널리 보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김안국은 소학보급에 더욱 적극적이었는데 그는 慶尙, 全羅監司로 있으면서 程愈의 集成小學을 간인하고 소학을 권하는 시70여 수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종 13년에는 諺解小學이 나오게 되었고 소학의 보급확산과 함께 성리학적 가치관이 보편화되자 朱子家禮의 실시, 鄕約의 보급 등 사림을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적 사회질서의 정착도 함께 진행되어 갔다.
소학의 보급과 더불어 성리학 이해의 심화와 이론적 근거를 위해 近思錄性理大全의 연구도 아울러 진행되었다. 성리대전은 세종대부터 성리학의 이해를 위해 널리 연구된 책이지만 중종대에 와서는 근사록이 특히 중시되고 많이 진강되었다는 사실은 성리학에 관한 넓은 지식과 전반적인 이해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성리학 이해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근사록은 奇峻 등의 건의에 의하여 경연에서 강의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그 수장인 太極圖說은 天地萬物의 理致를 구비한 것으로 중시되어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되었다. 中宗實錄 권26, 中宗 11년 10월 辛酉조.
당시 朴祥과 李彦迪은 기묘사림보다는 한 세대 이후의 젊은 학자들이었으나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중종 11년 박상의 辨無極說, 12,3년에 이언적의 書忘齊忘機堂無極太極說後答忘機堂書 등 성리학적 세계관의 본격적 이해를 알리는 글들이 나오게 되었다. 晦齋의 書忘齊忘機堂無極太極說後를 보면 그는 孫叔暾曺漢輔 등 선배의 無極太極說에 개입, 忘齊說은 陸象山설이라 하고 忘機堂答書는 周濂溪에 근본하고 있으나 儒家의 寂而感으로 보지 않고 佛敎의 寂而滅로 본 異端의 嫌疑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글들에서 理先氣後의 理氣關係를 분명히 하고 있어 조선성리학이 朱子中心의 性理學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성리학이 널리 보급되고 이해되기 시작하자 성리학적 입장에서의 사회질서 정립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는데 小學, 二倫行實圖, 孝經, 女訓 등의 언해와 보급을 통한 성리학적 윤리규범의 보편화가 추진되는 한편 사림이 중심이 되어 향촌의 자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향약의 보급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중종 10년 향약의 전국적인 시행이 건의된 이래 향약운동은 경상도뿐 아니라 기호지방에서도 성과를 거두게 되어 성리학적 이념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묘사림이 주축이 된 사림들의 성리학에 입각한 사회질서 재편성 시도는 훈구파의 반발로 야기된 己卯士禍(중종 14년, 1519)로 좌절되지만 기묘사림에 의해 형성된 실천적 성리학은 이후 조선성리학의 성격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추천자료
 조선후기 사회의 향촌사회구조
조선후기 사회의 향촌사회구조 조선의 마지막 화가 장승업과 조선후기 사회모습
조선의 마지막 화가 장승업과 조선후기 사회모습 [조선대학교]매스컴과 정보사회 (뉴미디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나?, 정보사회를 어떻게 볼 ...
[조선대학교]매스컴과 정보사회 (뉴미디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나?, 정보사회를 어떻게 볼 ... 5)사회-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조선의 건국과 한양
5)사회-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조선의 건국과 한양 5)사회-3. 유교전통이 자리잡은 조선 - 조선의 건국과 한양에 대한 내용 정리하기
5)사회-3. 유교전통이 자리잡은 조선 - 조선의 건국과 한양에 대한 내용 정리하기 5)사회-유교전통이 자리잡은 조선-조선의 문화 발달
5)사회-유교전통이 자리잡은 조선-조선의 문화 발달 5)사회-유교전통이 자리잡은 조선-조선 전기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과학적 ...
5)사회-유교전통이 자리잡은 조선-조선 전기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과학적 ... 5)사회-3-2. 조선의 문화와 과학의 발달 - 조선 전기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
5)사회-3-2. 조선의 문화와 과학의 발달 - 조선 전기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 5)사회-3. 유교전통이 자리잡은 조선 - 조선의 건국과 한양에 대한 내용 정리하기
5)사회-3. 유교전통이 자리잡은 조선 - 조선의 건국과 한양에 대한 내용 정리하기 [일본 오사카][오사카][일본][조선인 사회][한반도 교류][조선인 협동조합][협동조합][조선인...
[일본 오사카][오사카][일본][조선인 사회][한반도 교류][조선인 협동조합][협동조합][조선인... 소설 성격, 소설 근원, 소설 구조,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쌍린기(현씨양웅전) 현실성, ...
소설 성격, 소설 근원, 소설 구조,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쌍린기(현씨양웅전) 현실성, ... 고전소설의 특징, 의의,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쌍린기(현씨양웅전)의 현실성, 가부장 사...
고전소설의 특징, 의의,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쌍린기(현씨양웅전)의 현실성, 가부장 사...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발달과정에서의 조선시대 구제사업에 대해 서술 (시대적 ...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발달과정에서의 조선시대 구제사업에 대해 서술 (시대적 ...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추가지원 찬반 논쟁 [사회과학, 경제, 경영 보고서 레포트 에세이 ...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추가지원 찬반 논쟁 [사회과학, 경제, 경영 보고서 레포트 에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