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군현제도
1) 경 · 도호부 · 목과 군현
2) 특수 행정 조직 -향 · 부곡 · 소 · 장 · 처 · 역-
3) 촌락의 구조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군현제도
1) 경 · 도호부 · 목과 군현
2) 특수 행정 조직 -향 · 부곡 · 소 · 장 · 처 · 역-
3) 촌락의 구조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본문내용
를 가하였다. 그러나 향직의 담당자인 향호들이 공무를 가탁하여 백성을 침해하여 지방민들이 생활이 힘들어지고, 금유 조장이 권력을 남용함으로 인해 원성의 대상이 되자 성종 2년 금유 외장의 혁파와 12목의 실시를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군현제의 실시와 더불어 향리직제에 대한 통일적인 지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吏職의 개편은 먼저 신라식 유제의 청산에 있었는데, 당대등이나 대등과 같은 신라식 명칭을 호장, 부호장으로 고친 것이다. 그와 더불어 고려정부는 12목을 지방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여, 성종 6년(987)에 12목에 각각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등을 파견하여 諸生들을 훈육시켜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여 그들을 관료로 등용하겠다는 뜻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이것은 교육을 통하여 지방 거점도시로 육성시킴과 동시에 지방 토착세력의 자손(향호)의 자제들을 관인신분층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종 2년에 주부군현의 이직개편에 이어 성종 6년에 “제촌의 대감제감을 촌장촌정으로 삼았다”고 한다. 향리와 촌장은 다같이 군읍의 말단 행정을 담당하였던 계층인데, 주부군현의 향리와 제촌의 촌장은 그 기능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신라의 소읍단위의 군현제도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대읍중심의 군현제도를 창설함에 따라 촌장세력들의 역사적 활동은 종식을 고하였다. 대읍 중심의 군현제도의 성립으로 인해 대읍지방의 토착세력(향리)들은 성장기반이 더욱 확고하게 된 반면에 속읍지방의 토착세력(촌장)들은 몰락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향리층은 고려의 문벌귀족사회가 확립 발전해 가는데 큰 몫을 담당해 왔다. 이들은 귀족관인의 아류 동반자로서 존재해 왔으며, 토착적 세력기반과 지방통치조직을 바탕으로 농민의 지배와, 그 자신들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1213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전국적 농민항쟁의 와중에서 항쟁군이 중요한 공격대상의 하나가 지방의 향리층이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 될 수 있으며, 그들은 언제라도 정치집단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방편으로 지방관에게 이직에 대한 감찰 조목을 설정하고 이직에 대한 9단계의 단계적 승진규정의 재정 등 향리들의 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기인제도
중앙정부의 향리에 대한 통제책으로서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기인제도와 사심과 제도이다. 기인제란 지방세력을 견제하고 회유하기 위한 집권적인 통제책의 하나로서 향리의 자제를 상경 시위하게 하는 제도이다. 인질의 성격을 띠고 서울에 머무는 기인의 존재 필요성은 지방의 성주 장군들인 향호들에게 지방통치를 위임한 시대에 필요한 제도였을 것이다.
이 제도는 문종 31년(1077)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기인의 신분문제이다. 문종대에 와서는 호장신분층이 기인선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고려 국초에 지방호족의 자제를 상경시킨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둘째는 역의 내용이다. 고려 국초의 기인은 지방호족의 국왕에 대한 충성의 담보로서의 의미가 있어, 다른 身役을 지지 않았으나, 문종대의 기인은 신역을 지고 있었다. 이것은 시대의 변천으로 지방 세력의 지위가 하락됨에 따라서 중앙에서 선상된 기인을 노동의 인적자원으로 전용한 것이다. 기인은 중앙관서에서 이속격으로 잡무에 종사하면서 사심관 선발의 자문에 응하거나 당번을 나누어서 왕실을 시위하는 등의 일을 하고 그 역의 대가로서 기인전의 지급 및 동정직이 제수 되었다. 하지만 고려 후기에 전국적으로 지방관 파견이 확대됨에 따라 토착적 세력을 유지하던 향리의 정치, 사회적 지위 전락과 더불어 기인역 또한 고역으로 변모하였다. 그리하여 기인제도의 존폐 논의가 있기까지 한데, 고려말의 혁파논의에도 불구하고 기인제도는 조선조 광해군 때 대동법의 실시로 인해 사실상 기인의 역이 혁파될 때까지 비교적 질서있고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
◎ 사심관제도
기인제도와 더불어 호족세력을 무마 통제하기 위하여 고려정부에서 마련한 또 하나의 제도가 사심관제도였다. 사심관제는 외관이 본격적으로 파견되지 못하였던 성종 무렵에 이르기까지는 지방통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공신들은 이 제도에 따라 출신 本州 본주란 본관의 주를 의미하는데, 당시의 공신들은 거의가 호족출신으로서 중앙 귀족화되어 있지만, 그 본관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세력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방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에 대한 연고권을 바탕으로 그 권리를 공인 받으면서 사심이 되었다고 불 수 있다. 이들 공신들의 재지 세력기반을 이용하여 그 지방의 향리세력을 통제하려고 하였던 것이 결국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시기의 지방 세력에 대한 유일한 통제수단이었다. 고려의 지방통치는 수령-향리-지방민으로 이어지는 군현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성종 때에 와서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그 지방출신으로서 그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을 중앙 관리로 복무하게 하면서 그 출신지역을 제압 지배하게 된 것이 사심관의 설치 목적이었고, 그것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볼 때 합리적인 처사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심관은 人民의 宗主, 流品의 甄別, 賦役의 均平, 風俗의 表正 등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직능은 바로 지방관인 외관의 직능과 흡사하였다. 외관과 사심관의 권한을 비교해 볼 때, 정치적 행정적 지배권의 상당한 부분을 외관이 장악했으며, 사심관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많은 권한 중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권한을 유지해 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지방사회의 통치는 이제 중앙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통치방식이 일단 성공하게 됨으로써 사심관의 권한은 해당지역의 연고권에 기초한 경제적 관리권을 통해 지방사회 지배에 관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외관과 이중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는 정도로 제한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고려후기에 오면 권호들이 경제적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사심관의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하여, 충숙왕 4년(1318)에 혁파되어 고려시대의 지방통치는 종래의 지방관-향리-농민(지방군현민)이라는 장치와 사심관-향리-농민이라는 기구의 이중적 조직에서 전자의 지방관제로 일원화되었던 것이다.
성종 2년에 주부군현의 이직개편에 이어 성종 6년에 “제촌의 대감제감을 촌장촌정으로 삼았다”고 한다. 향리와 촌장은 다같이 군읍의 말단 행정을 담당하였던 계층인데, 주부군현의 향리와 제촌의 촌장은 그 기능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신라의 소읍단위의 군현제도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대읍중심의 군현제도를 창설함에 따라 촌장세력들의 역사적 활동은 종식을 고하였다. 대읍 중심의 군현제도의 성립으로 인해 대읍지방의 토착세력(향리)들은 성장기반이 더욱 확고하게 된 반면에 속읍지방의 토착세력(촌장)들은 몰락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향리층은 고려의 문벌귀족사회가 확립 발전해 가는데 큰 몫을 담당해 왔다. 이들은 귀족관인의 아류 동반자로서 존재해 왔으며, 토착적 세력기반과 지방통치조직을 바탕으로 농민의 지배와, 그 자신들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1213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전국적 농민항쟁의 와중에서 항쟁군이 중요한 공격대상의 하나가 지방의 향리층이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 될 수 있으며, 그들은 언제라도 정치집단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방편으로 지방관에게 이직에 대한 감찰 조목을 설정하고 이직에 대한 9단계의 단계적 승진규정의 재정 등 향리들의 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기인제도
중앙정부의 향리에 대한 통제책으로서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기인제도와 사심과 제도이다. 기인제란 지방세력을 견제하고 회유하기 위한 집권적인 통제책의 하나로서 향리의 자제를 상경 시위하게 하는 제도이다. 인질의 성격을 띠고 서울에 머무는 기인의 존재 필요성은 지방의 성주 장군들인 향호들에게 지방통치를 위임한 시대에 필요한 제도였을 것이다.
이 제도는 문종 31년(1077)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기인의 신분문제이다. 문종대에 와서는 호장신분층이 기인선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고려 국초에 지방호족의 자제를 상경시킨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둘째는 역의 내용이다. 고려 국초의 기인은 지방호족의 국왕에 대한 충성의 담보로서의 의미가 있어, 다른 身役을 지지 않았으나, 문종대의 기인은 신역을 지고 있었다. 이것은 시대의 변천으로 지방 세력의 지위가 하락됨에 따라서 중앙에서 선상된 기인을 노동의 인적자원으로 전용한 것이다. 기인은 중앙관서에서 이속격으로 잡무에 종사하면서 사심관 선발의 자문에 응하거나 당번을 나누어서 왕실을 시위하는 등의 일을 하고 그 역의 대가로서 기인전의 지급 및 동정직이 제수 되었다. 하지만 고려 후기에 전국적으로 지방관 파견이 확대됨에 따라 토착적 세력을 유지하던 향리의 정치, 사회적 지위 전락과 더불어 기인역 또한 고역으로 변모하였다. 그리하여 기인제도의 존폐 논의가 있기까지 한데, 고려말의 혁파논의에도 불구하고 기인제도는 조선조 광해군 때 대동법의 실시로 인해 사실상 기인의 역이 혁파될 때까지 비교적 질서있고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
◎ 사심관제도
기인제도와 더불어 호족세력을 무마 통제하기 위하여 고려정부에서 마련한 또 하나의 제도가 사심관제도였다. 사심관제는 외관이 본격적으로 파견되지 못하였던 성종 무렵에 이르기까지는 지방통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공신들은 이 제도에 따라 출신 本州 본주란 본관의 주를 의미하는데, 당시의 공신들은 거의가 호족출신으로서 중앙 귀족화되어 있지만, 그 본관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세력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방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에 대한 연고권을 바탕으로 그 권리를 공인 받으면서 사심이 되었다고 불 수 있다. 이들 공신들의 재지 세력기반을 이용하여 그 지방의 향리세력을 통제하려고 하였던 것이 결국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시기의 지방 세력에 대한 유일한 통제수단이었다. 고려의 지방통치는 수령-향리-지방민으로 이어지는 군현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성종 때에 와서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그 지방출신으로서 그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을 중앙 관리로 복무하게 하면서 그 출신지역을 제압 지배하게 된 것이 사심관의 설치 목적이었고, 그것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볼 때 합리적인 처사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심관은 人民의 宗主, 流品의 甄別, 賦役의 均平, 風俗의 表正 등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직능은 바로 지방관인 외관의 직능과 흡사하였다. 외관과 사심관의 권한을 비교해 볼 때, 정치적 행정적 지배권의 상당한 부분을 외관이 장악했으며, 사심관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많은 권한 중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권한을 유지해 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지방사회의 통치는 이제 중앙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통치방식이 일단 성공하게 됨으로써 사심관의 권한은 해당지역의 연고권에 기초한 경제적 관리권을 통해 지방사회 지배에 관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외관과 이중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는 정도로 제한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고려후기에 오면 권호들이 경제적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사심관의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하여, 충숙왕 4년(1318)에 혁파되어 고려시대의 지방통치는 종래의 지방관-향리-농민(지방군현민)이라는 장치와 사심관-향리-농민이라는 기구의 이중적 조직에서 전자의 지방관제로 일원화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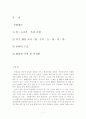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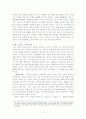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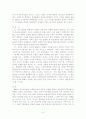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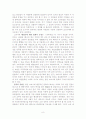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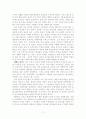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