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전(傳)
1. 가전의 명칭
2. 가전의 개념
3. 가전의 발생
4. 가전의 전개양상
5. 가전의 구조
6. 가전의 특징
7. 가전의 문학사적 위치
8. 가전과 소설의 관계
Ⅱ. ‘전(傳)’의 작품세계
1. 가전(家傳)
2. <동문선>에 수록된 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전(私傳)’
3.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 ‘탁전(托傳)’
4. 가전(假傳)
<참고문헌>
1. 가전의 명칭
2. 가전의 개념
3. 가전의 발생
4. 가전의 전개양상
5. 가전의 구조
6. 가전의 특징
7. 가전의 문학사적 위치
8. 가전과 소설의 관계
Ⅱ. ‘전(傳)’의 작품세계
1. 가전(家傳)
2. <동문선>에 수록된 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전(私傳)’
3.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 ‘탁전(托傳)’
4. 가전(假傳)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서 관련이 있는 고사를 잡다하게 열거하며 사물의 쓰임새를 비유로 삼아 사람의 처지를 문제 삼기도 하는 등의 이중의 작업을 한 것이다.
① 임춘의 <국순전(麴醇傳)>, <공방전(孔方傳)>
- 임춘(林春, 1147~1197)
고려 중기의 문인. 호는 서하(西河). 과거에 수차 낙방하였으며, 1170년(의종 24) 정중부의 난 때에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이인로, 오세재 등과 함께 강좌칠현(江左七賢)의 한 사람으로 시와 술로 세월을 보냈다. 한문과 당시(唐詩)에 능하였으며, 이인로가 그 유고(遺稿)를 모아 『서하선생집』6권을 엮었다. 『삼한시귀감』에 시문이 기록되어 있고, 두 편의 가전체 소설이 전한다.
- 임춘은 화려한 공상이나 관념적인 사고의 틀을 깨고, 구체적인 사물과의 일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처지를 드러냈는데 사물을 중요시하면서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국순전>은 술을, <공방전>은 돈을 다루었다. 술이 아쉬운 처지이고, 돈을 우습게 여기기에는 너무 가난해서 술타령과 돈타령을 해야만 했는데 그 둘을 의인화함으로써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했다. 그는 여기서 술과 돈의 생애를 서술하면서 고사와 전거를 갖다대는 능력을 한껏 자랑하는 것으로 세상에 불만을 나타냈고, 자기의 불운을 한탄하는 방법으로 삼았다.
임춘이 이러한 글을 쓴 이유는 돈이 벼슬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자기는 어렵게 살 수 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는 중국 화폐사에 얽힌 고사를 지겨울 정도로 열거하여 지식을 늘려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그러한 평가를 얻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② 이규보의 <국선생전(麴先生傳)>, <청강사자현부전(淸江使者玄夫傳)>
- 이규보(李奎報), 1168~1241)
고려 시대 의종~고종 연간의 문인. 자는 춘경(春卿), 호는 백운거사(白雲居士). 당대의 뛰어난 시인으로서 호탕하고도 웅려한 시풍을 구사하여 일세를 풍미하였다. 평소에 시와 술, 거문고를 즐겨 삼혹호 선생(三酷好先生)이라 스스로 칭할 만큼 성격과 행동이 호방하였으며, 만년에는 불교에 심취, 귀의하였다. 생전에 강좌칠현으로 불리던 오세재, 임춘, 조통, 황보항, 함순, 이담지 등의 명류와도 술벗을 하고 그들의 청담한 시상에 공감하였으나, 그들과는 달리 염세 도피의 사상을 배척풍자하였다.
- 이규보는 임춘의 가전을 읽고 더 나은 작품을 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임춘의 <국순전>과 다른 생각을 <국선생전>에서 펼치고 있다. 곧 <국선생전>은 술을, <청강사자현부전>에서는 거북을 등장시켰다. 이규보는 현부처럼 자유스럽게 살고자 하다가 뜻한 바와 다르게 세상에 나와서 벼슬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글을 지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실수를 하고 마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국선생전>에서 국성은 모든 일이 잘되기만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과는 딴판인 것이다. 즉, 사물의 이치에 술과 같은 경우가 있고 거북과 같은 경우도 있으며 사람이 나아가고 물러나는 데서도 흥망과 성패가 교체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규보의 가전은 작품에서 고사 열거를 줄이고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또한 불평을 토로하면서도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사물을 들어 세상의 이치를 밝히는데 힘쓴 점이 높이 평가된다.
- ‘문조물(問造物)’에 나타난 이규보의 문학관
“도(道)라는 이름의 진리는 물(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하여 검증해야 한다.”, “물이 도의 기준이며, 현실이 중요하다.”, “물이 스스로 생성되고 변화할 따름이지, 조물주가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것은 거짓이다.”는 ‘문조물’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규보는 ‘물(物)’의 존재를 중시하고 모든 인식과 존재의 원리가 현실에 있다는 사고 방식을 보이고 있다. ‘물’이 조물주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하는 관점은 ‘물’을 떠나서 ‘도(道)’와 ‘성(性)\'을 온전하게 하겠다는 기득권층의 주관적 관념론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 속에서 사물과 사람이 별개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물에 대한 세밀한 관심을 보인 태도가 문학적으로 반영된 것이 바로 가전체 문학이다.
③ 이곡의 <죽부인전(竹夫人傳)>, 이첨의 <저생전(楮生傳)>
이곡과 이첨의 작품은 가전이 모색기의 진통을 거쳐 사대부문학으로 정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곧 생활 주변의 사물을 차분하게 살피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곡의 <죽부인전>은 죽부인이라는 기구를 등장시켜 대나무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열거하면서 그 용도가 하나의 죽부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죽부인의 생김새와 행실을 말하고 그것을 통해 현숙한 부인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 보였다. 이첨의 저생전은 말 그대로 종이의 내력을 다루면서 관련된 사항을 광범위하게 거론했다. 종이는 문인과 친하고 제자백가의 글을 모두 기록했다고 하고, 그 밖에도 많은 쓰임새가 있어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칭송했다.
④ 승려 혜심의 가전
<동문선>에 실리지 않고 별도로 전하는 혜심의 가전은, 과거를 보아 급제했다가 승려가 된 혜심이 선시를 개척해 발상을 혁신하는데서 더 나아가 일반 문인들이 하는 창작활동에도 동참해 가전을 불교문학으로 만들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의 작품 <죽존자전(竹尊者傳)>에서는 대나무를, <빙도자전(氷道者傳)>에서는 얼음을 의인화해 불법을 닦는 승려의 자세를 나타낸 점은 특이하지만 의미의 층위 구성에서는 가전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⑤ 식영암의 <정시자전(丁侍者傳)>
<동문선>에 실려 있으나 상례를 벗어난 승려의 작품이다. 꿈속에서 자기를 찾아온 정시자의 형상은 지팡이였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에게는 필요 없는 듯해서 다른 이에게 가라고 일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뜻이 구체적이고 정확하지 않아 이 작품에서부터 가전이 해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2005 제 4판 1쇄
김창룡, 『가전산책』,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4
조동일 외 6인, 『한국문학강의』, 길벗, 1994
김창룡, 『가전문학의 이론』, 박이정, 2001
① 임춘의 <국순전(麴醇傳)>, <공방전(孔方傳)>
- 임춘(林春, 1147~1197)
고려 중기의 문인. 호는 서하(西河). 과거에 수차 낙방하였으며, 1170년(의종 24) 정중부의 난 때에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이인로, 오세재 등과 함께 강좌칠현(江左七賢)의 한 사람으로 시와 술로 세월을 보냈다. 한문과 당시(唐詩)에 능하였으며, 이인로가 그 유고(遺稿)를 모아 『서하선생집』6권을 엮었다. 『삼한시귀감』에 시문이 기록되어 있고, 두 편의 가전체 소설이 전한다.
- 임춘은 화려한 공상이나 관념적인 사고의 틀을 깨고, 구체적인 사물과의 일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처지를 드러냈는데 사물을 중요시하면서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국순전>은 술을, <공방전>은 돈을 다루었다. 술이 아쉬운 처지이고, 돈을 우습게 여기기에는 너무 가난해서 술타령과 돈타령을 해야만 했는데 그 둘을 의인화함으로써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했다. 그는 여기서 술과 돈의 생애를 서술하면서 고사와 전거를 갖다대는 능력을 한껏 자랑하는 것으로 세상에 불만을 나타냈고, 자기의 불운을 한탄하는 방법으로 삼았다.
임춘이 이러한 글을 쓴 이유는 돈이 벼슬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자기는 어렵게 살 수 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는 중국 화폐사에 얽힌 고사를 지겨울 정도로 열거하여 지식을 늘려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그러한 평가를 얻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② 이규보의 <국선생전(麴先生傳)>, <청강사자현부전(淸江使者玄夫傳)>
- 이규보(李奎報), 1168~1241)
고려 시대 의종~고종 연간의 문인. 자는 춘경(春卿), 호는 백운거사(白雲居士). 당대의 뛰어난 시인으로서 호탕하고도 웅려한 시풍을 구사하여 일세를 풍미하였다. 평소에 시와 술, 거문고를 즐겨 삼혹호 선생(三酷好先生)이라 스스로 칭할 만큼 성격과 행동이 호방하였으며, 만년에는 불교에 심취, 귀의하였다. 생전에 강좌칠현으로 불리던 오세재, 임춘, 조통, 황보항, 함순, 이담지 등의 명류와도 술벗을 하고 그들의 청담한 시상에 공감하였으나, 그들과는 달리 염세 도피의 사상을 배척풍자하였다.
- 이규보는 임춘의 가전을 읽고 더 나은 작품을 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임춘의 <국순전>과 다른 생각을 <국선생전>에서 펼치고 있다. 곧 <국선생전>은 술을, <청강사자현부전>에서는 거북을 등장시켰다. 이규보는 현부처럼 자유스럽게 살고자 하다가 뜻한 바와 다르게 세상에 나와서 벼슬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글을 지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실수를 하고 마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국선생전>에서 국성은 모든 일이 잘되기만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과는 딴판인 것이다. 즉, 사물의 이치에 술과 같은 경우가 있고 거북과 같은 경우도 있으며 사람이 나아가고 물러나는 데서도 흥망과 성패가 교체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규보의 가전은 작품에서 고사 열거를 줄이고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또한 불평을 토로하면서도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사물을 들어 세상의 이치를 밝히는데 힘쓴 점이 높이 평가된다.
- ‘문조물(問造物)’에 나타난 이규보의 문학관
“도(道)라는 이름의 진리는 물(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하여 검증해야 한다.”, “물이 도의 기준이며, 현실이 중요하다.”, “물이 스스로 생성되고 변화할 따름이지, 조물주가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것은 거짓이다.”는 ‘문조물’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규보는 ‘물(物)’의 존재를 중시하고 모든 인식과 존재의 원리가 현실에 있다는 사고 방식을 보이고 있다. ‘물’이 조물주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하는 관점은 ‘물’을 떠나서 ‘도(道)’와 ‘성(性)\'을 온전하게 하겠다는 기득권층의 주관적 관념론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 속에서 사물과 사람이 별개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물에 대한 세밀한 관심을 보인 태도가 문학적으로 반영된 것이 바로 가전체 문학이다.
③ 이곡의 <죽부인전(竹夫人傳)>, 이첨의 <저생전(楮生傳)>
이곡과 이첨의 작품은 가전이 모색기의 진통을 거쳐 사대부문학으로 정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곧 생활 주변의 사물을 차분하게 살피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곡의 <죽부인전>은 죽부인이라는 기구를 등장시켜 대나무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열거하면서 그 용도가 하나의 죽부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죽부인의 생김새와 행실을 말하고 그것을 통해 현숙한 부인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 보였다. 이첨의 저생전은 말 그대로 종이의 내력을 다루면서 관련된 사항을 광범위하게 거론했다. 종이는 문인과 친하고 제자백가의 글을 모두 기록했다고 하고, 그 밖에도 많은 쓰임새가 있어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칭송했다.
④ 승려 혜심의 가전
<동문선>에 실리지 않고 별도로 전하는 혜심의 가전은, 과거를 보아 급제했다가 승려가 된 혜심이 선시를 개척해 발상을 혁신하는데서 더 나아가 일반 문인들이 하는 창작활동에도 동참해 가전을 불교문학으로 만들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의 작품 <죽존자전(竹尊者傳)>에서는 대나무를, <빙도자전(氷道者傳)>에서는 얼음을 의인화해 불법을 닦는 승려의 자세를 나타낸 점은 특이하지만 의미의 층위 구성에서는 가전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⑤ 식영암의 <정시자전(丁侍者傳)>
<동문선>에 실려 있으나 상례를 벗어난 승려의 작품이다. 꿈속에서 자기를 찾아온 정시자의 형상은 지팡이였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에게는 필요 없는 듯해서 다른 이에게 가라고 일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뜻이 구체적이고 정확하지 않아 이 작품에서부터 가전이 해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2005 제 4판 1쇄
김창룡, 『가전산책』,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4
조동일 외 6인, 『한국문학강의』, 길벗, 1994
김창룡, 『가전문학의 이론』, 박이정, 2001
추천자료
 [마케팅전략]TROMM, 세탁기가 이름을 입었다
[마케팅전략]TROMM, 세탁기가 이름을 입었다 유통관리 유통산업
유통관리 유통산업 하우젠 마케팅 사례분석
하우젠 마케팅 사례분석 마케팅분석'딤채'
마케팅분석'딤채' 하우젠의 마케팅 전략과 브랜드개발
하우젠의 마케팅 전략과 브랜드개발 GE 사의 인재확보전략
GE 사의 인재확보전략 [2007년12월]GE사의 경영전략 사례연구 조사보고서
[2007년12월]GE사의 경영전략 사례연구 조사보고서  구매후 부조화(딤채)
구매후 부조화(딤채) 4단계 독학사 교양국어 시험대비 요약.
4단계 독학사 교양국어 시험대비 요약. 노키아,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
노키아,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 웅진코웨이 마케팅, 성공사례, 마케팅전략, 성공전략, 경영전략분석, 기업소개 및 역사와 특...
웅진코웨이 마케팅, 성공사례, 마케팅전략, 성공전략, 경영전략분석, 기업소개 및 역사와 특... 도요타 자동차공장의 생산방식(TPS)과 품질
도요타 자동차공장의 생산방식(TPS)과 품질 마케팅 사례연구 삼성전자 하우젠
마케팅 사례연구 삼성전자 하우젠 유통기업전략론 - 점포비교와 실제 (하이마트, LG전자)
유통기업전략론 - 점포비교와 실제 (하이마트, LG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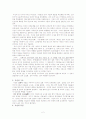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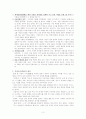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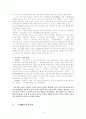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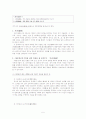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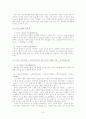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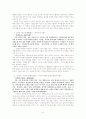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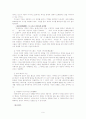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