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작가의 생애
2. 김사량의 작품 연구
3. 김사량의 창작어관
4. 김사량과 장혁주의 비교
1.작가의 생애
2. 김사량의 작품 연구
3. 김사량의 창작어관
4. 김사량과 장혁주의 비교
본문내용
본어로 예술적 형상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④ 현재의 모든 희생을 지불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말을 해야 폭넓게 독자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러 일본어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 로, 당사자에게 어떤 통절한 심적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⑤ 조선 문화, 생활, 감정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일본인 독자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동기
⑥ 조선 문화를 일본, 동양, 세계로 범위를 넓히기 위해 미력이나마 그 중개자의 수고 를 하고 싶다는 동기 등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⑦ 경계해야 할 것은 일본어로만 써야 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일 것이다.
4. 김사량과 장혁주의 비교
김사량은 장혁주(張赫宙, 1905~ )와 나란히 ‘재일조선인문학’의 효시로 간주 되고 있다.『문예수도(文藝首都)』나『문예(文藝)』등의 문예잡지에서 일본어 작가로서 활동한 선후배 관계의 두 사람은, 그 초기 작품에서 식민지화된 반도에 사는 조선인과 생활의 궁핍함 때문에 일본으로 흘러들지 않을 수 없었던 재일 조선인의 고통과 슬픔, 그 호소를 대변하는 테마와 모티브의 공통성에서 동지적인 연관을 갖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장혁주가 「아귀도(餓鬼道)」로 문단에 데뷔한 것은 1932년이다.) 그러나 김사량의 「빛 속으로」가 아쿠타가와상 후보가 될 무렵(1939)에 장혁주는 이미 「가토 기요마사」등 이른바 ‘친일파’인 작품을 많이 쓰고 있었다. 일본과 반도에서 ‘황국 문학’장려, ‘내선일체’, ‘창씨 개명’, ‘일본어 상용’ 등 황국주의, 군국주의가 고조됨에 따라 조선인 문학가는 그 민족주의적 입장과 친일파적 입장 사이에서 양자 택일을 강요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사량과 장혁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장혁주는 『개간(開墾)』『행복한 백성』『이와모토 시엔헤이』등에서 일본의 만주 침략, 조선인의 지원병 제도, 징병제도의 선전고취 등 돌이킬 수 없는 ‘일본인화’의 길을 걸어갔다. 이에 반해 김사량은 비록 「바다의 노래」등 국책 프로파간다 작품을 창작했었지만, 일본 패전 직전에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연안 지구로 탈출 했고 나아가 조선이 해방된 후에는 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의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인민 문학가’의 길을 걸어갔다.
장혁주는 일본의 패전후에 일본으로 귀화하여 ‘노구치 가쿠추’라는 이름으로 왕성한 창작력을 보였다. 그러나 김사량은 36세의 젊은 나이에 산중 궤주 도중 행방 불명 되었다.
④ 현재의 모든 희생을 지불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말을 해야 폭넓게 독자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러 일본어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 로, 당사자에게 어떤 통절한 심적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⑤ 조선 문화, 생활, 감정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일본인 독자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동기
⑥ 조선 문화를 일본, 동양, 세계로 범위를 넓히기 위해 미력이나마 그 중개자의 수고 를 하고 싶다는 동기 등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⑦ 경계해야 할 것은 일본어로만 써야 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일 것이다.
4. 김사량과 장혁주의 비교
김사량은 장혁주(張赫宙, 1905~ )와 나란히 ‘재일조선인문학’의 효시로 간주 되고 있다.『문예수도(文藝首都)』나『문예(文藝)』등의 문예잡지에서 일본어 작가로서 활동한 선후배 관계의 두 사람은, 그 초기 작품에서 식민지화된 반도에 사는 조선인과 생활의 궁핍함 때문에 일본으로 흘러들지 않을 수 없었던 재일 조선인의 고통과 슬픔, 그 호소를 대변하는 테마와 모티브의 공통성에서 동지적인 연관을 갖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장혁주가 「아귀도(餓鬼道)」로 문단에 데뷔한 것은 1932년이다.) 그러나 김사량의 「빛 속으로」가 아쿠타가와상 후보가 될 무렵(1939)에 장혁주는 이미 「가토 기요마사」등 이른바 ‘친일파’인 작품을 많이 쓰고 있었다. 일본과 반도에서 ‘황국 문학’장려, ‘내선일체’, ‘창씨 개명’, ‘일본어 상용’ 등 황국주의, 군국주의가 고조됨에 따라 조선인 문학가는 그 민족주의적 입장과 친일파적 입장 사이에서 양자 택일을 강요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사량과 장혁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장혁주는 『개간(開墾)』『행복한 백성』『이와모토 시엔헤이』등에서 일본의 만주 침략, 조선인의 지원병 제도, 징병제도의 선전고취 등 돌이킬 수 없는 ‘일본인화’의 길을 걸어갔다. 이에 반해 김사량은 비록 「바다의 노래」등 국책 프로파간다 작품을 창작했었지만, 일본 패전 직전에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연안 지구로 탈출 했고 나아가 조선이 해방된 후에는 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의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인민 문학가’의 길을 걸어갔다.
장혁주는 일본의 패전후에 일본으로 귀화하여 ‘노구치 가쿠추’라는 이름으로 왕성한 창작력을 보였다. 그러나 김사량은 36세의 젊은 나이에 산중 궤주 도중 행방 불명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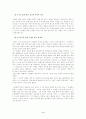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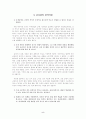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