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당대 사회 역사적 배경과 그 비극성
2) 신분 계층으로 인한 비극성의 심화
3) 임꺽정의 삶에 드러난 비극성 (화적편 중심)
4) 의형제들의 삶에 드러난 비극성 (의형제편 중심)
Ⅲ. 결론
Ⅱ. 본론
1) 당대 사회 역사적 배경과 그 비극성
2) 신분 계층으로 인한 비극성의 심화
3) 임꺽정의 삶에 드러난 비극성 (화적편 중심)
4) 의형제들의 삶에 드러난 비극성 (의형제편 중심)
Ⅲ. 결론
본문내용
골라들이시다니 무슨 까닭이 있소?”
“까닭은 나도 모르우.”
“비부쟁이에 무슨 까닭이 붙은 것 같구려.”
“까닭이 있거나 없거나 당신이 이쁜 안해만 데리구 살게 되면 고만 아니오.” 홍명희,『林巨正』의형제편 二, 사계절출판사, p.231
“언제 서방님 말씀이 기셨든가?”
“아니올시다. 아씨께서 오라셨습니다.”
“옳지, 아씨께서 오라셨어? 그러려니.”
그 양반이 고개를 젖혀들고 코웃음을 치는 모양이 말웃음 흡사하데. 위의 책. p.232
위의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돌석이 김도사집의 안주인의 계책으로 비부로 들어오게 된 것은 그 집안의 사람들 모두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일이었으나 누구도 그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해주지는 않는다. 결국 그는 김도사와 아내가 통간하는 것을 목격한다. 처음에는 아내를 속량해주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으나 김도사는 각서를 써달라는 배돌석에게 그가 글을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 또 다시 그를 속여 곤경에 빠뜨리려 든다. 결국 배돌석은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흉터를 남기고 도망쳐 떠돌이 신세가 된다. 배돌석은 비참했던 떠돌이 생활을 했던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김도사집 내외 모두에게 이용당한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그 후에 그는 호랑이를 잡은 공으로 역졸이 되고 虎患으로 과부가 된 여자를 아내로 맞지만 그의 아내 역시 처음부터 배돌석을 속이고 동네의 사냥꾼 김 서방과 정을 통하고 있었다. 또 다시 뒤늦게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배돌석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던 김 서방과 그의 아내를 죽이게 되고 결국 청석골로 숨어들어가게 된다. 배돌석의 비극성은 그가 주변 상황에 대한 무지, 즉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인물들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며 희생양이 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처음엔 그의 비참한 떠돌이 신세때문에 양반집의 집안 문제에 이용당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또 다시 자신의 아내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러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현실은 그를 살인이라는 극단적 상황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청석골로 도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3) 나가며
임꺽정이 청석골에 입당한 내력은 모순된 신분 제도 때문에 자신의 희망을 이룰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존 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된 가운데 스스로 갈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對사회적, 영웅적 성격이 강조되어 있다. 이에 반해 발표문에 제시된 박유복, 곽오주, 배돌석과 같은 그의 의형제들이 청석골에 들어오게 된 내력은 개인적이고 反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한창엽,『임거정의 서사와 패로디』 국학자료원, 1997. p.195
또한 그들은 힘이 장사거나 돌팔매질, 표창과 같은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긴 하지만 특별히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자신의 소망이 박탈되는 세계에 대항해서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성격을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영웅비극의 주인공들에게 나타나는 비극성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이유였든지 현실에 부딪혀 좌절하게 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청석골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비극적인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 의형제 편은 『林巨正』의 여러 편 가운데서 사실주의적이고 민중적 특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 부분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 당시 그들과 같은 하층민에게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뜻일 것이다. 의형제들의 삶에서 나타난 비극성의 요소들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그들이 하층민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었다는 요소가 깔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삶에서 비극성을 찾는 것은 의형제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하층민들의 삶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비극성이라는 의미 또한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웅성을 지닌 인물들에게 드러나는 비극성을 찾아보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홍명희,『林巨正』전 10권, 서울 : 사계절출판사, 1995
한창엽, ≪임거정의 서사와 패로디≫ 국학자료원, 1997
김창현, <영웅좌절담류 비극소설의 특징과 계보 파악을 위한 시론>
차혜영, <『임꺽정』의 인물과 서술방식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Ⅲ. 결론
이제껏 본 발표조는 『林巨正』에 드러난 영웅서사의 비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 다. 임꺽정은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소설의 전개 과정 속에서 자신의 현실 의식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헤쳐 나가고자 하지만 결국엔 자신이 처해 있는 세계가 자신에게는 비극적 세계임을 깨닫게 되고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된다. 이는 조선조 사회라는 사회적 배경과 인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각각의 인물의 성격은 계층적 일원화와 맞물려 이루어졌고, 이야기의 전개상 그 원동력이 된 것은 임꺽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힌 한이었다. 이러한 점이 비극성을 전제함을 알고, 임꺽정은 좌절과 절망을 느끼며 우리는 여기에서 비극성이 심화됨을 알 수 있다. 모순된 봉건주의 사회에서 임꺽정 개인의 좌절은, 그가 자신의 뜻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민중들의 입장을 수렴한 결과이며, 끊임없는 자아와 세계와의 대응과 대립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간 결과라고 생각한다.
『林巨正』이 식민지 당시의 현실의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국권 상실의 차원이 아니라, 식민주의 지배 정책이 낳은 핍박받는 민중들의 실체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는 부조리한 지배층의 논리를 바탕으로 민중들의 삶을 어렵게만 몰고 갔던 봉건주의 질서와 그 속의 영웅과 인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비극적 깨달음을 느끼며 절망하게 만드는 작가 의식이 담긴 현실적 소설이라고도 생각한다. 이러한 소설의 주체를 우리의 민족적 삶 속에 있는 민중이라고 생각한다면, 임꺽정과 같은 인물의 삶이 가슴 아프게 비극으로 다가오며, 그의 삶은 더럽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세계관을 갖고 반항하다가 간 삶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실제 역사에서나 허구의 소설에서나 드러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문학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비극성의 전달이라고 생각한다.
“까닭은 나도 모르우.”
“비부쟁이에 무슨 까닭이 붙은 것 같구려.”
“까닭이 있거나 없거나 당신이 이쁜 안해만 데리구 살게 되면 고만 아니오.” 홍명희,『林巨正』의형제편 二, 사계절출판사, p.231
“언제 서방님 말씀이 기셨든가?”
“아니올시다. 아씨께서 오라셨습니다.”
“옳지, 아씨께서 오라셨어? 그러려니.”
그 양반이 고개를 젖혀들고 코웃음을 치는 모양이 말웃음 흡사하데. 위의 책. p.232
위의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돌석이 김도사집의 안주인의 계책으로 비부로 들어오게 된 것은 그 집안의 사람들 모두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일이었으나 누구도 그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해주지는 않는다. 결국 그는 김도사와 아내가 통간하는 것을 목격한다. 처음에는 아내를 속량해주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으나 김도사는 각서를 써달라는 배돌석에게 그가 글을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 또 다시 그를 속여 곤경에 빠뜨리려 든다. 결국 배돌석은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흉터를 남기고 도망쳐 떠돌이 신세가 된다. 배돌석은 비참했던 떠돌이 생활을 했던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김도사집 내외 모두에게 이용당한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그 후에 그는 호랑이를 잡은 공으로 역졸이 되고 虎患으로 과부가 된 여자를 아내로 맞지만 그의 아내 역시 처음부터 배돌석을 속이고 동네의 사냥꾼 김 서방과 정을 통하고 있었다. 또 다시 뒤늦게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배돌석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던 김 서방과 그의 아내를 죽이게 되고 결국 청석골로 숨어들어가게 된다. 배돌석의 비극성은 그가 주변 상황에 대한 무지, 즉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인물들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며 희생양이 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처음엔 그의 비참한 떠돌이 신세때문에 양반집의 집안 문제에 이용당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또 다시 자신의 아내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러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현실은 그를 살인이라는 극단적 상황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청석골로 도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3) 나가며
임꺽정이 청석골에 입당한 내력은 모순된 신분 제도 때문에 자신의 희망을 이룰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존 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된 가운데 스스로 갈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對사회적, 영웅적 성격이 강조되어 있다. 이에 반해 발표문에 제시된 박유복, 곽오주, 배돌석과 같은 그의 의형제들이 청석골에 들어오게 된 내력은 개인적이고 反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한창엽,『임거정의 서사와 패로디』 국학자료원, 1997. p.195
또한 그들은 힘이 장사거나 돌팔매질, 표창과 같은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긴 하지만 특별히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자신의 소망이 박탈되는 세계에 대항해서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성격을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영웅비극의 주인공들에게 나타나는 비극성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이유였든지 현실에 부딪혀 좌절하게 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청석골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비극적인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 의형제 편은 『林巨正』의 여러 편 가운데서 사실주의적이고 민중적 특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 부분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 당시 그들과 같은 하층민에게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뜻일 것이다. 의형제들의 삶에서 나타난 비극성의 요소들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그들이 하층민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었다는 요소가 깔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삶에서 비극성을 찾는 것은 의형제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하층민들의 삶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비극성이라는 의미 또한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웅성을 지닌 인물들에게 드러나는 비극성을 찾아보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홍명희,『林巨正』전 10권, 서울 : 사계절출판사, 1995
한창엽, ≪임거정의 서사와 패로디≫ 국학자료원, 1997
김창현, <영웅좌절담류 비극소설의 특징과 계보 파악을 위한 시론>
차혜영, <『임꺽정』의 인물과 서술방식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Ⅲ. 결론
이제껏 본 발표조는 『林巨正』에 드러난 영웅서사의 비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 다. 임꺽정은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소설의 전개 과정 속에서 자신의 현실 의식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헤쳐 나가고자 하지만 결국엔 자신이 처해 있는 세계가 자신에게는 비극적 세계임을 깨닫게 되고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된다. 이는 조선조 사회라는 사회적 배경과 인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각각의 인물의 성격은 계층적 일원화와 맞물려 이루어졌고, 이야기의 전개상 그 원동력이 된 것은 임꺽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힌 한이었다. 이러한 점이 비극성을 전제함을 알고, 임꺽정은 좌절과 절망을 느끼며 우리는 여기에서 비극성이 심화됨을 알 수 있다. 모순된 봉건주의 사회에서 임꺽정 개인의 좌절은, 그가 자신의 뜻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민중들의 입장을 수렴한 결과이며, 끊임없는 자아와 세계와의 대응과 대립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간 결과라고 생각한다.
『林巨正』이 식민지 당시의 현실의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국권 상실의 차원이 아니라, 식민주의 지배 정책이 낳은 핍박받는 민중들의 실체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는 부조리한 지배층의 논리를 바탕으로 민중들의 삶을 어렵게만 몰고 갔던 봉건주의 질서와 그 속의 영웅과 인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비극적 깨달음을 느끼며 절망하게 만드는 작가 의식이 담긴 현실적 소설이라고도 생각한다. 이러한 소설의 주체를 우리의 민족적 삶 속에 있는 민중이라고 생각한다면, 임꺽정과 같은 인물의 삶이 가슴 아프게 비극으로 다가오며, 그의 삶은 더럽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세계관을 갖고 반항하다가 간 삶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실제 역사에서나 허구의 소설에서나 드러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문학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비극성의 전달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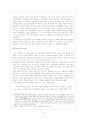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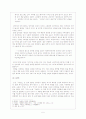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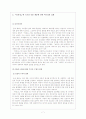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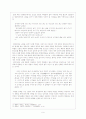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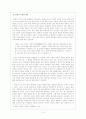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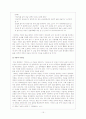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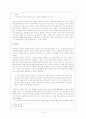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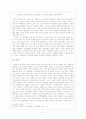











소개글